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목차
Ⅰ. 단원명
1. 단원의 개관
Ⅱ. 단원의 연구
1. 단원의 도입(생각해 보기)
2. 학습 계열
3. 단원의 학습 목표
Ⅲ. 단원의 지도 계획
1. 학습의 지도 계획
2. 평가 계획 및 방법
Ⅳ. 학습자 환경 분석
1. 학습자 실태 파악
2. 학습 환경 파악
Ⅴ. 학습내용 정리 및 교재 연구
1. 진단평가
2. 학습 만화
3. 학습 목표
4. 개념트리
5. 스펙트럼
6. 도플러효과
7. 허블 - 전개될 내용 관련 과학자소개
8. 탐구활동
9. 허블의 법칙과 그 적용
10. 심화학습
11. 정리
12. 형성평가
13. 보충학습
Ⅵ. 순환학습 모형에 따른 본시학습 지도안
1. 순환학습 모형
2. 순환학습 모형을 선택한 이유
3.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Ⅶ. 참고 문헌
1. 단원의 개관
Ⅱ. 단원의 연구
1. 단원의 도입(생각해 보기)
2. 학습 계열
3. 단원의 학습 목표
Ⅲ. 단원의 지도 계획
1. 학습의 지도 계획
2. 평가 계획 및 방법
Ⅳ. 학습자 환경 분석
1. 학습자 실태 파악
2. 학습 환경 파악
Ⅴ. 학습내용 정리 및 교재 연구
1. 진단평가
2. 학습 만화
3. 학습 목표
4. 개념트리
5. 스펙트럼
6. 도플러효과
7. 허블 - 전개될 내용 관련 과학자소개
8. 탐구활동
9. 허블의 법칙과 그 적용
10. 심화학습
11. 정리
12. 형성평가
13. 보충학습
Ⅵ. 순환학습 모형에 따른 본시학습 지도안
1. 순환학습 모형
2. 순환학습 모형을 선택한 이유
3.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 덕분에 말이다.
-아름다운 우주 스토리(세종서적) 발췌-
→ 최근 더 정밀한 관측에 의하여 허블상수는 72±5 km/s/Mpc 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도 134±3억년, 우주의 크기도 134±3억 광년으로 수정됨에 따라 우주의 나이는 “100에서 200억년 정도”라는 식의 시대는 지나갔다.
◇ 퀘이사 ◇
- 우리로부터 아주 먼 퀘이사의 후퇴속도를 측정해보면 광속의 0.9배의 속도인 27만km의 후퇴속도를 갖는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또하나의 증거가 된다.-
퀘이사는 1960년대 초에 발견되었으며, 정상적이고 희미한 청색별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전파를 쏟아낸다는 점에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다. 별처럼 생긴 외양과 강력한 전파원이라는 점이 결합되면서 ‘별처럼 생긴 전파원’(quasi-stellar radio sources)을 줄여서 ‘퀘이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퀘이사에서 정말 이상한 부분은 그 스펙트럼이다. 3C 48로 알려진, 삼각형자리의 16등급짜리 점 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앨런 샌디지는 그것이 이제까지 본 별 중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온갖 설명이 난무했다. 퀘이사는-이질적이고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고밀도의 별일 것이다. 최근의 초신성 폭발로 남은 잔해로서 복사를 내보내는 중일 것이다. 우리가 아는 원소에서 전자가 제거되면서 뭔가 이상한 원소로 바뀌었다. 아예 별이 아닐지라도 모른다 등등. 샌디지는 “3C 48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데 주목했다. 그리고...드디어 과학사의 일대 도약이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소재 칼테크에서 일하던 네덜란드 천문학자 마르텐 슈미트가 그 도약의 주인공이었다. 슈미트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에서 보낸 칠흑같은 밤으로부터 싹텄다. “1942년 여름-뭔가 이상하지만 분명 여름이었다- 나는 아마추어 천문가였던 삼촌 댁을 방문했다. 삼촌은 나에게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나는 화장지 두루마리를 경통으로 이용하면서 안간힘을 쓴 끝에 드디어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 첫 번째 망원경이었다.”
그러부터 20년 후, 슈미트는 세계 최대의 망원경인. 팔로마 산의 200인치 헤일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1962년 12월 27일 저녁. 그는 저 수수께끼의 천체가운데 하나인 3C 273의 스펙트럼을 기록하는 중이었다. 3C 273은 처녀자리에 있었고, 외견상 정상적인 13등급의 별로 보였다. 근처에는 그 별에서 나온 희미한 기류까지 보였다.
1988년, 슈미트는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에는 그 기류가 전파원과 연관된 특이한 은하이며, 13등급의 별은 전방에 있는 천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슈미트는 스펙트럼을 보면 그 별이 상대적으로 가깝고 희미하며 정상적인 천체라는 것이 곧 밝혀지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좀 괴상했다. 1963년 2월 5일. 예의 별에 관해 기사를 쓰던 중 슈미트는 문득 그 이유를 깨달았다. 수소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상적인 방출선이 있기는 다 있었지만 결코 일반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스펙트럼의 적색쪽으로 한참 치우쳐 있었다.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놀라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어떤 천체의 적색 편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우리로부터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더 빨리 후퇴할수록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C 273의 적색 편이는 곧 그 별이 광속의 16%에 이르는 놀라운 속도로 멀어져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것은 3C 273이 전방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먼 거리(20억 광년)에 있는 천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비록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거리를 감안할 때, 3C 273은 하나의 은하보다 100배쯤 더 밝은 엄청난 발광체였다. 계산결과에 깜짝 놀란 슈미트는 동료 이새 그린슈타인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린슈타인은 즉시 3C 48의 스펙트럼을 재조사했고,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색 편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다. 3C 48은 광속의 37%라는 놀라운 속도로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었고, 담뱃불이나 생일 촛불처럼 작은 빛의 점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지평선 위에서 불타는 큰 화톳불이었다. 이 발견에 천문학계는 일약 활기를 띠었다.
퀘이사는 생김새와 달리 항성이 아니며, 불과 10% 정도만이 강력한 전파원이다. 퀘이사는 젊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은하에서 발견된다. 그 은하들은 중심부에 대략 태양의 1억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숨기고 있다.또 그 블랙홀은 가스, 먼지, 별들을 소용돌이치는 흡착원반-이 원반이 마치 거대한 도넛처럼 블랙홀을 감싸고 있다-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천체들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들어가면 온도가 수억 도로 올라간다. 또한 빛, X선, 자외선 및 적외선 복사, 감마선, 종종 전파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엄청난 에너지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퀘이사는 가스가 풍부한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할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적외선 천문위성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은하들 중 일부가 충돌에 의해 생긴 거대한 먼지 폭풍 뒤에 퀘이사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수천 개의 퀘이사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새로 발견된 것일수록 더 멀리 있었다. 다른 폭발성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에서는 퀘이사를 볼 수 없다. 그것은 지금 보이는 퀘이사라고 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퀘이사는 이를테면 윈시 우주에 사는 이방인이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예를 든다. “70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를 본다는 것은 지구가 미처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구를 향해 먼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빛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퀘이사는 너무도 머나먼 거리, 빅뱅에 가까운 시간대에서 관측되고 있다. 그야말로 시간의 가장자리에 있는 셈이다. 퀘이사는 우리와 그것들 사이 - 과거와 현재 사이- 의 공간을 마치 우주의 플래시처럼 비추고 있다.
-아름다운 우주 스토리(세종서적) 발췌-
→ 최근 더 정밀한 관측에 의하여 허블상수는 72±5 km/s/Mpc 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도 134±3억년, 우주의 크기도 134±3억 광년으로 수정됨에 따라 우주의 나이는 “100에서 200억년 정도”라는 식의 시대는 지나갔다.
◇ 퀘이사 ◇
- 우리로부터 아주 먼 퀘이사의 후퇴속도를 측정해보면 광속의 0.9배의 속도인 27만km의 후퇴속도를 갖는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또하나의 증거가 된다.-
퀘이사는 1960년대 초에 발견되었으며, 정상적이고 희미한 청색별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전파를 쏟아낸다는 점에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다. 별처럼 생긴 외양과 강력한 전파원이라는 점이 결합되면서 ‘별처럼 생긴 전파원’(quasi-stellar radio sources)을 줄여서 ‘퀘이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퀘이사에서 정말 이상한 부분은 그 스펙트럼이다. 3C 48로 알려진, 삼각형자리의 16등급짜리 점 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앨런 샌디지는 그것이 이제까지 본 별 중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온갖 설명이 난무했다. 퀘이사는-이질적이고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고밀도의 별일 것이다. 최근의 초신성 폭발로 남은 잔해로서 복사를 내보내는 중일 것이다. 우리가 아는 원소에서 전자가 제거되면서 뭔가 이상한 원소로 바뀌었다. 아예 별이 아닐지라도 모른다 등등. 샌디지는 “3C 48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데 주목했다. 그리고...드디어 과학사의 일대 도약이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소재 칼테크에서 일하던 네덜란드 천문학자 마르텐 슈미트가 그 도약의 주인공이었다. 슈미트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에서 보낸 칠흑같은 밤으로부터 싹텄다. “1942년 여름-뭔가 이상하지만 분명 여름이었다- 나는 아마추어 천문가였던 삼촌 댁을 방문했다. 삼촌은 나에게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나는 화장지 두루마리를 경통으로 이용하면서 안간힘을 쓴 끝에 드디어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 첫 번째 망원경이었다.”
그러부터 20년 후, 슈미트는 세계 최대의 망원경인. 팔로마 산의 200인치 헤일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1962년 12월 27일 저녁. 그는 저 수수께끼의 천체가운데 하나인 3C 273의 스펙트럼을 기록하는 중이었다. 3C 273은 처녀자리에 있었고, 외견상 정상적인 13등급의 별로 보였다. 근처에는 그 별에서 나온 희미한 기류까지 보였다.
1988년, 슈미트는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에는 그 기류가 전파원과 연관된 특이한 은하이며, 13등급의 별은 전방에 있는 천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슈미트는 스펙트럼을 보면 그 별이 상대적으로 가깝고 희미하며 정상적인 천체라는 것이 곧 밝혀지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좀 괴상했다. 1963년 2월 5일. 예의 별에 관해 기사를 쓰던 중 슈미트는 문득 그 이유를 깨달았다. 수소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상적인 방출선이 있기는 다 있었지만 결코 일반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스펙트럼의 적색쪽으로 한참 치우쳐 있었다.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놀라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어떤 천체의 적색 편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우리로부터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더 빨리 후퇴할수록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C 273의 적색 편이는 곧 그 별이 광속의 16%에 이르는 놀라운 속도로 멀어져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것은 3C 273이 전방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먼 거리(20억 광년)에 있는 천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비록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거리를 감안할 때, 3C 273은 하나의 은하보다 100배쯤 더 밝은 엄청난 발광체였다. 계산결과에 깜짝 놀란 슈미트는 동료 이새 그린슈타인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린슈타인은 즉시 3C 48의 스펙트럼을 재조사했고,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색 편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다. 3C 48은 광속의 37%라는 놀라운 속도로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었고, 담뱃불이나 생일 촛불처럼 작은 빛의 점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지평선 위에서 불타는 큰 화톳불이었다. 이 발견에 천문학계는 일약 활기를 띠었다.
퀘이사는 생김새와 달리 항성이 아니며, 불과 10% 정도만이 강력한 전파원이다. 퀘이사는 젊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은하에서 발견된다. 그 은하들은 중심부에 대략 태양의 1억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숨기고 있다.또 그 블랙홀은 가스, 먼지, 별들을 소용돌이치는 흡착원반-이 원반이 마치 거대한 도넛처럼 블랙홀을 감싸고 있다-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천체들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들어가면 온도가 수억 도로 올라간다. 또한 빛, X선, 자외선 및 적외선 복사, 감마선, 종종 전파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엄청난 에너지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퀘이사는 가스가 풍부한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할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적외선 천문위성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은하들 중 일부가 충돌에 의해 생긴 거대한 먼지 폭풍 뒤에 퀘이사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수천 개의 퀘이사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새로 발견된 것일수록 더 멀리 있었다. 다른 폭발성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에서는 퀘이사를 볼 수 없다. 그것은 지금 보이는 퀘이사라고 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퀘이사는 이를테면 윈시 우주에 사는 이방인이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예를 든다. “70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를 본다는 것은 지구가 미처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구를 향해 먼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빛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퀘이사는 너무도 머나먼 거리, 빅뱅에 가까운 시간대에서 관측되고 있다. 그야말로 시간의 가장자리에 있는 셈이다. 퀘이사는 우리와 그것들 사이 - 과거와 현재 사이- 의 공간을 마치 우주의 플래시처럼 비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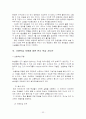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