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목차
1. 여러 민족의 성인식에서 볼 수 있는 통과의례의 의미
2. 몽고의 관혼상제(冠婚喪祭)
3. 베트남의 관혼상례
4. 일본의 관혼상제
5. 티베트인(藏族)들의 生育, 結婚, 葬禮
6. 티벳의 문화와 관혼상제(冠婚喪祭)
2. 몽고의 관혼상제(冠婚喪祭)
3. 베트남의 관혼상례
4. 일본의 관혼상제
5. 티베트인(藏族)들의 生育, 結婚, 葬禮
6. 티벳의 문화와 관혼상제(冠婚喪祭)
본문내용
이는 흙의 양기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마음에서이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신 때문이기도 하다. 흙 위에 시신을 내려놓은 후, 죽은 이의 장남은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부르는, 고복을 한다. 만약 세 번 불렀으나 죽은 자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영혼이 영원히 몸을 빠져나가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봤다. 그 다음 절차는 목욕례로 시신을 깨끗이 씻기는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씻기고, 어머니가 사망하면 딸이 씻겨주었다. 씻는 것이 끝나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힌다(많은 사람들이 사망 전에 이미 수의를 장만해 놓는다). 그 다음은 반함이라는 절차이다.
가족이 젓가락으로 죽은 사람의 입을 열어 한 줌의 쌀과 얼마간의 돈을 집어 넣는 것이다. 이는 죽은 사람도 계속 밥을 먹고,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려면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미신에 의한 것이다.
반함 절차 다음은 입관으로 시신을 관에다 안치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관을 서양처럼 육각형이 아니라 직육면체이다. 베트남에서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풍습은 고대부터 있었다. 중국의 문화가 북부지역에 유입되기 300~1000년 전, 훙브엉 시대의 관은 가운데가 텅 빈 통나무였다. 비엣쿠에와 하이퐁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 시대에 가운데가 빈 통나무에 창, 노, 종, 동접시 등과 함께 죽은 자의 시신을 묻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도 베트남과 쌍둥이 형제 종족인 므엉족은 가운데가 빈 통나무에 시신을 묻는다.
입관에 대해 더 살펴보면, 아내가 흰 무명이나 비단으로 시신을 짠다.
이를 염이라 하는데 시신을 쌀 때는 위 아래로 한 번 싼 후, 가로로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싼다. 입관을 할 때에는 손자들과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간을 정한다. 입관을 한 후에는 못으로 단단히 박고, 관 위에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을 올린 밥 한 그릇에 앞부분을 잘게 나눈 젓가락을 꽂는다. 관을 매장하고 난 후에 이 밥그릇은 영원히 그 묘 위에 놓아 둔다. 음양사상에 따르면 앞부분을 잘게 나눈 젓가락은 혼란한 세계를 상징하고 그 혼란으로부터 태극을 형성하며(밥그릇이 이를 상징), 태극으로부터 양의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양의는 즉 음과 양이다(한 쌍의 젓가락이 이를 상징한다). 그리고 음양은 생명력이 있다고 보았다(달걀이 이를 상징한다). 이 의례는 생명력이 새로이 되살아난다는데 있다. 가족들이 밥그릇, 젓가락, 달걀을 이용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망자가 하루빨리 회생해서 현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관에 넣은 시신을 집에 며칠씩 두는 것인데 어떤 곳은 일주일, 전에는 몇 주일 후에야 매장을 했다.
관은 집의 정중앙에 안치하고, 친지나 이웃, 손주들, 친분이 두터운 친구들이 풍비엥(조문)할 수 있도록 한다. 비엥이란 조문객이 고인에게 분향, 합장하며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이다. 망자는 음이므로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음, 즉 짝수여야 한다. 베트남 풍습에 따르면 망자에게 절을 할 때에는 두 번이나 네 번 즉 짝수로 절을 한다. 그리고 상을 당한 집안의 사람은 조문객이 절한 숫자의 절반으로 답배한다. 풍이라는 것은 조문객들이 꽃이나 명정, 휘장들을 고인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혹은 현물이나 돈으로 상주를 돕기도 한다. 입관을 한 후부터 집안사람들은 흰색 무영으로 지은 상복을 입기 시작하는데, 흰색은 오행에 있어 가장 나쁜 색깔이다. 가족들 모두 하얀 상복과 두건을 쓰고, 망자의 자식일 경우에만 가슴에 바나나 줄을 동여맨다. 망자를 포함하여 4대 이상 아래 손자들일 경우는 노란색 두건을 썼으며, 5대째의 자손들은 빨간 두건을 썼다. 오행설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색은 가장 좋은 색으로, 하늘이 복을 내려 망자가 증손자, 현손자를 볼 때까지 살아계셨던 것을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베트남과 이웃한 나라들의 장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풍습들을 접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과 회교도들 모두 몇 가지 공통된 풍습을 가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첫 번째 것은 망자가 아니라 묘혈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집안 사람은 시체를 묻을 장지를 찾기 위해 절이나 회교사원에 부고한다. 그들은 시신을 빨리 묻으면 묻을수록, 특히 시신을 죽은 후 여섯 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말레이인들의 관 또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바닥 부분이 없어 시신을 옮길 때 떨어지지 않도록 비단을 이용하여 바닥을 단단히 매었다. 회교도들의 관에 바닥 부분이 없는 것은 하관한 후 시신이 흙과 직접 닫게 하기 위한 풍습이었다.
또한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를 따랐기 때문에 절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습과 습전 그리고 화장의 세 가지 주요한 의례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가장 유의할 것은 습이다. 시신을 낮은 상 위에 눕히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며 손을 큰 양동이 아래로 늘어뜨려 놓는다. 애도를 표하기 위해 가족들과 친척들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다른 양동이에 있는 물을 떠서 시신의 손에 뿌린다. 중국에서는 시신을 옮길 때 장남이 망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세 개의 꼬리가 달린 종이 휘장을 손에 받쳐들고 간다. 차남은 망자의 이름이 적힌 절 모양의 작은 상자를 안고 간다. 상을 당한 집안은 관을 옮기고 묻은 일꾼을 구해야 한다.
베트남의 장례로 다시 돌아오면, 부모의 상여를 운구할 때는 모두 지팡이를 짚고, 딸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땅에서 구르거나 구덩이로 굴러들어가는 행동을 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들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상여 뒤를 따라가며,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등나무로 된 지팡이를 짚고 상여의 앞에서 뒷걸음으로 간다. 이 의례를 베트남어로는 메돈짜드어라고 한다. 이는 어머니는 영접하고 아버지는 전송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에 대해서만 뒷걸음으로 가야 하는가? 이는 고인에 대한 최상의 존경과 유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수도작 문명에서 여자를 중시하고 그중에서도 음-어머니-흙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관을 옮기고 묻는 것은
가족이 젓가락으로 죽은 사람의 입을 열어 한 줌의 쌀과 얼마간의 돈을 집어 넣는 것이다. 이는 죽은 사람도 계속 밥을 먹고,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려면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미신에 의한 것이다.
반함 절차 다음은 입관으로 시신을 관에다 안치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관을 서양처럼 육각형이 아니라 직육면체이다. 베트남에서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풍습은 고대부터 있었다. 중국의 문화가 북부지역에 유입되기 300~1000년 전, 훙브엉 시대의 관은 가운데가 텅 빈 통나무였다. 비엣쿠에와 하이퐁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 시대에 가운데가 빈 통나무에 창, 노, 종, 동접시 등과 함께 죽은 자의 시신을 묻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도 베트남과 쌍둥이 형제 종족인 므엉족은 가운데가 빈 통나무에 시신을 묻는다.
입관에 대해 더 살펴보면, 아내가 흰 무명이나 비단으로 시신을 짠다.
이를 염이라 하는데 시신을 쌀 때는 위 아래로 한 번 싼 후, 가로로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싼다. 입관을 할 때에는 손자들과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간을 정한다. 입관을 한 후에는 못으로 단단히 박고, 관 위에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을 올린 밥 한 그릇에 앞부분을 잘게 나눈 젓가락을 꽂는다. 관을 매장하고 난 후에 이 밥그릇은 영원히 그 묘 위에 놓아 둔다. 음양사상에 따르면 앞부분을 잘게 나눈 젓가락은 혼란한 세계를 상징하고 그 혼란으로부터 태극을 형성하며(밥그릇이 이를 상징), 태극으로부터 양의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양의는 즉 음과 양이다(한 쌍의 젓가락이 이를 상징한다). 그리고 음양은 생명력이 있다고 보았다(달걀이 이를 상징한다). 이 의례는 생명력이 새로이 되살아난다는데 있다. 가족들이 밥그릇, 젓가락, 달걀을 이용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망자가 하루빨리 회생해서 현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관에 넣은 시신을 집에 며칠씩 두는 것인데 어떤 곳은 일주일, 전에는 몇 주일 후에야 매장을 했다.
관은 집의 정중앙에 안치하고, 친지나 이웃, 손주들, 친분이 두터운 친구들이 풍비엥(조문)할 수 있도록 한다. 비엥이란 조문객이 고인에게 분향, 합장하며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이다. 망자는 음이므로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음, 즉 짝수여야 한다. 베트남 풍습에 따르면 망자에게 절을 할 때에는 두 번이나 네 번 즉 짝수로 절을 한다. 그리고 상을 당한 집안의 사람은 조문객이 절한 숫자의 절반으로 답배한다. 풍이라는 것은 조문객들이 꽃이나 명정, 휘장들을 고인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혹은 현물이나 돈으로 상주를 돕기도 한다. 입관을 한 후부터 집안사람들은 흰색 무영으로 지은 상복을 입기 시작하는데, 흰색은 오행에 있어 가장 나쁜 색깔이다. 가족들 모두 하얀 상복과 두건을 쓰고, 망자의 자식일 경우에만 가슴에 바나나 줄을 동여맨다. 망자를 포함하여 4대 이상 아래 손자들일 경우는 노란색 두건을 썼으며, 5대째의 자손들은 빨간 두건을 썼다. 오행설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색은 가장 좋은 색으로, 하늘이 복을 내려 망자가 증손자, 현손자를 볼 때까지 살아계셨던 것을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베트남과 이웃한 나라들의 장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풍습들을 접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과 회교도들 모두 몇 가지 공통된 풍습을 가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첫 번째 것은 망자가 아니라 묘혈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집안 사람은 시체를 묻을 장지를 찾기 위해 절이나 회교사원에 부고한다. 그들은 시신을 빨리 묻으면 묻을수록, 특히 시신을 죽은 후 여섯 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말레이인들의 관 또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바닥 부분이 없어 시신을 옮길 때 떨어지지 않도록 비단을 이용하여 바닥을 단단히 매었다. 회교도들의 관에 바닥 부분이 없는 것은 하관한 후 시신이 흙과 직접 닫게 하기 위한 풍습이었다.
또한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를 따랐기 때문에 절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습과 습전 그리고 화장의 세 가지 주요한 의례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가장 유의할 것은 습이다. 시신을 낮은 상 위에 눕히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며 손을 큰 양동이 아래로 늘어뜨려 놓는다. 애도를 표하기 위해 가족들과 친척들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다른 양동이에 있는 물을 떠서 시신의 손에 뿌린다. 중국에서는 시신을 옮길 때 장남이 망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세 개의 꼬리가 달린 종이 휘장을 손에 받쳐들고 간다. 차남은 망자의 이름이 적힌 절 모양의 작은 상자를 안고 간다. 상을 당한 집안은 관을 옮기고 묻은 일꾼을 구해야 한다.
베트남의 장례로 다시 돌아오면, 부모의 상여를 운구할 때는 모두 지팡이를 짚고, 딸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땅에서 구르거나 구덩이로 굴러들어가는 행동을 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들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상여 뒤를 따라가며,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등나무로 된 지팡이를 짚고 상여의 앞에서 뒷걸음으로 간다. 이 의례를 베트남어로는 메돈짜드어라고 한다. 이는 어머니는 영접하고 아버지는 전송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에 대해서만 뒷걸음으로 가야 하는가? 이는 고인에 대한 최상의 존경과 유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수도작 문명에서 여자를 중시하고 그중에서도 음-어머니-흙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관을 옮기고 묻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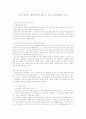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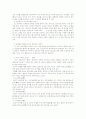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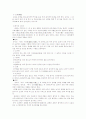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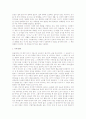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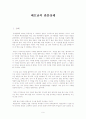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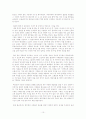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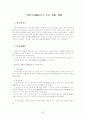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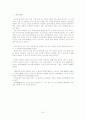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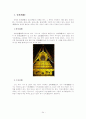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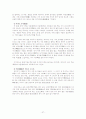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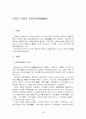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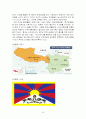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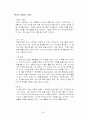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