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회갑상 앞에는 별도로 술과 술잔이 놓인 헌주상(獻酒床)을 놓는다.
갑주는 자손들이 새로 지어 바친 의복을 입고 배후자와 함께 병풍과 회갑상 사이에 나란히 앉는다. 자손들은 연령순으로 각각 갑주에게 헌작(獻酌), 즉 잔을 드리고, 헌수(獻壽), 즉 큰절을 올리며 회갑주의 건강과 장수를 빈다. 직계자손 다음으로 일가친척의 헌주와 큰절이 이어진다.
회갑잔치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행해진다. 회갑을 보낸 다음해는 진갑(進甲)이라고 하여 이때에도 잔치를 여는데 회갑잔치만큼 성대하게 갖지는 않는다.
7. 상례
상례는 숨이 끊어져서 죽은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근친들이 복을 입는 기간 동안 치르는 각종 의례이다. 상례는 한 개인으로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통과의례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영원히 이별하는 분리의례가 된다. 또한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이때부터 영혼을 취급하고 내세를 인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서 일생의례 가운데 관례와 혼례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상례와 제례는 비교적 전통적인 의례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상례를 중시하는 태도는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연장이라고 보는 인생관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아주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인식하여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고 표현한다. 돌아가신 어른들은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머물면서 후손들의 일을 모두 돌아보고 간섭하며 보호하고 이끌어 준다고 믿는다.
상례는 크게 초종(初終)성복발인(成服發靷)치장(治裝)흉제(凶祭)의 네 단계로 나누는데 이러한 절차와 형식에는 상주의 개념영혼관내세관 등이 표현되어 있다.
운명해서 입관하고 성복하기까지 행하는 절차를 초종이라고 한다. 둘째 날 목욕을 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습(襲)과 염(殮)을 한다. 염은 습이 끝난 시신을 작은 이불로 싸서 묶는 소렴과 사흘째 되는 날 시신을 마지막 묶어서 입관준비를 하는 대렴으로 구분한다.
입관 후에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낸다. 상주가 입는 상복은 죽은 사람과의 가깝고 먼 촌수에 따라서 참최재최대공소공시마의 다섯 단계가 있으며 입는 기간도 각기 다르다. 상주가 짚는 지팡이도 부상에는 죽장을 짚고, 모상에는 오동나무를 짚는 등 매우 까다로웠다. 성복제 이후에는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을 한다. 이 둘을 합쳐 조문이라고 한다. 조문 시에는 복장을 검소하게 하고 화장과 치장을 현란하게 하지 않는다.
상여가 나가기 전날 상여놀이를 한다. 이는 운구할 상두꾼들이 호흡을 맞추는 일종의 예행연습이다. 사흘째 출상하며 지내는 제사를 발인제라고 한다.
상례 중에 묘지를 정하고 시신을 땅에 묻는 일을 치장(治裝)이라 하고 이에 따르는 의식을 장례라 한다. 상여가 사립문을 나서서 연고가 있는 곳을 지날 때 친지나 친구들이 노제를 지내준다. 이것을 거리제라 부르기도 한다.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파기 전에 먼저 산신에게 고하는 산신제를 지낸다. 하관에 이어 땅을 다지며 회다지노래, 혹은 달구질노래를 부르고 평토제를 지낸 뒤에 봉분을 짓는다.
신주를 영좌에 모시고 돌아올 때에는 곡을 한다. 이것을 반곡(反哭)이라 하는데 곡이 끊어지면 혼백이 따라오지 못하므로 집에 올 때까지 해야한다고 믿었다. 형식을 중시한 조선조에는 상중에 곡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곡을 전문으로 하는 노비인 곡비를 둘 정도였다. 반곡례를 끝으로 장례절차는 모두 끝이 나고 다음은 상중의 제례 절차가 시작된다.
8. 제례
① 삼우제(三虞祭)
삼우제는 죽은 사람을 땅에 매장하였으므로 그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내는 제사로 초우(初虞), 재우, 삼우가 있다.
초우는 장삿날에 거행하며 장지가 멀어서 그 날로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주막집에서라도 지내야 할 만큼 중시되었다. 재우는 초우를 지낸 뒤에 처음 맞는 유일(柔日)에 지내며, 삼우는 재우 뒤에 강일(剛日)에 지낸다.
② 사십구재(四十九齋)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곧 중음(中陰)의 마지막 날로서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빈다. 불교 신자들은 대개 절에 가서 스님의 지휘 아래 불교 의식으로 지내는 제사이기도 하다.
③ 소상(小祥)
초상 1년 후에 지내는 제사이며, 제사의 절차는 우제와 비슷하다. 소상이 끝나면 기년복(朞年服), 곧 상복을 입은 사람은 복을 벗고 평소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
④ 대상(大祥)
초상 후 2년 만에 거행한다. 대상이 끝나면 신주는 가묘(家廟)로 옮기고 상청을 뜯으며 상복을 벗는다. 이로써 상제들은 상옷이나 상표를 모두 벗고 떼며, 조석으로 울리는 메도 중지된다.
⑤ 기제(忌祭)
삼년상이 지나고 나서, 곧 대상 다음해부터 죽은 사람의 죽기 전 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것은 고조까지만 지내며, 그 위의 선조는 시향(時享)이나 절사만을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조상의 부부는 언제나 같이 모시는데 할아버지의 제사에도 할머니 지방(紙榜)을 같이 모시고 지내며, 할머니 제사 때에서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지방을 부치고 지낸다.
⑥ 시제(時祭)
시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 가운데 달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골라서 고조 이하 각 조상 신위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시제는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며, 대개 조상의 선영에 후손들이 모여 지낸다. 주로 남자 후손들만 참례한다.
♣ 참고 문헌
한국민속학의 이해, 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한국의 민속, 김성배, 집문당, 1995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김의숙이창식, 북스힐, 2003
민속문화의 현장, 임동권, 민속원, 2003
♣ 참고 사이트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folk)
** 참고문헌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이지영, <<한국의 신화 이야기>>, 사군자, 2003.
-이종욱, <<건국신화(한국사의 1막 1장)>>, 휴머니스트, 2004.
- 서정오, <<우리신화(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현암사 , 2003.
갑주는 자손들이 새로 지어 바친 의복을 입고 배후자와 함께 병풍과 회갑상 사이에 나란히 앉는다. 자손들은 연령순으로 각각 갑주에게 헌작(獻酌), 즉 잔을 드리고, 헌수(獻壽), 즉 큰절을 올리며 회갑주의 건강과 장수를 빈다. 직계자손 다음으로 일가친척의 헌주와 큰절이 이어진다.
회갑잔치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행해진다. 회갑을 보낸 다음해는 진갑(進甲)이라고 하여 이때에도 잔치를 여는데 회갑잔치만큼 성대하게 갖지는 않는다.
7. 상례
상례는 숨이 끊어져서 죽은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근친들이 복을 입는 기간 동안 치르는 각종 의례이다. 상례는 한 개인으로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통과의례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영원히 이별하는 분리의례가 된다. 또한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이때부터 영혼을 취급하고 내세를 인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서 일생의례 가운데 관례와 혼례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상례와 제례는 비교적 전통적인 의례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상례를 중시하는 태도는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연장이라고 보는 인생관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아주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인식하여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고 표현한다. 돌아가신 어른들은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머물면서 후손들의 일을 모두 돌아보고 간섭하며 보호하고 이끌어 준다고 믿는다.
상례는 크게 초종(初終)성복발인(成服發靷)치장(治裝)흉제(凶祭)의 네 단계로 나누는데 이러한 절차와 형식에는 상주의 개념영혼관내세관 등이 표현되어 있다.
운명해서 입관하고 성복하기까지 행하는 절차를 초종이라고 한다. 둘째 날 목욕을 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습(襲)과 염(殮)을 한다. 염은 습이 끝난 시신을 작은 이불로 싸서 묶는 소렴과 사흘째 되는 날 시신을 마지막 묶어서 입관준비를 하는 대렴으로 구분한다.
입관 후에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낸다. 상주가 입는 상복은 죽은 사람과의 가깝고 먼 촌수에 따라서 참최재최대공소공시마의 다섯 단계가 있으며 입는 기간도 각기 다르다. 상주가 짚는 지팡이도 부상에는 죽장을 짚고, 모상에는 오동나무를 짚는 등 매우 까다로웠다. 성복제 이후에는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을 한다. 이 둘을 합쳐 조문이라고 한다. 조문 시에는 복장을 검소하게 하고 화장과 치장을 현란하게 하지 않는다.
상여가 나가기 전날 상여놀이를 한다. 이는 운구할 상두꾼들이 호흡을 맞추는 일종의 예행연습이다. 사흘째 출상하며 지내는 제사를 발인제라고 한다.
상례 중에 묘지를 정하고 시신을 땅에 묻는 일을 치장(治裝)이라 하고 이에 따르는 의식을 장례라 한다. 상여가 사립문을 나서서 연고가 있는 곳을 지날 때 친지나 친구들이 노제를 지내준다. 이것을 거리제라 부르기도 한다.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파기 전에 먼저 산신에게 고하는 산신제를 지낸다. 하관에 이어 땅을 다지며 회다지노래, 혹은 달구질노래를 부르고 평토제를 지낸 뒤에 봉분을 짓는다.
신주를 영좌에 모시고 돌아올 때에는 곡을 한다. 이것을 반곡(反哭)이라 하는데 곡이 끊어지면 혼백이 따라오지 못하므로 집에 올 때까지 해야한다고 믿었다. 형식을 중시한 조선조에는 상중에 곡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곡을 전문으로 하는 노비인 곡비를 둘 정도였다. 반곡례를 끝으로 장례절차는 모두 끝이 나고 다음은 상중의 제례 절차가 시작된다.
8. 제례
① 삼우제(三虞祭)
삼우제는 죽은 사람을 땅에 매장하였으므로 그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내는 제사로 초우(初虞), 재우, 삼우가 있다.
초우는 장삿날에 거행하며 장지가 멀어서 그 날로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주막집에서라도 지내야 할 만큼 중시되었다. 재우는 초우를 지낸 뒤에 처음 맞는 유일(柔日)에 지내며, 삼우는 재우 뒤에 강일(剛日)에 지낸다.
② 사십구재(四十九齋)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곧 중음(中陰)의 마지막 날로서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빈다. 불교 신자들은 대개 절에 가서 스님의 지휘 아래 불교 의식으로 지내는 제사이기도 하다.
③ 소상(小祥)
초상 1년 후에 지내는 제사이며, 제사의 절차는 우제와 비슷하다. 소상이 끝나면 기년복(朞年服), 곧 상복을 입은 사람은 복을 벗고 평소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
④ 대상(大祥)
초상 후 2년 만에 거행한다. 대상이 끝나면 신주는 가묘(家廟)로 옮기고 상청을 뜯으며 상복을 벗는다. 이로써 상제들은 상옷이나 상표를 모두 벗고 떼며, 조석으로 울리는 메도 중지된다.
⑤ 기제(忌祭)
삼년상이 지나고 나서, 곧 대상 다음해부터 죽은 사람의 죽기 전 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것은 고조까지만 지내며, 그 위의 선조는 시향(時享)이나 절사만을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조상의 부부는 언제나 같이 모시는데 할아버지의 제사에도 할머니 지방(紙榜)을 같이 모시고 지내며, 할머니 제사 때에서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지방을 부치고 지낸다.
⑥ 시제(時祭)
시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 가운데 달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골라서 고조 이하 각 조상 신위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시제는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며, 대개 조상의 선영에 후손들이 모여 지낸다. 주로 남자 후손들만 참례한다.
♣ 참고 문헌
한국민속학의 이해, 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한국의 민속, 김성배, 집문당, 1995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김의숙이창식, 북스힐, 2003
민속문화의 현장, 임동권, 민속원, 2003
♣ 참고 사이트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folk)
** 참고문헌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이지영, <<한국의 신화 이야기>>, 사군자, 2003.
-이종욱, <<건국신화(한국사의 1막 1장)>>, 휴머니스트, 2004.
- 서정오, <<우리신화(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현암사 ,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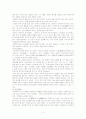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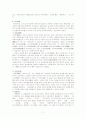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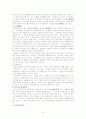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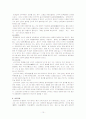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