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원순모음화의 진행 과정
Ⅲ. 원순모음화 현상에 관련된 논의들
1. 역행 원순모음화
2.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3. 비원순모음화
Ⅳ. 원순모음화의 원인
Ⅴ. 결론
<참고 자료>
Ⅱ. 원순모음화의 진행 과정
Ⅲ. 원순모음화 현상에 관련된 논의들
1. 역행 원순모음화
2.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3. 비원순모음화
Ⅳ. 원순모음화의 원인
Ⅴ.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르면 거의 모든 문헌에서 다량으로 나타난다.(송민 1985) 17세기 후반 자료인 <역어유해(譯語類解)> 조선 중기(1690년), 중국어에 한글 음(音)을 단 어학서(語學書). 2권 2책. 1690년(숙종 16) 역관(譯官) 김경준(金敬俊) 김지남(金指南) 신이행(愼以行) 등이 편찬하여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하였다. 청(淸)나라에서 일상 사용하는 말이나 문장 가운데 편리한 것을 가려 한글 음을 달고 중국 음도 함께 달아 놓았다. 역과초시(譯科初試) 및 한학(漢學)의 교재로 사용하였다.
(1690)에는 다음과 같은 실례가 나타난다.
a. 放水 믈트다 > 水酒 무술, 水桶 물통
苦理 무프레
爛煮 므르게 다 > 爛飯 무른 밥
咬 므다 > 咬人馬 사 무
告示 榜부티다
不怯氣 무셔워 아니타
b. 下葬 뭇다 > 種火 블믓다
陪者 무다 > 追陪 믈리다
이 자료는 형태소의 제1 음절에 나타나는 원순모음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a.에서는 당시에 순자음 아래에서 ㅡ>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순자음 중에서도 주로 ㅁ과 ㅂ 뒤에서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물’처럼 빈도가 큰 형태소일지라도 몇 개의 합성어에서만 원순모음화를 보일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믈’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b.는 a.와는 반대로 오히려 ㅜ>ㅡ와 같은 비원순모음화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들은 원순모음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화자의 어휘 인식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ㅡ는 체계상 아직도 와의 대립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ㅜ와의 대립 관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믿어진다.(송민 1985)
18세기 초엽에 이르면 순자음하에서는 ㅡ와 ㅜ가 거의 본래의 모습을 지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오륜전비언해(五倫全備諺解)>(1721) 1721년(경종 1)에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한 중국어학습서. 목판본. 8권 5책. 규장각 도서. 명나라 구준(丘濬)이 지은 《오륜전비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에서는 원순모음화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어휘목록에서 변화를 보인다.
a. 므>무, 므던다>무던다, 므릇>무릇, 므러>무러,
블러>불러, 브즈런이>부즈런도다, 부억, (角)
b. 무리(輩)>믈이, 무르라(問)>믈이, 붓그림>븟그러옴, 부리>브리
위의 예에서는 ‘’이 원순모음화를 보이고 있어 <역어유해>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비원순모음화가 <역어유해>보다 확대되어 있어 순자음하의 ㅡ와 ㅜ로 이루어지는 어휘목록의 동요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쯤에는 ㅡ와 ㅜ가 고위모음으로서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짝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송민 1985)
원순모음화가 확대된 모습은 18세기의 다른 자료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믈>물 물길(역어유해보 1775)
물(역어유해보 1775, 동문유해 1748)
블>불 불붓다(동문유해 1748)
플>풀 풀(동문유해 1748)
풀낫(한청문감 177?)
믈레>물레(한청문감 177?)
므지게>무지게(왜어유해 1786)
(1690)에는 다음과 같은 실례가 나타난다.
a. 放水 믈트다 > 水酒 무술, 水桶 물통
苦理 무프레
爛煮 므르게 다 > 爛飯 무른 밥
咬 므다 > 咬人馬 사 무
告示 榜부티다
不怯氣 무셔워 아니타
b. 下葬 뭇다 > 種火 블믓다
陪者 무다 > 追陪 믈리다
이 자료는 형태소의 제1 음절에 나타나는 원순모음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a.에서는 당시에 순자음 아래에서 ㅡ>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순자음 중에서도 주로 ㅁ과 ㅂ 뒤에서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물’처럼 빈도가 큰 형태소일지라도 몇 개의 합성어에서만 원순모음화를 보일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믈’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b.는 a.와는 반대로 오히려 ㅜ>ㅡ와 같은 비원순모음화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들은 원순모음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화자의 어휘 인식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ㅡ는 체계상 아직도 와의 대립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ㅜ와의 대립 관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믿어진다.(송민 1985)
18세기 초엽에 이르면 순자음하에서는 ㅡ와 ㅜ가 거의 본래의 모습을 지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오륜전비언해(五倫全備諺解)>(1721) 1721년(경종 1)에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한 중국어학습서. 목판본. 8권 5책. 규장각 도서. 명나라 구준(丘濬)이 지은 《오륜전비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에서는 원순모음화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어휘목록에서 변화를 보인다.
a. 므>무, 므던다>무던다, 므릇>무릇, 므러>무러,
블러>불러, 브즈런이>부즈런도다, 부억, (角)
b. 무리(輩)>믈이, 무르라(問)>믈이, 붓그림>븟그러옴, 부리>브리
위의 예에서는 ‘’이 원순모음화를 보이고 있어 <역어유해>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비원순모음화가 <역어유해>보다 확대되어 있어 순자음하의 ㅡ와 ㅜ로 이루어지는 어휘목록의 동요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쯤에는 ㅡ와 ㅜ가 고위모음으로서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짝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송민 1985)
원순모음화가 확대된 모습은 18세기의 다른 자료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믈>물 물길(역어유해보 1775)
물(역어유해보 1775, 동문유해 1748)
블>불 불붓다(동문유해 1748)
플>풀 풀(동문유해 1748)
풀낫(한청문감 177?)
믈레>물레(한청문감 177?)
므지게>무지게(왜어유해 1786)
추천자료
 통신언어에 관한 고찰
통신언어에 관한 고찰 장애유아 언어발달과 지도원리
장애유아 언어발달과 지도원리 국어의 운율적 자질
국어의 운율적 자질 2014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5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5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하계계절시험 국어학개론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7년 하계계절시험 국어학개론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국어학개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2학기 국어학개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국어학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국어학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언어의 본질(언어의 구조와 기능, 언어의 이해와 사용)
언어의 본질(언어의 구조와 기능, 언어의 이해와 사용) 2018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8년 1학기 소리와발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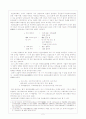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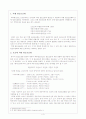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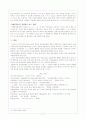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