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문과 해석
2. 화자의 성격
3. 배경설화로 살펴본 부전향가와의 관련성
4. 여음과 후렴구의 의미
5. 가시리 평설
Ⅲ. 결론
Ⅱ. 본론
1. 원문과 해석
2. 화자의 성격
3. 배경설화로 살펴본 부전향가와의 관련성
4. 여음과 후렴구의 의미
5. 가시리 평설
Ⅲ. 결론
본문내용
정리하고 부전향가와의 관련성을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음과 후렴구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양주동 여요전주 가시리평설과 함께 감상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원문과 해석
가시리는 악장가사와 악학편고에 노랫말 전체가 전하고 시용향악보에 귀호곡(歸乎曲)이란 제목으로 1절이 전한다. 악장가사 소재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잡와 두어리마
선면 아니 올셰라
붙잡아 둘 일이지마는
(혹시나 임께서)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두렵습니다.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셜온 님 보내노니 나
가시 도셔 오쇼셔 나
서러운 임을 보내 드리오니
가시자마자 곧 돌아서서 오소서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1)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가시리’는 노랫말의 율격을 위해 의문종결어미 ‘잇고’가 생략된 것으로, 이것은 시용향악보에서 귀호곡이라 부른 까닭이 된다. 박병채는 ‘가시렵니까’로 해석했는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의 정서는 생이별의 마당에서보다는 세상을 버리고 떠난 영원한 이별에서 오는, 뜻밖의 암담한 현실에서 온 절박한 심경의 표출로도 보인다. 최용수는 ‘(왜) 가시려 합니까?’로 해석해 만류와 애소의 정이 내재한 것으로 보았다.
‘나’은 조흥구로서, ‘서경별곡’의 “긴힛ㅅ 그츠리잇가 나”, ‘정석가’의 “삭삭기 셰몰애 별혜 나”과 같이 당시 향악의 노랫말에 상투적으로 사용되었다.
2) 위 증즐가 大平盛代
경기체가의 ‘위 京긔 엇더니잇고’에서 볼 수 있듯 ‘위’는 감탄사이다. ‘증즐가’는 악기소리의 의성어이고, ‘大平盛代’는 민요에서 궁중악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말로 보인다.
3) 선면 아니 올셰라
크게 ‘(혹시나 임께서)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두렵습니다’와 ‘“(눈에) 선하면 (스스로) 오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어’로 해석을 나눌 수 있다.
‘선면’은 문헌상(文獻上) 용례(用例)가 없어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양주동은 \'선\'을 \'선뜻, 선선\'의 뜻으로 보았다. ‘가시리평설’에서 ‘억지로 그랬다가는 님이 혹시 선한 생각에 다시 아니 올세라’로 현대역함으로써 ‘서운하면’의 의미로 파악했다. 김형규는 북청지방 방언의 ‘선하다’는 말이 ‘너무 지나쳐서 싫증이 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임에 착안하여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였다. 박병채는 \'선머슴, 선웃음\' 등의 \'선\'의 뜻일 것이라 하고 \'시틋하면, 귀찮아 마음이 거칠어지면, 까딱 잘못하면\'으로 풀이하였다.
‘올셰라’에서 ‘ㄹ셰라’는 의구형종결어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최철·박재민은 반드시 ‘두려움’이란 의미가 들어가야 할 강제성은 없다 하여 단순히 ‘~할까 추측된다·생각된다’의 의미범주로 해석하였다.
4) 셜온 님 보내노니 나
‘셜온 님’에서 ‘
Ⅱ. 본론
1. 원문과 해석
가시리는 악장가사와 악학편고에 노랫말 전체가 전하고 시용향악보에 귀호곡(歸乎曲)이란 제목으로 1절이 전한다. 악장가사 소재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잡와 두어리마
선면 아니 올셰라
붙잡아 둘 일이지마는
(혹시나 임께서)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두렵습니다.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셜온 님 보내노니 나
가시 도셔 오쇼셔 나
서러운 임을 보내 드리오니
가시자마자 곧 돌아서서 오소서
위 증즐가 大平盛代
위 증즐가 대평성대
1)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가시리’는 노랫말의 율격을 위해 의문종결어미 ‘잇고’가 생략된 것으로, 이것은 시용향악보에서 귀호곡이라 부른 까닭이 된다. 박병채는 ‘가시렵니까’로 해석했는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의 정서는 생이별의 마당에서보다는 세상을 버리고 떠난 영원한 이별에서 오는, 뜻밖의 암담한 현실에서 온 절박한 심경의 표출로도 보인다. 최용수는 ‘(왜) 가시려 합니까?’로 해석해 만류와 애소의 정이 내재한 것으로 보았다.
‘나’은 조흥구로서, ‘서경별곡’의 “긴힛ㅅ 그츠리잇가 나”, ‘정석가’의 “삭삭기 셰몰애 별혜 나”과 같이 당시 향악의 노랫말에 상투적으로 사용되었다.
2) 위 증즐가 大平盛代
경기체가의 ‘위 京긔 엇더니잇고’에서 볼 수 있듯 ‘위’는 감탄사이다. ‘증즐가’는 악기소리의 의성어이고, ‘大平盛代’는 민요에서 궁중악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말로 보인다.
3) 선면 아니 올셰라
크게 ‘(혹시나 임께서)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두렵습니다’와 ‘“(눈에) 선하면 (스스로) 오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어’로 해석을 나눌 수 있다.
‘선면’은 문헌상(文獻上) 용례(用例)가 없어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양주동은 \'선\'을 \'선뜻, 선선\'의 뜻으로 보았다. ‘가시리평설’에서 ‘억지로 그랬다가는 님이 혹시 선한 생각에 다시 아니 올세라’로 현대역함으로써 ‘서운하면’의 의미로 파악했다. 김형규는 북청지방 방언의 ‘선하다’는 말이 ‘너무 지나쳐서 싫증이 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임에 착안하여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였다. 박병채는 \'선머슴, 선웃음\' 등의 \'선\'의 뜻일 것이라 하고 \'시틋하면, 귀찮아 마음이 거칠어지면, 까딱 잘못하면\'으로 풀이하였다.
‘올셰라’에서 ‘ㄹ셰라’는 의구형종결어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최철·박재민은 반드시 ‘두려움’이란 의미가 들어가야 할 강제성은 없다 하여 단순히 ‘~할까 추측된다·생각된다’의 의미범주로 해석하였다.
4) 셜온 님 보내노니 나
‘셜온 님’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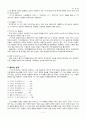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