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학
2. 해학의 작품
(1) 노처녀가
(2) 니츈풍젼(李春風傳)
(3) 잠노래
(4) 방구노래
(5) 부처송경
(6) 양사지환
(7) 바보 딸 삼형제
2. 해학의 작품
(1) 노처녀가
(2) 니츈풍젼(李春風傳)
(3) 잠노래
(4) 방구노래
(5) 부처송경
(6) 양사지환
(7) 바보 딸 삼형제
본문내용
窓(창) 내고쟈. : 초장의 다급한 상황에 대하여 사설을 늘어 놓음으로써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전문 풀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문의 종류) 암돌쩌귀 수돌쩌귀(문 다는 데 쓰이는 도구) 배목걸새(문고리에 꿰는 쇠) 크나큰 장두리로 뚝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해학가
표현 - 열거법, 반복법
주제 - 마음 속에 쌓인 비애와 고통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평민층 작가에 의한 사설로 추정되는데, 마음 속에 쌓인 답답함을 가슴에 창문이라도 내서 시원스럽게 펴고 싶다는 재미있는 착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적인 사고나 착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을 기상(奇想)이라 한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꽉 막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가슴에 창문이라도 내서 시원스럽게 펴고 싶다는 착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 언어와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괴로움을 강조하는 수법은 다분히 해학적(諧謔的)이기도 한데,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이처럼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 나라 평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연모가(戀慕歌). 해학적
표현 : 반복법. 의성법. 의태법
제재 : 임
주제 : 임에 대한 연모의 정(情)
▶ 작품 해설
조선 후기 산문 정신의 영향으로 등장한 사설 시조는 작품의 질적 수준보다는 당시 사회상의 반영, 세태에 대한 풍자,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 표현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작품 역시 임을 기다리는 야릇한 심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로서 임을 기다리는 심정이 일상어로 소박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 못해 개에게 그 미움이 전가되고 있다. 오시는 임을 개가 막는 일은 없지마는 짖는 개 때문에 임이 돌아가 오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웃음을 자아낸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미운 임은 반겨 맞고 고운 임은 짖어서 쫓아 버린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죄 없는 개한테로 옮겨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소박한 서민적 해학의 묘미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또 임을 내쫓는 개의 동작을 묘사한 부분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실감을 높인 것도 이 노래의 큰 장점이라 할 것이다.
우탁,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듸업네
저근듯 비러다가 뿌리과저 머리우희
귀밋헤 해묵은 서리를 불녀볼까 하노라.
- 우탁 (1263~1342)
* 건듯: 잠시. 잠깐.
* 간듸업네: 간곳없네. 온데간데없네.
* 저근듯: 잠깐.
* 비러다가: 빌려다가
* 뿌리과저: 뿌리고자. 뿌렸으면. 뿌렸으면 싶네. 뿌리고 싶네.
* 머리우희: 머리 위에
* 귀밋헤: 귀 밑에
* 불녀볼까: (바람에) 불려볼까. 나부껴볼까. 날려볼까. 흩날려볼까.
* 우탁의 시조는 탄로가 2수가 전한다. ‘탄로갗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우탁의 시조가 꼭 그렇게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시조 외의 다른 한 수 ‘한손에 가시를 들고’는 해학적인 면(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쳐서 막겠다는)이 있기도 하거니와 또 이 시조의 경우처럼 호탕한 면(눈을 단숨에 녹여버린 바람의 힘을 빌려다가 해묵은 서리를 일거에 날려버리겠다는)이 있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를 바라보는 지혜만은 없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우탁은 이 두 시조를 지어냄으로써 자신을 달래고 또 조금이나마 위안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설시조(辭說時調)
1. 사설시조의 개념:시조 3장 중에서 초·종장은 대체로 엇시조의 중장(40자 이내)의 자수(字數)와 일치하고, 중장은 그 자수가 제한 없이 길어진 시조이다.
2. 사설시조의 형성:영·정조 이후 서민 계급이 자기네들의 생활 감정을 담고자 종래의 양반 계급이 써 오던 평시조의 형태를 개조(改造)한 것이다.
3. 사설시조의 주제:① 구체적이고 서민적인 소재와 비유의 도입
② 강렬한 애정과 내용의 표출
③ 언어유희·재담(才談)·욕설의 도입
④ 기탄(忌憚)없는 비유를 통한 사회 비판
⑤ 비개성적 사물의 유형적 배열을 통한 감정의 발산
1..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 김수장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松골(송골)매도 갓고 줄에 안즌 져비도 갓고 百花園裡(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갓고 綠水波瀾(녹수파란)에 비오리도 갓고 따해 퍽 안즌 쇼로개도 갓고 석은 등걸에 부헝이도 갓데.
그려도 다 각각 남의 사랑인이 皆一色(개일색)인가 하노라. ― <해동가요>
계집(여인)들이 여러 층이더라.
송골매 같기도 하고, 줄에 앉은 제비 같기도 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뜰에 두루미 같기도 하고, 푸른 물결 위에 비오리(오리과에 속하는 물새) 같기도 하고, 땅에 퍽 주저앉은 솔개 같기도 하고, 썩은 등걸에 앉은 부엉이 같기도 하네.
그래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을 받으니 각자가 다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 성 격 : 풍자적, 해학적
● 표 현 : 직유법, 열거법
● 주 제 : 각기 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뭇 여인들(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데 대한 경계)
● 해설 및 감상 ː 일찍이 우리 문학사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애정관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즉, 초장에서는 여인들이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중장에서는 여인들을 여러 종류의 새에 비유한 뒤, 종장에서는 그 다양한 여인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임에게는 각각 가장 사랑 받는 여인들이니 모두 일색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여인들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해학미가 넘치는 표현으로 사설시조의 멋을 한껏 살린 작품이라 하겠다.
2..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지은이 모름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얄
[전문 풀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문의 종류) 암돌쩌귀 수돌쩌귀(문 다는 데 쓰이는 도구) 배목걸새(문고리에 꿰는 쇠) 크나큰 장두리로 뚝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해학가
표현 - 열거법, 반복법
주제 - 마음 속에 쌓인 비애와 고통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평민층 작가에 의한 사설로 추정되는데, 마음 속에 쌓인 답답함을 가슴에 창문이라도 내서 시원스럽게 펴고 싶다는 재미있는 착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적인 사고나 착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을 기상(奇想)이라 한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꽉 막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가슴에 창문이라도 내서 시원스럽게 펴고 싶다는 착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 언어와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괴로움을 강조하는 수법은 다분히 해학적(諧謔的)이기도 한데,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이처럼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 나라 평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연모가(戀慕歌). 해학적
표현 : 반복법. 의성법. 의태법
제재 : 임
주제 : 임에 대한 연모의 정(情)
▶ 작품 해설
조선 후기 산문 정신의 영향으로 등장한 사설 시조는 작품의 질적 수준보다는 당시 사회상의 반영, 세태에 대한 풍자,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 표현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작품 역시 임을 기다리는 야릇한 심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로서 임을 기다리는 심정이 일상어로 소박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 못해 개에게 그 미움이 전가되고 있다. 오시는 임을 개가 막는 일은 없지마는 짖는 개 때문에 임이 돌아가 오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웃음을 자아낸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미운 임은 반겨 맞고 고운 임은 짖어서 쫓아 버린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죄 없는 개한테로 옮겨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소박한 서민적 해학의 묘미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또 임을 내쫓는 개의 동작을 묘사한 부분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실감을 높인 것도 이 노래의 큰 장점이라 할 것이다.
우탁,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듸업네
저근듯 비러다가 뿌리과저 머리우희
귀밋헤 해묵은 서리를 불녀볼까 하노라.
- 우탁 (1263~1342)
* 건듯: 잠시. 잠깐.
* 간듸업네: 간곳없네. 온데간데없네.
* 저근듯: 잠깐.
* 비러다가: 빌려다가
* 뿌리과저: 뿌리고자. 뿌렸으면. 뿌렸으면 싶네. 뿌리고 싶네.
* 머리우희: 머리 위에
* 귀밋헤: 귀 밑에
* 불녀볼까: (바람에) 불려볼까. 나부껴볼까. 날려볼까. 흩날려볼까.
* 우탁의 시조는 탄로가 2수가 전한다. ‘탄로갗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우탁의 시조가 꼭 그렇게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시조 외의 다른 한 수 ‘한손에 가시를 들고’는 해학적인 면(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쳐서 막겠다는)이 있기도 하거니와 또 이 시조의 경우처럼 호탕한 면(눈을 단숨에 녹여버린 바람의 힘을 빌려다가 해묵은 서리를 일거에 날려버리겠다는)이 있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를 바라보는 지혜만은 없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우탁은 이 두 시조를 지어냄으로써 자신을 달래고 또 조금이나마 위안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설시조(辭說時調)
1. 사설시조의 개념:시조 3장 중에서 초·종장은 대체로 엇시조의 중장(40자 이내)의 자수(字數)와 일치하고, 중장은 그 자수가 제한 없이 길어진 시조이다.
2. 사설시조의 형성:영·정조 이후 서민 계급이 자기네들의 생활 감정을 담고자 종래의 양반 계급이 써 오던 평시조의 형태를 개조(改造)한 것이다.
3. 사설시조의 주제:① 구체적이고 서민적인 소재와 비유의 도입
② 강렬한 애정과 내용의 표출
③ 언어유희·재담(才談)·욕설의 도입
④ 기탄(忌憚)없는 비유를 통한 사회 비판
⑤ 비개성적 사물의 유형적 배열을 통한 감정의 발산
1..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 김수장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松골(송골)매도 갓고 줄에 안즌 져비도 갓고 百花園裡(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갓고 綠水波瀾(녹수파란)에 비오리도 갓고 따해 퍽 안즌 쇼로개도 갓고 석은 등걸에 부헝이도 갓데.
그려도 다 각각 남의 사랑인이 皆一色(개일색)인가 하노라. ― <해동가요>
계집(여인)들이 여러 층이더라.
송골매 같기도 하고, 줄에 앉은 제비 같기도 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뜰에 두루미 같기도 하고, 푸른 물결 위에 비오리(오리과에 속하는 물새) 같기도 하고, 땅에 퍽 주저앉은 솔개 같기도 하고, 썩은 등걸에 앉은 부엉이 같기도 하네.
그래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을 받으니 각자가 다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 성 격 : 풍자적, 해학적
● 표 현 : 직유법, 열거법
● 주 제 : 각기 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뭇 여인들(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데 대한 경계)
● 해설 및 감상 ː 일찍이 우리 문학사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애정관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즉, 초장에서는 여인들이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중장에서는 여인들을 여러 종류의 새에 비유한 뒤, 종장에서는 그 다양한 여인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임에게는 각각 가장 사랑 받는 여인들이니 모두 일색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여인들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해학미가 넘치는 표현으로 사설시조의 멋을 한껏 살린 작품이라 하겠다.
2..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지은이 모름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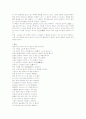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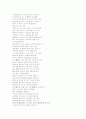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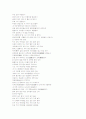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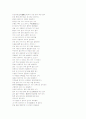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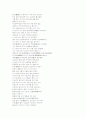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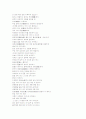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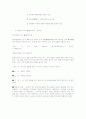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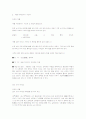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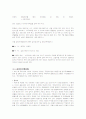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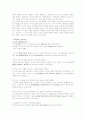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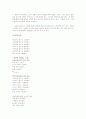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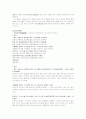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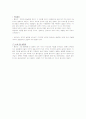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