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처용무가 궁중 무용의 꽃이라면 승무는 민속 무용의 꽃이다. 시인 조지훈이 그의 <승무>에서 표현한 대로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을 나비처럼 곱게 쓰고 그 위에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치고 기다란 소매를 허공에 뿌리며 추는 승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종교적인 품위가지 느끼게 해 준다.
부처님에게 축원하고 합장을 한 다음 긴 염불로 시작하여 북을 어른 뒤에 타령으로 바꾸어서 다시 북을 어르고, 굿거리를 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을 두드리고 다시 굿거리로 마치는 승무를 출 때, 왜 북을 두드리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승무의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인 한영숙과 더불어 승무와 살풀이춤의 대가로 꼽히는 이매방은 자기는 북을 두드릴 때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북에다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두드린다고 한다.
"남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나는 내 승무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깨져서 중이 되었는디 수도를 하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고 속세가 그리워 가슴 속에 왼갖 번뇌가 떠오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참다못해 그 울분, 화, 이런 것을 춤이나 북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소할라고 추는 춤이 바로 내 승무라........"
불교적인 용어로 점잖게 설명하자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기원하는 수도승의 내면 세계를 묘사한 춤이라는 말이 되겠지만 그런 어렵고 딱딱한 말보다는 그의 말이 훨씬 쉽고 현실감이 있어 보인다.
부처님에게 축원하고 합장을 한 다음 긴 염불로 시작하여 북을 어른 뒤에 타령으로 바꾸어서 다시 북을 어르고, 굿거리를 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을 두드리고 다시 굿거리로 마치는 승무를 출 때, 왜 북을 두드리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승무의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인 한영숙과 더불어 승무와 살풀이춤의 대가로 꼽히는 이매방은 자기는 북을 두드릴 때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북에다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두드린다고 한다.
"남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나는 내 승무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깨져서 중이 되었는디 수도를 하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고 속세가 그리워 가슴 속에 왼갖 번뇌가 떠오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참다못해 그 울분, 화, 이런 것을 춤이나 북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소할라고 추는 춤이 바로 내 승무라........"
불교적인 용어로 점잖게 설명하자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기원하는 수도승의 내면 세계를 묘사한 춤이라는 말이 되겠지만 그런 어렵고 딱딱한 말보다는 그의 말이 훨씬 쉽고 현실감이 있어 보인다.
본문내용
김금옥 선생이고 김금옥 선생의 제자로 한성준 선생과 박영구 선생이 있는데 한성준 선생 밑에서 한영숙씨가 나오고 박영구 선생 밑에서 내가 나왔다는 거지요.\"
승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뒤인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확실하게 단정을 내리기 어렵다. 게다가 신방초가 승무의 창시자라는 설은 문헌의 고증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고, 다만 여러 원로 무용인들 사이에 전해 오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계보를 추적해 올라갈 때에 승무계에서 제일 \'웃어른\'으로 꼽히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무난할 듯하다.
어쨌든 그러한 계보를 거쳐 전해진 승무를 그는 박영구에게 회초리를 맞아 가며 배웠다.
\"우리 선생님은 기가 막히게 춤을 추시고 소리북도 잘 치시는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발을 약간 절어요. 그래도 춤추면 몰라...... 우리 선생님이 북을 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레를 타다가 어깨춤을 절로 추곤 했으니께. 그 북가락을 내가 배우는디 참 배우는 방법이 옛날 식이라. 선생님이 북도 내주지를 않아서 함부로 칠 수도 없고 감나무 가지 꺾어서 만든 북채를 가지고 입으로 몇 가락 배운 것을 돌담에서 혼자 돌을 두드림서 연습을 혀. 그러자니 손등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혀요. 다른 기생들은 힘들다고 다 집어치웠는데 나는 끝까지 버텼어. 선생님 눈치 봐서 기분 좋을 때 한 가락씩, 사흘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동냥하다시피 가락을 배웠어요. 요새 사람들이 들으면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배운 거라서
승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뒤인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확실하게 단정을 내리기 어렵다. 게다가 신방초가 승무의 창시자라는 설은 문헌의 고증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고, 다만 여러 원로 무용인들 사이에 전해 오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계보를 추적해 올라갈 때에 승무계에서 제일 \'웃어른\'으로 꼽히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무난할 듯하다.
어쨌든 그러한 계보를 거쳐 전해진 승무를 그는 박영구에게 회초리를 맞아 가며 배웠다.
\"우리 선생님은 기가 막히게 춤을 추시고 소리북도 잘 치시는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발을 약간 절어요. 그래도 춤추면 몰라...... 우리 선생님이 북을 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레를 타다가 어깨춤을 절로 추곤 했으니께. 그 북가락을 내가 배우는디 참 배우는 방법이 옛날 식이라. 선생님이 북도 내주지를 않아서 함부로 칠 수도 없고 감나무 가지 꺾어서 만든 북채를 가지고 입으로 몇 가락 배운 것을 돌담에서 혼자 돌을 두드림서 연습을 혀. 그러자니 손등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혀요. 다른 기생들은 힘들다고 다 집어치웠는데 나는 끝까지 버텼어. 선생님 눈치 봐서 기분 좋을 때 한 가락씩, 사흘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동냥하다시피 가락을 배웠어요. 요새 사람들이 들으면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배운 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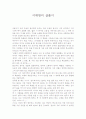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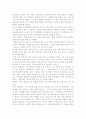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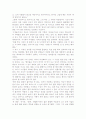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