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였었다. 쯔빙글리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시에 유행하던 물질적 경건(Materialistic popular piety), 즉 우상숭배, 성직자중심주의, 성인숭배, 면죄부 판매, 순례행진등을 공격하면서, 루터의 개혁은 ‘약자를 보존’(Sparing of The Weak)하는 개혁이므로 보다 더 완벽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레벨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 쯔빙글리와 그레벨의 분열도 ‘반성직자중심주의’와 ‘약자의 보존’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콘라드 그레벨은 낡은 제사장 중심적제의를 뿌리부터 가지까지 파괴하려고 했지만, 쯔빙글리는 원래의 개혁의지를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시의회는 또 십일세, 과다한 사용료등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가 그 태도를 번복하였다. 쯔빙글리와 시의화의 태도변화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거리를 만들었따. 입미 1523년 6월부터 십일세를 쮸리히 대성당의 수도사회에 내지 않기로 결정한 로이블린(Wilhelm Reublin) 중심의 비티콘(Wiykon)과 촐리콘(Zollikon)의 지방공동체는 쯔빙글리의 태도변화를 따를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 쯔빙글리는 십일세를 폐지하는 것은 제국도시와 전체제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갈등들 때문에, 결국 1525년 1월 쯔빙글리와 재세례파는 그들의 입장 차이를 재세례 시행으로 표면화 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1524년 9월 처음으로 스위스 형제단 (Swiss Brethren)이 구성되었다.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안드레아스 카스텔버거(Andreas Castelberger), 한스 오겐푸스(Hans Oggenfuss),발트리메 푸르(Vartlime Pur), 하인리히 아벨리(Heinrich Abrli),요하네스 브뢰틀리(Johannes Bro:tli), 한스 휘우프(Hans Huiuf)등의 구성원들은 노이슈타트(Neustadt)거리에 있는 펠릭스 만츠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쯔빙글리와 달리 독자적인 성서연구를 시작하였다. 스위스 형제단 내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신학을 훈련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지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체계보다는 삶 자체의 변화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스위스 형제단은 신자 개개인과 사회의 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범과 교훈에 따라야 한다는 ‘제자의 도’(Nachfolge Christi)사상을 강조하였고, 중세의 강제적인 교회형태(Compulsory Church)를 벗어나 자발적인 교회형태(Voluntary Church)를 구성하기 원했으며, 언제나 사랑과 무저항의 윤리를 지향하였다. 스위스 형제단은 나름대로의 참된교회(True Church)를 형성하려고 쯔빙글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였지만, 쯔빙그리는 참된 기독교인만이라는 구별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보다 일반 대중들을 신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쯔빙글리의 태도에 대하여 스위스 형제단은, 그가 본래의 계획목표를 상실했으며 이제는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고 믿게 되었다. 스위스 형제단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는 1524년 9월에서 1525년 1월 14일까지 쓴 그레벨의 편지들에 잘 나타나 있다. 1524년 9월 3일과 9월 5일의 편지는 그레벨이 정확한 복음적 지도력의 실천을 위해서 쯔빙글리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밝힌 편지였다. 그래서 그는 바디안에게 “나는 기다렸으나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거기 있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시몬 스텀프 등은 쯔빙글리에게 기존의 교회체계와 구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적 진리를 따라 ‘신자의 교회’(Believers\' Church)로 개혁하라고 요구하였고,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실현되고 십일세와 고리대금은 사라져야 하며 모든 것이 공평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결국, 1524년 여름부터 교회와 시의회는 스위스 형제단을 ‘천사의 옷을 입은 악당’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하의 원인을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세례파는 종교 개혁가들이 개혁을 실행할 후에도, 전체사회가 ‘하나의 보편적이고 신비한 몸’의 구실을 해야 한다는 중세적인 사회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재세례파와 쯔빙글리가 대립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개념에 있었던 것이다. 쯔빙글리는 자신이 처음에 지향했던 태도를 바꾸어서 국가교회(State Church)형성에 주력하게 되었지만 스위스 형제단은 계속 다음과 같은 쯔빙글리의 초기 입장을 고수하였다.
.. 공권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인의 자유를 다스리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다.... 공권력은 영(Soul)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소유물들을 다스린다.... 공권력이 신성한 진리에 위배되는 명령을 하거나 진리를 금지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복하기보다 죽음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목회자는 공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구원이나 교구회원들에 의해 선출 되어야 한다.
제세례파의 가치기준은 언제나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중세적인 미사문제, 성찬, 교회에 대한 국가의 행정문제, 로마 교회의 교권화와 타락의 문제등에 대하여 성서주의 (Biblicism)에 입각한 반대를 하였고, 쯔빙글리 보다 더 완벽하고 실제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결정적으로 스위스 형제단이 쯔빙글리를 비성서적이라고 몰아붙이게 된 문제는 유아세례의 문제였다. 스위스 형제단의 일원이 되어 그레벨과 절친했던 발타자르 후브마이어는 발츠홑(Waldshud)에서 이미 그의 급진저인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그는 신명기 27장에 근거해서 미사와 성상에 대한 우상적인 숭배를 비난하고 자국어(German)어로된 미사와 두 종류의 성찬을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발츠쿠의 다른 성직자들과 지배자들은 후브마이어의 행동이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한 불충이 된다고 규정하였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후브마이어에게 동조하였다. 후브마이어는 콘라드 그레벨과 연합하여 유아세례의 무
1524년 9월 처음으로 스위스 형제단 (Swiss Brethren)이 구성되었다.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안드레아스 카스텔버거(Andreas Castelberger), 한스 오겐푸스(Hans Oggenfuss),발트리메 푸르(Vartlime Pur), 하인리히 아벨리(Heinrich Abrli),요하네스 브뢰틀리(Johannes Bro:tli), 한스 휘우프(Hans Huiuf)등의 구성원들은 노이슈타트(Neustadt)거리에 있는 펠릭스 만츠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쯔빙글리와 달리 독자적인 성서연구를 시작하였다. 스위스 형제단 내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신학을 훈련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지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체계보다는 삶 자체의 변화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스위스 형제단은 신자 개개인과 사회의 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범과 교훈에 따라야 한다는 ‘제자의 도’(Nachfolge Christi)사상을 강조하였고, 중세의 강제적인 교회형태(Compulsory Church)를 벗어나 자발적인 교회형태(Voluntary Church)를 구성하기 원했으며, 언제나 사랑과 무저항의 윤리를 지향하였다. 스위스 형제단은 나름대로의 참된교회(True Church)를 형성하려고 쯔빙글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였지만, 쯔빙그리는 참된 기독교인만이라는 구별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보다 일반 대중들을 신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쯔빙글리의 태도에 대하여 스위스 형제단은, 그가 본래의 계획목표를 상실했으며 이제는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고 믿게 되었다. 스위스 형제단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는 1524년 9월에서 1525년 1월 14일까지 쓴 그레벨의 편지들에 잘 나타나 있다. 1524년 9월 3일과 9월 5일의 편지는 그레벨이 정확한 복음적 지도력의 실천을 위해서 쯔빙글리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밝힌 편지였다. 그래서 그는 바디안에게 “나는 기다렸으나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거기 있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시몬 스텀프 등은 쯔빙글리에게 기존의 교회체계와 구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적 진리를 따라 ‘신자의 교회’(Believers\' Church)로 개혁하라고 요구하였고,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실현되고 십일세와 고리대금은 사라져야 하며 모든 것이 공평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결국, 1524년 여름부터 교회와 시의회는 스위스 형제단을 ‘천사의 옷을 입은 악당’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하의 원인을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세례파는 종교 개혁가들이 개혁을 실행할 후에도, 전체사회가 ‘하나의 보편적이고 신비한 몸’의 구실을 해야 한다는 중세적인 사회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재세례파와 쯔빙글리가 대립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개념에 있었던 것이다. 쯔빙글리는 자신이 처음에 지향했던 태도를 바꾸어서 국가교회(State Church)형성에 주력하게 되었지만 스위스 형제단은 계속 다음과 같은 쯔빙글리의 초기 입장을 고수하였다.
.. 공권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인의 자유를 다스리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다.... 공권력은 영(Soul)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소유물들을 다스린다.... 공권력이 신성한 진리에 위배되는 명령을 하거나 진리를 금지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복하기보다 죽음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목회자는 공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구원이나 교구회원들에 의해 선출 되어야 한다.
제세례파의 가치기준은 언제나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중세적인 미사문제, 성찬, 교회에 대한 국가의 행정문제, 로마 교회의 교권화와 타락의 문제등에 대하여 성서주의 (Biblicism)에 입각한 반대를 하였고, 쯔빙글리 보다 더 완벽하고 실제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결정적으로 스위스 형제단이 쯔빙글리를 비성서적이라고 몰아붙이게 된 문제는 유아세례의 문제였다. 스위스 형제단의 일원이 되어 그레벨과 절친했던 발타자르 후브마이어는 발츠홑(Waldshud)에서 이미 그의 급진저인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그는 신명기 27장에 근거해서 미사와 성상에 대한 우상적인 숭배를 비난하고 자국어(German)어로된 미사와 두 종류의 성찬을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발츠쿠의 다른 성직자들과 지배자들은 후브마이어의 행동이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한 불충이 된다고 규정하였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후브마이어에게 동조하였다. 후브마이어는 콘라드 그레벨과 연합하여 유아세례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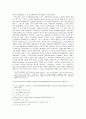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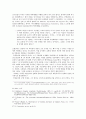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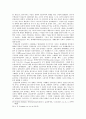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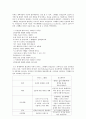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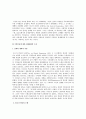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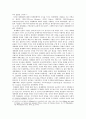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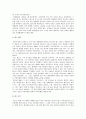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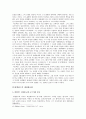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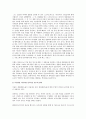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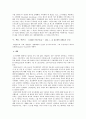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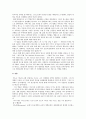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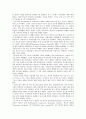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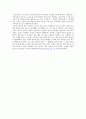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