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상(李 箱)
왜, 그는 자폐공간으로 퇴행(退行)할 수밖에 없었던가.
Ⅰ. 서론
“이상(李 箱)의 이상(異常)한 문학과 이상한 삶”
Ⅱ.본론
ⅰ) 이상의 생애와 그에 얽힌 이모저모
ⅱ) 부정적 존재의식과 부정의식의 근원
ⅲ) 부정적인 세계와 도전의식
ⅳ) 훼손된 주체적 자아의 회복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왜, 그는 자폐공간으로 퇴행(退行)할 수밖에 없었던가.
Ⅰ. 서론
“이상(李 箱)의 이상(異常)한 문학과 이상한 삶”
Ⅱ.본론
ⅰ) 이상의 생애와 그에 얽힌 이모저모
ⅱ) 부정적 존재의식과 부정의식의 근원
ⅲ) 부정적인 세계와 도전의식
ⅳ) 훼손된 주체적 자아의 회복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울 따름이었다. 이에 역행하는 것이 추악한 현실에서 순결할 수 있고, 죽을 운명을 지니고 있지만 살아있어야만 될 존재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날개」를 통해서 이 일상적인 삶에 대한 거부의 근원의식이 부분 밝혀진다.
주인공 ‘나’는 방안에서 고립된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행동양상이 달라진다. 물질에 대한 가치를 깨달음은 동시에 세속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다. 나는 돈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에서 나와 ‘거리’(현실세계)로 들어간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폐적인 삶을 살아온 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능을 보두 잊어버렸다. ‘백치’로서의 삶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황금의 사용 기능까지 망각해 버리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중성이 엿보인다. 상실하고 싶은 갈망이 중첩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리의 배회’는 물질적인 욕망을 억제하려는 자기암시의 하나이며 돈을 모독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소외현상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과 타협될까 두려워서 자폐적인 삶으로 위장한 내가 다시 그 현실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바로 부지런한 지구 위에서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과학적이고 획일적인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가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되가지고 돌아간 것은 이런 현실적인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로 인해 물질에 얽매이게 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번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 한 칸만으로 행복하던 나는 물질에 눈을 뜨면서 위선과 비도덕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고 아내에게 속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아내를 의심한 것을 다시 거두기로 하고 되돌아가지만 그것은 불신을 확인하는 데 불과했다. 그곳은 더 이상 행복의 방이 아니게 된 것이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박제’된 삶에 대한 자각과 물질적 현실의 부정성의 체득 이었다. 이상이 일상적인 삶들을 무의미한 ‘포오즈’로 처리하는 것도 이러한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인공의 날개’ ‘인공의 날개’에서 초월과 함께 영웅의 이미지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없어진 ‘인공의 날개’는 탕아나 건달의 근대적 영웅의 이미지를 지니면, 이는 고대 아기장수의 설화에서 펴보지 못하고 제거당한 ‘박제된’날개의 이미지와 상통하여, 현실에서 뜻을 펴보지 못한 비극성을 도출해 낸다. 따라서 ‘날자, 날자, 날자.’의 반복적 언술은 현실초월의 의미와 함께 현실대응의 의지를 동시에 수반한다.
가 돋아나기를 갈망하며 물신화 되어 있는 세계에서의 탈출과 도전을 동시에 꿈꾼다.
ⅳ) 훼손된 주체적 자아의 회복문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 생명과 생활을 잃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를 암시한다. 이어 무엇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이루어 갈 목표가 없는 듯한 서술자의, ‘인생의 제행(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어 버려 삶 자체를 중단한 듯한 태도가 명백히 보인다. 이에는 물론 소설 밖의 시대배경인 1930년대 식민지 치하에 사는 한 지식인으로서의 고통도 투영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작가 이상이 서양의 현대 화가를 애호하며 그들과는 ‘정신적 혈연’ 김기림. 「자기 분열의 초극」 1938.1.26
을 느끼는 바, 20세기 첨단의 예술가들과 호흡함을 작가로서 자부한다고 할 때,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짙고 19세기적 문화유산에 집착하는 당시의 문화·사회 풍토 안에서 어떤 교양과 수준의 격차 때문에 숨 막히는 답답함을 분명히 느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서두에서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封鎖)해 버리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다른 시대 배경 속에서 자신의 ‘비범한 발육’을 그의 20세기적 기준으로 삼고 작품 「날개」는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나의 심리적 풍경이 드러난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쳐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직업도 없이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술시중을 들며 벌어들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삶을 ‘절대적인 상태’로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내용을 보자.
한잠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물 껍질로
주인공 ‘나’는 방안에서 고립된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행동양상이 달라진다. 물질에 대한 가치를 깨달음은 동시에 세속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다. 나는 돈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에서 나와 ‘거리’(현실세계)로 들어간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폐적인 삶을 살아온 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능을 보두 잊어버렸다. ‘백치’로서의 삶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황금의 사용 기능까지 망각해 버리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중성이 엿보인다. 상실하고 싶은 갈망이 중첩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리의 배회’는 물질적인 욕망을 억제하려는 자기암시의 하나이며 돈을 모독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소외현상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과 타협될까 두려워서 자폐적인 삶으로 위장한 내가 다시 그 현실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바로 부지런한 지구 위에서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과학적이고 획일적인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가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되가지고 돌아간 것은 이런 현실적인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로 인해 물질에 얽매이게 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번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 한 칸만으로 행복하던 나는 물질에 눈을 뜨면서 위선과 비도덕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고 아내에게 속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아내를 의심한 것을 다시 거두기로 하고 되돌아가지만 그것은 불신을 확인하는 데 불과했다. 그곳은 더 이상 행복의 방이 아니게 된 것이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박제’된 삶에 대한 자각과 물질적 현실의 부정성의 체득 이었다. 이상이 일상적인 삶들을 무의미한 ‘포오즈’로 처리하는 것도 이러한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인공의 날개’ ‘인공의 날개’에서 초월과 함께 영웅의 이미지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없어진 ‘인공의 날개’는 탕아나 건달의 근대적 영웅의 이미지를 지니면, 이는 고대 아기장수의 설화에서 펴보지 못하고 제거당한 ‘박제된’날개의 이미지와 상통하여, 현실에서 뜻을 펴보지 못한 비극성을 도출해 낸다. 따라서 ‘날자, 날자, 날자.’의 반복적 언술은 현실초월의 의미와 함께 현실대응의 의지를 동시에 수반한다.
가 돋아나기를 갈망하며 물신화 되어 있는 세계에서의 탈출과 도전을 동시에 꿈꾼다.
ⅳ) 훼손된 주체적 자아의 회복문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 생명과 생활을 잃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를 암시한다. 이어 무엇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이루어 갈 목표가 없는 듯한 서술자의, ‘인생의 제행(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어 버려 삶 자체를 중단한 듯한 태도가 명백히 보인다. 이에는 물론 소설 밖의 시대배경인 1930년대 식민지 치하에 사는 한 지식인으로서의 고통도 투영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작가 이상이 서양의 현대 화가를 애호하며 그들과는 ‘정신적 혈연’ 김기림. 「자기 분열의 초극」 1938.1.26
을 느끼는 바, 20세기 첨단의 예술가들과 호흡함을 작가로서 자부한다고 할 때,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짙고 19세기적 문화유산에 집착하는 당시의 문화·사회 풍토 안에서 어떤 교양과 수준의 격차 때문에 숨 막히는 답답함을 분명히 느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서두에서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封鎖)해 버리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다른 시대 배경 속에서 자신의 ‘비범한 발육’을 그의 20세기적 기준으로 삼고 작품 「날개」는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나의 심리적 풍경이 드러난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쳐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직업도 없이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술시중을 들며 벌어들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삶을 ‘절대적인 상태’로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내용을 보자.
한잠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물 껍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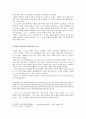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