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超人’은 시적 화자가 못 다 이룬 업적을 이어줄 후손 혹은 훗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떠난 자신의 안타까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순수한 그 누군가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본다. 그래서 광복의 그날이 왔을 때에는 가슴에 맺혔던 울분을 ‘목놓아’ 후련하게 털어내 버리려 하고자 함일 것이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살아온 이육사는 지친 말처럼 먼 타국에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였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언정 그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빛나는 털과 반짝이는 두 눈을 가진 백마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하고 처절하리만큼 힘들게 살아간 이육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식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뼈속 깊이까지 전해주고 간 지사이자, 시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참고 문헌
심원섭 편주 『원본 李陸史 전집』, 집문당, 1986.
김희곤,『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0.
이상규,「陸史 詩에 나타난 安東方言」, 『어문학』72호 (2001).
박호영, 「이육사의 <광야>에 대한 실증적 접근」*,『문학과 교육』, 1998년 봄호.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살아온 이육사는 지친 말처럼 먼 타국에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였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언정 그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빛나는 털과 반짝이는 두 눈을 가진 백마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하고 처절하리만큼 힘들게 살아간 이육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식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뼈속 깊이까지 전해주고 간 지사이자, 시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참고 문헌
심원섭 편주 『원본 李陸史 전집』, 집문당, 1986.
김희곤,『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0.
이상규,「陸史 詩에 나타난 安東方言」, 『어문학』72호 (2001).
박호영, 「이육사의 <광야>에 대한 실증적 접근」*,『문학과 교육』, 1998년 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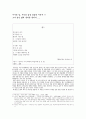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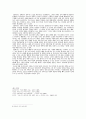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