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삼의당의 생애
2. 삼의당 시의 문학적 배경
1) 내적 요인
2) 외적 요인
3. 삼의당의 시세계
1) 소재적 특성
2) 주제적 특성
4. 마치면서
5. 참고문헌
2. 삼의당 시의 문학적 배경
1) 내적 요인
2) 외적 요인
3. 삼의당의 시세계
1) 소재적 특성
2) 주제적 특성
4. 마치면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風動梧桐影 바람이 오동나무 그림자를 흔드네.
<「三宜堂槁」, 券之一, 淸夜汲水>
: 이 시에 흐르는 서정은 비단결같이 고우면서도 요란하거나 난삽하지가 않다. 그러면서도 달 밝은 밤의 아름다운 미적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淸夜汲淸水”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발상으로부터 “明月湧金井”이라고 한 구절은 절사가 아닐 수 없다. 우물 속에 떠 있는 달의 아름다움, 그것을 길어 올려놓는 시적 전이야말로 이 시의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 달빛아래 지나는 바람이 오동잎을 한들거리게 하면 그 그림자가 또한 별다른 정취를 돋우어 줄 것이다. 그런데도 다만 “無語立欄干”이라고 한 정적인 자세는 이 시의 안정된 정서를 서정적 정감으로 심화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본다.
삼의당에 있어 서정의 표출을 단이나 꽃과 같은 대상의 사물에 한하지 않는다. 보다 성실한 자신의 생활체험에서 얻어진 소재로 절실한 주제를 극명하게 형상화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삼의당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와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하여 자기 안에 샘솟는 시적 정서를 촉발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구현한 시적 정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서정을 표출하는 방향에도 귀결된다. 그는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자신의 감정으로 깊숙이 삭여서 다시금 내놓은 특이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3) 고뇌의 승화
삼의당은 개인적으로 유달리 불우한 사람이었다. 그의 고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 고뇌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고뇌이다.
삼의당의 외적 고뇌는 주로 가정환경과 가족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는 일생을 두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남편을 산으로 공부하게 하고, 서울로 보내 과거보게 하는 등, 생애의 상당부분을 헤어져 살아야 했던 삼의당은 항상 기다리는 외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다.
相思苦 相思苦 임 그리는 괴로움이여, 임 그리는 괴로움이여
鷄三唱 夜五鼓 닭은 세 번 울고, 날은 이미 밝았네
無眠對鴛鴦 뒤척이며 잠 못이루고 원앙금침 대하니
淚如雨 淚如雨 눈물이 비오듯 하여라. 눈물이 비오듯 하여라.
<「三宜堂槁」, 券之一, 夫子自京 經年未歸 余題詩以伸情私 四首中의 一>
: 남편이 서울에서 해가 바뀌도록 돌아오지 않으며 기다리다 못해 지었다는 시로 삼의당의 간절한 심경이 절실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것에는 <春閨詞>, <秋閨詞>, <梧桐雨>등이 있고, 이 작품은 모두 남편을 멀리 두고 그리는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남편과 헤어져 있는 기간이 길수록 삼의당의 괴로움도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夜色近五更 밤빛이 아득한데 날샐녘이 가까워
滿庭秋月正分明 뜰에 가득 가을달이 너무도 환하다.
衾强做相思夢 이불에 기대어 억지로나마 꿈꾸어 볼까.
到郞邊却自驚 임의 곁에 가자마자 문득 놀라 깨었다.
孔雀屛風翡翠衾 공작병풍을 치고 비취이불 덮었는데
一窓夜色正 창에 가득 밤빛은 진정 침침하여라
相思惟有靑天月 서로 그리워하나니, 청천의 저 달만은
應照人間兩地心 아마 우리 둘의 마음 비추어 주리.
獨步紗窓夜己深 창 앞에 홀로 앉아 밤이 이미 깊었는데
斜將釵股滴燈心 흘러내리는 비녀 잡고 등불 심지를 긁네.
天涯一別無消息 한번 이별한 뒤 영영 소식이 없어
欲相思抱尺琴 그리움을 노래하려 거문고를 안아보네
<「三宜堂槁」, 券之一, 秋閨詞中의 三,七,一>
: 삼의당은 자신의 고뇌를 잊기 위해 잠을 청하고 꿈 속에서나마 낭군을 만나려한다.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못하게 되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그 달이 서로를 비추어 주고 있으리라고 자위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써도 괴로움은 털어버릴 수 없게 되자. 거문고를 타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삼의당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이별해 있는 외로움이 고뇌의 주된 원인이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아쉬움, 현실적인 가난, 부모와 친지들에게 죄스러운 마음 등이 모두 남편의 성공을 통해 해소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무너지고 삼의당의 마음의 고통은 더욱 참담해졌다.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와 기다림에 치친 그에게 또 다른 걱정은 자녀문제였다. 딸들을 잃은 처참한 심경과, 40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고뇌도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삼의당이 가진 이런 고뇌는 외적 문제 이외에 자신의 내적 고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녀의 차별이 극심했던 때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 것은 삼의당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삼의당은 드러내 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작품 바탕에는 여자의 한의 서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의당의 생애를 보면 그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남편을 보살피고 앞장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여자이면서도 단순한 여자로 머물지 못하고 남자의 세계를 깊숙이 알았기 때문에 삼의당의 고뇌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이 삼의당 문학의 한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4. 마치면서
삼의당은 지금껏 배운 여류 시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교로 문학을 표출해 이상향을 그리지도 않고, 자신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과감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가 유교의식을 매우 따르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러한 애정 표현은 일종의 파격일수도 있겠다. 그는 자서를 자신이 써 붙인 것도 그 시대에 있어 이상히 여길만 하나, 작품을 발표할 의도가 아닌 훗날의 거울이 되고자 했던 것으로 그가 대범했음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주고받은 시나 남편과의 관계 또한 여타 보아온 여성들과는 다르다. 그녀는 기존의 유교윤리는 지키면서 속내를 대범하게 표출해내는 그 시내 나름의 신여성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5. 참고문헌
김덕수, 김삼의당의 시문학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김동신, 김삼의당 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김영자, 삼의당의 생애와 문학,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2
송영수, 김삼의당의 생애와 시, 우석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http://2003.246.40.133/contents/4-2-1.htm
<「三宜堂槁」, 券之一, 淸夜汲水>
: 이 시에 흐르는 서정은 비단결같이 고우면서도 요란하거나 난삽하지가 않다. 그러면서도 달 밝은 밤의 아름다운 미적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淸夜汲淸水”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발상으로부터 “明月湧金井”이라고 한 구절은 절사가 아닐 수 없다. 우물 속에 떠 있는 달의 아름다움, 그것을 길어 올려놓는 시적 전이야말로 이 시의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 달빛아래 지나는 바람이 오동잎을 한들거리게 하면 그 그림자가 또한 별다른 정취를 돋우어 줄 것이다. 그런데도 다만 “無語立欄干”이라고 한 정적인 자세는 이 시의 안정된 정서를 서정적 정감으로 심화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본다.
삼의당에 있어 서정의 표출을 단이나 꽃과 같은 대상의 사물에 한하지 않는다. 보다 성실한 자신의 생활체험에서 얻어진 소재로 절실한 주제를 극명하게 형상화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삼의당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와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하여 자기 안에 샘솟는 시적 정서를 촉발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구현한 시적 정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서정을 표출하는 방향에도 귀결된다. 그는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자신의 감정으로 깊숙이 삭여서 다시금 내놓은 특이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3) 고뇌의 승화
삼의당은 개인적으로 유달리 불우한 사람이었다. 그의 고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 고뇌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고뇌이다.
삼의당의 외적 고뇌는 주로 가정환경과 가족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는 일생을 두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남편을 산으로 공부하게 하고, 서울로 보내 과거보게 하는 등, 생애의 상당부분을 헤어져 살아야 했던 삼의당은 항상 기다리는 외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다.
相思苦 相思苦 임 그리는 괴로움이여, 임 그리는 괴로움이여
鷄三唱 夜五鼓 닭은 세 번 울고, 날은 이미 밝았네
無眠對鴛鴦 뒤척이며 잠 못이루고 원앙금침 대하니
淚如雨 淚如雨 눈물이 비오듯 하여라. 눈물이 비오듯 하여라.
<「三宜堂槁」, 券之一, 夫子自京 經年未歸 余題詩以伸情私 四首中의 一>
: 남편이 서울에서 해가 바뀌도록 돌아오지 않으며 기다리다 못해 지었다는 시로 삼의당의 간절한 심경이 절실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것에는 <春閨詞>, <秋閨詞>, <梧桐雨>등이 있고, 이 작품은 모두 남편을 멀리 두고 그리는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남편과 헤어져 있는 기간이 길수록 삼의당의 괴로움도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夜色近五更 밤빛이 아득한데 날샐녘이 가까워
滿庭秋月正分明 뜰에 가득 가을달이 너무도 환하다.
衾强做相思夢 이불에 기대어 억지로나마 꿈꾸어 볼까.
到郞邊却自驚 임의 곁에 가자마자 문득 놀라 깨었다.
孔雀屛風翡翠衾 공작병풍을 치고 비취이불 덮었는데
一窓夜色正 창에 가득 밤빛은 진정 침침하여라
相思惟有靑天月 서로 그리워하나니, 청천의 저 달만은
應照人間兩地心 아마 우리 둘의 마음 비추어 주리.
獨步紗窓夜己深 창 앞에 홀로 앉아 밤이 이미 깊었는데
斜將釵股滴燈心 흘러내리는 비녀 잡고 등불 심지를 긁네.
天涯一別無消息 한번 이별한 뒤 영영 소식이 없어
欲相思抱尺琴 그리움을 노래하려 거문고를 안아보네
<「三宜堂槁」, 券之一, 秋閨詞中의 三,七,一>
: 삼의당은 자신의 고뇌를 잊기 위해 잠을 청하고 꿈 속에서나마 낭군을 만나려한다.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못하게 되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그 달이 서로를 비추어 주고 있으리라고 자위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써도 괴로움은 털어버릴 수 없게 되자. 거문고를 타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삼의당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이별해 있는 외로움이 고뇌의 주된 원인이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아쉬움, 현실적인 가난, 부모와 친지들에게 죄스러운 마음 등이 모두 남편의 성공을 통해 해소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무너지고 삼의당의 마음의 고통은 더욱 참담해졌다.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와 기다림에 치친 그에게 또 다른 걱정은 자녀문제였다. 딸들을 잃은 처참한 심경과, 40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고뇌도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삼의당이 가진 이런 고뇌는 외적 문제 이외에 자신의 내적 고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녀의 차별이 극심했던 때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 것은 삼의당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삼의당은 드러내 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작품 바탕에는 여자의 한의 서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의당의 생애를 보면 그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남편을 보살피고 앞장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여자이면서도 단순한 여자로 머물지 못하고 남자의 세계를 깊숙이 알았기 때문에 삼의당의 고뇌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이 삼의당 문학의 한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4. 마치면서
삼의당은 지금껏 배운 여류 시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교로 문학을 표출해 이상향을 그리지도 않고, 자신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과감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가 유교의식을 매우 따르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러한 애정 표현은 일종의 파격일수도 있겠다. 그는 자서를 자신이 써 붙인 것도 그 시대에 있어 이상히 여길만 하나, 작품을 발표할 의도가 아닌 훗날의 거울이 되고자 했던 것으로 그가 대범했음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주고받은 시나 남편과의 관계 또한 여타 보아온 여성들과는 다르다. 그녀는 기존의 유교윤리는 지키면서 속내를 대범하게 표출해내는 그 시내 나름의 신여성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5. 참고문헌
김덕수, 김삼의당의 시문학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김동신, 김삼의당 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김영자, 삼의당의 생애와 문학,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2
송영수, 김삼의당의 생애와 시, 우석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http://2003.246.40.133/contents/4-2-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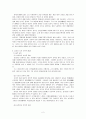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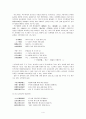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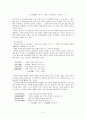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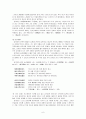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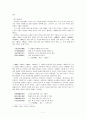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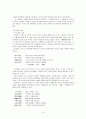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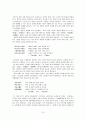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