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본문
1) 인간 박지원
2) 독자성(獨自性)에 기인한 흥취
3) 중국 대륙 속 연암의 호방함
3. 나오며
1. 들어가며
2. 본문
1) 인간 박지원
2) 독자성(獨自性)에 기인한 흥취
3) 중국 대륙 속 연암의 호방함
3. 나오며
본문내용
람들은 모두 하나 같이 이렇게 말한다.
“요동벌판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이 절대 성난 소리로 울지 않아”
하지만 이것은 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요하는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단지 사람들이 밤에 건너지 않았을 뿐이다. 낮에는 강물을 볼 수 있으니까 위험을 직접 보며 벌벌 떠느라 그 눈이 근심을 불러온다. 그러니 어찌 귀에 들리는 게 있겠는가. 지금 나는 한밤중에 강을 건너느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것에만 쏠리고 그 바람에 귀는 두려워 떨며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막북행정록」, 야구도하기, p 174
그는 연경에서 열하로 가기 위하여 강을 몇 번이고 건넜어야 했다. 지금이야 강을 건넌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지만 그 때 당시에는 위 상황은 생명을 건 위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상황들이 몇 번이고 이어졌다는 것은 연암은 그토록 열망하던 연경으로 가기 위해서 몇 번이고 생명을 걸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막북행정록」에서 “아홉 번 강을 건너다”라고 따로 이름을 달았을 만큼 연암에게는 인상적인 부분들 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연암은 자신의 강을 건너는데 있어서의 두려움과 근심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써 내려간다. 연암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는 길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암은 여기에서 두려운 상황을 “두렵다”라고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호방한 성품으로 이겨낸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의 기초를 닦는 일까지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명심(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섬세해져서 갈수록 병이 된다. 지금 내 마부는 말에 밟혀서 뒷수레에 실려있다.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풀어 주고 강물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꼰 채 발을 옹송거리고 앉았다. 한번 떨어지면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건만 아무 근심 없이 자리에서 앉았다 누웠다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경지였다. 「막북행정록」, 야구도하기, p 174
연암은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넌 위 사건들을 통해 옛날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에 접목 시킨다. 내용인 즉, 우임금이 강을 건널 때 황룡이 배를 등에 짊어져서 몹시 위험한 지경이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뚜렷해지자 용이든 지렁이든 눈앞의 크고 작은 것에 개의치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연암은 이것을 바탕으로 “외물은 언제나 귀와 눈에 누가 되어 사람들이 보고 듣는 바른 길을 잃어 버리도록 한다.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험난하고 위험하기가 강물보다 더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병통이 됨에 있어서랴. 이에, 내가 사는 산속으로 돌아가 문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금 곱씹어 볼 작정이다. 이로써 몸가짐에 재빠르고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바이다. ” 「막북행정록」, 야구도하기, p 175
라고 확장 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가는 것이다. 연암이 이처럼 항상 같은 상황에서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발견 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천재성 보다는 자잘한 일이나 외부의 시선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하고자 하는 그의 성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의 자유로운 해석이 쌓이고 쌓여 “세계화의 기치 올린 비범한 선각자라는 박지원의” 타이틀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3. 나오며
현대 사회에서 재구성되는 고전 콘텐츠는 그 콘텐츠 자체의 내용에도 기인하지만 콘텐츠 제작자의 인물특성 등에도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최근 영화 <광해>가 광해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인기몰이를 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수필이라는 한계를 깨고 문학성 뛰어난 하나의 예술 콘텐츠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이런 『열하일기』에서 드러나는 연암 박지원의 모습을 연구하고 논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본고에서 주장했듯, 연암 박지원의 일생에서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과 청년기의 시련들은 그대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글 기저에 깔리는 고독한 감성을 만들어 냈으며, 이것은 이 『열하일기』가 분명히 ‘일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현대 사회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재조명할 수 있는 분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려운 고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조선 후기 북학파가 주장한 실학사상과 관련된 정치사회의 흐름을 조명할 수 있으며, 문화 산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를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적]
역주 과정록 김윤조, 태학사, 1997.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 고미숙, 작은길, 2012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上, 下 - 고미숙, 길진숙, 김풍기 편저, 그린비, 2008
열하일기 1,2,3 김혈조 옮김
국역 열하일기 1, 2 민족문화추진회, 1966
열하일기 上, 中, 下 - 리상호 옮김, 보리출판사, 2004
[논문]
18세기의 문화적 아케이드, 박지원의 『열하일기』
허정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 2012.12, pp 303-327
낯설음과 낯익음의 경계 : ‘열하일기’의 감성적 지평
金暻鎬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연구 51, 2013.3, pp 203-229
‘海外’를 바라보는 北學 :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이태진, 한국사 시민강좌 48, 2011.2, pp 77-93
金箕懋의 『雲嶠詩集』 연구 : 특히 박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김윤조,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92, 2006.6, pp 211-232
李羲天論 : 18세기 후반 老論淸流 지식인의 운명
정길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규장각), 규장각 27, 2004.12, pp 95-116
“요동벌판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이 절대 성난 소리로 울지 않아”
하지만 이것은 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요하는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단지 사람들이 밤에 건너지 않았을 뿐이다. 낮에는 강물을 볼 수 있으니까 위험을 직접 보며 벌벌 떠느라 그 눈이 근심을 불러온다. 그러니 어찌 귀에 들리는 게 있겠는가. 지금 나는 한밤중에 강을 건너느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것에만 쏠리고 그 바람에 귀는 두려워 떨며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막북행정록」, 야구도하기, p 174
그는 연경에서 열하로 가기 위하여 강을 몇 번이고 건넜어야 했다. 지금이야 강을 건넌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지만 그 때 당시에는 위 상황은 생명을 건 위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상황들이 몇 번이고 이어졌다는 것은 연암은 그토록 열망하던 연경으로 가기 위해서 몇 번이고 생명을 걸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막북행정록」에서 “아홉 번 강을 건너다”라고 따로 이름을 달았을 만큼 연암에게는 인상적인 부분들 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연암은 자신의 강을 건너는데 있어서의 두려움과 근심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써 내려간다. 연암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는 길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암은 여기에서 두려운 상황을 “두렵다”라고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호방한 성품으로 이겨낸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의 기초를 닦는 일까지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명심(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섬세해져서 갈수록 병이 된다. 지금 내 마부는 말에 밟혀서 뒷수레에 실려있다.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풀어 주고 강물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꼰 채 발을 옹송거리고 앉았다. 한번 떨어지면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건만 아무 근심 없이 자리에서 앉았다 누웠다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경지였다. 「막북행정록」, 야구도하기, p 174
연암은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넌 위 사건들을 통해 옛날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에 접목 시킨다. 내용인 즉, 우임금이 강을 건널 때 황룡이 배를 등에 짊어져서 몹시 위험한 지경이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뚜렷해지자 용이든 지렁이든 눈앞의 크고 작은 것에 개의치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연암은 이것을 바탕으로 “외물은 언제나 귀와 눈에 누가 되어 사람들이 보고 듣는 바른 길을 잃어 버리도록 한다.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험난하고 위험하기가 강물보다 더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병통이 됨에 있어서랴. 이에, 내가 사는 산속으로 돌아가 문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금 곱씹어 볼 작정이다. 이로써 몸가짐에 재빠르고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바이다. ” 「막북행정록」, 야구도하기, p 175
라고 확장 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가는 것이다. 연암이 이처럼 항상 같은 상황에서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발견 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천재성 보다는 자잘한 일이나 외부의 시선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하고자 하는 그의 성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의 자유로운 해석이 쌓이고 쌓여 “세계화의 기치 올린 비범한 선각자라는 박지원의” 타이틀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3. 나오며
현대 사회에서 재구성되는 고전 콘텐츠는 그 콘텐츠 자체의 내용에도 기인하지만 콘텐츠 제작자의 인물특성 등에도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최근 영화 <광해>가 광해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인기몰이를 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수필이라는 한계를 깨고 문학성 뛰어난 하나의 예술 콘텐츠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이런 『열하일기』에서 드러나는 연암 박지원의 모습을 연구하고 논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본고에서 주장했듯, 연암 박지원의 일생에서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과 청년기의 시련들은 그대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글 기저에 깔리는 고독한 감성을 만들어 냈으며, 이것은 이 『열하일기』가 분명히 ‘일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현대 사회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재조명할 수 있는 분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려운 고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조선 후기 북학파가 주장한 실학사상과 관련된 정치사회의 흐름을 조명할 수 있으며, 문화 산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를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적]
역주 과정록 김윤조, 태학사, 1997.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 고미숙, 작은길, 2012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上, 下 - 고미숙, 길진숙, 김풍기 편저, 그린비, 2008
열하일기 1,2,3 김혈조 옮김
국역 열하일기 1, 2 민족문화추진회, 1966
열하일기 上, 中, 下 - 리상호 옮김, 보리출판사, 2004
[논문]
18세기의 문화적 아케이드, 박지원의 『열하일기』
허정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 2012.12, pp 303-327
낯설음과 낯익음의 경계 : ‘열하일기’의 감성적 지평
金暻鎬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연구 51, 2013.3, pp 203-229
‘海外’를 바라보는 北學 :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이태진, 한국사 시민강좌 48, 2011.2, pp 77-93
金箕懋의 『雲嶠詩集』 연구 : 특히 박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김윤조,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92, 2006.6, pp 211-232
李羲天論 : 18세기 후반 老論淸流 지식인의 운명
정길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규장각), 규장각 27, 2004.12, pp 9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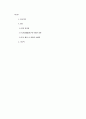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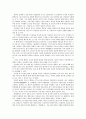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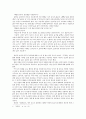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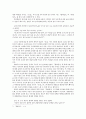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