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조선시대 사회․문화적 배경
1. 남존여비 (男尊女卑)
2. 교육의 불균등 (不均等)
3. 기생제도 (妓生制度)
Ⅲ. 본 론
1. 여류문학 개관 (女流文學 槪觀)
1) 조선 이전 사회
2) 조선 시대
2. 신분계층별 작가․작품 세계
1) 규수 (閨秀)
2) 소실 (小室)
3) 기생 (妓生)
Ⅳ. 결 론
Ⅱ. 조선시대 사회․문화적 배경
1. 남존여비 (男尊女卑)
2. 교육의 불균등 (不均等)
3. 기생제도 (妓生制度)
Ⅲ. 본 론
1. 여류문학 개관 (女流文學 槪觀)
1) 조선 이전 사회
2) 조선 시대
2. 신분계층별 작가․작품 세계
1) 규수 (閨秀)
2) 소실 (小室)
3) 기생 (妓生)
Ⅳ. 결 론
본문내용
한 것이 많은데 내용적으로 여성들이 작자를 밝히기를 꺼려했을 것으로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에서 변화되고 소멸되었으며 기록될 때 많은 작품이 음사라 하여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동동(動動)’을 한 예로 살펴본다면, 『고려사 악지(고려사 악지)』의 기록에, ‘동동’은 궁중악으로 불려졌으며 나예(儺禮)뒤에는 동동무가 있어 무속적인 송수(頌壽)와 남녀간의 상사(相思)를 노래했다.
고려 때의 기녀로서 동인홍(動人紅)의 ‘자서(自敍)’와 간돌(干)의 ‘기국담(寄國膽)’이 한시로 보한집(補閑集)에 기록되어 비련(悲戀)과 고고(孤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조선 사회
엄격한 유교주의의 질곡 속에서도 여류문학으로 시조를 비롯하여 내방가사(內房歌詞)와 궁중내인들의 恨을 그린 수필 종류와 남자 못지않은 한시 작가가 있어 양적으로는 적으나마 다채롭게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한시 작가는 약 150여명이 전한다.
성종 때 황진이(黃眞伊), 매창(梅窓) 이계생(李桂生), 이옥봉(李玉峰), 그리고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 혜경궁 홍씨(惠敬宮 洪氏)등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조선시대의 여류 작가들이다.
궁녀의 작으로 광해군 5년에 지은『계축일기(계축일기)』는 일기체로 쓴 수필문학이고, 숙종 때 궁중의 비극을 중심으로 한 내간체 문학인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이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시단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니 이른바 <삼호정 시단(三湖亭 詩壇)>이다. 삼호정은 서울 용산의 한강변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요, 동시에 김금원(金錦園)이 살고 있던 곳에 5명의 여성이 모여 인생을 의논하고 각각 소실(小室)로서 신세타령도 하면서 여류시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오늘날처럼 결사(結社)는 아닐망정 여류작가로서 더구나 19세기 중반에 소실끼리의 모임은 시재를 발휘하게 하였으니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사회에서는 내외법이 강조되고 여성의 외부활동이 금기시됨에 따라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성들의 눈길로부터 격리되었다. 외출 시 외간 남성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마를 타거나 쓰개로 온몸을 가려야 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몽수(蒙看)라고 부르는 쓰개가 있어서 온몸을 가리고 다녔으나, 고려 도경에 기록되었듯이 몽수를 쓰되 앞을 걷어 올려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이 유행한 것 『高麗圖經』卷第二十婢妾.
으로 보아 내외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녀자들은 내외를 하기 위해 너울이나 면사, 쓰개치마, 장옷 등의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도록 하였다.
세조(各籬) 3년(1457)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옛날 풍속에 부인(婦人)들이 나갈 때는 도자(兜綾)를 타고 바깥으로 휘장과 장막을 드리워서 바깥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엿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말을 타는 자도 또한 면사(面史)를 드리우고 말군(襪裙)으로 묶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으레 간략한 예법에 따라서 종종 옷을 간편하게 하고 면사(面紗)를 말아 올리고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유속(流俗)의 폐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조숙생의 처를 욕보인 것이 우계번이 술에 취하였기 때문만은 아니고, 실은 조숙생의 집에서 스스로 욕을 부른 것이다.〃 『世祖實錄』3年6月10日(壬寅).
성종(成宗) 2년(1471)에도,
¨양반 부녀(兩班婦女)는 노상(路上)에서 면사(面紗) 걷는 것을 금(禁)하게 하소서.〃 『成宗實錄』2年5月25日(丁酉).
이것으로 볼 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면 기녀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점점 더 강조되어 조선후기로 가면 신분이 낮은 여성들도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비롯한 각종 쓰개를 내외용으로 착용하였다. 기녀나 의녀들은 전모(氈帽)나 가리마 가리마(加里), 가니마(加尼), 가니아(加尼), 차액(遮額) 등의 명칭이 기록에
나타난다.
처럼 얼굴이 노출되는 쓰개를 쓸 수 있었으며 의복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조선후기 풍속화에서 기녀들이 어깨에는 쓰개치마나 장옷을 두르고 머리에는 전모를 쓴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 남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유교적 교양과 덕을 완성한 인간형인 군자와 선비이듯이 이 시기 여성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형 역시 여 군자(女君綾)였으며, 황수연, 17세기 사족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03, 171면.
이에 도달하기 위해 여성들은 부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덕(婦德)이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색(色)의 대항개념이었으며,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제한하기 위한 가부장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숙인, 열녀담론의 철학적 배경: 여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보는 열녀, 『조선
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월인, 2002, 52면.
용모를 단정히 하되, 지나치게 외모를 치장하여 이성의 눈길을 끄는 것은 기녀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이므로 여염집 여성은 피해야 할 태도로 여겼다. 여염집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 죄악시 하였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여염집 여성과 기녀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어염 집 여성들에게는 강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복식의 종류와 재료에 제한이 있었던 반면, 기녀에게는 신분에 상관없이 외모를 꾸미고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용인되었다. 기생에게는 각종 비단과 큰머리와 화려한 비녀, 노리개등 사대부 여성 못지않은 사치가 허용되었으며, 교방에서 다른 기예와 함께 몸치장하는 법을 교육 받았다.
유교적 윤리관이 널리 자리 잡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첫 번째 임무는 남편과 양친에게 순종하는 일, 가정을 지키고 아들을 낳아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정조는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혈통을 잇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 정성희, 조선시대 매춘과 유녀(遊女)의 존재양태, 『조선시대 양반사회와 문화3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412면
다산(多
‘동동(動動)’을 한 예로 살펴본다면, 『고려사 악지(고려사 악지)』의 기록에, ‘동동’은 궁중악으로 불려졌으며 나예(儺禮)뒤에는 동동무가 있어 무속적인 송수(頌壽)와 남녀간의 상사(相思)를 노래했다.
고려 때의 기녀로서 동인홍(動人紅)의 ‘자서(自敍)’와 간돌(干)의 ‘기국담(寄國膽)’이 한시로 보한집(補閑集)에 기록되어 비련(悲戀)과 고고(孤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조선 사회
엄격한 유교주의의 질곡 속에서도 여류문학으로 시조를 비롯하여 내방가사(內房歌詞)와 궁중내인들의 恨을 그린 수필 종류와 남자 못지않은 한시 작가가 있어 양적으로는 적으나마 다채롭게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한시 작가는 약 150여명이 전한다.
성종 때 황진이(黃眞伊), 매창(梅窓) 이계생(李桂生), 이옥봉(李玉峰), 그리고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 혜경궁 홍씨(惠敬宮 洪氏)등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조선시대의 여류 작가들이다.
궁녀의 작으로 광해군 5년에 지은『계축일기(계축일기)』는 일기체로 쓴 수필문학이고, 숙종 때 궁중의 비극을 중심으로 한 내간체 문학인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이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시단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니 이른바 <삼호정 시단(三湖亭 詩壇)>이다. 삼호정은 서울 용산의 한강변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요, 동시에 김금원(金錦園)이 살고 있던 곳에 5명의 여성이 모여 인생을 의논하고 각각 소실(小室)로서 신세타령도 하면서 여류시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오늘날처럼 결사(結社)는 아닐망정 여류작가로서 더구나 19세기 중반에 소실끼리의 모임은 시재를 발휘하게 하였으니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사회에서는 내외법이 강조되고 여성의 외부활동이 금기시됨에 따라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성들의 눈길로부터 격리되었다. 외출 시 외간 남성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마를 타거나 쓰개로 온몸을 가려야 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몽수(蒙看)라고 부르는 쓰개가 있어서 온몸을 가리고 다녔으나, 고려 도경에 기록되었듯이 몽수를 쓰되 앞을 걷어 올려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이 유행한 것 『高麗圖經』卷第二十婢妾.
으로 보아 내외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녀자들은 내외를 하기 위해 너울이나 면사, 쓰개치마, 장옷 등의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도록 하였다.
세조(各籬) 3년(1457)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옛날 풍속에 부인(婦人)들이 나갈 때는 도자(兜綾)를 타고 바깥으로 휘장과 장막을 드리워서 바깥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엿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말을 타는 자도 또한 면사(面史)를 드리우고 말군(襪裙)으로 묶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으레 간략한 예법에 따라서 종종 옷을 간편하게 하고 면사(面紗)를 말아 올리고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유속(流俗)의 폐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조숙생의 처를 욕보인 것이 우계번이 술에 취하였기 때문만은 아니고, 실은 조숙생의 집에서 스스로 욕을 부른 것이다.〃 『世祖實錄』3年6月10日(壬寅).
성종(成宗) 2년(1471)에도,
¨양반 부녀(兩班婦女)는 노상(路上)에서 면사(面紗) 걷는 것을 금(禁)하게 하소서.〃 『成宗實錄』2年5月25日(丁酉).
이것으로 볼 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면 기녀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점점 더 강조되어 조선후기로 가면 신분이 낮은 여성들도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비롯한 각종 쓰개를 내외용으로 착용하였다. 기녀나 의녀들은 전모(氈帽)나 가리마 가리마(加里), 가니마(加尼), 가니아(加尼), 차액(遮額) 등의 명칭이 기록에
나타난다.
처럼 얼굴이 노출되는 쓰개를 쓸 수 있었으며 의복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조선후기 풍속화에서 기녀들이 어깨에는 쓰개치마나 장옷을 두르고 머리에는 전모를 쓴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 남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유교적 교양과 덕을 완성한 인간형인 군자와 선비이듯이 이 시기 여성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형 역시 여 군자(女君綾)였으며, 황수연, 17세기 사족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03, 171면.
이에 도달하기 위해 여성들은 부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덕(婦德)이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색(色)의 대항개념이었으며,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제한하기 위한 가부장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숙인, 열녀담론의 철학적 배경: 여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보는 열녀, 『조선
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월인, 2002, 52면.
용모를 단정히 하되, 지나치게 외모를 치장하여 이성의 눈길을 끄는 것은 기녀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이므로 여염집 여성은 피해야 할 태도로 여겼다. 여염집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 죄악시 하였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여염집 여성과 기녀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어염 집 여성들에게는 강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복식의 종류와 재료에 제한이 있었던 반면, 기녀에게는 신분에 상관없이 외모를 꾸미고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용인되었다. 기생에게는 각종 비단과 큰머리와 화려한 비녀, 노리개등 사대부 여성 못지않은 사치가 허용되었으며, 교방에서 다른 기예와 함께 몸치장하는 법을 교육 받았다.
유교적 윤리관이 널리 자리 잡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첫 번째 임무는 남편과 양친에게 순종하는 일, 가정을 지키고 아들을 낳아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정조는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혈통을 잇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 정성희, 조선시대 매춘과 유녀(遊女)의 존재양태, 『조선시대 양반사회와 문화3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412면
다산(多
추천자료
 친일문학 작가들에 대해서
친일문학 작가들에 대해서 (페미니즘 문학)1930년대 여성작가에 대한 분석과 문학작품 (강경애, 박화성, 백신애 등등)
(페미니즘 문학)1930년대 여성작가에 대한 분석과 문학작품 (강경애, 박화성, 백신애 등등) 아동문학작가-윌리엄스타이크
아동문학작가-윌리엄스타이크 아동문학작가 이원수의 작품세계
아동문학작가 이원수의 작품세계 [한국현대문학] 최명익의 『심문』과 『장삼이사』를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작가세계관 분석
[한국현대문학] 최명익의 『심문』과 『장삼이사』를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작가세계관 분석 [현대소설A+] 김애란 작가소개와 작품분석 및 김애란문학의 특징
[현대소설A+] 김애란 작가소개와 작품분석 및 김애란문학의 특징 [최근 독일 문학의 경향] 68혁명, 독일대표작가
[최근 독일 문학의 경향] 68혁명, 독일대표작가 허균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허균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소설 홍길동전의 주제, 허균...
허균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허균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소설 홍길동전의 주제, 허균... [중국문학작품론] 노신(魯迅) 소설과 작품집 - 작가 소개(노신의 작품), 아Q정전, 고향, 축원...
[중국문학작품론] 노신(魯迅) 소설과 작품집 - 작가 소개(노신의 작품), 아Q정전, 고향, 축원...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4학년 공통] ‘고전‘의 가치와 잡지 ’문장‘파 근대예술가들의 지향점...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4학년 공통] ‘고전‘의 가치와 잡지 ’문장‘파 근대예술가들의 지향점... 스페인(에스파냐) 중남미 문화의 이해 - 스페인 문학을 이끌어나가는 작가들 (소설 & 시 ...
스페인(에스파냐) 중남미 문화의 이해 - 스페인 문학을 이끌어나가는 작가들 (소설 & 시 ... 쇼리킴,중국인 거리,작가소개- 송병수,송병수 작품의 특성,1950년대 시대적 특성,문학적 특성
쇼리킴,중국인 거리,작가소개- 송병수,송병수 작품의 특성,1950년대 시대적 특성,문학적 특성 나를 살리는 글쓰기 힐링 회복 글쟁이 시 문학 시인 문학가 작가 예술 예능인 예술작품 인문...
나를 살리는 글쓰기 힐링 회복 글쟁이 시 문학 시인 문학가 작가 예술 예능인 예술작품 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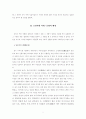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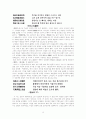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