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박상환 교수님 저,『고쳐 읽는 중국철학 이야기』중
청대의 실학사상
1. 역사적 사실과 경전에 대한 강조
2. 고증학과 양명학
청대의 실학사상
1. 역사적 사실과 경전에 대한 강조
2. 고증학과 양명학
본문내용
있다.
(2)경전으로 돌아가라: 황종희와 고염무
황종희와 고염무는 서로 학문적 교류를 했으며, 후대 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염무는 청대 고증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과 경전을 중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공리공담을 배격한 것은 왕부지와도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황종희의 사상은 민본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사상이었다. 명이대방록에서 “천하가 주인이고, 임금은 객”이라 주장한다. 관리들도 임금을 위해서가 아닌 천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국토가 모두 임금의 사유재산이라는 당시의 통념을 비판 한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학교의 공정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종희는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천하를 위한 법’과 임금의 ‘일가를 위한 법’을 구분했다. 그에 의하면 천하가 주인이므로 천하를 위한 법만이 진정한 법이다. 이를 보아 그를 민본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근대 민주주와는 다르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학문적인 관점으로 뒷받침된다. 그는 유학이 ‘천지를 경영하기 위한’ 실질적 학문이라 생각했다. 성리학과 양명학을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유학과 도학을 구분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기수양과 형이상학전 논의만 강조했던 송대 도학자들의 태도 및 경전을 경시하는 일부 양명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
황종희는 유교경전이 ‘모두 도를 게재한 서적’이고, ‘모두 실질 정치와 일상생활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민본사상도 경전을 통해 발견한 성인의 도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에 그는 경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매주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해석뿐만 아니라 경전이 실행된 당시의 문물제도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나 문자의 훈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염무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더욱 중시했다. 그의 저서 일지록을 보면 그의 사상은 박학어문, 행기유치, 호고민구로 대변된다. 세 구절 모두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박학어문: 문물에 관해 널리 배우는 것
행기유치: 부끄러움을 알아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
호고민구: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추구하는 것
이를 통해 당시의 학문 풍토를 비판한다. 특히 그는 심과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성현의 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는 오직 경전에 담겨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황종
(2)경전으로 돌아가라: 황종희와 고염무
황종희와 고염무는 서로 학문적 교류를 했으며, 후대 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염무는 청대 고증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과 경전을 중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공리공담을 배격한 것은 왕부지와도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황종희의 사상은 민본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사상이었다. 명이대방록에서 “천하가 주인이고, 임금은 객”이라 주장한다. 관리들도 임금을 위해서가 아닌 천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국토가 모두 임금의 사유재산이라는 당시의 통념을 비판 한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학교의 공정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종희는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천하를 위한 법’과 임금의 ‘일가를 위한 법’을 구분했다. 그에 의하면 천하가 주인이므로 천하를 위한 법만이 진정한 법이다. 이를 보아 그를 민본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근대 민주주와는 다르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학문적인 관점으로 뒷받침된다. 그는 유학이 ‘천지를 경영하기 위한’ 실질적 학문이라 생각했다. 성리학과 양명학을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유학과 도학을 구분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기수양과 형이상학전 논의만 강조했던 송대 도학자들의 태도 및 경전을 경시하는 일부 양명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
황종희는 유교경전이 ‘모두 도를 게재한 서적’이고, ‘모두 실질 정치와 일상생활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민본사상도 경전을 통해 발견한 성인의 도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에 그는 경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매주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해석뿐만 아니라 경전이 실행된 당시의 문물제도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나 문자의 훈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염무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더욱 중시했다. 그의 저서 일지록을 보면 그의 사상은 박학어문, 행기유치, 호고민구로 대변된다. 세 구절 모두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박학어문: 문물에 관해 널리 배우는 것
행기유치: 부끄러움을 알아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
호고민구: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추구하는 것
이를 통해 당시의 학문 풍토를 비판한다. 특히 그는 심과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성현의 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는 오직 경전에 담겨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황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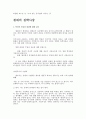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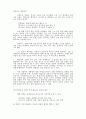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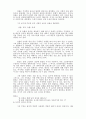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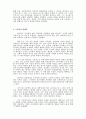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