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작가의 삶
2. 시대배경
3. 작품세계
- 여우난골족
- 모닥불
- 연자간
3. 결론
2. 시대배경
3. 작품세계
- 여우난골족
- 모닥불
- 연자간
3. 결론
본문내용
에 함흥 영생고보에 부임하게 되는데, 3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1939년 1월에 《조선일보》에 재입사하여 출판부에 근무하면서 《여성》지의 편집일을 하였으나 다시 그만두고 만주의 신경으로 옮겨 新京市 東三馬路에서 살게 된다.
만주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측량보조원, 측량서기, 또 만주의 안동에서 세관업무에 종사하기도 한다.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신의주에 거주하다 고향 정주로 돌아오게 된다.
백석은 해방 이후 1947년 10월에 열린 문학예술총동맹 제4차 중앙위원회의 개편된 조직에서 외국문학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주로 번역 출판을 하여 시 창작에는 전념하지 않았다. 1956년 10월에 열린 제2차 작가대회에서는 『문학신문』의 편집위원 겸 부장의 직책을 맡아 아동문학에 관한 평론을 발표하며 아울러 동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백석은 아동문학에 대한 의견에 비판을 받아 1958년에는 창작을 중단하고 삼수군 관평리에 있는 국영협동조합 축산반에서 일하게 된다. 그 이후 1960년도에 『조선문학』에 시를 발표하지만 1962년에 다시 창작 활동
을 중단하게 된다.
북한에서 백석은 번역가로 활동했다. 그가 번역해 내놓은 소설 ‘고요한 돈강’은 북한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북한에서도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다. 결국 유배당하듯 삼수갑산으로 들어갔다. 극한으로 자신을 내몬 것이다. 그는 삼수갑산에서 고독하고 자유롭고 싶었다. 백석은 눈 감을 때까지 시인의 마음으로 살았다.
강단에서의 모습
시집<사슴>의 초판본
1980년대 중반 백석이 70대 중반일 무렵 가족사진 부인 이윤희씨와 둘째아들과 막내딸
2. 시대배경
백석이 활동한 시기는 일제 말기의 혹독한 시련기로 모국어의 사용 금지와 신사 참배 강요, 창씨개명 등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민족성이 박탈당하는 때였다. 백석은 이러한 당대 현실을 인식하고 전통을 찾아내어 계승하여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주체성 인식을 시에 담아내었다. 백석의 시에는 세시풍속이나 전통적인 놀이, 민간신앙 등을 시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한 독특한 고향의식을 전개시켜 나갔다. 더구나 1935년 카프 해산 무렵에 등단한 이래 점차 사라져 가는 민족적인 삶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으며, 소외된 계층으로서 민중적인 삶의 양식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다. 특히 평북 방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족혼의 상징으로서 민족어와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백석은 민속 그 자체를 시의 대상으로 삼는 시인이며 북쪽의 산골 마을을 詩作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북방언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방언을 통해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망각되어 있는 한국인의 상상력의 원초적 장이 드러난다. 폐쇄된 사회의 민속을 되살리려 한 것이다. 이처럼 백석 시는 방언을 바탕으로 유년기의 고향과 전통, 공동체적 의식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백석의 시는 거의 전적으로 상실된 고향 그 자체를 묘사하는데 바쳐져 있다. 여느 시인들처럼 그저 향수에 잠기거나, 헤어나기 어려운 그리움에 시달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고향 그것을 시적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적 노력의 근본적 계기는 향수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향수라는 감정에 기인하여 대상을 주관적인 소망에 따라 채색하지는 않는다. 있는 대로의 고향을 그리는데 전심하고 있는 것이다.
3. 작품세계
여우난골족(族)
명절날 나는 엄매 아배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적거리는 하루
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
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
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려(承女)
아들 승(承)동이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든 말 끝에
섧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배나무접을 잘 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엄매 사춘누
이 사춘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만주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측량보조원, 측량서기, 또 만주의 안동에서 세관업무에 종사하기도 한다.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신의주에 거주하다 고향 정주로 돌아오게 된다.
백석은 해방 이후 1947년 10월에 열린 문학예술총동맹 제4차 중앙위원회의 개편된 조직에서 외국문학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주로 번역 출판을 하여 시 창작에는 전념하지 않았다. 1956년 10월에 열린 제2차 작가대회에서는 『문학신문』의 편집위원 겸 부장의 직책을 맡아 아동문학에 관한 평론을 발표하며 아울러 동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백석은 아동문학에 대한 의견에 비판을 받아 1958년에는 창작을 중단하고 삼수군 관평리에 있는 국영협동조합 축산반에서 일하게 된다. 그 이후 1960년도에 『조선문학』에 시를 발표하지만 1962년에 다시 창작 활동
을 중단하게 된다.
북한에서 백석은 번역가로 활동했다. 그가 번역해 내놓은 소설 ‘고요한 돈강’은 북한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북한에서도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다. 결국 유배당하듯 삼수갑산으로 들어갔다. 극한으로 자신을 내몬 것이다. 그는 삼수갑산에서 고독하고 자유롭고 싶었다. 백석은 눈 감을 때까지 시인의 마음으로 살았다.
강단에서의 모습
시집<사슴>의 초판본
1980년대 중반 백석이 70대 중반일 무렵 가족사진 부인 이윤희씨와 둘째아들과 막내딸
2. 시대배경
백석이 활동한 시기는 일제 말기의 혹독한 시련기로 모국어의 사용 금지와 신사 참배 강요, 창씨개명 등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민족성이 박탈당하는 때였다. 백석은 이러한 당대 현실을 인식하고 전통을 찾아내어 계승하여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주체성 인식을 시에 담아내었다. 백석의 시에는 세시풍속이나 전통적인 놀이, 민간신앙 등을 시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한 독특한 고향의식을 전개시켜 나갔다. 더구나 1935년 카프 해산 무렵에 등단한 이래 점차 사라져 가는 민족적인 삶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으며, 소외된 계층으로서 민중적인 삶의 양식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다. 특히 평북 방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족혼의 상징으로서 민족어와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백석은 민속 그 자체를 시의 대상으로 삼는 시인이며 북쪽의 산골 마을을 詩作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북방언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방언을 통해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망각되어 있는 한국인의 상상력의 원초적 장이 드러난다. 폐쇄된 사회의 민속을 되살리려 한 것이다. 이처럼 백석 시는 방언을 바탕으로 유년기의 고향과 전통, 공동체적 의식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백석의 시는 거의 전적으로 상실된 고향 그 자체를 묘사하는데 바쳐져 있다. 여느 시인들처럼 그저 향수에 잠기거나, 헤어나기 어려운 그리움에 시달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고향 그것을 시적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적 노력의 근본적 계기는 향수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향수라는 감정에 기인하여 대상을 주관적인 소망에 따라 채색하지는 않는다. 있는 대로의 고향을 그리는데 전심하고 있는 것이다.
3. 작품세계
여우난골족(族)
명절날 나는 엄매 아배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적거리는 하루
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
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
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려(承女)
아들 승(承)동이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든 말 끝에
섧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배나무접을 잘 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엄매 사춘누
이 사춘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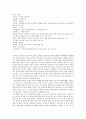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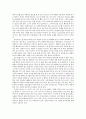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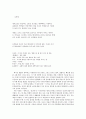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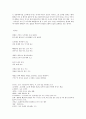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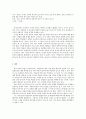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