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목차
1. 악장의 개념과 명칭
2. 악장의 성립과 전개과정
1. 조선 초기의 문학사적 위치 및 악장의 성립
2. 조선 초기 악장의 성격의 변용양상
3. 악장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악장의 소멸
3. 악장의 형태와 분류
1. 악장의 분류
2. 단장체 악장
3. 연장체 악장
4. 주요 작가와 작품
1. 정도전(鄭道傳)의 작품
2. 권근(權近)의 작품
3. 하륜(河崙)의 작품
4. 윤회(尹淮)의 작품
5. 작자미상의 작품
6. 용비어천가
7.월인천강지곡
▣ 부 록 ▣
【참고문헌】
2. 악장의 성립과 전개과정
1. 조선 초기의 문학사적 위치 및 악장의 성립
2. 조선 초기 악장의 성격의 변용양상
3. 악장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악장의 소멸
3. 악장의 형태와 분류
1. 악장의 분류
2. 단장체 악장
3. 연장체 악장
4. 주요 작가와 작품
1. 정도전(鄭道傳)의 작품
2. 권근(權近)의 작품
3. 하륜(河崙)의 작품
4. 윤회(尹淮)의 작품
5. 작자미상의 작품
6. 용비어천가
7.월인천강지곡
▣ 부 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류된다. 조규익, \"선초악장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p.252.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는 악장이 어떠한 연원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그만큼 악장의 생성은 다양한 장르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문 시가형과 관련된 유형과 그에 속한 작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체가형 악장 : 상대별곡, 화산별곡, 연형제곡, 오륜가, 가성덕, 축성수 등
2) 속요체 악장 : 신도가, 감군은, 유림가 등
3) 서사송시체 악장 :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성호주, \"경기체가 및 악장시가 개관\", 수련어문논집 13, 1986, p.61.
조선 초 악장 중에는 특히 ‘-별곡’이라는 명칭을 가진 경기체가형 악장이 많은데, 이는 이 시기 악장의 중요한 특성이 경기체가와 상통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악장을 규정하는 중요한 성격에는 교술성과 음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체가는 기존의 다른 국문시가들에 비해 이러한 면에서 악장과 많이 닮아 있었기에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선 많았다. 특히 분장체 형식과 후렴구의 존재는 음악으로 실현되기에 적합한 구조적 특성이며, 집단에 의한 창작과 향수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체가와 악장 모두 찬양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의 하나다.
경기체가형 악장에는 이외에도 ‘五倫歌’, ‘宴兄弟曲’, ‘華山別曲’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교술적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 경기체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유락적인 성격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부류에 속한다. 경기체가 본래의 유락적 성격이 조선 초 악장으로의 변용 과정에서 줄어들고, 대신 이상적인 시대에 관한 이념을 전달하는 교술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전체 문맥 속에서 작품 전체에 깔린 고조된 분위기는 위와 같은 교술적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시 형식적인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마지막 장이다. 4장까지는 기존 경기체가의 형식적 관습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가 제 5장에 와서 파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 형식의 파격 문제는 세계를 파악하는 각 장르의 고유한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상대별곡’의 마지막 장에서 발견되는 파격은 즉 한 작품 내에 경기체가의 지속과 변이를 모두 보여준다 조규익, \"선초악장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p.79.
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속요체로 분류한 ‘感君恩’에서는 시조 형식과 연결될 수 있는 형식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四海 바닷기잣 닫줄로 자히리어니와
님의 德澤기잣 어줄로 자히리잇고
享福無彊샤 萬歲 누리쇼셔
享福無彊샤 萬歲 누리쇼셔
一竿明月이 亦君恩이샷다
(‘감군은’ 1장) 악장가사
율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의 작품은 3음보라기보다는 4음보에 가깝다. 그런데 이는 고려 가요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3음보 율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쉽게 속요체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물론 여음의 존재와 분장체라는 점은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통하지만, 여음을 제외하고 보면 각 장이 시조의 3장 형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조와 가사 등 사대부 취향에 잘 맞는 4음보 기조의 장르가 유행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혼재 역시 조선 초 국문 악장에서 발견되는 장르의 왕성한 변이 과정을 보이는 하나의 단서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악장은 전대의 시가 장르뿐만 아니라 당대에 공존했던 다양한 국문 시가 양식을 광범위하게 흡수하여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새로운 노래 유형을 모색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가요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노래 유형을 창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악장의 문학사적 위치를 강조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악장 문학에 대한 이해에는 그 당시 공존했던 다른 장르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장르 체계에 대한 접근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의 악장 제작은 주로 단형의 국문 시가를 활용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 역시 송축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실험 단계를 거쳐 세종대에 들어서면 악장 제작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회례 때의 문무무 등 두 가지 춤에 연주할 악장에 대하여 박연이 말하기를, ‘마땅히 지금의 일을 가영해야 합니다.’고 하였으나 내가 생각해보니, 대체로 가사라는 것은 성공을 상징하여 성대한 덕을 송찬하는 것이다. …… 만약 반드시 그때 그때의 세상 일로 노래를 지어야 한다면 왕위를 계승하는 임금은 모두 다 (그를 위한) 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어찌 그들의 공덕이 다 가영할 만한 것이겠는가. 今會禮文武 二舞樂章 朴堧以爲宜歌詠當今之事 予思之 大抵歌辭象成功 而頌盛德 …… 若必以當時之事作歌 則繼世之君 皆有樂章矣 豈其功德皆可歌詠乎
조선왕조실록 권8, p.17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은 초기작들이 주로 先王과 現王의 단편적인 위업에 대한 찬양에 치중했음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한 성격의 악장은 조종의 공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조에는 악장 창작에 있어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된다.
대표적인 작품인 ‘龍飛御天歌’는 조선 건국과 관련된 조상들의 사적이 총집합되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작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상의 위업을 빠짐없이 서술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편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시가(詩歌)와 그에 대한 사전적(史傳的) 성격을 띤 배경 사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중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졸고, \"용비어천가 텍스트의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p.12.
내용 역시 현 왕조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규계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점에서 이전의 악장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110장에서 124장에 이르는 물망장의 설정은 이러한 성격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四祖ㅣ便安히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는 악장이 어떠한 연원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그만큼 악장의 생성은 다양한 장르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문 시가형과 관련된 유형과 그에 속한 작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체가형 악장 : 상대별곡, 화산별곡, 연형제곡, 오륜가, 가성덕, 축성수 등
2) 속요체 악장 : 신도가, 감군은, 유림가 등
3) 서사송시체 악장 :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성호주, \"경기체가 및 악장시가 개관\", 수련어문논집 13, 1986, p.61.
조선 초 악장 중에는 특히 ‘-별곡’이라는 명칭을 가진 경기체가형 악장이 많은데, 이는 이 시기 악장의 중요한 특성이 경기체가와 상통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악장을 규정하는 중요한 성격에는 교술성과 음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체가는 기존의 다른 국문시가들에 비해 이러한 면에서 악장과 많이 닮아 있었기에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선 많았다. 특히 분장체 형식과 후렴구의 존재는 음악으로 실현되기에 적합한 구조적 특성이며, 집단에 의한 창작과 향수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체가와 악장 모두 찬양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의 하나다.
경기체가형 악장에는 이외에도 ‘五倫歌’, ‘宴兄弟曲’, ‘華山別曲’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교술적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 경기체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유락적인 성격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부류에 속한다. 경기체가 본래의 유락적 성격이 조선 초 악장으로의 변용 과정에서 줄어들고, 대신 이상적인 시대에 관한 이념을 전달하는 교술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전체 문맥 속에서 작품 전체에 깔린 고조된 분위기는 위와 같은 교술적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시 형식적인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마지막 장이다. 4장까지는 기존 경기체가의 형식적 관습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가 제 5장에 와서 파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 형식의 파격 문제는 세계를 파악하는 각 장르의 고유한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상대별곡’의 마지막 장에서 발견되는 파격은 즉 한 작품 내에 경기체가의 지속과 변이를 모두 보여준다 조규익, \"선초악장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p.79.
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속요체로 분류한 ‘感君恩’에서는 시조 형식과 연결될 수 있는 형식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四海 바닷기잣 닫줄로 자히리어니와
님의 德澤기잣 어줄로 자히리잇고
享福無彊샤 萬歲 누리쇼셔
享福無彊샤 萬歲 누리쇼셔
一竿明月이 亦君恩이샷다
(‘감군은’ 1장) 악장가사
율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의 작품은 3음보라기보다는 4음보에 가깝다. 그런데 이는 고려 가요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3음보 율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쉽게 속요체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물론 여음의 존재와 분장체라는 점은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통하지만, 여음을 제외하고 보면 각 장이 시조의 3장 형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조와 가사 등 사대부 취향에 잘 맞는 4음보 기조의 장르가 유행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혼재 역시 조선 초 국문 악장에서 발견되는 장르의 왕성한 변이 과정을 보이는 하나의 단서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악장은 전대의 시가 장르뿐만 아니라 당대에 공존했던 다양한 국문 시가 양식을 광범위하게 흡수하여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새로운 노래 유형을 모색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가요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노래 유형을 창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악장의 문학사적 위치를 강조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악장 문학에 대한 이해에는 그 당시 공존했던 다른 장르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장르 체계에 대한 접근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의 악장 제작은 주로 단형의 국문 시가를 활용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 역시 송축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실험 단계를 거쳐 세종대에 들어서면 악장 제작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회례 때의 문무무 등 두 가지 춤에 연주할 악장에 대하여 박연이 말하기를, ‘마땅히 지금의 일을 가영해야 합니다.’고 하였으나 내가 생각해보니, 대체로 가사라는 것은 성공을 상징하여 성대한 덕을 송찬하는 것이다. …… 만약 반드시 그때 그때의 세상 일로 노래를 지어야 한다면 왕위를 계승하는 임금은 모두 다 (그를 위한) 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어찌 그들의 공덕이 다 가영할 만한 것이겠는가. 今會禮文武 二舞樂章 朴堧以爲宜歌詠當今之事 予思之 大抵歌辭象成功 而頌盛德 …… 若必以當時之事作歌 則繼世之君 皆有樂章矣 豈其功德皆可歌詠乎
조선왕조실록 권8, p.17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은 초기작들이 주로 先王과 現王의 단편적인 위업에 대한 찬양에 치중했음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한 성격의 악장은 조종의 공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조에는 악장 창작에 있어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된다.
대표적인 작품인 ‘龍飛御天歌’는 조선 건국과 관련된 조상들의 사적이 총집합되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작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상의 위업을 빠짐없이 서술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편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시가(詩歌)와 그에 대한 사전적(史傳的) 성격을 띤 배경 사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중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졸고, \"용비어천가 텍스트의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p.12.
내용 역시 현 왕조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규계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점에서 이전의 악장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110장에서 124장에 이르는 물망장의 설정은 이러한 성격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四祖ㅣ便安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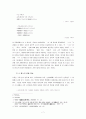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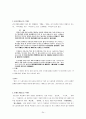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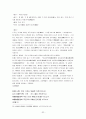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