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써 그 결과 이 가사들의 유형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근거 위에서 <갑민가>의 작자는 현실비판가사의 작자층과 동일한 계층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실비판가사의 작자층에 소속되어 동일한 사회적 성격을 지님으로써 공통의 의식과 세계관을 지닐 수 있었던 인물, 즉 지방 하층 사족층에 의해 <갑민가>는 지어졌다 하겠다.
5) 형식적 특징- 대화체 형식
<갑민가>는 생원과 갑산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문학에서 대화체는 전체 구성에 관여하여 쓰이는 경우에서부터 부분적 대화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형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화체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토의(논쟁)적 성격을 띤다. <갑민가>에서 생원과 갑산민의 대화는 유리문제에 대한 논쟁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갑민가>는 토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갑산민의 발언 내용은 유리하기까지의 심적 변화에 맞추어져 있고, 그 변화의 단계를 설정해주고 있는 근거는 바로 생원의 발언 내용에 있다. 이러한 대응구조 속에서 생원의 발언은 갑산민의 발언을 유도해내기 위한 반대항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갑민가>에서 생원과 갑산민의 대화체가 지니는 의미는, 조선후기사회에서 소외계층인 지방하층사족과 농민, 즉 유리행위 당사자인 민중의 유리문제에 대한 위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생원과 갑산만은 모두 갑산에 거주하는 마을 사람으로서 유리행위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원은 유리하지 말고 차라리 견뎌보자는, 아직은 남은 것이 있어서 낙관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소극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갑산민은 유리행위를 선택한 자로서 논리적, 적극적으로 행위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화체가 당대 민중들의 의향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것은 당시 향촌 내에서 유리행위에 대한 갈등 현실이 내재해 있음을 포착하고 이러한 갈등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갑민가>에서의 대화체는 사실성에 기반을 둔 형식의 사용인 것이다.
Ⅱ. 종교선전
노래인 시가는 전통적으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가사 또한 크게 다를 바 없다. 포교를 목적으로 자기가 믿거나 창건한 종교를 노래한 가사들이 많이 있다.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사로는 西往歌, 尋牛歌, 樂道歌, 僧元歌, 歸山曲, 靑鶴洞歌, 太平曲, 回心曲 등이 있고, 천주교 관계 가사로는 天主恭敬歌, 十誡命歌, 聖堂歌 등 여러 편이 있다.
동학가사로는 최제우가 동학을 창건한 뒤 득도의 기쁨을 노래한 龍潭歌, 부녀들을 안심시키 위하여 지은 安心歌, 자질들에게 교훈을 한 敎訓歌, 그 외 교도들에게 설교한 道修詞, 勸學歌, 夢中老少問答歌, 興比歌 등이 있다.
○주요 작품
<십계명가>
50 호(大虎) 죽어저서 가죽글 기고
51 인(大人)은 죽어저도 이름을 긴다네
52 도적이 크고 고 인륜에 큰죄일셰
53 음 속에 도적심도 큰 죄 된다 못 쇼냐
54 도적질 손가지(枝) 안이 망(亡者) 보왓느냐
55 셰 번 나서 의명분(大義名分) 시여서
56 큰의 가 먼저 셰셰(昌昌世世) 전보셰
57 국운이 기우러저 흥망성(興亡盛衰) 렷네
58 신소부(奸臣小夫) 막치 헐더서 움일셰
59 고로 터씸움에 죽고고 얼드냐
60 예졔 터씸움은 군신셔민(君臣庶民) 일반일셰
61 우부(愚夫)되고 초부(草夫)치 어질개 살드냐
62 널개 눈 턴쥬 큰 알고면
63 벌튼 인세 듯시 전혀업네
1) 작품 해제
십계명가는 이승훈의 문집인 蔓川遺稿, 「잡고」에 전한다. 정조 3년(1779) 11월에 丁若銓, 權相學, 李寵億 3인이 합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상적인 윤리와 관련된 실천적 교리의 강조는 종교의 포교에 있어서 향용되는 방편이다. 여기서는 특히 당대의 迷信發福과 대조 비판함으로써 천주교 교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忠孝 등 유교의 윤리 강력에 기대는 식으로, 당대적 동의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2) 구성
01-07: 서사. 01의 “션비님”은 권유의 대상에 대한 존경의 뜻이 들어 있다. 06의 “람들”이 본의이다. 곧, 우매한 대중에 대한 포교의 발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08-16: 포교의 의도를 지닌 종교가사의 일반적인 수사법-미각과 자각의 대비를 통해 자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7-21: “上帝上神”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개념인데 이를 天主와 동일시하였다. 또, “人獸之辨”(20)행을 통해 유교와 천주교의 공통저
5) 형식적 특징- 대화체 형식
<갑민가>는 생원과 갑산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문학에서 대화체는 전체 구성에 관여하여 쓰이는 경우에서부터 부분적 대화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형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화체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토의(논쟁)적 성격을 띤다. <갑민가>에서 생원과 갑산민의 대화는 유리문제에 대한 논쟁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갑민가>는 토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갑산민의 발언 내용은 유리하기까지의 심적 변화에 맞추어져 있고, 그 변화의 단계를 설정해주고 있는 근거는 바로 생원의 발언 내용에 있다. 이러한 대응구조 속에서 생원의 발언은 갑산민의 발언을 유도해내기 위한 반대항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갑민가>에서 생원과 갑산민의 대화체가 지니는 의미는, 조선후기사회에서 소외계층인 지방하층사족과 농민, 즉 유리행위 당사자인 민중의 유리문제에 대한 위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생원과 갑산만은 모두 갑산에 거주하는 마을 사람으로서 유리행위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원은 유리하지 말고 차라리 견뎌보자는, 아직은 남은 것이 있어서 낙관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소극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갑산민은 유리행위를 선택한 자로서 논리적, 적극적으로 행위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화체가 당대 민중들의 의향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것은 당시 향촌 내에서 유리행위에 대한 갈등 현실이 내재해 있음을 포착하고 이러한 갈등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갑민가>에서의 대화체는 사실성에 기반을 둔 형식의 사용인 것이다.
Ⅱ. 종교선전
노래인 시가는 전통적으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가사 또한 크게 다를 바 없다. 포교를 목적으로 자기가 믿거나 창건한 종교를 노래한 가사들이 많이 있다.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사로는 西往歌, 尋牛歌, 樂道歌, 僧元歌, 歸山曲, 靑鶴洞歌, 太平曲, 回心曲 등이 있고, 천주교 관계 가사로는 天主恭敬歌, 十誡命歌, 聖堂歌 등 여러 편이 있다.
동학가사로는 최제우가 동학을 창건한 뒤 득도의 기쁨을 노래한 龍潭歌, 부녀들을 안심시키 위하여 지은 安心歌, 자질들에게 교훈을 한 敎訓歌, 그 외 교도들에게 설교한 道修詞, 勸學歌, 夢中老少問答歌, 興比歌 등이 있다.
○주요 작품
<십계명가>
50 호(大虎) 죽어저서 가죽글 기고
51 인(大人)은 죽어저도 이름을 긴다네
52 도적이 크고 고 인륜에 큰죄일셰
53 음 속에 도적심도 큰 죄 된다 못 쇼냐
54 도적질 손가지(枝) 안이 망(亡者) 보왓느냐
55 셰 번 나서 의명분(大義名分) 시여서
56 큰의 가 먼저 셰셰(昌昌世世) 전보셰
57 국운이 기우러저 흥망성(興亡盛衰) 렷네
58 신소부(奸臣小夫) 막치 헐더서 움일셰
59 고로 터씸움에 죽고고 얼드냐
60 예졔 터씸움은 군신셔민(君臣庶民) 일반일셰
61 우부(愚夫)되고 초부(草夫)치 어질개 살드냐
62 널개 눈 턴쥬 큰 알고면
63 벌튼 인세 듯시 전혀업네
1) 작품 해제
십계명가는 이승훈의 문집인 蔓川遺稿, 「잡고」에 전한다. 정조 3년(1779) 11월에 丁若銓, 權相學, 李寵億 3인이 합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상적인 윤리와 관련된 실천적 교리의 강조는 종교의 포교에 있어서 향용되는 방편이다. 여기서는 특히 당대의 迷信發福과 대조 비판함으로써 천주교 교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忠孝 등 유교의 윤리 강력에 기대는 식으로, 당대적 동의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2) 구성
01-07: 서사. 01의 “션비님”은 권유의 대상에 대한 존경의 뜻이 들어 있다. 06의 “람들”이 본의이다. 곧, 우매한 대중에 대한 포교의 발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08-16: 포교의 의도를 지닌 종교가사의 일반적인 수사법-미각과 자각의 대비를 통해 자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7-21: “上帝上神”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개념인데 이를 天主와 동일시하였다. 또, “人獸之辨”(20)행을 통해 유교와 천주교의 공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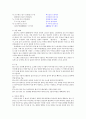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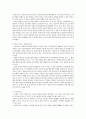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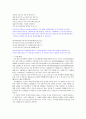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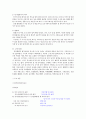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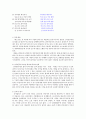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