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1. 신라(新羅)의 불교(佛敎)
2. 신라(新羅)선종(禪宗)의 형성(形成)
2.1 신라의 선종(禪宗)전래(傳來)
2.2 구산선문(九山禪門)
3. 골품제도
3.1 골품제의 형성과정과 구조
3.2 골품제와 관등과 관직의 관계
4. 신라의 여왕들
4.1 선덕왕
4.2 진덕왕
4.3 진성왕
4.4 여왕통치와 신라시대의 여성관
나오는 말
1. 신라(新羅)의 불교(佛敎)
2. 신라(新羅)선종(禪宗)의 형성(形成)
2.1 신라의 선종(禪宗)전래(傳來)
2.2 구산선문(九山禪門)
3. 골품제도
3.1 골품제의 형성과정과 구조
3.2 골품제와 관등과 관직의 관계
4. 신라의 여왕들
4.1 선덕왕
4.2 진덕왕
4.3 진성왕
4.4 여왕통치와 신라시대의 여성관
나오는 말
본문내용
興王) 이후 불교식(佛敎式) 왕명을 채택하였고 왕족의 이름도 인도 불가의 이름을 따랐는데, 진평왕(眞平王)은 스스로를 석가의 아버지인 백정왕이라하고 그 부인을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라 함으로써 석가모니의 집안이 다시 전생하여 신라의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신성족 의식을 강하게 갖기도 했다.
골품제도는 본래 8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성골이 소멸하고 3두품 이하의 평민들과의 구분이 없어진 결과 진골(眞骨), 6두품, 5두품, 4두품, 백성 등 5개 신분층으로 정리되었다. 각 신분층 내부에서 상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은 법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 간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자식은 부모가 갖고 있는 신분 중 하위의 신분으로 귀속돠어 신분이 하락되었다. 골품제도에 편입된 사람들은 왕경에 사는 사람들로 제한되었다. 이같이 골품제도가 왕경인에 한정된 신분제로 기능함에 따라 왕경인은 지방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왕경에 거주하고 있기는 했지만 노비와 같은 천인은 골품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골품제는 국가 통치력이 미치는 전지역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대의 신분제에 비해 불완전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3.2 골품제(骨品制)와 관등(官等)과 관직(官職)의 관계
골품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관직의 관계로 신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성을 규정한 점이다. 관등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서 신라에는 17등급의 관등제가 있었다. 이는 6세기에 법흥왕(法興王) 대에 완성되었는데, 관등 명칭에 찬()이나 사(舍), 지(知)와 같이 이전의 수장적 의미를 간직한 것이 많은 점으로 보아 본래 여러 종류였던 지배자의 명칭이 하나의 관등체제에 편제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골품제는 신분에 따라 올라 갈 수 있는 관등의 상(上)한선은 정해져 있었으나 하(下)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골품에 따라 차지할 수 있는 관등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든 하급 신분층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중위제도 일종의 특진제도이다. 신라 사회가 골품제의 제한에 따른 폐쇄성을 보완하려 했지만 중위제는 골품제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골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변통한 것에 불과하다.
이다.
골품제와 사회 생활을 보면, 골품제는 일반인의 사회 생활 전반에 신분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를 가했다. 공복에 있어서 진골은 자색, 6두품은 비색, 5두품은 청색, 4두품은 황색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겉옷 및 속옷에 사용되는 옷감의 종류, 관(冠)의 재질, 요대 및 신발의 재질, 사용하는 포(布)의 종류 등 복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했다. 가옥, 마구간도 신분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이 골품제에 의해 통제되었다.
골품제는 신라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립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신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골품제도 끊임없이 변화했다. 특히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이 완성된 후 이전의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은 본국에서 갖고 있던 관등의 고하에 따라 신라의 관등을 수여 받음으로써 골품제 안에 편입되었다. 통일 신라기의 사회 변화와 경제적 계층 변화, 분화가 심화됨에 따라 신분제도 동요되었다. 폐쇄적 성격이 강한 골품제는 변화된 사회 양상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이전의 운영원리를 고수하여, 신분제로서 탄력성을 상실하고 사회 변동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신라 하대에는 지배계층의 분열과 왕위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지배계층 스스로 골품제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4. 신라(新羅)의 여왕(女王)들
<삼국유사>에는 “성골(成骨)신분의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덕왕이 즉위하였다”고 적혀 있고 <삼국사기>에는 “시조부터 28대까지는 성골(聖骨)이고 29대 태종 무열왕 이후는 진골(眞骨)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정된 신분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여자가 남게 되더라도 성골이라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26대 진평왕(眞平王)을 끝으로 남자 가운데 성골 신분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되자 할 수 없이 진평왕의 큰딸인 선덕왕이 즉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덕왕의 즉위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 왕위에 오른 사례이며, 곧이어 진덕왕이, 그리고 25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진성왕이 즉위하여 신라에서만 3명의 여왕이 되었다.
신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성골은 불교가 크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불교는 왕실과 국왕의 권위를 수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3대 법흥왕(法興王)은 바로 ‘불법(佛法)을 일으킨 왕(王)’이라는 뜻이다. 국왕의 이름도 선덕왕을 제외하면 24대 진흥왕(振興王) 이후 28대 진덕왕까지 모두 ‘진(眞)’자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진(眞)’자를 많이 사용한 것은 불교의 진종설 진종이란 ‘진정한 종족’이란 뜻인데,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라 왕실이 자신들을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種族)이라고 표방한 것은 스스로를 보다 신성하고 선택된 족속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왕족과는 차별적인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진평왕과 그 형제들은 부친인 동륜(動輪)을 정점으로 자신들을 다른 진골(眞骨)과 구분하기 위해 불교의 진종설을 바탕으로 ‘성골(聖骨)’이라는 특수한 신분층으로 자처하였고, 이 성골을 왕위계승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과 관련된 것이다.
4.1 선덕왕(善德王)
?-647(진덕왕 1년) 신라 27대왕, 재위 632-647년. 성은 김씨(金氏)이고 이름은 덕만(德曼)이다. 진평왕(眞平王)의 장녀로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다.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어서 국인이 추대하여-화백회의(和白會議)에서- 그를 왕위에 추대하고, 성조황고(成條皇姑)란 상호(上號) 삼국사기에 의하면 국왕에 상호를 한 것은 무열왕에 태종이라 상호한 두예밖에 없다. 상호는 특별하고 막중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매우 주목된다. 성조(聖祖)란 뜻은 태조(太祖)라는
골품제도는 본래 8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성골이 소멸하고 3두품 이하의 평민들과의 구분이 없어진 결과 진골(眞骨), 6두품, 5두품, 4두품, 백성 등 5개 신분층으로 정리되었다. 각 신분층 내부에서 상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은 법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 간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자식은 부모가 갖고 있는 신분 중 하위의 신분으로 귀속돠어 신분이 하락되었다. 골품제도에 편입된 사람들은 왕경에 사는 사람들로 제한되었다. 이같이 골품제도가 왕경인에 한정된 신분제로 기능함에 따라 왕경인은 지방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왕경에 거주하고 있기는 했지만 노비와 같은 천인은 골품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골품제는 국가 통치력이 미치는 전지역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대의 신분제에 비해 불완전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3.2 골품제(骨品制)와 관등(官等)과 관직(官職)의 관계
골품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관직의 관계로 신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성을 규정한 점이다. 관등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서 신라에는 17등급의 관등제가 있었다. 이는 6세기에 법흥왕(法興王) 대에 완성되었는데, 관등 명칭에 찬()이나 사(舍), 지(知)와 같이 이전의 수장적 의미를 간직한 것이 많은 점으로 보아 본래 여러 종류였던 지배자의 명칭이 하나의 관등체제에 편제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골품제는 신분에 따라 올라 갈 수 있는 관등의 상(上)한선은 정해져 있었으나 하(下)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골품에 따라 차지할 수 있는 관등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든 하급 신분층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중위제도 일종의 특진제도이다. 신라 사회가 골품제의 제한에 따른 폐쇄성을 보완하려 했지만 중위제는 골품제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골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변통한 것에 불과하다.
이다.
골품제와 사회 생활을 보면, 골품제는 일반인의 사회 생활 전반에 신분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를 가했다. 공복에 있어서 진골은 자색, 6두품은 비색, 5두품은 청색, 4두품은 황색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겉옷 및 속옷에 사용되는 옷감의 종류, 관(冠)의 재질, 요대 및 신발의 재질, 사용하는 포(布)의 종류 등 복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했다. 가옥, 마구간도 신분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이 골품제에 의해 통제되었다.
골품제는 신라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립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신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골품제도 끊임없이 변화했다. 특히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이 완성된 후 이전의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은 본국에서 갖고 있던 관등의 고하에 따라 신라의 관등을 수여 받음으로써 골품제 안에 편입되었다. 통일 신라기의 사회 변화와 경제적 계층 변화, 분화가 심화됨에 따라 신분제도 동요되었다. 폐쇄적 성격이 강한 골품제는 변화된 사회 양상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이전의 운영원리를 고수하여, 신분제로서 탄력성을 상실하고 사회 변동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신라 하대에는 지배계층의 분열과 왕위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지배계층 스스로 골품제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4. 신라(新羅)의 여왕(女王)들
<삼국유사>에는 “성골(成骨)신분의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덕왕이 즉위하였다”고 적혀 있고 <삼국사기>에는 “시조부터 28대까지는 성골(聖骨)이고 29대 태종 무열왕 이후는 진골(眞骨)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정된 신분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여자가 남게 되더라도 성골이라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26대 진평왕(眞平王)을 끝으로 남자 가운데 성골 신분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되자 할 수 없이 진평왕의 큰딸인 선덕왕이 즉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덕왕의 즉위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 왕위에 오른 사례이며, 곧이어 진덕왕이, 그리고 25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진성왕이 즉위하여 신라에서만 3명의 여왕이 되었다.
신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성골은 불교가 크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불교는 왕실과 국왕의 권위를 수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3대 법흥왕(法興王)은 바로 ‘불법(佛法)을 일으킨 왕(王)’이라는 뜻이다. 국왕의 이름도 선덕왕을 제외하면 24대 진흥왕(振興王) 이후 28대 진덕왕까지 모두 ‘진(眞)’자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진(眞)’자를 많이 사용한 것은 불교의 진종설 진종이란 ‘진정한 종족’이란 뜻인데,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라 왕실이 자신들을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種族)이라고 표방한 것은 스스로를 보다 신성하고 선택된 족속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왕족과는 차별적인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진평왕과 그 형제들은 부친인 동륜(動輪)을 정점으로 자신들을 다른 진골(眞骨)과 구분하기 위해 불교의 진종설을 바탕으로 ‘성골(聖骨)’이라는 특수한 신분층으로 자처하였고, 이 성골을 왕위계승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과 관련된 것이다.
4.1 선덕왕(善德王)
?-647(진덕왕 1년) 신라 27대왕, 재위 632-647년. 성은 김씨(金氏)이고 이름은 덕만(德曼)이다. 진평왕(眞平王)의 장녀로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다.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어서 국인이 추대하여-화백회의(和白會議)에서- 그를 왕위에 추대하고, 성조황고(成條皇姑)란 상호(上號) 삼국사기에 의하면 국왕에 상호를 한 것은 무열왕에 태종이라 상호한 두예밖에 없다. 상호는 특별하고 막중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매우 주목된다. 성조(聖祖)란 뜻은 태조(太祖)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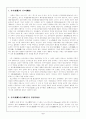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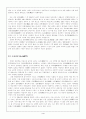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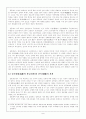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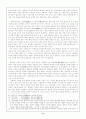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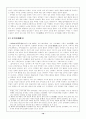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