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하이데거의 생애
2.하이데거의 <철학에의 기여>
본론
1.존재의 문제
2.신 문제
3.존재와 신
결론
1.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적 의문
2.하이데거 철학의 본의미
1.하이데거의 생애
2.하이데거의 <철학에의 기여>
본론
1.존재의 문제
2.신 문제
3.존재와 신
결론
1.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적 의문
2.하이데거 철학의 본의미
본문내용
\'으로서 있어온다\". \'사건\'은, 어떤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건\'은 신을 인간에게 맡기는 것( bereignet)이고, 인간을 신에게 넘겨주는(zueignet) 것이다. \'전회\'는 끊임없는 \'전도\'(顚倒, Umkehr), \'전향\'(轉向, Abkehr) 그리고 \'회귀\'(回歸, Wiederkehr)를 의미하며, 따라서 하나 속에서 둘 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존재와 무는 동일한 것인가\"?
하이데거는 \"마지막 神의 스쳐 지나감\"을 알리고 있다. 이로써 신에 대한 문제, 즉 하나의 신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가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고 만다. 아니 한번도 결정되지 못했다. 신들은 세어질 수 없다. \"신들의 많음(Vielheit)은 수(Zahl)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또 마지막 신은 \"계산적 규정에서 벗어나 있으며\"(같은 곳), 따라서 유일신론(Monotheismus), 범신론(Pantheismus) 그리고 무신론(Atheismus)의 저편에, 즉 도대체 모든 \"신론\"(Theismus)의 저편에 놓여 있다. 신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신론도 사그라진다\"(같은 곳). \'마지막 신\'은 \"가장 극단적인 멂\" 속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유일 무이한 가까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神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가까워지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내보이는지 등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우리는 단지 그 \'마지막 신\'이 역사적으로 \"스쳐 지나감\"을 기대하기만 하거나, 아마도 그것을 희망하고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신 또는 신들, 존재 또는 비존재 등, 이 모든 것은 잠정적으로 열린 채로 남는다.
결론
1.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적 의문
결론하여 나는 단지, 앞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몇몇 비판적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이데거의 업적 전체가 논란에 부쳐지는 것은 아니다. 분명 하이데거는 사유의 중요한 동인들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존재와 시간≫에서, 이미 \'존재의 문제\'라는 단초를 통해, 현존재의 분석론, 이해에 관한 이론, 역사적-해석학적 사유, \'시간 비판\' 등등을 통해 그러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제, 즉 형이상학과 특히 \'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남겨져 있다.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은 서양 철학의 전통 전체에 해당된 것이다. 그로써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에서 획득된 개념들, 원리들 그리고 방법들 모두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하이데거가 신과 신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의 달아남과 다가옴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은 분명,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고 검증될 수도 있을 현상학이나 다른 어떤 사태적 방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것은 단지, 사유의 어떠한 이성적 매개도 배제하고, 어떠한 논리적 \'근거 제시\'도 내던져 버리는 직접적 경험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것은 철학인가, 아니면 신화론인가?
하이데거는, \"다른 시원\"을 놓기 위해, 유대적-그리스도교적 믿음까지를 포함한 철학의 전통 전체를 뛰어넘으려 한다. 그러나 이때 하이데거는 다른 방식으로, 즉 \'존재의 사유\'에로 번역된 채, 바로 이러한 전통의 내용들, 즉 신의 계시, \'구원의 역사\'[그리스도 수난사]로서의 역사,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의 다가옴 등의 개념들을 그리스도교적 전승에서 넘겨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의 유대적 전승에서부터도 \"신의 스쳐 지나감\"(Pascha, 逾越節[국경을 넘어감])을 넘겨받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이데거 자신은 신성에 의해 또는 \'존재의 운명\'에 의해 예언의 사명을 짊어진, 마지막 신의 예언자로서 행동하지 않는가?
신 또는 \'신적인 것\'에 관한 하이데거의 이야기는 초기 그리스 시대의 신들에 대한 신화적 믿음에로 되돌아가고 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신\"(der Gott) 또한 \"신들\"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이다. 여러 신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신\'의 절대성을 이미 지양한 것이며, 따라서 이 \'하나의 신\'은 존재하는 것도,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보다 고차의 힘들이 거주하는 애매한 영역에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또한 하이데거가 말하는 \"마지막 신\"도, 우리가 사유를 통해 도달할 수 있고, 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神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2.하이데거 철학의 본의미
그런데도 하이데거는 \'신적인 것\'을 동경하고 있다. 그는 \'신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로써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한 증인이 된다. 신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과 종교적 경험에 대한 깊은 동경은 살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경은, 만일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성적 사유의 반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근거 제시\'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 차원에서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에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형이상학에게 존재는 하나의 이름없는, 역사적으로 지배하는 \'운명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자의 모든 \"존재의 현실성\"의 원리이다. 그러나 \"존재 그 자체\"는 존재의 무제약적이고 무한한 충만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 \'존재 근거\', 즉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해, 역사 속에서도 작용하고, 우리들 속에 살아 있는, 살아계신 인격적 신이다.
우리가 믿어도 좋은 신은, 하이데거의 \"\'그 신\' 또는 신들\"보다 그리고 오지도 있지도 않은 \"마지막 신\"보다 그 이상이며, 그것도 무한히 그 이상이며, 보다 더 위대하고, 보다 더 존엄하며, 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신이다. 하이데거의 사유는 신에게로 가지 않고, 신에게로 통해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나지막한 소리로 마지막 물음을 던지면서 이 강연을 끝맺고자 한다. \"마지막 신\"에는 어떤 마지막 흔적, 즉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처럼 \"알려져 있지 않은\" 신에 대한 어떤 기념-비(紀念碑, Denk-mal)가 숨겨져 있는가?
하이데거는 \"마지막 神의 스쳐 지나감\"을 알리고 있다. 이로써 신에 대한 문제, 즉 하나의 신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가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고 만다. 아니 한번도 결정되지 못했다. 신들은 세어질 수 없다. \"신들의 많음(Vielheit)은 수(Zahl)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또 마지막 신은 \"계산적 규정에서 벗어나 있으며\"(같은 곳), 따라서 유일신론(Monotheismus), 범신론(Pantheismus) 그리고 무신론(Atheismus)의 저편에, 즉 도대체 모든 \"신론\"(Theismus)의 저편에 놓여 있다. 신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신론도 사그라진다\"(같은 곳). \'마지막 신\'은 \"가장 극단적인 멂\" 속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유일 무이한 가까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神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가까워지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내보이는지 등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우리는 단지 그 \'마지막 신\'이 역사적으로 \"스쳐 지나감\"을 기대하기만 하거나, 아마도 그것을 희망하고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신 또는 신들, 존재 또는 비존재 등, 이 모든 것은 잠정적으로 열린 채로 남는다.
결론
1.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적 의문
결론하여 나는 단지, 앞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몇몇 비판적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이데거의 업적 전체가 논란에 부쳐지는 것은 아니다. 분명 하이데거는 사유의 중요한 동인들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존재와 시간≫에서, 이미 \'존재의 문제\'라는 단초를 통해, 현존재의 분석론, 이해에 관한 이론, 역사적-해석학적 사유, \'시간 비판\' 등등을 통해 그러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제, 즉 형이상학과 특히 \'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남겨져 있다.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은 서양 철학의 전통 전체에 해당된 것이다. 그로써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에서 획득된 개념들, 원리들 그리고 방법들 모두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하이데거가 신과 신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의 달아남과 다가옴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은 분명,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고 검증될 수도 있을 현상학이나 다른 어떤 사태적 방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것은 단지, 사유의 어떠한 이성적 매개도 배제하고, 어떠한 논리적 \'근거 제시\'도 내던져 버리는 직접적 경험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것은 철학인가, 아니면 신화론인가?
하이데거는, \"다른 시원\"을 놓기 위해, 유대적-그리스도교적 믿음까지를 포함한 철학의 전통 전체를 뛰어넘으려 한다. 그러나 이때 하이데거는 다른 방식으로, 즉 \'존재의 사유\'에로 번역된 채, 바로 이러한 전통의 내용들, 즉 신의 계시, \'구원의 역사\'[그리스도 수난사]로서의 역사,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의 다가옴 등의 개념들을 그리스도교적 전승에서 넘겨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의 유대적 전승에서부터도 \"신의 스쳐 지나감\"(Pascha, 逾越節[국경을 넘어감])을 넘겨받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이데거 자신은 신성에 의해 또는 \'존재의 운명\'에 의해 예언의 사명을 짊어진, 마지막 신의 예언자로서 행동하지 않는가?
신 또는 \'신적인 것\'에 관한 하이데거의 이야기는 초기 그리스 시대의 신들에 대한 신화적 믿음에로 되돌아가고 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신\"(der Gott) 또한 \"신들\"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이다. 여러 신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신\'의 절대성을 이미 지양한 것이며, 따라서 이 \'하나의 신\'은 존재하는 것도,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보다 고차의 힘들이 거주하는 애매한 영역에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또한 하이데거가 말하는 \"마지막 신\"도, 우리가 사유를 통해 도달할 수 있고, 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神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2.하이데거 철학의 본의미
그런데도 하이데거는 \'신적인 것\'을 동경하고 있다. 그는 \'신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로써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한 증인이 된다. 신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과 종교적 경험에 대한 깊은 동경은 살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경은, 만일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성적 사유의 반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근거 제시\'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 차원에서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에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형이상학에게 존재는 하나의 이름없는, 역사적으로 지배하는 \'운명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자의 모든 \"존재의 현실성\"의 원리이다. 그러나 \"존재 그 자체\"는 존재의 무제약적이고 무한한 충만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 \'존재 근거\', 즉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해, 역사 속에서도 작용하고, 우리들 속에 살아 있는, 살아계신 인격적 신이다.
우리가 믿어도 좋은 신은, 하이데거의 \"\'그 신\' 또는 신들\"보다 그리고 오지도 있지도 않은 \"마지막 신\"보다 그 이상이며, 그것도 무한히 그 이상이며, 보다 더 위대하고, 보다 더 존엄하며, 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신이다. 하이데거의 사유는 신에게로 가지 않고, 신에게로 통해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나지막한 소리로 마지막 물음을 던지면서 이 강연을 끝맺고자 한다. \"마지막 신\"에는 어떤 마지막 흔적, 즉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처럼 \"알려져 있지 않은\" 신에 대한 어떤 기념-비(紀念碑, Denk-mal)가 숨겨져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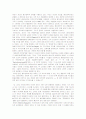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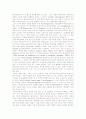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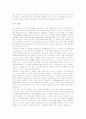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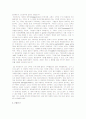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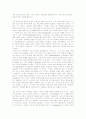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