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공자의 생애
3. 예
예의 의미
4. 공자의 인간상
5. 묵가의 도전과 맹자의 재해석
6. 결론
2. 공자의 생애
3. 예
예의 의미
4. 공자의 인간상
5. 묵가의 도전과 맹자의 재해석
6. 결론
본문내용
라는 내용과 문화전승의 총체를 말하는 문이라는 윤곽의 조화에서 나오는 내적 결실이었다. 곧 내용과 윤곽의 완전한 조화를 이룬 인격자를 말했다. 둘째는 외적태도의 차이로, 군자는 항상 태연하나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여 가책이 없으므로 평온한데 비해, 소인은 남 앞에서 걱정하거나 교만하며 항상 불안하다고 묘사된다. 셋째로 남과의 관계에서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키우며 언제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화합하는데 비하여, 소인은 동의하는 것 같지만 화합하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군자는 다른 이들을 키우는데 반해, 소인은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 따라서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은 군자뿐이며,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이도 군자뿐이다. 마찬가지로 군자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 속에서도 자적할 수 있어서, 가난한 중에서도 기쁠 수 있고, 부유 속에서도 禮를 행한다는 유가적 재물관이 확립된다. 넷째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규범의 차이이다. 그런데 규범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논해야 할 것 같다. 군자의 일차적인 규범은 자신에 대한 충실로서 언제나 자기 안에서 이유를 구하기 때문에 남이 몰라주어도 근심하지 않는데 비하여,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므로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남에게 탓을 돌린다. 그러면, 남이 몰라주어도 평온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군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논어에서 우리는 이 답을 공자의 개인 생활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덕의 근원인 천을 공자는 자신의 최종 규범으로 삼고 있었다. 이미 시서에서 최고신으로 나왔던 天은 논어에 17번 나오는데, 그 중 10번은 공자의 말속에, 7번은 다른 이들의 말로 나온다. 우선 공자는 천을 위험이나 슬픔에서는 물론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는 속일 수 없는 도덕의 원천으로 불렀고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이해했다. 堯曰篇에 제문속에 인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의 말에서 나오는 6번의 천은 모두 공자의 사명과 연결되어 나온다. 덕이천에서 주어졌기에 결과적으로 덕자를 이해하는 것은 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논어에서 천, 혹은 종교적 측면은 인간내부라는 근저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규범은 자신을 초월하는 인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에 대한 진실성이다. 자기 자신의 생애 외에는 천을 언급하 지 않았던 공자의 모범은 인간주의적 유가사상의 강점을 표시하는 동시에 계속 되는 중국전통에서 종교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던 유가사상의 약점이기도 했다고 하겠다.
4. 墨家의 도전과 孟子의 재해석
기원전 5세기에 묵자는 강력한 聖王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공자가 확립시켜 놓은 유가의 군자상에 도전해왔다. 그의 유명한 十大主張을 통하여 묵자는 시서에 대한더 자구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兼相愛와 交相利라는 대원칙 아래서 仁,義, 孝등 유가에서 군자지도로 尙德의 길로 제시한 것을 상대화하여 兼이라는 개념안에 흡수해 버리고, 禮와 樂과 命을 존중하는 습관이 가져오는 폐단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인간관계의 가까움과 멈에 따라 차등을 두는 유가의 실천론을 別이라 하여 배척하고, 모든 이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兼愛가 곧 天志로서 인간의 궁극적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한 尙同이라는 개념은 시서에서와 같이 다시 천자를 천과 백성 중간에 선 중심적 인물로 부가시켰고, 따라서 묵자의 인간상은 우선적으로 왕을 위한 것이었다. 일반인을 위한 賢人像이 나오기는 하나 尙賢篇에서까지 주인공은 현인을 우대해야 되는 성왕이며, 왕이 상벌로써 장려하면 모든 이가 현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묵가의 성왕은 질서의 수호자이며 공적에 따라 모든 이를 공정히 다루는 활동적인 운영가로서 인간의 내적수양이나 문화적 교육에 대한 여유는 없었다고 보겠다. 이러한 묵가사상이 만연할 때 유가를 재정비하려던 맹자의 인간상은 여러 면에서 공자를 재해석한 것이었다. 우선 논어에서 중심적인 인간상의 위치를 차지하던 군자와 소인이라는 상대적 이미지들이 사라지고, 대신 聖人이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부각된다. 성인이란 논어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이상이었으나, 맹자에서는 더 포괄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보편적 인간상으로 모든 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맹자에서의 중심적 이미지가 군자에서 성인으로 변천된 것은 묵가의 강력한 성왕사상에 대항할만한 유가의 인간상으로 내어놓기에 군자상은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戰國시대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역사적 요구 속에서 맹자의 성인상은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王子라는 정치이상과 내적 완성자로서의 성인이라는 보편적 인간이상의 두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했다. 요와 순을 왕자일 뿐만 아니라 人倫之至로 보았고, 공자 역시 왕자만이 할 수 있는 春秋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여 두면의 이상이 이들 안에서 합치되게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인간 이상으로서의 성인상을 제시함에 있어 맹자는 성 자체란 시간적으로나 공적으로 변함이 없이 같은 것이며, 성인은 인 간 안에 있는 공통적인 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므로, 결국 성인과 우리는 同類 者라고 결론지었다. 이 공통점을 맹자는 그의 유명한 性善說로 발전시켰는데, 성 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개, 소, 山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국 천에서 받은 것을 지칭했다. 다시 말해서 맹자의 성은 논어의 덕에 맞먹는 개념으로 훨씬 구 체화되어 있지만, 결국 인간성의 배양을 가능케 하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告 子와의 토론에서 보이듯이 맹자가 초첨을 두고자 한 것은 인성의 독특한 면인 四端이라고 부른 仁義禮智의 도덕성으로 이것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보편 적 가능성이었다. 이 사단의 뿌리를 心으로 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心을 지키는 것이 곧 성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논어에서는 인격 자 근저에 숨어있던 천이 맹자에서는 성의 형이상학적 기원으로서 유가이론 속 에 확립되고, 도덕근원인 천은 誠하다고 묘사되었다. 따라서 유교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인간상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고유의 天性인 善함을 극대화 시켜 聖人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4. 墨家의 도전과 孟子의 재해석
기원전 5세기에 묵자는 강력한 聖王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공자가 확립시켜 놓은 유가의 군자상에 도전해왔다. 그의 유명한 十大主張을 통하여 묵자는 시서에 대한더 자구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兼相愛와 交相利라는 대원칙 아래서 仁,義, 孝등 유가에서 군자지도로 尙德의 길로 제시한 것을 상대화하여 兼이라는 개념안에 흡수해 버리고, 禮와 樂과 命을 존중하는 습관이 가져오는 폐단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인간관계의 가까움과 멈에 따라 차등을 두는 유가의 실천론을 別이라 하여 배척하고, 모든 이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兼愛가 곧 天志로서 인간의 궁극적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한 尙同이라는 개념은 시서에서와 같이 다시 천자를 천과 백성 중간에 선 중심적 인물로 부가시켰고, 따라서 묵자의 인간상은 우선적으로 왕을 위한 것이었다. 일반인을 위한 賢人像이 나오기는 하나 尙賢篇에서까지 주인공은 현인을 우대해야 되는 성왕이며, 왕이 상벌로써 장려하면 모든 이가 현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묵가의 성왕은 질서의 수호자이며 공적에 따라 모든 이를 공정히 다루는 활동적인 운영가로서 인간의 내적수양이나 문화적 교육에 대한 여유는 없었다고 보겠다. 이러한 묵가사상이 만연할 때 유가를 재정비하려던 맹자의 인간상은 여러 면에서 공자를 재해석한 것이었다. 우선 논어에서 중심적인 인간상의 위치를 차지하던 군자와 소인이라는 상대적 이미지들이 사라지고, 대신 聖人이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부각된다. 성인이란 논어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이상이었으나, 맹자에서는 더 포괄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보편적 인간상으로 모든 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맹자에서의 중심적 이미지가 군자에서 성인으로 변천된 것은 묵가의 강력한 성왕사상에 대항할만한 유가의 인간상으로 내어놓기에 군자상은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戰國시대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역사적 요구 속에서 맹자의 성인상은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王子라는 정치이상과 내적 완성자로서의 성인이라는 보편적 인간이상의 두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했다. 요와 순을 왕자일 뿐만 아니라 人倫之至로 보았고, 공자 역시 왕자만이 할 수 있는 春秋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여 두면의 이상이 이들 안에서 합치되게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인간 이상으로서의 성인상을 제시함에 있어 맹자는 성 자체란 시간적으로나 공적으로 변함이 없이 같은 것이며, 성인은 인 간 안에 있는 공통적인 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므로, 결국 성인과 우리는 同類 者라고 결론지었다. 이 공통점을 맹자는 그의 유명한 性善說로 발전시켰는데, 성 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개, 소, 山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국 천에서 받은 것을 지칭했다. 다시 말해서 맹자의 성은 논어의 덕에 맞먹는 개념으로 훨씬 구 체화되어 있지만, 결국 인간성의 배양을 가능케 하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告 子와의 토론에서 보이듯이 맹자가 초첨을 두고자 한 것은 인성의 독특한 면인 四端이라고 부른 仁義禮智의 도덕성으로 이것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보편 적 가능성이었다. 이 사단의 뿌리를 心으로 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心을 지키는 것이 곧 성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논어에서는 인격 자 근저에 숨어있던 천이 맹자에서는 성의 형이상학적 기원으로서 유가이론 속 에 확립되고, 도덕근원인 천은 誠하다고 묘사되었다. 따라서 유교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인간상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고유의 天性인 善함을 극대화 시켜 聖人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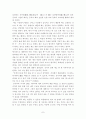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