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는 1939년에 이러한 경향의 시를 모아 \'와사등\'이란 시집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시는 도시적 감상에 빠져 주지시로서 성공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때 장만영도 주지시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는데, 농촌과 자연을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시각적으로 심상화하는 특색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상은 1934년에 초현실주의적인 시 \'오감도\', \'거울\' 등 독특하고 난해한 실험시를 발표하여 당시의 문단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파격적인 작품을 써 종래 시의 고정 관념을 무너뜨린 다다이즘적인 주지주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3) 전원파
1935년 경에 반도시적경향의 전원파 시인들의 활동도 있었다. 이들은 도시 문명을 벗어나 농촌과 자연을 소재로 택하여 자연 친화적 경향을 보였는데, 김동명, 김상용, 신석정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동명은 시집 \'하늘\'에서 전원과 자연을 예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김상용은 \'남으로 창을 내겠소.\'에서 전원에서의 삶을 갈망하였다.
한편, 신석정은 \'시문학\'에서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전원적, 목가적 시풍을 나타내었다.
저 재를 넘어 가는 저녁 해의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 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에서
또한, 1935년을 전후하여 \'시원\'을 통하여 시작 활동을 한 여류 시인으로는 노천명과 모윤숙이 있다.
(4) 생명파와 청록파의 시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생명파 시인들은 인간 문제와 생명의 탐구에 주력했다. \'시인 부락\'의 동인인 서정주와 \'생리\' 동인인 유치환이 그들이다. 이들은 주지시파들의 감각적 기교나 시문학파의 순수 서정의 표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정주는 시집 \'화사\'(1938)에서 인간의 원죄 의식과 생명의 몸부림을 육감적이고 원색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유치환은 시집 \'청마시초\'(1939)에서 강인한 대결 정신과 생명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서정주와 유치환은 생명 의식의 앙양을 상징적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30년대 말에 \'문장\'지의 추천을 거쳐 등단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을 소위 청록파라 하는데 이들은 자연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이를 노래함으로써 현대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이 청록파는 자연 귀의라는 공통성은 있었으나 각각 특색을 지닌 세계를 구축하였다.
조지훈은 \'봉황수\', \'완화삼\', \'승무\'를 통하여 고전적 풍류와 선적인 정취를 전아한 가락에 담아 표현하였고, 박두진은 \'향현\', \'도봉\' 등을 통하여 청산에서의 종교적 갈망과 이상향을 추구했다. 그리고 박목월은 \'윤사월\', \'나그네\', \'청노루\' 등에서 향토색이 짙은 산수의 서경을 민요적 가락으로 노래하였다. 박남수도 \'초롱불\', \'주막\' 등으로 \'문장\'의 추천을 받아 등장하였으나 후에는 사회에 관심을 두면서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시조는 \'문장\'의 추천을 받은 이호우, 김상옥이 등장함으로써 20년대의 시조 부흥 운동을 이어 받게 되었다. 그들은 시조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계승하는 한편, 표현 기법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4. 암흑기의 저항시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는 문학사상 암흑기에 해당한다. 신문이 모두 폐간되고 \'문장\' 역시 폐간당하게 된다. 시를 발표할 지면을 잃고 말조차 빼앗겼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인들이 붓을 꺾고 말았는데, 일제에 항거하는 시를 쓰며 민족사의 내일을 위해 헌신한 시인들이 있었다. 바로 이육사와 윤동주가 그들이다.
이육사는 \'자오선\' 동인이다. 동시에 그는 당당한 민족 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광야\', \'절정\', \'꽃\', \'교목\'을 통하여 남성적인 목소리로 강인한 대륙적 풍모를 보여 주었고, 일제에 대한 당당한 대결 정신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햇빛을 본 것은 8 15 이후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 이육사, \'꽃\'에서
윤동주는 식민지하의 지식인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참회록\', \'십자가\' 등을 통하여 표현하였고, \'서시\'를 통하여 도덕적 순결성을 노래하였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어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주리자./ ---- 만 이십 사 년 일 개월을/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든가.
- 윤동주, \'참회록(懺悔錄)\'에서
이 두 시인은 시와 행동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시정신에 투철한 시인들이다.
5. 해방후 혼란기의 시(1945∼1950)
8 15 광복을 계기로 그 동안 붓을 꺾었던 시인들이 다시 우리말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단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 속에서 순수 문학과 프로 문학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가 얼마 가지 않아 분단이 되고, 남쪽에서는 시단이 재편성되면서 순수 문학을 제창한 시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40년대 말에 와서 우리의 시는 두 경향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생명파와 청록파에 의하여 대표되는 전통시의 재건을 꾀하는 시풍이고, 또 다른 하나는 30년대의 주지시를 계승하고자 하는 시풍이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이 3인 공동 시집 \'청록집\'(1946)을 발간한 것을 비롯하여, 유치환은 \'생명의 서\'(1947)를, 서정주는 \'귀촉도\'(1948)를 내놓았다. 이로써 전통시는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계승되는 계기가 되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흰 옷깃 염여 염여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리.
신이나 삼어 줄
이때 장만영도 주지시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는데, 농촌과 자연을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시각적으로 심상화하는 특색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상은 1934년에 초현실주의적인 시 \'오감도\', \'거울\' 등 독특하고 난해한 실험시를 발표하여 당시의 문단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파격적인 작품을 써 종래 시의 고정 관념을 무너뜨린 다다이즘적인 주지주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3) 전원파
1935년 경에 반도시적경향의 전원파 시인들의 활동도 있었다. 이들은 도시 문명을 벗어나 농촌과 자연을 소재로 택하여 자연 친화적 경향을 보였는데, 김동명, 김상용, 신석정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동명은 시집 \'하늘\'에서 전원과 자연을 예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김상용은 \'남으로 창을 내겠소.\'에서 전원에서의 삶을 갈망하였다.
한편, 신석정은 \'시문학\'에서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전원적, 목가적 시풍을 나타내었다.
저 재를 넘어 가는 저녁 해의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 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에서
또한, 1935년을 전후하여 \'시원\'을 통하여 시작 활동을 한 여류 시인으로는 노천명과 모윤숙이 있다.
(4) 생명파와 청록파의 시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생명파 시인들은 인간 문제와 생명의 탐구에 주력했다. \'시인 부락\'의 동인인 서정주와 \'생리\' 동인인 유치환이 그들이다. 이들은 주지시파들의 감각적 기교나 시문학파의 순수 서정의 표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정주는 시집 \'화사\'(1938)에서 인간의 원죄 의식과 생명의 몸부림을 육감적이고 원색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유치환은 시집 \'청마시초\'(1939)에서 강인한 대결 정신과 생명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서정주와 유치환은 생명 의식의 앙양을 상징적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30년대 말에 \'문장\'지의 추천을 거쳐 등단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을 소위 청록파라 하는데 이들은 자연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이를 노래함으로써 현대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이 청록파는 자연 귀의라는 공통성은 있었으나 각각 특색을 지닌 세계를 구축하였다.
조지훈은 \'봉황수\', \'완화삼\', \'승무\'를 통하여 고전적 풍류와 선적인 정취를 전아한 가락에 담아 표현하였고, 박두진은 \'향현\', \'도봉\' 등을 통하여 청산에서의 종교적 갈망과 이상향을 추구했다. 그리고 박목월은 \'윤사월\', \'나그네\', \'청노루\' 등에서 향토색이 짙은 산수의 서경을 민요적 가락으로 노래하였다. 박남수도 \'초롱불\', \'주막\' 등으로 \'문장\'의 추천을 받아 등장하였으나 후에는 사회에 관심을 두면서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시조는 \'문장\'의 추천을 받은 이호우, 김상옥이 등장함으로써 20년대의 시조 부흥 운동을 이어 받게 되었다. 그들은 시조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계승하는 한편, 표현 기법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4. 암흑기의 저항시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는 문학사상 암흑기에 해당한다. 신문이 모두 폐간되고 \'문장\' 역시 폐간당하게 된다. 시를 발표할 지면을 잃고 말조차 빼앗겼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인들이 붓을 꺾고 말았는데, 일제에 항거하는 시를 쓰며 민족사의 내일을 위해 헌신한 시인들이 있었다. 바로 이육사와 윤동주가 그들이다.
이육사는 \'자오선\' 동인이다. 동시에 그는 당당한 민족 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광야\', \'절정\', \'꽃\', \'교목\'을 통하여 남성적인 목소리로 강인한 대륙적 풍모를 보여 주었고, 일제에 대한 당당한 대결 정신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햇빛을 본 것은 8 15 이후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 이육사, \'꽃\'에서
윤동주는 식민지하의 지식인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참회록\', \'십자가\' 등을 통하여 표현하였고, \'서시\'를 통하여 도덕적 순결성을 노래하였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어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주리자./ ---- 만 이십 사 년 일 개월을/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든가.
- 윤동주, \'참회록(懺悔錄)\'에서
이 두 시인은 시와 행동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시정신에 투철한 시인들이다.
5. 해방후 혼란기의 시(1945∼1950)
8 15 광복을 계기로 그 동안 붓을 꺾었던 시인들이 다시 우리말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단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 속에서 순수 문학과 프로 문학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가 얼마 가지 않아 분단이 되고, 남쪽에서는 시단이 재편성되면서 순수 문학을 제창한 시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40년대 말에 와서 우리의 시는 두 경향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생명파와 청록파에 의하여 대표되는 전통시의 재건을 꾀하는 시풍이고, 또 다른 하나는 30년대의 주지시를 계승하고자 하는 시풍이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이 3인 공동 시집 \'청록집\'(1946)을 발간한 것을 비롯하여, 유치환은 \'생명의 서\'(1947)를, 서정주는 \'귀촉도\'(1948)를 내놓았다. 이로써 전통시는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계승되는 계기가 되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흰 옷깃 염여 염여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리.
신이나 삼어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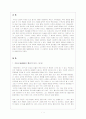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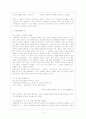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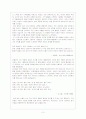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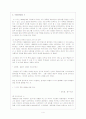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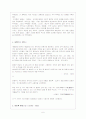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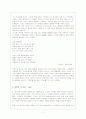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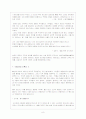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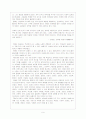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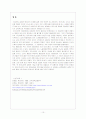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