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젓갈류의 분류
2.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저장 음식
3. 종류와 주의할 점
4. 이름도 쓰임새도 다양한 새우젓
5. 감칠맛 나는 멸치젓
6. 그 밖의 젓갈
7. 식해
8. 오래될수록 맛있는 어리굴젓
9. 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진석화젓
#수산발효식품의 식품학적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2.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저장 음식
3. 종류와 주의할 점
4. 이름도 쓰임새도 다양한 새우젓
5. 감칠맛 나는 멸치젓
6. 그 밖의 젓갈
7. 식해
8. 오래될수록 맛있는 어리굴젓
9. 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진석화젓
#수산발효식품의 식품학적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
2.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저장 음식
-젓갈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이다. 한나라 무제가 동이족을 쫓아서 산둥 반도에 이르렀을 때 좋은 냄새가 나서 찾아보게 하니 물고기 창자와 소금을 넣고 흙으로 덮어 둔 항아리에서 나는 냄새였다. 이것이 바로 젓갈이었다고 한다. 이를 쫓다가 얻어 ‘축이’라고 했다 한다. 당시의 산둥 반도는 우리 겨레의 활동 무대였으므로 우리 조상은 일찍부터 젓갈을 조미료로 사용하였다. B.C. 3-5세기의 중국 <이아>라는 사전에는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지’, 육으로 만든 젓갈을 ‘해’라 한다.”고 하였고 그 후의 문헌에는 지,자,해 등이 나온다.
5세기경의 <제민요술>에는 “장에는 누룩과 메주,술,소금으로 담그는 작장법과 수조어육류,소금,채소로 담그는 어육장법이 있다”고 씌어 있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신문왕8년(683년)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때 납폐품목에 ‘장’과 함께 ‘해’가 적혀 있다. (여기서 해는 젓갈을 말한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는 어패류를 소금에만 절이는 지염해,젓갈과 절인 생선에 익힌 곡물과 채소 등을 합하여 숙성시키는 식해로 크게 나뉘었다.
여름철에는 양념한 새우젓만으로도 잃었던 입맛을 되찾을 수 있다. 새우젓이나 조개젓은 다진 파와 마늘,깨소금,참기름,고춧가루를 조금씩 넣고 무쳐 바로 먹어야 맛있다. 서울과 충청도에서 즐겨먹고 남쪽으로 갈수록 멸치젓이나 대구아가미젓 등 진하고 매운 젓갈을 더 즐긴다.
젓갈은 어패류를 염장법으로 담근 것으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여러 생선과 새우,조개 등에 소금을 약 20% 섞어서 절여 얼마 동안 저장하면 특유의 맛과 향을 내게 된다. 젓갈은 숙성 기간 중에 자체에 있는 자기분해효소와 미생물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미아미노산과 핵산 분해 산물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특유의 감칠맛이 나는 것이다. 작은 생선의 뼈나 새우,갑각류의 껍질은 숙성 중에 연해져서 칼슘의 좋은 급원 식품이 되기도 한다.
식해는 수산물과 소금 외에 밥이나 전분질을 섞어서 담그는 일종의 젓갈이다. 재료 중의 전분이 발효하면서 유산이 생겨 독특한 신맛이 나고 부패를 막아 준다. 생선의 삭은 맛이 유별나게 좋다.
음식의 간은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은 입맛이 중간 정도이며 추운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싱겁게 먹고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짜게 먹는다. 그래서 짠맛이 강한 젓갈은 남쪽 지방에서 특히 발달하였고 북쪽 지방에는 거의 없다.
젓갈은 그대로 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김치에 넣거나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많이 쓰인다. 예전에는 제철에 흔한 생선이나 조개류로 직접 집에서 담갔다.
3. 종류와 주의할 점
-젓갈은 수산물이 가장 많이 잡힐 때 염장을 하므로 지방마다 담그는 시기가 다르다. 우리 나라의 젓갈 종류는 약 140여종에 이른다. 소재별로 분류해 보면 생선으로 담근 것이 80여종, 생선의 내장이나 생식소로 담근 것이 50여 종, 게나 새우 등 갑각류로 담근 것이 20여 종이고 낙지,문어,오징어 등의 두족류로 담근 것이 16종, 그 밖에 해삼이나 성게로 담근 젓갈이 있다.
가장 흔한 젓갈은 새우젓,조기젓,황석어젓,멸치젓 등으로 주로 김치 담글 때 넣는다. 찌개나 국의 간을 맞출 때에는 주로 새우젓을 나물을 무칠 때는 멸치젓으로 만든 멸장을 넣는데 간장만으로도 간을 한 것과는 달리 독특한 맛이 있다.
새우젓은 서해안이 주 생산지이고 명태가 많이 잡히는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말리는 덕장으로 보내기 전에 알은 모아서 명란젓을 담그고 창자로는 창란젓을 담근다. 대구아가미젓은 대구모젓이라고도 하는데 얇게 썬 무를 넣고 무쳐서 반찬으로 먹는다. 전라도에서는 철에 따라 잡히는 어패류로 게,전어,복어,돔배,토하,낙지,꼴뚜기,갈치,소라,병어 등으로 젓갈을 담가 각각의 독특한 향미를 즐긴다. 대개 밥 반찬용으로는 조개젓,어리굴젓,명란젓,창란젓,오징어젓 등을 즐겨 먹는다.
젓갈 담글 때 주의할 점은 첫째, 모든 재료는 반드시 소금물로 씻는다. 맹물로 씻으면 저장하는 동안 젓갈의 맛과 색이 변한다. 둘째, 생선의 내장을 빼되 멸치나 작은 생선은 그대로 담근다. 셋째, 재료와 소금의 비율이 10대 3정도가 되도록 한다. 소금이 적으면 저장하는 동안 부패해 버린다. 넷째, 항아리나 유리,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다섯째, 재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돌이나 접시로 눌러서 국물안에 잠겨 있도록 한다. 여섯째, 젓갈이 숙성하여 꺼낼 때는 물기가 없는 도구나 손으로 덜어낸다.
4. 이름도 쓰임새도 다양한 새우젓
-젓갈 중 가장 많이 먹는 새우젓은 반찬으로도 먹지만 김치 등을 담글 때 조미료로 많이 쓴다. 젓을 담글 때 쓴 새우에 따라 생김새와 이름,쓰임새가 각각 다르다. 음력 정월 그믐부터 4월 사이에 잡은 새우로 담근 것을 풋젓이라 하는데 서해안에서는 데뜨기젓(돗떼게젓)이라 한다. 살이 연하고 희다. 그 중 2월에 담근 것을 동백하젓이라고도 한다. 오젓은 오월에 담근 것으로 살이 단단하지 않고 붉은빛이 돈다. 유월의 새우는 육젓이라 하는데 흰 바탕에 연홍색을 띠며 껍질이 얇고 살이 많아 새우젓 중에 제일로 친다. 7월은 차젓이라 하고 8월은 추젓으로 자잘하고 흰빛이 난다. 추젓은 온갖 잡것이 섞여 있어 당장 먹기는 좋지 못하나 두었다가 모두 삭으면 김장 때나 일년 내 두고 젓국에 쓰기에 알맞다. 9-10월에 잡은 것은 동백젓, 동짓달의 것은 동젓이라고 한다. 그 밖에 눈처럼 흰 새우를 삭힌 백하젓, 분홍빛이 나는 자하로 담근 건댕이젓, 아주 작은 새우로 담근 고개미젓 등이 있다.
전북 옥구군 성산리와 오봉리에서 4월에 잡히는 붉은 중새우의 알을 모아서 새우알젓을 담가 조선조 말 궁중에 진상품으로 올렸다고 한다.
민물 새우로 만든 젓은 토하젓이라고 하는데 빨리 익히려면 새우와 밥,고춧가루를 함께 갈아서 담근다.
새우젓은 충남 광천이 가장 유명한데 강천 장터에는 젓갈상이 30여군데나 있다. 광천에서 대천 방향으로 5km쯤 가면 용암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독배라는 굴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킨다. 해방 후 윤만길이란 할아버지가 우연히 폐광된 금광에 새우젓을 저장하게 되었는데
2.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저장 음식
-젓갈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이다. 한나라 무제가 동이족을 쫓아서 산둥 반도에 이르렀을 때 좋은 냄새가 나서 찾아보게 하니 물고기 창자와 소금을 넣고 흙으로 덮어 둔 항아리에서 나는 냄새였다. 이것이 바로 젓갈이었다고 한다. 이를 쫓다가 얻어 ‘축이’라고 했다 한다. 당시의 산둥 반도는 우리 겨레의 활동 무대였으므로 우리 조상은 일찍부터 젓갈을 조미료로 사용하였다. B.C. 3-5세기의 중국 <이아>라는 사전에는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지’, 육으로 만든 젓갈을 ‘해’라 한다.”고 하였고 그 후의 문헌에는 지,자,해 등이 나온다.
5세기경의 <제민요술>에는 “장에는 누룩과 메주,술,소금으로 담그는 작장법과 수조어육류,소금,채소로 담그는 어육장법이 있다”고 씌어 있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신문왕8년(683년)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때 납폐품목에 ‘장’과 함께 ‘해’가 적혀 있다. (여기서 해는 젓갈을 말한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는 어패류를 소금에만 절이는 지염해,젓갈과 절인 생선에 익힌 곡물과 채소 등을 합하여 숙성시키는 식해로 크게 나뉘었다.
여름철에는 양념한 새우젓만으로도 잃었던 입맛을 되찾을 수 있다. 새우젓이나 조개젓은 다진 파와 마늘,깨소금,참기름,고춧가루를 조금씩 넣고 무쳐 바로 먹어야 맛있다. 서울과 충청도에서 즐겨먹고 남쪽으로 갈수록 멸치젓이나 대구아가미젓 등 진하고 매운 젓갈을 더 즐긴다.
젓갈은 어패류를 염장법으로 담근 것으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여러 생선과 새우,조개 등에 소금을 약 20% 섞어서 절여 얼마 동안 저장하면 특유의 맛과 향을 내게 된다. 젓갈은 숙성 기간 중에 자체에 있는 자기분해효소와 미생물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미아미노산과 핵산 분해 산물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특유의 감칠맛이 나는 것이다. 작은 생선의 뼈나 새우,갑각류의 껍질은 숙성 중에 연해져서 칼슘의 좋은 급원 식품이 되기도 한다.
식해는 수산물과 소금 외에 밥이나 전분질을 섞어서 담그는 일종의 젓갈이다. 재료 중의 전분이 발효하면서 유산이 생겨 독특한 신맛이 나고 부패를 막아 준다. 생선의 삭은 맛이 유별나게 좋다.
음식의 간은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은 입맛이 중간 정도이며 추운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싱겁게 먹고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짜게 먹는다. 그래서 짠맛이 강한 젓갈은 남쪽 지방에서 특히 발달하였고 북쪽 지방에는 거의 없다.
젓갈은 그대로 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김치에 넣거나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많이 쓰인다. 예전에는 제철에 흔한 생선이나 조개류로 직접 집에서 담갔다.
3. 종류와 주의할 점
-젓갈은 수산물이 가장 많이 잡힐 때 염장을 하므로 지방마다 담그는 시기가 다르다. 우리 나라의 젓갈 종류는 약 140여종에 이른다. 소재별로 분류해 보면 생선으로 담근 것이 80여종, 생선의 내장이나 생식소로 담근 것이 50여 종, 게나 새우 등 갑각류로 담근 것이 20여 종이고 낙지,문어,오징어 등의 두족류로 담근 것이 16종, 그 밖에 해삼이나 성게로 담근 젓갈이 있다.
가장 흔한 젓갈은 새우젓,조기젓,황석어젓,멸치젓 등으로 주로 김치 담글 때 넣는다. 찌개나 국의 간을 맞출 때에는 주로 새우젓을 나물을 무칠 때는 멸치젓으로 만든 멸장을 넣는데 간장만으로도 간을 한 것과는 달리 독특한 맛이 있다.
새우젓은 서해안이 주 생산지이고 명태가 많이 잡히는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말리는 덕장으로 보내기 전에 알은 모아서 명란젓을 담그고 창자로는 창란젓을 담근다. 대구아가미젓은 대구모젓이라고도 하는데 얇게 썬 무를 넣고 무쳐서 반찬으로 먹는다. 전라도에서는 철에 따라 잡히는 어패류로 게,전어,복어,돔배,토하,낙지,꼴뚜기,갈치,소라,병어 등으로 젓갈을 담가 각각의 독특한 향미를 즐긴다. 대개 밥 반찬용으로는 조개젓,어리굴젓,명란젓,창란젓,오징어젓 등을 즐겨 먹는다.
젓갈 담글 때 주의할 점은 첫째, 모든 재료는 반드시 소금물로 씻는다. 맹물로 씻으면 저장하는 동안 젓갈의 맛과 색이 변한다. 둘째, 생선의 내장을 빼되 멸치나 작은 생선은 그대로 담근다. 셋째, 재료와 소금의 비율이 10대 3정도가 되도록 한다. 소금이 적으면 저장하는 동안 부패해 버린다. 넷째, 항아리나 유리,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다섯째, 재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돌이나 접시로 눌러서 국물안에 잠겨 있도록 한다. 여섯째, 젓갈이 숙성하여 꺼낼 때는 물기가 없는 도구나 손으로 덜어낸다.
4. 이름도 쓰임새도 다양한 새우젓
-젓갈 중 가장 많이 먹는 새우젓은 반찬으로도 먹지만 김치 등을 담글 때 조미료로 많이 쓴다. 젓을 담글 때 쓴 새우에 따라 생김새와 이름,쓰임새가 각각 다르다. 음력 정월 그믐부터 4월 사이에 잡은 새우로 담근 것을 풋젓이라 하는데 서해안에서는 데뜨기젓(돗떼게젓)이라 한다. 살이 연하고 희다. 그 중 2월에 담근 것을 동백하젓이라고도 한다. 오젓은 오월에 담근 것으로 살이 단단하지 않고 붉은빛이 돈다. 유월의 새우는 육젓이라 하는데 흰 바탕에 연홍색을 띠며 껍질이 얇고 살이 많아 새우젓 중에 제일로 친다. 7월은 차젓이라 하고 8월은 추젓으로 자잘하고 흰빛이 난다. 추젓은 온갖 잡것이 섞여 있어 당장 먹기는 좋지 못하나 두었다가 모두 삭으면 김장 때나 일년 내 두고 젓국에 쓰기에 알맞다. 9-10월에 잡은 것은 동백젓, 동짓달의 것은 동젓이라고 한다. 그 밖에 눈처럼 흰 새우를 삭힌 백하젓, 분홍빛이 나는 자하로 담근 건댕이젓, 아주 작은 새우로 담근 고개미젓 등이 있다.
전북 옥구군 성산리와 오봉리에서 4월에 잡히는 붉은 중새우의 알을 모아서 새우알젓을 담가 조선조 말 궁중에 진상품으로 올렸다고 한다.
민물 새우로 만든 젓은 토하젓이라고 하는데 빨리 익히려면 새우와 밥,고춧가루를 함께 갈아서 담근다.
새우젓은 충남 광천이 가장 유명한데 강천 장터에는 젓갈상이 30여군데나 있다. 광천에서 대천 방향으로 5km쯤 가면 용암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독배라는 굴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킨다. 해방 후 윤만길이란 할아버지가 우연히 폐광된 금광에 새우젓을 저장하게 되었는데
추천자료
 전통음식의 브랜드화
전통음식의 브랜드화 이탈리아와 터키의 전통음식
이탈리아와 터키의 전통음식 유아교육계획안 우리나라 전통음식
유아교육계획안 우리나라 전통음식 [중국요리][중국음식][중국][요리][음식]중국요리(중국음식)의 특징 고찰(중국요리(중국음식)...
[중국요리][중국음식][중국][요리][음식]중국요리(중국음식)의 특징 고찰(중국요리(중국음식)... 전통음식 김치 학습지도안
전통음식 김치 학습지도안 일본의 전통음식, 전통요리 및 지역별 음식의 특징, 향토요리, 대중요리, 퓨전요리
일본의 전통음식, 전통요리 및 지역별 음식의 특징, 향토요리, 대중요리, 퓨전요리 색채와 간판의 연관성, 꽃마다 색깔이 다른 이유, 전통음식에서의 색 이용, SK기업의 별색규...
색채와 간판의 연관성, 꽃마다 색깔이 다른 이유, 전통음식에서의 색 이용, SK기업의 별색규... 일본의 전통음식(역사, 분류, 종류, 특징)
일본의 전통음식(역사, 분류, 종류, 특징) 영국의 음식문화, 지역별 전통음식,기념일 음식
영국의 음식문화, 지역별 전통음식,기념일 음식 일본전통문화 - 가부키 , 분라쿠, 전통음식, 기모노, 유카타
일본전통문화 - 가부키 , 분라쿠, 전통음식, 기모노, 유카타  아동영양학-전통음식의 특징과 장점을 쓰시오
아동영양학-전통음식의 특징과 장점을 쓰시오 일본 긴키지방의 전통음식
일본 긴키지방의 전통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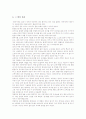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