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Ⅱ.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란 무엇인가?
1. 의무론적 윤리
2. 목적론적 윤리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윤리
1. 목적론적 윤리로서의 행복
2. 피조물들의 신에 대한 목적경향성
3. 인간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행복
Ⅳ.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목적론적 윤리의 조건
1. 기독교전통에서의 행복 : 지복과 은총
2. 악의 정의와 종류
3. 사주덕과 신학적인 덕목
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무론적 윤리
1. 영원법
2. 자연법
3. 인정법
4. 하나님의 법
Ⅵ. 결론 - 행복은 사랑으로...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Ⅱ.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란 무엇인가?
1. 의무론적 윤리
2. 목적론적 윤리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윤리
1. 목적론적 윤리로서의 행복
2. 피조물들의 신에 대한 목적경향성
3. 인간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행복
Ⅳ.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목적론적 윤리의 조건
1. 기독교전통에서의 행복 : 지복과 은총
2. 악의 정의와 종류
3. 사주덕과 신학적인 덕목
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무론적 윤리
1. 영원법
2. 자연법
3. 인정법
4. 하나님의 법
Ⅵ. 결론 - 행복은 사랑으로...
본문내용
S.T., IIa, 91, 2;
다시 말하면 “자연법이란 이성적인 피조물에 있어서의 영원법의 분유이다.” S.T., IIa, Iae, 91, 2.
이 ‘자연법’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경향이나 욕구(이것에 관해서 그의 이성을 성찰한다)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찰의 결과로서 인간의 이성이 선언하는 여러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 도덕법을 직접 공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 법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어떤 것과 관계가 없을 리는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영원법의 반영이고, 영원법에로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인간의 이성으로써 직접 공통되는 한 우리는 실천이성(實踐理性)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 기본해 있는 자연 도덕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인간은 도덕률을 다만 위로부터 억지로 내려씌워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플스톤, 강성위 역, p. 326.
토마스는 자연법을 1차적 규칙과 2차적 규칙으로 구분한다. 1차적 규칙만이 불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선은 행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Bonum est faciendum et malum vitandum)는 말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선 또는 정의는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마스는 이 명제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자연의 객관적 관찰에서 자연법의 구체적인 규칙, 즉 자연법의 제 2차적 규칙을 이끌어 낸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토마스는 자연법의 제1규칙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명제 - 사실 이것은 기본적 도덕 원칙이다 -에서 자연법의 구체적 규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객관적 관찰’에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토마스는 국가나 인간 사회, 기타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외부세계인 자연 질서에서 자연법의 구체적 규칙을 객관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제2차적 규칙인 선의 구체적인 내용, 즉 올바른 것의 내용은 인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하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인간이 경험적 방법을 통하여 매우 불완전하게 자연(본성)을 인식하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규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상황이 다양하게 변하고 따라서 올바른 것의 내용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마스는 우리의 본성이 변하기 때문에 자연법도 변한다고 말하고 있다. S.T., IIa, Iae, 97, 2.; S.T., IIa, Iae, 94, 5.
이와 같이 토마스의 자연법의 내용은 골격적 성격을 지닌 지침으로서 일반적이고 불확실하며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정법(=인정법)이 필요하다. 불확실하게 유동적인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자연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인정법의 근거와 한계가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S.T., IIa, Iae, 95, 2.
3. 인정법(人定法)
인정법(人定法=實定法)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자연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자연에서 이끌어 낸 올바른 행위규칙인 자연법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일반적 지침일 뿐이다. 구체적 인간의 사회 생활을 안정되고 질서있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정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법규는 자연법 규칙과 독립되어 있거나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 규칙에서 이끌어 내며,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자연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법은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도출된다. 그 하나는 추리를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도출된다. 예를 들면, “누구도 해하지 말라”라는 자연법상의 금지규범으로부터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다. 둘째는 자연법상의 일반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도출된다. 예를 들면 “범죄는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자연법상의 규범을 근거로 하여 범죄에 과하여질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이 두가지는 자연에서 이끌어 낸 행위규칙을 역사적 상황에 적용하는 결론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법의 모호한 부분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도출된다. S.T., IIa, Iae, 95, 2, 3.
이러한 인정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도출된다는 측면에서 이성의 산물이고, 입법자가 분명하고 고정된 성문 형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런데 인정법은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우선 인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인민 내지는 사회의 자연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공동선(bonum commune)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 그 인정법(구체적 실정법규)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정법규는 입법자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정법은 변화하는 자연적 정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적응해야 한다. “실정법규는 자연(본성)에 따라, 국가의 관습에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고 가능해야 하며, 장소와 시간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유익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S.T., IIa, Iae, 95, 3.
그러므로 토마스에 있어서 인정법은 어느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나 그룹이 그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하여 자연법에 근거하여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 사회생활의 규칙을 제정하는 인간 이성과 의지의 작품이다. 인정법은 자연(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해서 자연법에 근거하여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며, 따라서 사람들을 구속한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인정법(실정법)은 정의의 실현 및 표현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자연)에 근거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성에 의해 인정될 때에 법이라고 할 수 있다. S.T., IIa, Iae, 96, 1, 3.
다시 말하면 “자연법이란 이성적인 피조물에 있어서의 영원법의 분유이다.” S.T., IIa, Iae, 91, 2.
이 ‘자연법’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경향이나 욕구(이것에 관해서 그의 이성을 성찰한다)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찰의 결과로서 인간의 이성이 선언하는 여러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 도덕법을 직접 공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 법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어떤 것과 관계가 없을 리는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영원법의 반영이고, 영원법에로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인간의 이성으로써 직접 공통되는 한 우리는 실천이성(實踐理性)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 기본해 있는 자연 도덕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인간은 도덕률을 다만 위로부터 억지로 내려씌워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플스톤, 강성위 역, p. 326.
토마스는 자연법을 1차적 규칙과 2차적 규칙으로 구분한다. 1차적 규칙만이 불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선은 행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Bonum est faciendum et malum vitandum)는 말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선 또는 정의는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마스는 이 명제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자연의 객관적 관찰에서 자연법의 구체적인 규칙, 즉 자연법의 제 2차적 규칙을 이끌어 낸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토마스는 자연법의 제1규칙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명제 - 사실 이것은 기본적 도덕 원칙이다 -에서 자연법의 구체적 규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객관적 관찰’에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토마스는 국가나 인간 사회, 기타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외부세계인 자연 질서에서 자연법의 구체적 규칙을 객관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제2차적 규칙인 선의 구체적인 내용, 즉 올바른 것의 내용은 인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하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인간이 경험적 방법을 통하여 매우 불완전하게 자연(본성)을 인식하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규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상황이 다양하게 변하고 따라서 올바른 것의 내용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마스는 우리의 본성이 변하기 때문에 자연법도 변한다고 말하고 있다. S.T., IIa, Iae, 97, 2.; S.T., IIa, Iae, 94, 5.
이와 같이 토마스의 자연법의 내용은 골격적 성격을 지닌 지침으로서 일반적이고 불확실하며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정법(=인정법)이 필요하다. 불확실하게 유동적인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자연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인정법의 근거와 한계가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S.T., IIa, Iae, 95, 2.
3. 인정법(人定法)
인정법(人定法=實定法)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자연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자연에서 이끌어 낸 올바른 행위규칙인 자연법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일반적 지침일 뿐이다. 구체적 인간의 사회 생활을 안정되고 질서있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정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법규는 자연법 규칙과 독립되어 있거나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 규칙에서 이끌어 내며,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자연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법은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도출된다. 그 하나는 추리를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도출된다. 예를 들면, “누구도 해하지 말라”라는 자연법상의 금지규범으로부터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다. 둘째는 자연법상의 일반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도출된다. 예를 들면 “범죄는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자연법상의 규범을 근거로 하여 범죄에 과하여질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이 두가지는 자연에서 이끌어 낸 행위규칙을 역사적 상황에 적용하는 결론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법의 모호한 부분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도출된다. S.T., IIa, Iae, 95, 2, 3.
이러한 인정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도출된다는 측면에서 이성의 산물이고, 입법자가 분명하고 고정된 성문 형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런데 인정법은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우선 인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인민 내지는 사회의 자연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공동선(bonum commune)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 그 인정법(구체적 실정법규)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정법규는 입법자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정법은 변화하는 자연적 정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적응해야 한다. “실정법규는 자연(본성)에 따라, 국가의 관습에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고 가능해야 하며, 장소와 시간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유익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S.T., IIa, Iae, 95, 3.
그러므로 토마스에 있어서 인정법은 어느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나 그룹이 그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하여 자연법에 근거하여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 사회생활의 규칙을 제정하는 인간 이성과 의지의 작품이다. 인정법은 자연(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해서 자연법에 근거하여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며, 따라서 사람들을 구속한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인정법(실정법)은 정의의 실현 및 표현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자연)에 근거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성에 의해 인정될 때에 법이라고 할 수 있다. S.T., IIa, Iae, 96,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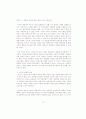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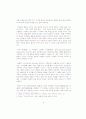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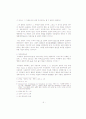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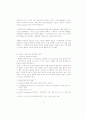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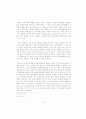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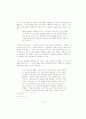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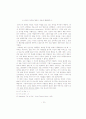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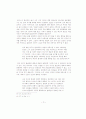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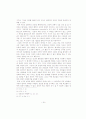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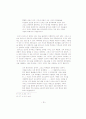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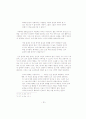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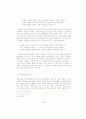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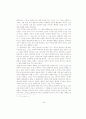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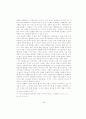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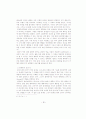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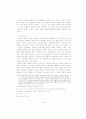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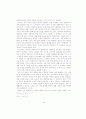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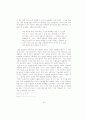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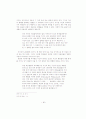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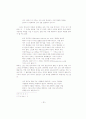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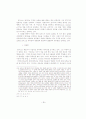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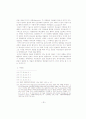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