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본문내용
와 세련된 표현 등 과연 국문문학의 백미편으로 이를 만하다.
19세기 중엽 漢山居士의 장편가사〈漢陽歌〉는 수도 한양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봉건사회의 생태를 드러내어 은연중 풍자하고 있다. 이 무렵 방각소설이 간행되면서 국문소설은 독자의 폭을 점차로 넓혀 갔다. 1906년 개화의 물결을 타고 신소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새 인쇄술에 의한 ‘딱지본’으로 꽤 널리 보급되었다. 가곡집으로「女唱歌謠錄」,「歌曲源流」등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국문가요를 여러모로 총정리한 것이었고, 개인 시조집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한 이세보의「風雅」가 나왔다. 시조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형식을 어느 정도 고수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담으려 하였다. 가사문학도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위정척사, 동학, 천주교 등의 사조극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나타났다. 19세기 말 전통적인 국문문학이 새로운 사회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변신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국문문학 양식이 태어나고 있었다. 신소설, 신시, 창가 등이 국문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가늠하며 나타났던 것이다.
2. 정조의 문체반정에 대하여
1. 문체 반정(文體反正)
정조는 당시 불꽃같이 일어나던 실학자들의 학풍을 개탄하여 이를 몹시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세상을 휩쓸던 이 학풍은 후계자를 얻지 못하여 꺾이고 말았다. 따라서 순정(醇正)을 표방하는 고문파로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릇된 학풍을 바른 자리로 되돌렸다\'고 할 수 있는 일로서, 이를 정조의 \'문체 반정\'이라 한다.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弘肅全書)>에서는 당시의 실학파 학자들의 문체를 사체(邪體)라 하고, 그 학문을 위학(僞學)이라고 하여 크게 비난하였으며, 종래의 순정 문학(醇正文學 : 古文)의 견지에서 실학파 문학을 신랄(辛辣)하게 비판하였다.
2. 정조의 문체 반정의 배경
정조대는 조선후기 문화의 융성기였다. 정조 자신이 뛰어난 學者君主였으며 文治에 주력하여, 문화의 진흥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조대의 이러한 문화정책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문화정책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정조 즉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정조 자신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것이었다. 換局期 이후 노론의 집권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노론 대 소론남인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영조대에 蕩平策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당파의 안배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리고 영조 말년부터 戚臣勢力이 강화되어 정치적 폐단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세손시절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며 정조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등극한 정조의 왕권은 그 기반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조의 정치적 제 1목표는 자신의 친위세력을 키워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이러한 목표는 문화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었다. 즉 奎章閣을 설치하여 자신의 친위세력을 키웠고 文體反正을 통하여 집권세력을 견제하며 蕩平의 장치로써 활용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친위부대인 壯勇營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이룩한 정조는 자신이 이상으로 삼았던 절대군주 중심의 왕도정치를 실행해 나갔다.
3. 文體反正의 정치적 의의
정조는 즉위 초부터 文風 내지 文體에 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反正’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 문제를 당시 정치의 최고의 急務로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아래에서 이 文體反正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文體反正의 외연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 문체의 문란이었다. 정조는 이 문체문란의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뜻을 여러 차례 개진하였다. 즉 정조는 六經에 근본을 두지 않은 패관소품체, 다시 말하면 明淸의 패관소설이나 형식미에만 집착하는 六朝이래의 騈儷體의 시문만 성행하는 문원의 풍조를 경계하고 우려한 것이며 이러한 문체문란이 정조가 문체반정을 의도한 원인이 되었다.
정조는 ‘稗官小品體의 해악은 서학보다도 크다.’라고 하여 문체를 바로잡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란한 문체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조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였는가, 즉 무엇을 목표로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는 사회기강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文章의 得失이 世道의 得失과 관련이 있다.’라는 “道文一致論”적인 문장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체의 문란은 곧 사회 기강의 문란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문란해진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문체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으로서 즉 문체반정을 蕩平의 구체적 장치로 삼고 이를 통하여 君主權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소론의 李東稷은 정조의 문체론에 편승하여 남인 李家煥의 문체를 비판하면서 남인측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정조는 그 저의를 파악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으로 인재의 적소등용을 내세우면서, 四色 내지 時僻의 갈등을 상호 견제하여 각기 그 특성에 따라 제자리에 등용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治道의 일단을 밝혔다. 이어서 정조는 문체문제와 관련하여 노론 南公轍 등의 징계에 대해, ‘治世의 希音을 듣기 위해 연소한 문신을 재교육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남공철 등이며 이들은 명가의 자제로서 文衡을 잡을 인물이므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지도 편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이가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도 역시 좋은 가문이나 100년간 낙척하여 그 慷慨之辭를 離騷九歌에 붙여 가탁한 것이며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조정의 책임이라고 언명하고, 영조의 기본 정책인 탕평책을 다시 부각시켰다.
이는 정조의 문체반정의 의도가 선명하게 부각된 언사로서 그의 근본 목적은 결국 탕평에 있었던 것이고, 문체반정은 탕평책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사색당파중 노론의 전제정치를 구축하고 있던 당시의 정치상황 속에서 정조는 왕권강화 내지 왕조부흥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색의 상호견제를 위한 탕평책을 선왕에 이어 계승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체반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이를 통하여
19세기 중엽 漢山居士의 장편가사〈漢陽歌〉는 수도 한양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봉건사회의 생태를 드러내어 은연중 풍자하고 있다. 이 무렵 방각소설이 간행되면서 국문소설은 독자의 폭을 점차로 넓혀 갔다. 1906년 개화의 물결을 타고 신소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새 인쇄술에 의한 ‘딱지본’으로 꽤 널리 보급되었다. 가곡집으로「女唱歌謠錄」,「歌曲源流」등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국문가요를 여러모로 총정리한 것이었고, 개인 시조집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한 이세보의「風雅」가 나왔다. 시조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형식을 어느 정도 고수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담으려 하였다. 가사문학도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위정척사, 동학, 천주교 등의 사조극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나타났다. 19세기 말 전통적인 국문문학이 새로운 사회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변신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국문문학 양식이 태어나고 있었다. 신소설, 신시, 창가 등이 국문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가늠하며 나타났던 것이다.
2. 정조의 문체반정에 대하여
1. 문체 반정(文體反正)
정조는 당시 불꽃같이 일어나던 실학자들의 학풍을 개탄하여 이를 몹시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세상을 휩쓸던 이 학풍은 후계자를 얻지 못하여 꺾이고 말았다. 따라서 순정(醇正)을 표방하는 고문파로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릇된 학풍을 바른 자리로 되돌렸다\'고 할 수 있는 일로서, 이를 정조의 \'문체 반정\'이라 한다.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弘肅全書)>에서는 당시의 실학파 학자들의 문체를 사체(邪體)라 하고, 그 학문을 위학(僞學)이라고 하여 크게 비난하였으며, 종래의 순정 문학(醇正文學 : 古文)의 견지에서 실학파 문학을 신랄(辛辣)하게 비판하였다.
2. 정조의 문체 반정의 배경
정조대는 조선후기 문화의 융성기였다. 정조 자신이 뛰어난 學者君主였으며 文治에 주력하여, 문화의 진흥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조대의 이러한 문화정책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문화정책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정조 즉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정조 자신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것이었다. 換局期 이후 노론의 집권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노론 대 소론남인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영조대에 蕩平策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당파의 안배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리고 영조 말년부터 戚臣勢力이 강화되어 정치적 폐단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세손시절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며 정조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등극한 정조의 왕권은 그 기반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조의 정치적 제 1목표는 자신의 친위세력을 키워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이러한 목표는 문화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었다. 즉 奎章閣을 설치하여 자신의 친위세력을 키웠고 文體反正을 통하여 집권세력을 견제하며 蕩平의 장치로써 활용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친위부대인 壯勇營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이룩한 정조는 자신이 이상으로 삼았던 절대군주 중심의 왕도정치를 실행해 나갔다.
3. 文體反正의 정치적 의의
정조는 즉위 초부터 文風 내지 文體에 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反正’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 문제를 당시 정치의 최고의 急務로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아래에서 이 文體反正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文體反正의 외연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 문체의 문란이었다. 정조는 이 문체문란의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뜻을 여러 차례 개진하였다. 즉 정조는 六經에 근본을 두지 않은 패관소품체, 다시 말하면 明淸의 패관소설이나 형식미에만 집착하는 六朝이래의 騈儷體의 시문만 성행하는 문원의 풍조를 경계하고 우려한 것이며 이러한 문체문란이 정조가 문체반정을 의도한 원인이 되었다.
정조는 ‘稗官小品體의 해악은 서학보다도 크다.’라고 하여 문체를 바로잡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란한 문체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조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였는가, 즉 무엇을 목표로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는 사회기강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文章의 得失이 世道의 得失과 관련이 있다.’라는 “道文一致論”적인 문장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체의 문란은 곧 사회 기강의 문란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문란해진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문체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으로서 즉 문체반정을 蕩平의 구체적 장치로 삼고 이를 통하여 君主權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소론의 李東稷은 정조의 문체론에 편승하여 남인 李家煥의 문체를 비판하면서 남인측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정조는 그 저의를 파악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으로 인재의 적소등용을 내세우면서, 四色 내지 時僻의 갈등을 상호 견제하여 각기 그 특성에 따라 제자리에 등용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治道의 일단을 밝혔다. 이어서 정조는 문체문제와 관련하여 노론 南公轍 등의 징계에 대해, ‘治世의 希音을 듣기 위해 연소한 문신을 재교육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남공철 등이며 이들은 명가의 자제로서 文衡을 잡을 인물이므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지도 편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이가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도 역시 좋은 가문이나 100년간 낙척하여 그 慷慨之辭를 離騷九歌에 붙여 가탁한 것이며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조정의 책임이라고 언명하고, 영조의 기본 정책인 탕평책을 다시 부각시켰다.
이는 정조의 문체반정의 의도가 선명하게 부각된 언사로서 그의 근본 목적은 결국 탕평에 있었던 것이고, 문체반정은 탕평책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사색당파중 노론의 전제정치를 구축하고 있던 당시의 정치상황 속에서 정조는 왕권강화 내지 왕조부흥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색의 상호견제를 위한 탕평책을 선왕에 이어 계승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체반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이를 통하여
추천자료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여성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여성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과 조벽암 소설의 공간설정 양상 및 작가의식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과 조벽암 소설의 공간설정 양상 및 작가의식 한국 고전 문학의 시대 구분
한국 고전 문학의 시대 구분 작가 이상과 그의 작품「날개」의 문학사적 의의
작가 이상과 그의 작품「날개」의 문학사적 의의 1960년대한국문학비평사
1960년대한국문학비평사 [한국문학] 1930년대 한국소설 연구(작가를 중심으로 주요작품 접근)
[한국문학] 1930년대 한국소설 연구(작가를 중심으로 주요작품 접근) [문학비평][신비평][한국문학]문학비평 신비평의 역사, 문학비평 신비평의 개념, 문학비평 신...
[문학비평][신비평][한국문학]문학비평 신비평의 역사, 문학비평 신비평의 개념, 문학비평 신... 북한문학(북한의 문학), 독일문학(독일의 문학), 프랑스문학(프랑스의 문학), 영국문학(영국...
북한문학(북한의 문학), 독일문학(독일의 문학), 프랑스문학(프랑스의 문학), 영국문학(영국... [한국 근대문학]한국 근대문학의 역사, 한국 근대문학의 구분, 한국 근대문학 시문학, 한국 ...
[한국 근대문학]한국 근대문학의 역사, 한국 근대문학의 구분, 한국 근대문학 시문학, 한국 ... [한국문학][문학][고전문학][현대문학]한국(한국문학) 고전문학, 한국(한국문학) 근대문학, ...
[한국문학][문학][고전문학][현대문학]한국(한국문학) 고전문학, 한국(한국문학) 근대문학, ... [한국문학][민족문학][민중문학][분단문학][문학]한국문학의 특성,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
[한국문학][민족문학][민중문학][분단문학][문학]한국문학의 특성,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 [한국문학][분단문학][해학][자연][한국문학의 논쟁 사례]한국문학의 특질, 한국문학의 교류,...
[한국문학][분단문학][해학][자연][한국문학의 논쟁 사례]한국문학의 특질, 한국문학의 교류,...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염상섭 초기 3부작의 문학사적 의의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염상섭 초기 3부작의 문학사적 의의 [작가, 영미 작가, 중남미 작가, 영국 작가, 독일 작가, 한국 작가, 중국 작가, 영미, 중남미...
[작가, 영미 작가, 중남미 작가, 영국 작가, 독일 작가, 한국 작가, 중국 작가, 영미, 중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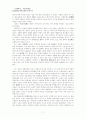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