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백성들의 생활 모습
가. 촌락의 구조
나. 법률과 풍속
다.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여성의 지위
라. 상속
ꊲ 백성들의 신앙 생활
가. 향도
나. 무속신앙
다. 불교신앙
라. 도교
마. 풍수지리설
ꊳ 백성의 경제 생활
가. 농업기술의 발달
나. 수공업 활동
다. 상업 활동
라. 사회 시책과 사회 시설
ꊴ 백성들의 문화 활동
가. 고려가요
나. 조각
ꊵ 참고 자료
1. 팔관회
2. 고려 시대의 미륵신앙
3. 사천 매향비(泗川 埋香碑)
4. 정토신앙(淨土信仰)
5.「향약구급방」
6. 가시리 연구
가. 촌락의 구조
나. 법률과 풍속
다.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여성의 지위
라. 상속
ꊲ 백성들의 신앙 생활
가. 향도
나. 무속신앙
다. 불교신앙
라. 도교
마. 풍수지리설
ꊳ 백성의 경제 생활
가. 농업기술의 발달
나. 수공업 활동
다. 상업 활동
라. 사회 시책과 사회 시설
ꊴ 백성들의 문화 활동
가. 고려가요
나. 조각
ꊵ 참고 자료
1. 팔관회
2. 고려 시대의 미륵신앙
3. 사천 매향비(泗川 埋香碑)
4. 정토신앙(淨土信仰)
5.「향약구급방」
6. 가시리 연구
본문내용
히 폐쇄된 사회는 아니었다.
라. 상속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 자녀간에 다소 액수의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토지 상속에 있어서는 자녀간 균분 상속, 적장자 우대 상속, 적장자 단독 상속 등 세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녀간 균분 상속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많았고,
적장자 우대 상속은 소유 토지가 적은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데, 보편적인 상속 형태라고 본다.
그리고 적장자 단독 상속은 국가에 대해 특정한 역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준 收租地에서 나타나는 상속 형태라고 보았다. 군역을 지는 軍人田이나 향역을 지는 향리들이 지급받는 外役田의 상속을 적장자 단독 상속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백성들의 신앙 생활
가. 향도
농민들은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香徒)였다. 이는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埋香)이라고 한다. 이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香徒)라고 하였다.
고려 시대 香徒의 성격은 그 활동 내용상 전기까지는 불상석탑사찰 등의 조성에 치중했던 데 비해,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 활동보다 향촌 공동체적 모습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나. 무속신앙
마음 입구에는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이라는 장승을 세워 洞神으로 받들었다. 장승은 본래 절의 경계 표시로 세우기 시작했는데 마을 경계나 이정표 구실도 하였다.
또 마을마다 수목신인 堂神에게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이런 무속 신앙 형태는 보편적인 종교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전승되었다. 무속을 이끄는 사람은 신의 대리자를 표방하는 무당이다.
사람들은 집에 우환이 있으면 무당집을 찾아가 빌었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 재난을 물리치고 영험을 얻으려 했다.
개인적으로 집안에서는 부엌신인 조왕을 받들고, 측간의 신인 측간신을 섬겼다.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속신을 받들었다. 고려에서는 송악산에 숭산묘(崧山廟)를 세우고 산신을 받들었다. 산신제에서는 돼지나 소의 머리를 바쳤다.
다. 불교신앙
1) 연등회 : 본래 연등(蓮燈)은 등에 불을 켜 놓음으로써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려 善業을 쌓고자 하는 공양의 한 방법이었다.
고려에서는 처음 매년 1월 15일(上元日)에 행사를 가지던 것이 거란의 침입으로 피난길에 올랏던 顯宗이 돌아오던 도중 淸州의 별궁에서 2월 15일에 열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 날짜로 바뀌었다.
이날에는 대궐에 많은 등을 밝히고 술과 다과를 마련한 가운데 음악과 춤 및 연극을 베풀어 군신이 할게 즐기는 한편, 부처와 天地神明을 또한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던 것이다. 아울러 많은 백성들도 참여하여 같이 즐기게 하였다.
2) 佛誕日 : 연례적인 佛事로는 48 佛誕日 행사를 들 수 있다. 불신도로서 부처의 탄생을 경축하는 이날에는 전국의 사원마다 초저녁부터 많은 등을 달아 대낮처럼 밝히고, 찬불하는 법회를 열었다.
또한 민가에서도 등을 달아 하례하는 한편, 백성들이 즐거운 놀이를 하는 날로서 명절이나 다름이 없었다.
3) 팔관회 :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국가적 행사였다.
훈요 10조에서 “천령 및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원래 불교 행사였던 팔관회는 고려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게 나라의 태평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 때에는 상인이나 여진 및 왕가의 사절이 와서 왕께 진기한 물품을 바치고 크게 무역을 행하는 국제적 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팔관회의 개최일은 개경에서는 11월 15일, 서경에서는 10월 15일이었고, 팔관 휴가로 전후 3일을 주었다고 한다.
4) 미륵신앙 : 고려시대에는 화엄종이나 선종의 유행과 함께 미륵신앙이 상당히 유포되었다.
이때의 신앙형태로는 지배층의 경우 사찰건립이나 법회의 개최 등이 있었고, 민간에서는 미륵에 대한 공양을 위한 모임인 향도(香徒)와 결계(結契)가 활발했다.
향도의 예로는 태조 때부터 미륵사에 공신당을 두고 매년 법회를 개최한 일, 현종 때 미륵신앙을 중요시하는 법상종 승려를 위한 현화사 창건, 문종 때 흥왕사 내에 자씨전(慈氏殿)의 창건, 예종 때 미륵사에서의 법회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결계의 예로는 미륵불에게 향을 공양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해변에 향목(香木)을 묻어두는 풍습의 유행, 우왕 때 사천매향비에 나타난 1,000명의 결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라. 도교
고려 시대에는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도 성행하였다.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醮祭)가 성행하였다.
고려에 이르러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이룬 것은 16대 睿宗(1106-1122)에 이르러서였다.
道觀인 福源宮을 건립하여 도교의 중흥을 꾀하였으며, 대궐에서 醮祭를 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관의 건립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성립에 이르지 못한 것은, 도교의 雜神性과 비조직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는 도교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제약점이기도 하였다.
마.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 사상이 더해져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圖讖이란 징후전조 또는 神託占言 등의
라. 상속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 자녀간에 다소 액수의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토지 상속에 있어서는 자녀간 균분 상속, 적장자 우대 상속, 적장자 단독 상속 등 세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녀간 균분 상속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많았고,
적장자 우대 상속은 소유 토지가 적은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데, 보편적인 상속 형태라고 본다.
그리고 적장자 단독 상속은 국가에 대해 특정한 역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준 收租地에서 나타나는 상속 형태라고 보았다. 군역을 지는 軍人田이나 향역을 지는 향리들이 지급받는 外役田의 상속을 적장자 단독 상속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백성들의 신앙 생활
가. 향도
농민들은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香徒)였다. 이는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埋香)이라고 한다. 이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香徒)라고 하였다.
고려 시대 香徒의 성격은 그 활동 내용상 전기까지는 불상석탑사찰 등의 조성에 치중했던 데 비해,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 활동보다 향촌 공동체적 모습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나. 무속신앙
마음 입구에는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이라는 장승을 세워 洞神으로 받들었다. 장승은 본래 절의 경계 표시로 세우기 시작했는데 마을 경계나 이정표 구실도 하였다.
또 마을마다 수목신인 堂神에게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이런 무속 신앙 형태는 보편적인 종교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전승되었다. 무속을 이끄는 사람은 신의 대리자를 표방하는 무당이다.
사람들은 집에 우환이 있으면 무당집을 찾아가 빌었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 재난을 물리치고 영험을 얻으려 했다.
개인적으로 집안에서는 부엌신인 조왕을 받들고, 측간의 신인 측간신을 섬겼다.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속신을 받들었다. 고려에서는 송악산에 숭산묘(崧山廟)를 세우고 산신을 받들었다. 산신제에서는 돼지나 소의 머리를 바쳤다.
다. 불교신앙
1) 연등회 : 본래 연등(蓮燈)은 등에 불을 켜 놓음으로써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려 善業을 쌓고자 하는 공양의 한 방법이었다.
고려에서는 처음 매년 1월 15일(上元日)에 행사를 가지던 것이 거란의 침입으로 피난길에 올랏던 顯宗이 돌아오던 도중 淸州의 별궁에서 2월 15일에 열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 날짜로 바뀌었다.
이날에는 대궐에 많은 등을 밝히고 술과 다과를 마련한 가운데 음악과 춤 및 연극을 베풀어 군신이 할게 즐기는 한편, 부처와 天地神明을 또한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던 것이다. 아울러 많은 백성들도 참여하여 같이 즐기게 하였다.
2) 佛誕日 : 연례적인 佛事로는 48 佛誕日 행사를 들 수 있다. 불신도로서 부처의 탄생을 경축하는 이날에는 전국의 사원마다 초저녁부터 많은 등을 달아 대낮처럼 밝히고, 찬불하는 법회를 열었다.
또한 민가에서도 등을 달아 하례하는 한편, 백성들이 즐거운 놀이를 하는 날로서 명절이나 다름이 없었다.
3) 팔관회 :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국가적 행사였다.
훈요 10조에서 “천령 및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원래 불교 행사였던 팔관회는 고려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게 나라의 태평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 때에는 상인이나 여진 및 왕가의 사절이 와서 왕께 진기한 물품을 바치고 크게 무역을 행하는 국제적 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팔관회의 개최일은 개경에서는 11월 15일, 서경에서는 10월 15일이었고, 팔관 휴가로 전후 3일을 주었다고 한다.
4) 미륵신앙 : 고려시대에는 화엄종이나 선종의 유행과 함께 미륵신앙이 상당히 유포되었다.
이때의 신앙형태로는 지배층의 경우 사찰건립이나 법회의 개최 등이 있었고, 민간에서는 미륵에 대한 공양을 위한 모임인 향도(香徒)와 결계(結契)가 활발했다.
향도의 예로는 태조 때부터 미륵사에 공신당을 두고 매년 법회를 개최한 일, 현종 때 미륵신앙을 중요시하는 법상종 승려를 위한 현화사 창건, 문종 때 흥왕사 내에 자씨전(慈氏殿)의 창건, 예종 때 미륵사에서의 법회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결계의 예로는 미륵불에게 향을 공양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해변에 향목(香木)을 묻어두는 풍습의 유행, 우왕 때 사천매향비에 나타난 1,000명의 결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라. 도교
고려 시대에는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도 성행하였다.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醮祭)가 성행하였다.
고려에 이르러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이룬 것은 16대 睿宗(1106-1122)에 이르러서였다.
道觀인 福源宮을 건립하여 도교의 중흥을 꾀하였으며, 대궐에서 醮祭를 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관의 건립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성립에 이르지 못한 것은, 도교의 雜神性과 비조직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는 도교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제약점이기도 하였다.
마.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 사상이 더해져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圖讖이란 징후전조 또는 神託占言 등의
추천자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사회구조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사회구조 고려시대 불화를 통해 본 고려시대의 특성
고려시대 불화를 통해 본 고려시대의 특성 조선시대여성과 고려시대여성의 차이
조선시대여성과 고려시대여성의 차이 고려시대의 구제정책과 조선시대의 구제정책
고려시대의 구제정책과 조선시대의 구제정책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과거제도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과거제도 <고려시대의 교육과 중세시대의 교육 비교연구>
<고려시대의 교육과 중세시대의 교육 비교연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농민항쟁, 조선사림정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농민항쟁, 조선사림정치 고려시대는 귀족제인가 관료제인가 - 『한국사 시민강좌』중 「고려사회의 기본 성격」을 중...
고려시대는 귀족제인가 관료제인가 - 『한국사 시민강좌』중 「고려사회의 기본 성격」을 중... 집의 역사 -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움집의 시대), 청동기 시대, 삼국시대(고구려의 주택,...
집의 역사 -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움집의 시대), 청동기 시대, 삼국시대(고구려의 주택,... 우리나라 소방의 발달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우리나라 소방의 발달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인사행정(교육제도,과거제도)과 재무행정(토지제도,조세제도)
[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인사행정(교육제도,과거제도)과 재무행정(토지제도,조세제도) [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한국역사에서의 교육철학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교육과 철학, 개화기 민족수난기의 ...
한국역사에서의 교육철학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교육과 철학, 개화기 민족수난기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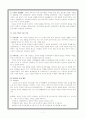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