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1. 작가 소개 - 박정애
2. 에코페미니즘 개관
Ⅱ. 본론
1. <에덴의 서쪽> 작품분석
2. <에덴의 서쪽> 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1) 여성화된 자연, 자연화된 여성
2) 생명으로서의 여성, 어머니, 어머니.
3) 글쓰기와 순환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역사
Ⅲ. 나오며
1. 작가 소개 - 박정애
2. 에코페미니즘 개관
Ⅱ. 본론
1. <에덴의 서쪽> 작품분석
2. <에덴의 서쪽> 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1) 여성화된 자연, 자연화된 여성
2) 생명으로서의 여성, 어머니, 어머니.
3) 글쓰기와 순환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역사
Ⅲ. 나오며
본문내용
계 혈통의 가족사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똥님, 윤지, 그리고 윤지의 쌍둥이 딸들로 이어지는 모녀 관계가 들어있다. 윤지는 똥님이 아프게 낳은 딸이자 곧 그녀와 한 몸이다. 아버지는 여성에 대한 배타적 성적 권리를 통해 자신의 아이라는 승인을 하지만 엄마와 아이는 본래 한 몸이며 출생이후 거부와 동경의 과정을 거쳐 아버지가 되어가는 아들과 달리 자신의 운명과 경험의 길을 갈 존재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요한 인물 중 하나는 ‘예설영’이다. 신학을 공부한 명문가의 여성의 ‘예설영’은 ‘똥님’의 동서이다. 시댁과 남편에 대한 흉보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뿐 아니라 숫자 읽기나 책 읽기 등을 통해 ‘똥님’에게 숨 쉴 구멍을 트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서는 한 이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 받는 관계를 통해 요즈음 이야기되는 ‘자매애’를 느끼게 한다. 결국 그녀의 주장으로 ‘똥님’과 함께 ‘탈출’하게 되고 자신의 아이를 ‘똥님’에게 남기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남성을 통해 연결된 가족관계가 아닌 여성 중심의 가족 관계로 재편성 된다. 이후에 ‘윤열’의 생부이자 ‘설영’의 연인이었던 남성과 ‘똥님’의 관계를 통해 이들은 더욱 견고한 모계혈통의 일원이 된다.
‘혜주’는 ‘똥님’에게 상처를 입고 날아든 새와 같은 존재였다. 공장에서 학대받은 어린아이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폭력적인 삶을 살아왔던 혜주는 모두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똥님’의 민박집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게 된다. 여기서 ‘똥님’의 공간은 자연의 공간이자 어머니의 공간이며 치유의 공간이다. ‘혜주’는 이후에 ‘똥님’의 아들인 ‘윤열’과 부부가 되는 것으로 모계가정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다. 이들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남성들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한 남성이다. 아버지로서의 남성이 의미는 있되 가부장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설영과 ‘똥님’이 맨 처음 혼인한 남성들은 생명력이 없는 남성이었고 윤지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기생하면서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똥님’과 두 번째 남편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그가 ‘윤열’을 가족으로 승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지 역시 그녀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한 후배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가 두 딸이라는 생명의 탄생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증오하며 방황하던 윤지는 어머니의 공간에 와서 안정을 찾고 삶의 평화를 맞이한다.
3) 글쓰기와 순환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역사
처음 ‘똥님’이 글을 배운 사람은 동서인 ‘예설영’이다. 여성을 통해 전승된 언어는 그녀들을 살리는 언어로 작용한다. 이불 안에서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소설들을 읽어나갈 수 있게 하는 언어는 그녀들의 삶을 생기 있고 끈기 있게 해주었다. ‘윤지’가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과 ‘똥님’이 ‘영농일지’를 쓰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락을 갖는다. ‘똥님’에게 글쓰기는 밭농사와 자식농사 같은 삶에서 핍진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적어 내려가는 그녀 스스로의 역사이자 생명력이었다. ‘윤지’ 역시 자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직업 작가로서 ‘창녀’들의 행로나 ‘연예인의 음주문화’등의 문제를 타자화시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스스로의 삶에서 우러나온 고민과 직접적으로 닿아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엄마와 나의 이야기 혹은 우리 가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써나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엄마를 그리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중심이 되기 위해 남들을 타자화 시키는 삶이 윤지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라면 스스로 아이를 낳고 엄마를 이해하며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사는 삶은 스스로 넓어짐으로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온 집 안 가득 펄럭이는 기저귀감들은 소설의 맨처음에 등장하는 ‘똥님’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연결된다. ‘똥’은 하찮지 않으며 ‘똥’과 함께 하는 삶 역시 그러하다는 것, 순환하는 여성의 역사는 맞춤법이 맞지 않는 엄마의 일기를 딸이 읽어나가고 그 딸이 다시 쓰는 이야기들만큼 강하고 끈질기다.
딸들을 낳고 나서야 나는 내 속에 언제나 있었던 자궁을, 어머니를 발견함과 동시에 내 몸을 닿아 기른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라는 오래된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비로소 몸으로 깨달았다. 당신 몸 속의 방에서 나를 키워 뼈 마디마디가 벌어지는 고통 속에서 나를 세상에 내보낸 다음 지상의 방에 나를 눕히고 내 입술의 선홍빛 점막 속으로 당신 유방의 한가운데에 돌출된 검붉은 내막을 밀어 넣은 어머니의 체험을, 나는 내 딸들을 낳는 과정에서 곱다시 공유할 수 있었다. 내 몸에 새겨져 있던 어머니의 역사를 나는 발견한 것이었다. pp. 291-292
언급했다시피, 서술자는 자신의 출산체험을 통해 여성들 사이에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역사에서 배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자각하고 여성의 역사를 쓰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경험을 회상,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쓰고자 하는 것이 서술자 개인의 역사가 아니기에 어머니와 나, 그리고 작은 엄마, 올케의 서로 다른 체험을 기술하되, 연대를 위해 경험자아는 복수(둘)인데 서술자아는 단수(하나)인 서술방법을 채택한다. 여기에서 ‘둘이면서 하나’라는 특징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특징이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III. 나 오 며
에코페미니즘의 한계
에코페미니즘 내부에는 문화 에코페미니즘과 사회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문화 에코페미니즘은 에코페미니즘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지금까지 이 흐름이 페미니즘 내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대표해 왔다. 그리고 이 점이 논쟁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본질주의적 전통에 의존하는 자연*문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자연과 연관시키는 것을 인정한다. 이들은 남성문화의 공격성, 개인주의, 위계적 사고에 대해 비난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요한 인물 중 하나는 ‘예설영’이다. 신학을 공부한 명문가의 여성의 ‘예설영’은 ‘똥님’의 동서이다. 시댁과 남편에 대한 흉보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뿐 아니라 숫자 읽기나 책 읽기 등을 통해 ‘똥님’에게 숨 쉴 구멍을 트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서는 한 이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 받는 관계를 통해 요즈음 이야기되는 ‘자매애’를 느끼게 한다. 결국 그녀의 주장으로 ‘똥님’과 함께 ‘탈출’하게 되고 자신의 아이를 ‘똥님’에게 남기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남성을 통해 연결된 가족관계가 아닌 여성 중심의 가족 관계로 재편성 된다. 이후에 ‘윤열’의 생부이자 ‘설영’의 연인이었던 남성과 ‘똥님’의 관계를 통해 이들은 더욱 견고한 모계혈통의 일원이 된다.
‘혜주’는 ‘똥님’에게 상처를 입고 날아든 새와 같은 존재였다. 공장에서 학대받은 어린아이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폭력적인 삶을 살아왔던 혜주는 모두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똥님’의 민박집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게 된다. 여기서 ‘똥님’의 공간은 자연의 공간이자 어머니의 공간이며 치유의 공간이다. ‘혜주’는 이후에 ‘똥님’의 아들인 ‘윤열’과 부부가 되는 것으로 모계가정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다. 이들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남성들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한 남성이다. 아버지로서의 남성이 의미는 있되 가부장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설영과 ‘똥님’이 맨 처음 혼인한 남성들은 생명력이 없는 남성이었고 윤지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기생하면서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똥님’과 두 번째 남편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그가 ‘윤열’을 가족으로 승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지 역시 그녀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한 후배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가 두 딸이라는 생명의 탄생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증오하며 방황하던 윤지는 어머니의 공간에 와서 안정을 찾고 삶의 평화를 맞이한다.
3) 글쓰기와 순환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역사
처음 ‘똥님’이 글을 배운 사람은 동서인 ‘예설영’이다. 여성을 통해 전승된 언어는 그녀들을 살리는 언어로 작용한다. 이불 안에서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소설들을 읽어나갈 수 있게 하는 언어는 그녀들의 삶을 생기 있고 끈기 있게 해주었다. ‘윤지’가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과 ‘똥님’이 ‘영농일지’를 쓰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락을 갖는다. ‘똥님’에게 글쓰기는 밭농사와 자식농사 같은 삶에서 핍진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적어 내려가는 그녀 스스로의 역사이자 생명력이었다. ‘윤지’ 역시 자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직업 작가로서 ‘창녀’들의 행로나 ‘연예인의 음주문화’등의 문제를 타자화시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스스로의 삶에서 우러나온 고민과 직접적으로 닿아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엄마와 나의 이야기 혹은 우리 가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써나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엄마를 그리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중심이 되기 위해 남들을 타자화 시키는 삶이 윤지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라면 스스로 아이를 낳고 엄마를 이해하며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사는 삶은 스스로 넓어짐으로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온 집 안 가득 펄럭이는 기저귀감들은 소설의 맨처음에 등장하는 ‘똥님’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연결된다. ‘똥’은 하찮지 않으며 ‘똥’과 함께 하는 삶 역시 그러하다는 것, 순환하는 여성의 역사는 맞춤법이 맞지 않는 엄마의 일기를 딸이 읽어나가고 그 딸이 다시 쓰는 이야기들만큼 강하고 끈질기다.
딸들을 낳고 나서야 나는 내 속에 언제나 있었던 자궁을, 어머니를 발견함과 동시에 내 몸을 닿아 기른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라는 오래된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비로소 몸으로 깨달았다. 당신 몸 속의 방에서 나를 키워 뼈 마디마디가 벌어지는 고통 속에서 나를 세상에 내보낸 다음 지상의 방에 나를 눕히고 내 입술의 선홍빛 점막 속으로 당신 유방의 한가운데에 돌출된 검붉은 내막을 밀어 넣은 어머니의 체험을, 나는 내 딸들을 낳는 과정에서 곱다시 공유할 수 있었다. 내 몸에 새겨져 있던 어머니의 역사를 나는 발견한 것이었다. pp. 291-292
언급했다시피, 서술자는 자신의 출산체험을 통해 여성들 사이에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역사에서 배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자각하고 여성의 역사를 쓰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경험을 회상,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쓰고자 하는 것이 서술자 개인의 역사가 아니기에 어머니와 나, 그리고 작은 엄마, 올케의 서로 다른 체험을 기술하되, 연대를 위해 경험자아는 복수(둘)인데 서술자아는 단수(하나)인 서술방법을 채택한다. 여기에서 ‘둘이면서 하나’라는 특징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특징이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III. 나 오 며
에코페미니즘의 한계
에코페미니즘 내부에는 문화 에코페미니즘과 사회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문화 에코페미니즘은 에코페미니즘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지금까지 이 흐름이 페미니즘 내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대표해 왔다. 그리고 이 점이 논쟁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본질주의적 전통에 의존하는 자연*문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자연과 연관시키는 것을 인정한다. 이들은 남성문화의 공격성, 개인주의, 위계적 사고에 대해 비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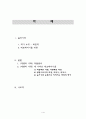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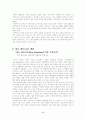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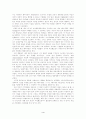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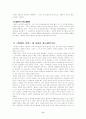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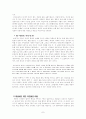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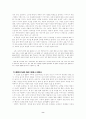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