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래
2. 특징
1) 고개의 의미
2) 음과 장단의 매력
3) 진솔성
4) 형식의 용이성
5) 색정성
6) 저항성
7) 시대상의 반영
3. 종류
1) 정선 아리랑
2) 밀양 아리랑
3) 진도 아리랑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래
2. 특징
1) 고개의 의미
2) 음과 장단의 매력
3) 진솔성
4) 형식의 용이성
5) 색정성
6) 저항성
7) 시대상의 반영
3. 종류
1) 정선 아리랑
2) 밀양 아리랑
3) 진도 아리랑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아이롱 불문원납성(但願我耳聾 不聞願納聲:원하노니 내 귀나 어두워져라, 원납소리 듣기도 싫구나” 하고 부른 ‘아이롱(我耳聾)’이 ‘아리랑’ 으로 와전되었다.
④ 아리랑설(我離娘說) : 역시 대원군시절 경복궁 공사에 부역 온 인부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에 시달린 백성들은 오랜 고독으로 인하여 고향에 두고 온 처자를 몹시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妻)와 떨어져 살기 힘든 자신”들의 심정을 ‘我離娘’으로 표현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아리랑으로 변하여 불려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2. 특징
1) 고개의 의미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꽃씨와도 같다. 우리 민족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그곳의 토양에 맞게 다양한 내용의 노랫말에 녹아든다. 하지만 아리랑에는 늘 ‘아리랑고개’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아리랑에서의 고개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개는 산을 모태로 한다. 산이 유달리 많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산을 신성시 하고 산에 대한 믿음 또한 강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그 너머의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가는 통로이기에 언제나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곳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 마루에 서낭당을 세워 신성시 했고, 장승을 세우거나 돌탑을 쌓아 마을의 경계이자 수호신으로 여기며 넘어갈 때마다 안녕을 빌곤 했다.
우리 조상들은 고개를 오르내리는 것을 인생에 비유했다. 아리랑 고개를 열두 고개로 표현하는 것도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표현한 것이다. 12수(數)는 12지(十二支)와 일 년 열두 달을 상징하는 수로, 우리 민족이 저승에 이르기 위해 지나야 하는 열 두 대문을 상징 하기도 한다. 열 두 대문을 지날 때마다 갖가지 시련이 있으며,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갠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해주아리랑>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월강곡>
울며 넘던 피눈물의 아리랑 고개
한번가면 다시 못 올 탄식의 고개 <기쁨의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혁명의 고개 < 혁명의 아리랑>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서
백두산 고개를 넘어간다 <신아리랑>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아리랑 고개는 좌절과 시련의 역사, 그리고 이를 극복한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다. 아리랑 고개는 괴나리못짐을 짊어지고 넘던 고개였고, 눈물을 뿌리며 넘던 고개이기도 했다. EH한 백두산을 넘나들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일제와 싸우는 토사들에게는 혁명의 고개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실존의 고개이든 상징의 고개이든지 아리랑 고개가 많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 민족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아리랑 고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극복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아리랑 가사를 보아도 “아리랑 고개로(를) 넘어간다”고 했지, 넘어보니 어떻더라는 내용은 없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의 아리랑 고개는 결국 자신들이 처한 삶 속에서 꼭 넘어서야만 하는 현실과도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거라
아리랑고개는 이전의 슬픔이나 탄식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약동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아리랑 고개는 미지의 세계이자 불멸의 세계로 자리하고 있다.
2) 음과 장단의 매력
<청산별곡>의 “얄리얄리 얄라성”과 같은 고대가요의 후렴을 분석을 한 결과는 ‘아,이’음, 그리고 ‘ㄹ,ㅇ’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이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음소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아리랑>은 바로 그 음소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다.
<아/리/랑>이란 장단도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박자이다. 그 예로 울음소리인 “아이고-아이고”의 곡성이 세마치 장단인데 <아리랑>이 이를 닮아 있고, 친족어와 감탄사에도 세 음절이 압도적으로 많다. ‘어머니’‘아버지’‘할머니’‘할애비’등과 감탄사로 ‘어이구’‘어머나’‘아이야’등 이 세마치 장단 3음절(세마디)은 우리에게 흥과 신명을 돋궈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아리랑>이 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성깔에 잘 맞아 떨어진다는 매력을 지녔다.
3) 진솔성
아리랑은 눈에 비치고, 실감되고, 피부에 와 닿는 모든 사상(事象)과 정서와 사유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표출하고 있다. 복잡하게 표현할 상상력과 창작력 또한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의 차이와 거리에서 오는 결과이다.
a. 세상텬지에 남자도 만컨만
나는 왜 요리 혼자 사나 <서울>
b.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싸이지
사시상철 님 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정선>
c. 알뜰살뜰 오순도순 약속을 하고
녹두나물 변하듯 싹 톨아졌네 <해주>
d. 무정한 세월아 오고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백발이 되었네 <정선진도>
a는 짝없는 고통의 아픔을, b는 상사의 아픔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다. c는 약속을 저버린 님을 녹두나물의 쉼에 비유하는 토속적인 해학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진지하기만 하다. d는 탄로유감(嘆老有感)의 심사가 수식 없이 직선적으로 그려져 있다.
4) 형식의 용이성
벼개가 높거들랑 내 팔을 비고
아실아실 춥거들랑 내 품에 들게
<강릉아리랑>
청천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서울아리랑>
삽교노 신마찌엔 게다짝소리
상해라 홍구공원에 폭탄소리
<광복군 아리랑>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밀양아리랑>
이상의 여러 아리랑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2행(行) 1연(聯)에 후렴을 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형식은 듣기와 기억을 쉽게 하여 즉흥성을 촉발케 하는 잠재력이 강하다. 말하자면 즉흥부(노랫말)와 고정부(후렴)로 나누어 즉흥부만 담당하면 되 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해서 개인에게든 집단에게든,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리랑>이 우선 소리질러지는 것이다.
5) 색정성
저놈의 가시내 눈매를 보소
겉눈만 감고서 속눈은 떴네
저 건너 저 가시네 속곳 밑 보아라
대목장 볼라고 홍당목 젓네
갈보라 하는 것이 씨종자가 있는가
놈사정 볼라다 내가 떼갈보 되
④ 아리랑설(我離娘說) : 역시 대원군시절 경복궁 공사에 부역 온 인부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에 시달린 백성들은 오랜 고독으로 인하여 고향에 두고 온 처자를 몹시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妻)와 떨어져 살기 힘든 자신”들의 심정을 ‘我離娘’으로 표현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아리랑으로 변하여 불려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2. 특징
1) 고개의 의미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꽃씨와도 같다. 우리 민족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그곳의 토양에 맞게 다양한 내용의 노랫말에 녹아든다. 하지만 아리랑에는 늘 ‘아리랑고개’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아리랑에서의 고개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개는 산을 모태로 한다. 산이 유달리 많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산을 신성시 하고 산에 대한 믿음 또한 강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그 너머의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가는 통로이기에 언제나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곳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 마루에 서낭당을 세워 신성시 했고, 장승을 세우거나 돌탑을 쌓아 마을의 경계이자 수호신으로 여기며 넘어갈 때마다 안녕을 빌곤 했다.
우리 조상들은 고개를 오르내리는 것을 인생에 비유했다. 아리랑 고개를 열두 고개로 표현하는 것도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표현한 것이다. 12수(數)는 12지(十二支)와 일 년 열두 달을 상징하는 수로, 우리 민족이 저승에 이르기 위해 지나야 하는 열 두 대문을 상징 하기도 한다. 열 두 대문을 지날 때마다 갖가지 시련이 있으며,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갠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해주아리랑>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월강곡>
울며 넘던 피눈물의 아리랑 고개
한번가면 다시 못 올 탄식의 고개 <기쁨의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혁명의 고개 < 혁명의 아리랑>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서
백두산 고개를 넘어간다 <신아리랑>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아리랑 고개는 좌절과 시련의 역사, 그리고 이를 극복한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다. 아리랑 고개는 괴나리못짐을 짊어지고 넘던 고개였고, 눈물을 뿌리며 넘던 고개이기도 했다. EH한 백두산을 넘나들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일제와 싸우는 토사들에게는 혁명의 고개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실존의 고개이든 상징의 고개이든지 아리랑 고개가 많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 민족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아리랑 고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극복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아리랑 가사를 보아도 “아리랑 고개로(를) 넘어간다”고 했지, 넘어보니 어떻더라는 내용은 없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의 아리랑 고개는 결국 자신들이 처한 삶 속에서 꼭 넘어서야만 하는 현실과도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거라
아리랑고개는 이전의 슬픔이나 탄식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약동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아리랑 고개는 미지의 세계이자 불멸의 세계로 자리하고 있다.
2) 음과 장단의 매력
<청산별곡>의 “얄리얄리 얄라성”과 같은 고대가요의 후렴을 분석을 한 결과는 ‘아,이’음, 그리고 ‘ㄹ,ㅇ’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이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음소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아리랑>은 바로 그 음소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다.
<아/리/랑>이란 장단도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박자이다. 그 예로 울음소리인 “아이고-아이고”의 곡성이 세마치 장단인데 <아리랑>이 이를 닮아 있고, 친족어와 감탄사에도 세 음절이 압도적으로 많다. ‘어머니’‘아버지’‘할머니’‘할애비’등과 감탄사로 ‘어이구’‘어머나’‘아이야’등 이 세마치 장단 3음절(세마디)은 우리에게 흥과 신명을 돋궈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아리랑>이 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성깔에 잘 맞아 떨어진다는 매력을 지녔다.
3) 진솔성
아리랑은 눈에 비치고, 실감되고, 피부에 와 닿는 모든 사상(事象)과 정서와 사유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표출하고 있다. 복잡하게 표현할 상상력과 창작력 또한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의 차이와 거리에서 오는 결과이다.
a. 세상텬지에 남자도 만컨만
나는 왜 요리 혼자 사나 <서울>
b.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싸이지
사시상철 님 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정선>
c. 알뜰살뜰 오순도순 약속을 하고
녹두나물 변하듯 싹 톨아졌네 <해주>
d. 무정한 세월아 오고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백발이 되었네 <정선진도>
a는 짝없는 고통의 아픔을, b는 상사의 아픔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다. c는 약속을 저버린 님을 녹두나물의 쉼에 비유하는 토속적인 해학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진지하기만 하다. d는 탄로유감(嘆老有感)의 심사가 수식 없이 직선적으로 그려져 있다.
4) 형식의 용이성
벼개가 높거들랑 내 팔을 비고
아실아실 춥거들랑 내 품에 들게
<강릉아리랑>
청천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서울아리랑>
삽교노 신마찌엔 게다짝소리
상해라 홍구공원에 폭탄소리
<광복군 아리랑>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밀양아리랑>
이상의 여러 아리랑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2행(行) 1연(聯)에 후렴을 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형식은 듣기와 기억을 쉽게 하여 즉흥성을 촉발케 하는 잠재력이 강하다. 말하자면 즉흥부(노랫말)와 고정부(후렴)로 나누어 즉흥부만 담당하면 되 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해서 개인에게든 집단에게든,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리랑>이 우선 소리질러지는 것이다.
5) 색정성
저놈의 가시내 눈매를 보소
겉눈만 감고서 속눈은 떴네
저 건너 저 가시네 속곳 밑 보아라
대목장 볼라고 홍당목 젓네
갈보라 하는 것이 씨종자가 있는가
놈사정 볼라다 내가 떼갈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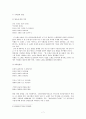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