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역사적 권역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
2. 동아시아 세계에서 문명의 개념
3. 근대적 세계로의 전입과정
4.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명담론들
5. 식민지시기 우리 문화의 인식 문제
2. 동아시아 세계에서 문명의 개념
3. 근대적 세계로의 전입과정
4.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명담론들
5. 식민지시기 우리 문화의 인식 문제
본문내용
. 이는 성인의 공능이니 자고로 요·순이나 공자에게 부여되었던 ‘문’의 개념이다. 이 문채(文彩), 이 문덕(文德)이 찬연히 빛나는 상태 그것을 일러 ‘문명’이라 했던 것이다.
주역(周易)의 논리를 보면 인간 만사의 변화를 해명함에 있어 문명이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 첫머리 건괘(乾卦)의 문언(文言)에서부터 “출현한 용이 지상에 있음에 천하가 문명한다.(見龍在田 天下文明)”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이어 분괘(賁卦)에 와서는 ‘분(賁)’이란 괘이름 자체가 인간이 공력을 가해 빛나게 되는 상태, 즉 문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상에 문명이 펼쳐지는 형상 거기에 인문이란 개념이 부여된다. 그리하여 “인문에서 관찰하여 천하를 화성한다.(觀乎人文 化成天下: 化成天下는 經天緯地와 같은 의미)”고 하였으니 문명은 인류적 이상의 구현태인 셈이다. 곧 “출현한 용이 지상에 있음에 천하가 문명한다”와 의미 맥락이 상통하는 것이다. 용이란 상징물은 이 경우 성인을 암시할 터인데 직접적으로는 양기운을 뜻한다. 에너지를 문명의 시발로 사고한 것으로 붙여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해가 떠서 어둠이 가시고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가리켜 문명이라 이르기도 하였다.
고려의 시인 진화(陳)의 시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노니 하늘 동쪽으로 해가 붉게 떠오르려네(坐待文明旦 天東日欲紅)”는 바로 이 뜻을 취해 쓴 것이다. 이 시의 문면에서 문명의 일차적 어의는 해가 떠서 밝아지는 자연현상을 가리킨다. 그 자연현상을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붙인 뜻이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앞 구절에서 “북쪽 변방은 아직 혼몽하다(北塞尙昏蒙)”고 하였은즉 ‘문명의 아침’은 어둡고 미개한 상태에 대조되는 것이다. 비록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문명의 의미가 야만에 상대적 개념으로 떠오른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실학파의 학자들에 이르러 문명은 이 개념으로 확실히 잡혀지게 된다. 정약용의 글에서 중국의 경우 문명이 지방에까지 보급되어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 서울 도성 밖으로 십리만 벗어나도 홍황세계나 다름없다라고 말한 곳이 있다. 홍황세계에 대조되는 개념의 문명, 그 원적지는 아무래도 중국일 터이며, 조선의 그 현주소는 수도 서울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문’의 독특한 의미에 기초해서 성립·발전한 동양적(중국적) 개념의 문명이 한자문화권으로 구현된 사실은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다음에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중국 문명의 위상과 그것의 주변부와의 관계를 간략히 짚어보기로 한다.
이 권역에서 중국은 비중이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워낙 막대하다. 중국이란 나라는 자고로 흥망·교체의 무상한 변천을 거듭했으되 하여간 그 세계에서는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꾸준히 판도를 확대, 인종을 포괄하여 오늘에 이르지 않았던가. 유럽 지역을 비롯한 여러 권역과는 전혀 다른, 동아시아의 특수한 정황이다.
문명 역시 중국을 벗어나서는 개념 범주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역사상 상·주(商周)로부터 한·당·송(漢唐宋)으로 이어진 문화전통이 적어도 이 권역에서는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식, 통행되고 있었다. ‘화하문명(華夏文明)’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에 문명의 중심부로서의 중화에 대하여 그 주변의 인종 지역은 고대 그리스인이 페르시아를 ‘바르바르’라고 불렀듯 야만시하였다. 인종을 구분하던 화이(華夷)란 말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문화론적 개념으로 전이된다. 문명은 그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파급되는 것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한 일로 생각했으니, ‘용하변이(用夏變夷)’가 그것이다. 화하의 문명을 가지고 야만적인 주변부의 인종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형성된 한자문명권은 조공(朝貢)이라는 형식으로 국제관계의 질서를 유지해 왔다. 이 조공체제는 중세기 중국 중심적 세계질서를 반영한 형태였음이 물론이다. 우리 한반도는 중국중심적 세계에서 비록 주변부에 속했으나 소중화(小中華)로 자부했을 뿐아니라 그처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반면에 일본은 그 세계체제에서 주변부의 주변부로 치부되었다. 주로 지리적 거리 때문이었겠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인 스스로 당착된 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자기들의 영역을 신주(神州)로 자부하는 등 일본중심의 천하관을 내세우는 한편 중심부로 기울어진 마음은 마치 꿈속에서 임을 그리듯 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17세기에 조선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대하여 ‘당인(唐人)’으로 일컬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중국과의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조선인을 통해 중국문화(중심부)에 대한 짝사랑을 해소했던 셈이다. ‘소중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얻었다고나 할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소중화란 떳떳지 못하게 의식되는 면이 있거니와, 일본은 중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관계가 도리어 자존심을 높여주는 재료가 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앞서 언급한 바 항시 한족이 주인 노릇한 것은 아니었다. 가까운 역사를 보더라도 몽골족의 원에서 한족의 명으로 넘어온 이후로도 다시 만주족의 청이 들어섰다가는 20세기로 들어서 한족의 주권을 겨우 회복한 것이다. 이런 역사의 실제 상황에 화이론은 어떻게 굴절을 하였던가? 예컨대 17세기 청황제 체제의 등장에 대해 우리 조선왕조의 집권세력은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이념에 입각해서 북벌(北伐)을 국시로 내세웠던 것이다.
청황제 체제는 ‘천하일통(一統)’에 ‘화이일가(華夷一家)’의 논리를 세워 중국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청의 옹정제가 조칙에서 밝힌 말인데 한·당·송의 전성시에도 북적(北狄) · 서융(西戎)은 신복(臣服)하지 않아 변방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금 자기들이 들어와서 군주의 자리에 앉은 이후로 ‘천하일통’이 보다 광역으로 완수되어 화이의 구분을 해소하는 대통합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한족(漢族)본위로부터 ‘화이일가’로 지양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문명 또한 화이를 혼합하는 형태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황제들이 제이수도로 건설했던 열하(熱河)의 피서산장(避暑山莊)이 증언하고 있는 바다. 그곳의 궁전과 사원의 현판들을 보면 모두 한·만·몽(漢·滿·蒙)의 문자를 같이 쓰고 있거니와, 화하의 전통에 티
주역(周易)의 논리를 보면 인간 만사의 변화를 해명함에 있어 문명이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 첫머리 건괘(乾卦)의 문언(文言)에서부터 “출현한 용이 지상에 있음에 천하가 문명한다.(見龍在田 天下文明)”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이어 분괘(賁卦)에 와서는 ‘분(賁)’이란 괘이름 자체가 인간이 공력을 가해 빛나게 되는 상태, 즉 문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상에 문명이 펼쳐지는 형상 거기에 인문이란 개념이 부여된다. 그리하여 “인문에서 관찰하여 천하를 화성한다.(觀乎人文 化成天下: 化成天下는 經天緯地와 같은 의미)”고 하였으니 문명은 인류적 이상의 구현태인 셈이다. 곧 “출현한 용이 지상에 있음에 천하가 문명한다”와 의미 맥락이 상통하는 것이다. 용이란 상징물은 이 경우 성인을 암시할 터인데 직접적으로는 양기운을 뜻한다. 에너지를 문명의 시발로 사고한 것으로 붙여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해가 떠서 어둠이 가시고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가리켜 문명이라 이르기도 하였다.
고려의 시인 진화(陳)의 시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노니 하늘 동쪽으로 해가 붉게 떠오르려네(坐待文明旦 天東日欲紅)”는 바로 이 뜻을 취해 쓴 것이다. 이 시의 문면에서 문명의 일차적 어의는 해가 떠서 밝아지는 자연현상을 가리킨다. 그 자연현상을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붙인 뜻이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앞 구절에서 “북쪽 변방은 아직 혼몽하다(北塞尙昏蒙)”고 하였은즉 ‘문명의 아침’은 어둡고 미개한 상태에 대조되는 것이다. 비록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문명의 의미가 야만에 상대적 개념으로 떠오른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실학파의 학자들에 이르러 문명은 이 개념으로 확실히 잡혀지게 된다. 정약용의 글에서 중국의 경우 문명이 지방에까지 보급되어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 서울 도성 밖으로 십리만 벗어나도 홍황세계나 다름없다라고 말한 곳이 있다. 홍황세계에 대조되는 개념의 문명, 그 원적지는 아무래도 중국일 터이며, 조선의 그 현주소는 수도 서울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문’의 독특한 의미에 기초해서 성립·발전한 동양적(중국적) 개념의 문명이 한자문화권으로 구현된 사실은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다음에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중국 문명의 위상과 그것의 주변부와의 관계를 간략히 짚어보기로 한다.
이 권역에서 중국은 비중이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워낙 막대하다. 중국이란 나라는 자고로 흥망·교체의 무상한 변천을 거듭했으되 하여간 그 세계에서는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꾸준히 판도를 확대, 인종을 포괄하여 오늘에 이르지 않았던가. 유럽 지역을 비롯한 여러 권역과는 전혀 다른, 동아시아의 특수한 정황이다.
문명 역시 중국을 벗어나서는 개념 범주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역사상 상·주(商周)로부터 한·당·송(漢唐宋)으로 이어진 문화전통이 적어도 이 권역에서는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식, 통행되고 있었다. ‘화하문명(華夏文明)’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에 문명의 중심부로서의 중화에 대하여 그 주변의 인종 지역은 고대 그리스인이 페르시아를 ‘바르바르’라고 불렀듯 야만시하였다. 인종을 구분하던 화이(華夷)란 말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문화론적 개념으로 전이된다. 문명은 그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파급되는 것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한 일로 생각했으니, ‘용하변이(用夏變夷)’가 그것이다. 화하의 문명을 가지고 야만적인 주변부의 인종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형성된 한자문명권은 조공(朝貢)이라는 형식으로 국제관계의 질서를 유지해 왔다. 이 조공체제는 중세기 중국 중심적 세계질서를 반영한 형태였음이 물론이다. 우리 한반도는 중국중심적 세계에서 비록 주변부에 속했으나 소중화(小中華)로 자부했을 뿐아니라 그처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반면에 일본은 그 세계체제에서 주변부의 주변부로 치부되었다. 주로 지리적 거리 때문이었겠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인 스스로 당착된 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자기들의 영역을 신주(神州)로 자부하는 등 일본중심의 천하관을 내세우는 한편 중심부로 기울어진 마음은 마치 꿈속에서 임을 그리듯 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17세기에 조선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대하여 ‘당인(唐人)’으로 일컬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중국과의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조선인을 통해 중국문화(중심부)에 대한 짝사랑을 해소했던 셈이다. ‘소중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얻었다고나 할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소중화란 떳떳지 못하게 의식되는 면이 있거니와, 일본은 중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관계가 도리어 자존심을 높여주는 재료가 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앞서 언급한 바 항시 한족이 주인 노릇한 것은 아니었다. 가까운 역사를 보더라도 몽골족의 원에서 한족의 명으로 넘어온 이후로도 다시 만주족의 청이 들어섰다가는 20세기로 들어서 한족의 주권을 겨우 회복한 것이다. 이런 역사의 실제 상황에 화이론은 어떻게 굴절을 하였던가? 예컨대 17세기 청황제 체제의 등장에 대해 우리 조선왕조의 집권세력은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이념에 입각해서 북벌(北伐)을 국시로 내세웠던 것이다.
청황제 체제는 ‘천하일통(一統)’에 ‘화이일가(華夷一家)’의 논리를 세워 중국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청의 옹정제가 조칙에서 밝힌 말인데 한·당·송의 전성시에도 북적(北狄) · 서융(西戎)은 신복(臣服)하지 않아 변방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금 자기들이 들어와서 군주의 자리에 앉은 이후로 ‘천하일통’이 보다 광역으로 완수되어 화이의 구분을 해소하는 대통합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한족(漢族)본위로부터 ‘화이일가’로 지양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문명 또한 화이를 혼합하는 형태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황제들이 제이수도로 건설했던 열하(熱河)의 피서산장(避暑山莊)이 증언하고 있는 바다. 그곳의 궁전과 사원의 현판들을 보면 모두 한·만·몽(漢·滿·蒙)의 문자를 같이 쓰고 있거니와, 화하의 전통에 티
추천자료
 한국사회문화의 특성과 교육의 위기
한국사회문화의 특성과 교육의 위기 한국음식문화
한국음식문화 [사회과학] 한국행정문화
[사회과학] 한국행정문화 한국문화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문화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역사 속 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특징 드러내기
역사 속 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특징 드러내기 [세시풍속][계절별 세시풍속][월별 세시풍속][띠별 세시풍속][12지신][12간지 세시풍속]세시...
[세시풍속][계절별 세시풍속][월별 세시풍속][띠별 세시풍속][12지신][12간지 세시풍속]세시... [문화연구입문A+] 한국문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혼종성
[문화연구입문A+] 한국문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혼종성 한국전통문화 활동화를 위한 정부에서의역할
한국전통문화 활동화를 위한 정부에서의역할 [문화심리] 한국문화 맞춤 상담
[문화심리] 한국문화 맞춤 상담 [전통문화] 숫자라는 코드 - 한국의전통문화.ppt
[전통문화] 숫자라는 코드 - 한국의전통문화.ppt 인간발달과 사회복지실천-다문화가정,한국사회문화변화
인간발달과 사회복지실천-다문화가정,한국사회문화변화 2014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체험한 문화관광 긍정적 부정적측면)
2014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체험한 문화관광 긍정적 부정적측면) 2016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체험한 문화자원의 역사적 배경)
2016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체험한 문화자원의 역사적 배경) 2017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B형(문화자원 직접체험)
2017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B형(문화자원 직접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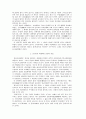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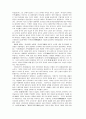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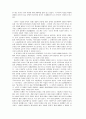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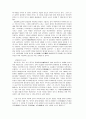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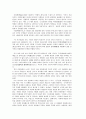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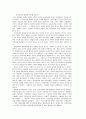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