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p1
2. 수로왕릉(金首露王陵)-p1
3. 수로왕비릉[首露王妃陵]-p2
4. 국립김해박물관-p3
1) 구석기 ~ 철기
2) 가야(加耶)
① 아라가야
② 금관가야
③ 대가야
④ 소가야
⑤ 가야의 멸망
5. 박물관을 나서며..-p12
2. 수로왕릉(金首露王陵)-p1
3. 수로왕비릉[首露王妃陵]-p2
4. 국립김해박물관-p3
1) 구석기 ~ 철기
2) 가야(加耶)
① 아라가야
② 금관가야
③ 대가야
④ 소가야
⑤ 가야의 멸망
5. 박물관을 나서며..-p12
본문내용
다. 내가 깜빡잊고 플래쉬 설정을 하지 않아 플래쉬가 터지게 해 놓았던 것이다. 친구가 무식한 티낸다고 놀려 댔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의 토기였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는 다른 토기에 비해 고운 점토를 사용해서 만든 붉은간토기와 가지무늬토기가 자주 나온다.
붉은간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붉은 안료를 발라서 간 토기를 말하며, 적색마연토기(赤色磨硏土器)ㆍ홍도(紅陶) 등으로도 불린다. 대동강유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지역에서 출토되지만, 동북지방과 남부지방에 많다.
가지무늬토기는 토기의 몸통에 흑색의 가지무늬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무늬를 내는 방법은 도구로 새기거나 물감으로 그려 넣는 것이 아니라, 무늬를 넣고자 하는 부위에 식물 등의 유기물질을 놓고 열을 가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로 무덤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용기라고 할 수 있으며, 경상도ㆍ전라도 등 남부지방에서만 출토된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를 보고 돌아나오는 중앙에 큰 전시물이 있다. 그것은 환호로 둘러 싸인 마을을 나타낸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마을은 다른 마을과 경계를 구분하거나 다른 집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을 주위로 돌아가면서 도랑[環濠]을 파고 나무울타리[木柵]를 세웠는데, 이런 모습의 마을을 환호취락(環濠聚落)이라고 한다.
농경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인구도 늘어난다.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작지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집단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환호와 같은 방어시설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청동기시대의 마을유적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동남부지방의 대표적인 환호취락으로는 울산 검단리, 창원 남산, 진주 대평리유적 등이 있다.
그옆에는 대표적인 돌과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있는데 돌로 만든 무기는 간돌검[磨製石劍], 간돌창[磨製石槍], 간돌살촉[磨製石鏃]이 있다. 간돌검은 자루를 함께 제작한 자루식(有柄式)과 나무로 만든 자루에 끼워서 사용하는 슴베식[有莖式]의 두 가지가 있다. 돌창은 나무로 만든 긴 자루의 끝에 매달아 짐승이나 적을 찌르는데 사용하였다. 돌살촉도 수렵과 전투에 사용한 것인데 처음에는 뿌리가 없는 것[無莖式石鏃]을 사용하다가 뿌리가 있는 것[有莖式石鏃]으로 바뀐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로는 청동검[銅劍], 청동투겁창[銅?], 청동살촉[銅鏃] 등이 있으며, 주로 무덤에서 많이 출토된다. 청동검은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사용된 요령식동검(遼寧式銅劍)과 후기에 사용된 한국식동검(韓國式銅劍)이 있다.
요령식동검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처음 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 형태는 날의 중간에 돌기를 두고 그 위쪽과 아래쪽 부분이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비파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해서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이라고도 한다. 손잡이 부분은 나무 등으로 따로 만들어 끼워서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지방에서 출토되는 요령식동검은 뿌리의 한 쪽에 홈이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식동검은 요령식동검에서 변화된 보다 세장(細長)한 형태이다. 중간에 결입부가 있는 점이나 손잡이를 따로 제작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날이 있는 몸통부분이 직선적으로 처리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다.
민무늬토기란 말 그대로 무늬가 없는 토기를 말하지만, 토기의 아가리 주변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도 많다. 경남지역에서 나오는 민무늬토기는 아가리 주변에 새긴 무늬에 따라 덧띠새김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 겹아가리토기[二重口緣土器], 골아가리토기[口脣刻目文土器], 구멍무늬토기[孔列文土器], 빗금무늬토기[短斜線文土器], 덧띠토기[粘土帶土器] 등으로 나누어지고, 토기의 모양에 따라서는 바리[鉢形土器], 항아리[壺形土器]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있는데, 처음 출토된 유적의 이름을 따서 가락리식(可樂里式)토기, 역삼동식(驛三洞式)토기, 흔암리식(欣岩里式)토기, 송국리식(松菊里式)토기 등으로도 불려진다. 남한의 민무늬토기문화는 토기의 형태와 새겨진 무늬에 따라 크게 전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기(前期)〉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에 뒤이어 아가리에 덧띠를 붙인 덧띠새김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가 나타나면서 민무늬토기가 시작된다. 이어서 겹아가리에 빗금무늬가 있는 가락리식(可樂里式)토기, 구멍무늬와 골아가리무늬가 있는 역삼동식토기(驛三洞式)가 유행한다. 이후 이 두 가지 토기의 특징이 혼합된 흔암리식(欣岩里式)토기가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다.
〈중기(中期)〉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처음 발견된 짧게 벌어진 아가리를 특징으로 하는 송국리식토기가 새로이 나타나서 중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된다. 이와 함께 붉은간토기와 가지무늬토기도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 그리고 앞단계에 유행했던 구멍무늬나 빗금무늬의 토기도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가리 주변의 무늬가 거의 없어지는 시기이다
〈후기(後期)〉
이전에 있었던 구멍무늬나 빗금무늬의 토기, 그리고 송국리식토기는 모두 없어지고, 아가리에 단면 원형과 삼각형의 점토띠를 붙인 덧띠토기와 검은간토기[黑陶長頸壺]가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쇠뿔모양손잡이토기[牛角形把手附壺], 굽다리접시[豆形土器] 등도 함께 사용되었다.
진주 대평리(大坪里), 울산 옥현(玉峴), 밀양 살내ㆍ금천리(琴川里)유적의 청동기시대 마을에서는 논과 밭이 확인되었다. 논은 구릉 사이의 낮은 곳에 만들었는데, 논바닥, 두둑, 수로(水路) 등이 확인되어 당시 논의 구조를 알 수 있었고, 논바닥에서는 당시 사람의 발자국, 경작도구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대평리유적에서 보이는 대규모 밭은 고랑과 두둑이 잘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들 유적에서는 하천에서부터 자연제방, 밭, 환호, 주거지, 논, 습지가 순서있게 확인되어 마을 전체의 구조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농경도구로서는 반달돌칼[半月形石刀], 돌낫[石鎌], 돌괭이[石鋤], 돌보습, 그리고 나무로 만든 각종의 도구가 있다. 현재 나무로 만든 도구는
다음은 청동기 시대의 토기였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는 다른 토기에 비해 고운 점토를 사용해서 만든 붉은간토기와 가지무늬토기가 자주 나온다.
붉은간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붉은 안료를 발라서 간 토기를 말하며, 적색마연토기(赤色磨硏土器)ㆍ홍도(紅陶) 등으로도 불린다. 대동강유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지역에서 출토되지만, 동북지방과 남부지방에 많다.
가지무늬토기는 토기의 몸통에 흑색의 가지무늬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무늬를 내는 방법은 도구로 새기거나 물감으로 그려 넣는 것이 아니라, 무늬를 넣고자 하는 부위에 식물 등의 유기물질을 놓고 열을 가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로 무덤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용기라고 할 수 있으며, 경상도ㆍ전라도 등 남부지방에서만 출토된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를 보고 돌아나오는 중앙에 큰 전시물이 있다. 그것은 환호로 둘러 싸인 마을을 나타낸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마을은 다른 마을과 경계를 구분하거나 다른 집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을 주위로 돌아가면서 도랑[環濠]을 파고 나무울타리[木柵]를 세웠는데, 이런 모습의 마을을 환호취락(環濠聚落)이라고 한다.
농경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인구도 늘어난다.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작지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집단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환호와 같은 방어시설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청동기시대의 마을유적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동남부지방의 대표적인 환호취락으로는 울산 검단리, 창원 남산, 진주 대평리유적 등이 있다.
그옆에는 대표적인 돌과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있는데 돌로 만든 무기는 간돌검[磨製石劍], 간돌창[磨製石槍], 간돌살촉[磨製石鏃]이 있다. 간돌검은 자루를 함께 제작한 자루식(有柄式)과 나무로 만든 자루에 끼워서 사용하는 슴베식[有莖式]의 두 가지가 있다. 돌창은 나무로 만든 긴 자루의 끝에 매달아 짐승이나 적을 찌르는데 사용하였다. 돌살촉도 수렵과 전투에 사용한 것인데 처음에는 뿌리가 없는 것[無莖式石鏃]을 사용하다가 뿌리가 있는 것[有莖式石鏃]으로 바뀐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로는 청동검[銅劍], 청동투겁창[銅?], 청동살촉[銅鏃] 등이 있으며, 주로 무덤에서 많이 출토된다. 청동검은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사용된 요령식동검(遼寧式銅劍)과 후기에 사용된 한국식동검(韓國式銅劍)이 있다.
요령식동검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처음 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 형태는 날의 중간에 돌기를 두고 그 위쪽과 아래쪽 부분이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비파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해서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이라고도 한다. 손잡이 부분은 나무 등으로 따로 만들어 끼워서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지방에서 출토되는 요령식동검은 뿌리의 한 쪽에 홈이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식동검은 요령식동검에서 변화된 보다 세장(細長)한 형태이다. 중간에 결입부가 있는 점이나 손잡이를 따로 제작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날이 있는 몸통부분이 직선적으로 처리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다.
민무늬토기란 말 그대로 무늬가 없는 토기를 말하지만, 토기의 아가리 주변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도 많다. 경남지역에서 나오는 민무늬토기는 아가리 주변에 새긴 무늬에 따라 덧띠새김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 겹아가리토기[二重口緣土器], 골아가리토기[口脣刻目文土器], 구멍무늬토기[孔列文土器], 빗금무늬토기[短斜線文土器], 덧띠토기[粘土帶土器] 등으로 나누어지고, 토기의 모양에 따라서는 바리[鉢形土器], 항아리[壺形土器]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있는데, 처음 출토된 유적의 이름을 따서 가락리식(可樂里式)토기, 역삼동식(驛三洞式)토기, 흔암리식(欣岩里式)토기, 송국리식(松菊里式)토기 등으로도 불려진다. 남한의 민무늬토기문화는 토기의 형태와 새겨진 무늬에 따라 크게 전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기(前期)〉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에 뒤이어 아가리에 덧띠를 붙인 덧띠새김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가 나타나면서 민무늬토기가 시작된다. 이어서 겹아가리에 빗금무늬가 있는 가락리식(可樂里式)토기, 구멍무늬와 골아가리무늬가 있는 역삼동식토기(驛三洞式)가 유행한다. 이후 이 두 가지 토기의 특징이 혼합된 흔암리식(欣岩里式)토기가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다.
〈중기(中期)〉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처음 발견된 짧게 벌어진 아가리를 특징으로 하는 송국리식토기가 새로이 나타나서 중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된다. 이와 함께 붉은간토기와 가지무늬토기도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 그리고 앞단계에 유행했던 구멍무늬나 빗금무늬의 토기도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가리 주변의 무늬가 거의 없어지는 시기이다
〈후기(後期)〉
이전에 있었던 구멍무늬나 빗금무늬의 토기, 그리고 송국리식토기는 모두 없어지고, 아가리에 단면 원형과 삼각형의 점토띠를 붙인 덧띠토기와 검은간토기[黑陶長頸壺]가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쇠뿔모양손잡이토기[牛角形把手附壺], 굽다리접시[豆形土器] 등도 함께 사용되었다.
진주 대평리(大坪里), 울산 옥현(玉峴), 밀양 살내ㆍ금천리(琴川里)유적의 청동기시대 마을에서는 논과 밭이 확인되었다. 논은 구릉 사이의 낮은 곳에 만들었는데, 논바닥, 두둑, 수로(水路) 등이 확인되어 당시 논의 구조를 알 수 있었고, 논바닥에서는 당시 사람의 발자국, 경작도구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대평리유적에서 보이는 대규모 밭은 고랑과 두둑이 잘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들 유적에서는 하천에서부터 자연제방, 밭, 환호, 주거지, 논, 습지가 순서있게 확인되어 마을 전체의 구조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농경도구로서는 반달돌칼[半月形石刀], 돌낫[石鎌], 돌괭이[石鋤], 돌보습, 그리고 나무로 만든 각종의 도구가 있다. 현재 나무로 만든 도구는
추천자료
 가야의 지명 연구
가야의 지명 연구 부산광역시에 대한 자료
부산광역시에 대한 자료 김유신(金庾信)과 그의 가계
김유신(金庾信)과 그의 가계 잃어버린 왕국 가야
잃어버린 왕국 가야 가야의성립
가야의성립 [과외]중학 사회 1-1학기 기말 예상문제 15
[과외]중학 사회 1-1학기 기말 예상문제 15 2007년 노인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작성
2007년 노인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작성 일본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일본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제주항공의 마케팅 전략과 향후 개선책
제주항공의 마케팅 전략과 향후 개선책 가야 문화 축제, 유래, 역사, 경제적 효과, 배경, 성공 요인, 마케팅 전략, 특징, 중요성, 지...
가야 문화 축제, 유래, 역사, 경제적 효과, 배경, 성공 요인, 마케팅 전략, 특징, 중요성, 지... 부산 광역시 소개, 슬로건, 7대 프로젝트, 위치, 인구, 문화, 문화도시 프로젝트, 축제, 행정...
부산 광역시 소개, 슬로건, 7대 프로젝트, 위치, 인구, 문화, 문화도시 프로젝트, 축제, 행정... 제주항공 About 서비스경영전략 (제주항공,저가항공사,항공마케팅,LCC,마케팅,브랜드,브랜드...
제주항공 About 서비스경영전략 (제주항공,저가항공사,항공마케팅,LCC,마케팅,브랜드,브랜드... 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 백지화
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 백지화 본인이 거주하는 인근지역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지역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정리하시...
본인이 거주하는 인근지역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지역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정리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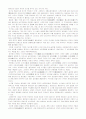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