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광수 생애와 활동 / 동학이란?
1. 머리말
1) 자금까지의 연구
2) 춘원과 동학과의 관계
2. 본 말
1) 작품 내용과 구성
2) 작품과 사실과의 관계
2.1) 등장인물
2.2)체포
2.3)순교
3)작품에 반영된 수운사상
3.1)시천주사상
3.2)개벽사상
3.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1) 자금까지의 연구
2) 춘원과 동학과의 관계
2. 본 말
1) 작품 내용과 구성
2) 작품과 사실과의 관계
2.1) 등장인물
2.2)체포
2.3)순교
3)작품에 반영된 수운사상
3.1)시천주사상
3.2)개벽사상
3.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허구화된 문학작품과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춘원의 동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죽음]의 등장인물과 실제 역사적 인물 비교, 작품속의 체포될때의 장면, 순교의 장면과, 역사적 기록과의 거리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아 역사는 사실만을 추구한다면 문학은 사실보다는 진실을, 역사가 과학적 방법에 의존한다면 문학은 작가의 상상력에 역사가 동기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문학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한다고 항 수이 있다.
우리는 편의상 역사적 사실의 텍스트로서 [천도교창건사]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과 비교 검토 하고자 한다.
2.1) 등장 인물
등장인물은 주인공 체제우, 부인물 박대여와 부인 김시, 김덕원, 그 외 보조인물로 해월, 대구 영장 정기룡, 대구감사 서헌순 등이다.
①최제우: [거룩한 죽음]에서는 수운 최제우는 ‘선생, 선생님, 동학선생’으로 서술되고 최제우란 말은 꼭 한번만 나온다. ‘선생’은 객관적 서술형식일 때 주로 사용되었고 ‘선생님’은 제자들이 호칭할 때 국한시켰고 ‘동학선생’은 대구 장대에 모인 군중들이 쓴 말이다. 수운이란 말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고, ‘최제우’란말은 단 한 번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춘원의 의도적인 것으로, ‘최제우’란 말은 단 한 번밖에 표출되지 않는 것은 춘원의 의도적인 것으로,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춘원 자신의 개인적 상황 때문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존인물이며 그 명명만 간접적 표현을 썼을 뿐이다.
②박대여와 김씨부인: 김씨부인은 동학관계의 여타 기록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이며, 박대여는 실존 인물이며 수운의 제자다.[천도교창건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 임술년(1862년) 3월에 수운 선생은 남원 온적암으로부터 경주로 돌아와 경주 현서면의 백사길의 집에 들어와 동행했던 심부름꾼 최의중으로 하여금 책을 전달케 하고 백대여의 집으로 가서 숨어 지내더니 최경상이 뜻밖에 찾아뵈었다.
- 이 길로 여러 곳을 순회하여 서산의 박대여의 집으로 향하는데 밤에 큰비가 급히 쏟아져 수운 선생은 백대여의 집에 여러 날을 설법하셨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수운 선생은 1862년 임술년에 남원 은적암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직후에 주로 머문 곳은 박대여의 집임을 알 수 있다.
③김덕원: 김덕원은 최제우가 사형당한 사흘 후 문도들과 함께 시체를 거둔 사람이다.
- 사흘 후 신도들인 김경필 김경숙 정용서 곽덕원 임익서 김덕원 등이 수운 선생의 시체를 거두어...
-그때 수운 선생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김경숙 김정필 정용서 곽덕원 임익서 상주사람 김덕원이다.
④해월과 서현순: 해월 최경상과 대구 감사 서헌순은 동학관계의 사료와 정부의 기록에도 나온다.
⑤대구영장 정기룡:
“대구영졍 귀룡이가 삼십명 라졸을 다리고...” (<개벽> 33호,.36쪽)로 표현되어 있고 [창건사]와 [도원서기]에는 “선전관 정귀룡”으로 [천교도 백년약사]에는“선전관 정운귀”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거룩한 죽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과 일치하며 단지 박대여 부인인 김씨는 작가의 창작적 인물이다. 이 작품 역시 역사소설이므로 실존했던 인물을 그대로 작품상의 인물로 했다.
2.2)체포
작품 전체의 내용과 <전개> 의 ⑤⑥을 통해 선생이 박애여의 집에 와서 닷새를 머물던 밤에 해월이 새벽에 와서 피신할 것을 애원하였으나 선생(수운)은 천명이라고 하면서 다른 문도들을 모두 피신하게 하고 혼자 대구 영장 정귀룡에게 잡혀간다
.
[도원기서] [수운문집] [천도교창건사] [천도교100년약사] 에 나타나 수운의 체포되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수운이 임술년이 십이월 십일에 체포되었고, 둘째 그 장소는 용담정이며 셋째 혼자만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되었으며 넷째, 체포한 사람은 어명을 받은 선전과 정귀룡과 그 나졸임을 알 수 있다. 작품에는 박대여의 집으로 되어있고 혼자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가지점이 사실과 상충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수운이 체포되기 일년전인 신유년 구월에 경주부의 윤선달이란 사람이 무고로 경주영장에게 잡혀갔다가 놓여난 일이 있는데 그때 수운은 박대여의 집에 머물었고 그 후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남원 은적암으로 약 8개월간 피신했다가 돌아와 다시 박대여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천도교창건사]와 [도원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충원은 이를 혼동 했을 것이거나 아니면 작품의 주제부각을 하기위해 허구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춘원과 동학과의 관계를 보면 춘원은 입도까지 했으며 동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판단아래 춘원이 작품의 효과를 노리기 위래 허구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적한 신솔 박대여집에서 몇몇 제자들과 기도를 드리며 강론함이 보다 더 종교적 분위기에 걸맞고 또한 부인 김씨를 등장시켜 남녀평등사상을 나타낼 수 있게 했다. 일차 체포당할 때가 박대여의 집이었으므로 단편에서 구태여 사건을 복잡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동학사상가 수운의 거룩한 죽음을 집중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춘원의 의도적인 허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순교
수운의 순교장면을 작품 거룩한죽음과 역사적 사실인 천도교창건사의 내용과 대비시켜 본다. 역사적 기록은 [수운문집]이나[도원서기]나 [백년약사]가 모두 [창건사]와 일치하므로 [천도교창건사]를 인용한다.
<작품>
삼월초욜흘 갑자년 삼월 초연홀
대구 장대에는 사람이 백챠일친듯이 모혔다.대구 감영사람들 사방으로서 모혀 들어온 동학하는 사람들,동학선생이 죽는 것을 보량으로 아츰일찍부터 모혀 들었다.<절정>①
선생의 마즈막 처을 들어 라졸이 냉수 한그릇을 새로 떠왔다, 선생은 등상에서 닐어나 흙우해 백지 한장을 깔고 그우해 냉수그릇을 노토 가만히 흙우해 꿀허 안더니 눈을 감고 손을 읍하고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잇다. 돌아선 사람들 중에도 션생모양으로 꿀어아는이가 여기져기 보이며 어대션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포턱턴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지 무극대도대덕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
우리는 편의상 역사적 사실의 텍스트로서 [천도교창건사]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과 비교 검토 하고자 한다.
2.1) 등장 인물
등장인물은 주인공 체제우, 부인물 박대여와 부인 김시, 김덕원, 그 외 보조인물로 해월, 대구 영장 정기룡, 대구감사 서헌순 등이다.
①최제우: [거룩한 죽음]에서는 수운 최제우는 ‘선생, 선생님, 동학선생’으로 서술되고 최제우란 말은 꼭 한번만 나온다. ‘선생’은 객관적 서술형식일 때 주로 사용되었고 ‘선생님’은 제자들이 호칭할 때 국한시켰고 ‘동학선생’은 대구 장대에 모인 군중들이 쓴 말이다. 수운이란 말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고, ‘최제우’란말은 단 한 번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춘원의 의도적인 것으로, ‘최제우’란 말은 단 한 번밖에 표출되지 않는 것은 춘원의 의도적인 것으로,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춘원 자신의 개인적 상황 때문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존인물이며 그 명명만 간접적 표현을 썼을 뿐이다.
②박대여와 김씨부인: 김씨부인은 동학관계의 여타 기록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이며, 박대여는 실존 인물이며 수운의 제자다.[천도교창건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 임술년(1862년) 3월에 수운 선생은 남원 온적암으로부터 경주로 돌아와 경주 현서면의 백사길의 집에 들어와 동행했던 심부름꾼 최의중으로 하여금 책을 전달케 하고 백대여의 집으로 가서 숨어 지내더니 최경상이 뜻밖에 찾아뵈었다.
- 이 길로 여러 곳을 순회하여 서산의 박대여의 집으로 향하는데 밤에 큰비가 급히 쏟아져 수운 선생은 백대여의 집에 여러 날을 설법하셨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수운 선생은 1862년 임술년에 남원 은적암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직후에 주로 머문 곳은 박대여의 집임을 알 수 있다.
③김덕원: 김덕원은 최제우가 사형당한 사흘 후 문도들과 함께 시체를 거둔 사람이다.
- 사흘 후 신도들인 김경필 김경숙 정용서 곽덕원 임익서 김덕원 등이 수운 선생의 시체를 거두어...
-그때 수운 선생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김경숙 김정필 정용서 곽덕원 임익서 상주사람 김덕원이다.
④해월과 서현순: 해월 최경상과 대구 감사 서헌순은 동학관계의 사료와 정부의 기록에도 나온다.
⑤대구영장 정기룡:
“대구영졍 귀룡이가 삼십명 라졸을 다리고...” (<개벽> 33호,.36쪽)로 표현되어 있고 [창건사]와 [도원서기]에는 “선전관 정귀룡”으로 [천교도 백년약사]에는“선전관 정운귀”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거룩한 죽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과 일치하며 단지 박대여 부인인 김씨는 작가의 창작적 인물이다. 이 작품 역시 역사소설이므로 실존했던 인물을 그대로 작품상의 인물로 했다.
2.2)체포
작품 전체의 내용과 <전개> 의 ⑤⑥을 통해 선생이 박애여의 집에 와서 닷새를 머물던 밤에 해월이 새벽에 와서 피신할 것을 애원하였으나 선생(수운)은 천명이라고 하면서 다른 문도들을 모두 피신하게 하고 혼자 대구 영장 정귀룡에게 잡혀간다
.
[도원기서] [수운문집] [천도교창건사] [천도교100년약사] 에 나타나 수운의 체포되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수운이 임술년이 십이월 십일에 체포되었고, 둘째 그 장소는 용담정이며 셋째 혼자만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되었으며 넷째, 체포한 사람은 어명을 받은 선전과 정귀룡과 그 나졸임을 알 수 있다. 작품에는 박대여의 집으로 되어있고 혼자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가지점이 사실과 상충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수운이 체포되기 일년전인 신유년 구월에 경주부의 윤선달이란 사람이 무고로 경주영장에게 잡혀갔다가 놓여난 일이 있는데 그때 수운은 박대여의 집에 머물었고 그 후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남원 은적암으로 약 8개월간 피신했다가 돌아와 다시 박대여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천도교창건사]와 [도원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충원은 이를 혼동 했을 것이거나 아니면 작품의 주제부각을 하기위해 허구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춘원과 동학과의 관계를 보면 춘원은 입도까지 했으며 동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판단아래 춘원이 작품의 효과를 노리기 위래 허구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적한 신솔 박대여집에서 몇몇 제자들과 기도를 드리며 강론함이 보다 더 종교적 분위기에 걸맞고 또한 부인 김씨를 등장시켜 남녀평등사상을 나타낼 수 있게 했다. 일차 체포당할 때가 박대여의 집이었으므로 단편에서 구태여 사건을 복잡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동학사상가 수운의 거룩한 죽음을 집중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춘원의 의도적인 허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순교
수운의 순교장면을 작품 거룩한죽음과 역사적 사실인 천도교창건사의 내용과 대비시켜 본다. 역사적 기록은 [수운문집]이나[도원서기]나 [백년약사]가 모두 [창건사]와 일치하므로 [천도교창건사]를 인용한다.
<작품>
삼월초욜흘 갑자년 삼월 초연홀
대구 장대에는 사람이 백챠일친듯이 모혔다.대구 감영사람들 사방으로서 모혀 들어온 동학하는 사람들,동학선생이 죽는 것을 보량으로 아츰일찍부터 모혀 들었다.<절정>①
선생의 마즈막 처을 들어 라졸이 냉수 한그릇을 새로 떠왔다, 선생은 등상에서 닐어나 흙우해 백지 한장을 깔고 그우해 냉수그릇을 노토 가만히 흙우해 꿀허 안더니 눈을 감고 손을 읍하고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잇다. 돌아선 사람들 중에도 션생모양으로 꿀어아는이가 여기져기 보이며 어대션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포턱턴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지 무극대도대덕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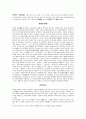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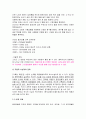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