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향가의 개념
2. 향가의 특성
본론-삼국유사 수록 향가 고찰
1. 모죽지랑가
2. 헌화가
3. 안민가
4. 讚耆婆郞歌(찬기파랑가, 충담)
5. 處容歌(처용가, 처용)
6. 薯童謠(서동요, 백제무왕)
7. 禱千手觀音歌(도천수관음가, 희명)
8. 風謠(풍요, 미상)
9. 願往生歌(원왕생가, 광덕(처))
10. 兜率歌(도솔가, 월명)
11. 祭亡妹歌(제망매가, 월명)
12. 彗星歌(혜성가, 융천)
13. 怨歌(원가, 신충)
14. 遇賊歌(우적가, 영재)
결론
1. 향가의 개념
2. 향가의 특성
본론-삼국유사 수록 향가 고찰
1. 모죽지랑가
2. 헌화가
3. 안민가
4. 讚耆婆郞歌(찬기파랑가, 충담)
5. 處容歌(처용가, 처용)
6. 薯童謠(서동요, 백제무왕)
7. 禱千手觀音歌(도천수관음가, 희명)
8. 風謠(풍요, 미상)
9. 願往生歌(원왕생가, 광덕(처))
10. 兜率歌(도솔가, 월명)
11. 祭亡妹歌(제망매가, 월명)
12. 彗星歌(혜성가, 융천)
13. 怨歌(원가, 신충)
14. 遇賊歌(우적가, 영재)
결론
본문내용
고전시가의 정형화된 틀의 바탕을 제공했다는 것은 향가가 우리문학의 뿌리요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향가의 개념정리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14수를 배경신화와 더불어 각기 다른 학자들의 향가의 해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향가의 개념
향가는 현존하는 국문학 유산 중 에서 양식화된 서정시 형식의 최초의 형태로서 향찰(鄕札) 이라는 특수문자로 표기된 신라 및 고려시대의 시가 장르이다. 향가라고 하는 명칭이 문헌에 최초로 보이기는 고려 문종29년 (문종,1075)에 혁련정에 의해 엮어진 [균여전]에서이고 이후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헌상에 사용된 범위는 한국 고유의 노래라는 뜻으로 넓게는 삼국 이전의 시가로부터 좁게는 [서동요] 이후 신라의 정형가요에까지 이른다. 향가는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옴과 함께 유입된 중국시가에 상응하여 우리민족고유의 특질이 담겨진 시형을 만들어낸 것으로 발생의 기원을 보지만 직접적으로 향가 시형이 새롭게 태어나서 크게 성하게 된 것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뒤라고 보여 진다.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문화가 크게 성행하였고 서역으로부터 불교의식의 [범패]라는 노래가 들어왔었지만 우리민족의 정서 속으로 파고드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고유음악을 백성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포교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불교와 함께 향가의 전성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향가를 이용하여 불교를 전파했던 모습은 [공덕가], [도솔가],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신앙의 고백 등은 [원앙생가]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노래를 향가라고 했을 때 고려속요도 향가라 할 수 있지만 학술적용어로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국어가요 중 향찰(鄕札)로 표기되어 전하는 것만을 일컫을 뿐 국어가요라 할지라도 한역되어 전하거나 후대에 국문으로 표기된 것은 같은 형식의 가요일지라도 향가라 부르지 않는다. 향가의 다른 명칭 ‘새내’가 ‘신라’와 동의어라 보아 향가를 신라의 가요 즉, [사뇌가]라는 이름으로 쓸 것을 주장한 학자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문헌상에서 [사뇌가]라는 명칭은 향가 중 일부 작품 군을 칭하는 것으로 주로 그 형식이 정돈되고 완성된 10구체를 일컫는 게 보통이다.
2.향가의 특성
향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로서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형식을 가지며 연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 중에10구체는 향가의 최종 완성형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향가(10구체)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면 8구까지 주요 내용이 마무리되고 남은 2구에서 앞의 주의를 반복 강조하는 전/후절의 구조를 가지며 10구체 형식의 묘미는 바로 결사인 후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후구가 전구의 여운적 역할을 하여 노래를 한층 은근하고 끈기 있는 정조를 담아내게 한다. 그러면 향가의 각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4구체는 4줄로 된 향가이다. 민요가 두 줄, 네 줄로 된 것이 많으며[ 황조가], [구지가] 등 상고시가 또한 4줄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민요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향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민요와는 달리 그 작가가 비교적 분명하며 개인 서정시가적 측면이 강하다. 작품으로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등이 전한다.
8구체는 8줄로 된 향가이다. 현존 작품 2편만 가지고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사정을 생각할 때
이 8구체 형식은 10구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그 형식의 존속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구체의 배수로 된 8구체부터 향가의 창작정신은 민요적 차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작품으로 [모죽지랑가], [처용가] 등이 있다.
10구체는 10줄로 된 향가이다. 향가의 최종 완성 형태로 통일 신라 시대를 전후하여 등장했다. 결사의 첫구(9번째 줄의 첫구)는 항상 ‘아으’ 등의 감탄사를 동반하는데 이점은 [시조] 종장 첫 3글자의 형식적 원형을 제공했다. [보현십원가]11수를 제외하면 총8수가 전한다. 작품으로는 [안민가], [우적가], [원가(결사인9/10구는 소실됨)], [원앙생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천수대비가], [혜성가], [보현십원가11수] 가 전한다.
이러한 향가의 주요 작자 층은 승려나 화랑 등 귀족 계층으로 나타나며 향가의 내용이 불교적 색체가 짙은 것은 이러한 작자 층에 연유한다고 하겠다. 문헌 기록에는 항가집으로 [삼대목]이라는 책이 편찬된바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향가는 현재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한다.
{본론}
위에서 향가의 개념과 전반적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14수를 배경설화와 함께 양주동, 정렬모, 김완진의 풀이를 중심으로 원문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학자마다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향가시대에는 아직 우리문자가 없었으므로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했던 것에 있는데 이렇게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을 차자(借字)의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한자의 훈(訓)을 빌리는 방법(훈차자,訓借字)과 한자의 음을 빌리는 방법(음차자,音借字)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훈차자 와 음차자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훈이나 음을 가진 차자의 경우 훈 또는 음으로 읽을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므로 학자들의 이견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본지에서는 배경설화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의 해독을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다.
1.삼국유사 수록 향가 고찰
1. 慕竹旨郞歌(모죽지랑가, 득오)
<장덕순-‘이야기국문학사’의 풀이>
1. 去隱春皆林米 지난 봄을 그리워하매
2.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모든 것이 애닯다
3.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어드메 좋은 데로
4. 史年數就音墮支行齊 모습을 더지셨뇨
5. 目煙廻於尸七史伊衣 아득한 데에서야
6. 逢烏支惡知作乎下是 만나지오리
7. 郞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낭이어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
8.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쑥밭 구렁에 잘 밤이사 있으리
1) 김완진 해독 <김완진 해독의 수정>
간 봄
1. 향가의 개념
향가는 현존하는 국문학 유산 중 에서 양식화된 서정시 형식의 최초의 형태로서 향찰(鄕札) 이라는 특수문자로 표기된 신라 및 고려시대의 시가 장르이다. 향가라고 하는 명칭이 문헌에 최초로 보이기는 고려 문종29년 (문종,1075)에 혁련정에 의해 엮어진 [균여전]에서이고 이후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헌상에 사용된 범위는 한국 고유의 노래라는 뜻으로 넓게는 삼국 이전의 시가로부터 좁게는 [서동요] 이후 신라의 정형가요에까지 이른다. 향가는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옴과 함께 유입된 중국시가에 상응하여 우리민족고유의 특질이 담겨진 시형을 만들어낸 것으로 발생의 기원을 보지만 직접적으로 향가 시형이 새롭게 태어나서 크게 성하게 된 것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뒤라고 보여 진다.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문화가 크게 성행하였고 서역으로부터 불교의식의 [범패]라는 노래가 들어왔었지만 우리민족의 정서 속으로 파고드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고유음악을 백성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포교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불교와 함께 향가의 전성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향가를 이용하여 불교를 전파했던 모습은 [공덕가], [도솔가],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신앙의 고백 등은 [원앙생가]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노래를 향가라고 했을 때 고려속요도 향가라 할 수 있지만 학술적용어로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국어가요 중 향찰(鄕札)로 표기되어 전하는 것만을 일컫을 뿐 국어가요라 할지라도 한역되어 전하거나 후대에 국문으로 표기된 것은 같은 형식의 가요일지라도 향가라 부르지 않는다. 향가의 다른 명칭 ‘새내’가 ‘신라’와 동의어라 보아 향가를 신라의 가요 즉, [사뇌가]라는 이름으로 쓸 것을 주장한 학자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문헌상에서 [사뇌가]라는 명칭은 향가 중 일부 작품 군을 칭하는 것으로 주로 그 형식이 정돈되고 완성된 10구체를 일컫는 게 보통이다.
2.향가의 특성
향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로서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형식을 가지며 연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 중에10구체는 향가의 최종 완성형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향가(10구체)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면 8구까지 주요 내용이 마무리되고 남은 2구에서 앞의 주의를 반복 강조하는 전/후절의 구조를 가지며 10구체 형식의 묘미는 바로 결사인 후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후구가 전구의 여운적 역할을 하여 노래를 한층 은근하고 끈기 있는 정조를 담아내게 한다. 그러면 향가의 각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4구체는 4줄로 된 향가이다. 민요가 두 줄, 네 줄로 된 것이 많으며[ 황조가], [구지가] 등 상고시가 또한 4줄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민요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향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민요와는 달리 그 작가가 비교적 분명하며 개인 서정시가적 측면이 강하다. 작품으로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등이 전한다.
8구체는 8줄로 된 향가이다. 현존 작품 2편만 가지고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사정을 생각할 때
이 8구체 형식은 10구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그 형식의 존속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구체의 배수로 된 8구체부터 향가의 창작정신은 민요적 차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작품으로 [모죽지랑가], [처용가] 등이 있다.
10구체는 10줄로 된 향가이다. 향가의 최종 완성 형태로 통일 신라 시대를 전후하여 등장했다. 결사의 첫구(9번째 줄의 첫구)는 항상 ‘아으’ 등의 감탄사를 동반하는데 이점은 [시조] 종장 첫 3글자의 형식적 원형을 제공했다. [보현십원가]11수를 제외하면 총8수가 전한다. 작품으로는 [안민가], [우적가], [원가(결사인9/10구는 소실됨)], [원앙생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천수대비가], [혜성가], [보현십원가11수] 가 전한다.
이러한 향가의 주요 작자 층은 승려나 화랑 등 귀족 계층으로 나타나며 향가의 내용이 불교적 색체가 짙은 것은 이러한 작자 층에 연유한다고 하겠다. 문헌 기록에는 항가집으로 [삼대목]이라는 책이 편찬된바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향가는 현재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한다.
{본론}
위에서 향가의 개념과 전반적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14수를 배경설화와 함께 양주동, 정렬모, 김완진의 풀이를 중심으로 원문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학자마다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향가시대에는 아직 우리문자가 없었으므로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했던 것에 있는데 이렇게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을 차자(借字)의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한자의 훈(訓)을 빌리는 방법(훈차자,訓借字)과 한자의 음을 빌리는 방법(음차자,音借字)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훈차자 와 음차자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훈이나 음을 가진 차자의 경우 훈 또는 음으로 읽을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므로 학자들의 이견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본지에서는 배경설화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의 해독을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다.
1.삼국유사 수록 향가 고찰
1. 慕竹旨郞歌(모죽지랑가, 득오)
<장덕순-‘이야기국문학사’의 풀이>
1. 去隱春皆林米 지난 봄을 그리워하매
2.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모든 것이 애닯다
3.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어드메 좋은 데로
4. 史年數就音墮支行齊 모습을 더지셨뇨
5. 目煙廻於尸七史伊衣 아득한 데에서야
6. 逢烏支惡知作乎下是 만나지오리
7. 郞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낭이어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
8.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쑥밭 구렁에 잘 밤이사 있으리
1) 김완진 해독 <김완진 해독의 수정>
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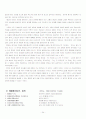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