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Ⅰ. Michel Tournier의 삶
1 . 소설작가로서의 투르니에
2 . 사진작가로서의 투르니에
Ⅱ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작품 분석
1 . 분석하기에 앞서
2 . 소설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비평과 분석
ⅰ . 프롤로그
ⅱ . 방드르디 이전
- 탄식의 섬 / 1, 2장
- 지배하고 다스리는 섬 / 3, 4 장
- 사람의 대상으로서의 섬 / 5, 6 장
ⅲ . 방드르디 이후
- 방드르디의 출현 / 7장
- 폭발 / 8장
- 새로운 세계 속에 태어난 새로운 인간(호모 파베르에서 호모 루덴스로) / 9장 -
- 태양의 로빈슨 / 10장
- 화이트버드 호 / 11장
- 죄디 jeudi / 12장
3 . 귀결
Ⅲ. 투르니에의 철학적 삶과 작품과의 관계
결론
본론
Ⅰ. Michel Tournier의 삶
1 . 소설작가로서의 투르니에
2 . 사진작가로서의 투르니에
Ⅱ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작품 분석
1 . 분석하기에 앞서
2 . 소설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비평과 분석
ⅰ . 프롤로그
ⅱ . 방드르디 이전
- 탄식의 섬 / 1, 2장
- 지배하고 다스리는 섬 / 3, 4 장
- 사람의 대상으로서의 섬 / 5, 6 장
ⅲ . 방드르디 이후
- 방드르디의 출현 / 7장
- 폭발 / 8장
- 새로운 세계 속에 태어난 새로운 인간(호모 파베르에서 호모 루덴스로) / 9장 -
- 태양의 로빈슨 / 10장
- 화이트버드 호 / 11장
- 죄디 jeudi / 12장
3 . 귀결
Ⅲ. 투르니에의 철학적 삶과 작품과의 관계
결론
본문내용
뜻하는 지는 몰라도 짐작하기에 작자 역시 피폐하고 먼지와 폐허의 세계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아니다. 이것은 그의 소설 기법에서 가장 치밀하고 계산된 내용이다. 그는 방드르디를 화이트 버드호에 승선시킴으로써 이야기 내용의 반복을 나타내려 한 듯하다. 바로 순환론적 구성을 기한 것이다. 방드르디를 문명에 내보내어 순화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타락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는 문명과 자연의 끊임없는 충돌과 합일의 관계를 반복적 소설 기법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 죄디 jeudi / 12장
새벽에 잠을 깬 로빈슨은 범선에 매혹된 방드르디가 그 배를 타고 사라졌음을 깨닫고 다급하게 찾아다닌다. 절망한 그는 폭파된 후 남은 굴의 잔해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한다. 그 순간 바위더미 좁은 구멍 통로에서 한 소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다. 지난날 방드르디가 그랬듯이 화이트버드호의 어린 수부 자앙이 로빈슨의 친절에 감동하여 그의 곁으로 피신한 것이었다. 로빈슨은 그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화이트버드호를 바라본다. 12장은 시적인 탄생과 순화의 장면을 볼 수 있다. 로빈슨은 아이의 이름을〈죄디 jeudi (목요일)〉로 바꾸어 명명한다. 이는 로빈슨이 방드르디에게 이름을 붙여 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투르니에는 갈매기, 꽃잎, 태양을 통하여 순화하는 장면을 서술했고 로빈슨을 이름을 명명하는 장면을 통하여 생명의 원천으로 나타내려 한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현실세계를 부정하는 로빈슨으로 하여금 무질서의 세계에 남겨두는 대신 무질서의 세계를 강요한 방드르디를 왜 현실세계로 보내려 하는 의도를 나타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또 어린 수부 자앙을 꼭 원시세계에 남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부정하려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의 소설 구조로써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작품 <방드르디>의 구조는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니는데, 전체 스토리의 구성을 순환론적 구조로 이룸으로써 투르니에는 소설의 체계를 대단히 복잡하게 한다. 이는 필자가 처음 분석전에도 밝혔듯이, 보면 볼수록 다른 각도로 분석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순환론적 구조는 이야기 구석구석에 나타나는데, 섬의 탐사유아기로의 퇴행예전 문명사회에서 받은 교육의 재현모태로 복귀등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투르니에는 처음 로빈슨과 방드르디의 관계에 대한 재현을 다시 로빈슨과 죄디의 관계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기울어지던(inclinee)> 직선적 흐름의 시간 또한 똑같은 날을 끊임없이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의 순환 운동이 되는 것이다. 金灑煥,「<방드르디 혹은 태평양의 끝>에 나타난 小說技法 硏究 - Les technique romaneques dans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de Michel Tournier」,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9.2, p.14.
그리하여, 투르니에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즉 야만으로의 완전한 회귀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단지 원초적인 삶의 세계로 돌아가 우주의 원소들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삶을 그려냄으로써 너무 문명적 이기에 취해 있는 현대인에게 일침을 가하려 한 것이다. 즉, 투르니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이란, 잃어버린 본연의 순수를 되찾아 다연과 일체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제도와 문명에 얽매여 있는 완전한 기계적인 삶도 아니요, 완전히 야생의 동물들같은 원시적 삶도 아니라는 것이다.
3 . 귀결
다니엘 디포는〈무인도에 표류한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하여 노동의 엄격한 기원과 질서, 혹은 순서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거기서 새로이 꾸려 가게 되는 삶의 과정과 방식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투르니에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기원과 과거 쪽 보다는 미래와 결말 쪽에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리하여 디포의 소설이 순전히〈회고적〉으로, 손에 닿는 수단들을 동원하여〈과거에 잃어버린 문명을 복원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투르니에의 소설은 미래를 향한 채〈창의적〉이고〈기획적〉이고자 하는 것 같다.
순전히 철학적인 화제는 다니엘 디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투르니에가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발전 단계에 있어서 두 가지 문명〈로빈슨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기독교와 방드르디로 대표되는 제3세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비인간적인 고독으로 인하여 한 인간의 존재와 삶이 마모되고 바탕에서부터 발가벗겨짐으로써 그가 지녔던 일체의 문명적 요소가 깎여 나가는 과정과 그 근원적 싹쓸이 위에서 창조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인 것이다. 이것이 작가 자신이 나타내고자하는 이 작품의 주제가 아닐까?
우선 섬이라는 공간의 설정 자체가 작품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섬은 그 자체가 외부와 절연된 고독의 공간이다. 섬은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하는 격리된 장소이므로 타로 카드의 게임을 관장하는 그것과 유사한 조합적 구조가 허용하는 즉흥적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섬에 혼자 표류한 로빈슨은 무엇보다 먼저 두 가지 사회의 부재를 확인한다. 즉 영국, 유럽, 백인, 버지니아호 등으로 대표되던 과거의 문명 사회는 등 뒤의 기억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다른 한편 아직 답사해 보지 못한 미래의 섬은 그의 앞에 남은 백지일 뿐이다. 따라서 둘 다〈상상 속의 사회〉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살지 않는 풍경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내면에서는〈비인간화의 절차〉가 시작된다. 인간은 저마다 내면에 허약하면서도 복잡한 습관들의 틀을 가지고 있다.
로빈슨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요약해볼까 한다.
우선 절해고도(絶海孤島)에 혼자 남은 로빈슨은 그 무인도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난파한 배에서 건져온 도구와 물건들, 그리고 섬에서 발견한 재료들로 배를 한 척 건조한다. 그것이〈탈출호〉이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그 큰 배를 바닷물 속에까지 진수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 죄디 jeudi / 12장
새벽에 잠을 깬 로빈슨은 범선에 매혹된 방드르디가 그 배를 타고 사라졌음을 깨닫고 다급하게 찾아다닌다. 절망한 그는 폭파된 후 남은 굴의 잔해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한다. 그 순간 바위더미 좁은 구멍 통로에서 한 소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다. 지난날 방드르디가 그랬듯이 화이트버드호의 어린 수부 자앙이 로빈슨의 친절에 감동하여 그의 곁으로 피신한 것이었다. 로빈슨은 그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화이트버드호를 바라본다. 12장은 시적인 탄생과 순화의 장면을 볼 수 있다. 로빈슨은 아이의 이름을〈죄디 jeudi (목요일)〉로 바꾸어 명명한다. 이는 로빈슨이 방드르디에게 이름을 붙여 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투르니에는 갈매기, 꽃잎, 태양을 통하여 순화하는 장면을 서술했고 로빈슨을 이름을 명명하는 장면을 통하여 생명의 원천으로 나타내려 한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현실세계를 부정하는 로빈슨으로 하여금 무질서의 세계에 남겨두는 대신 무질서의 세계를 강요한 방드르디를 왜 현실세계로 보내려 하는 의도를 나타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또 어린 수부 자앙을 꼭 원시세계에 남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부정하려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의 소설 구조로써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작품 <방드르디>의 구조는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니는데, 전체 스토리의 구성을 순환론적 구조로 이룸으로써 투르니에는 소설의 체계를 대단히 복잡하게 한다. 이는 필자가 처음 분석전에도 밝혔듯이, 보면 볼수록 다른 각도로 분석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순환론적 구조는 이야기 구석구석에 나타나는데, 섬의 탐사유아기로의 퇴행예전 문명사회에서 받은 교육의 재현모태로 복귀등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투르니에는 처음 로빈슨과 방드르디의 관계에 대한 재현을 다시 로빈슨과 죄디의 관계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기울어지던(inclinee)> 직선적 흐름의 시간 또한 똑같은 날을 끊임없이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의 순환 운동이 되는 것이다. 金灑煥,「<방드르디 혹은 태평양의 끝>에 나타난 小說技法 硏究 - Les technique romaneques dans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de Michel Tournier」,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9.2, p.14.
그리하여, 투르니에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즉 야만으로의 완전한 회귀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단지 원초적인 삶의 세계로 돌아가 우주의 원소들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삶을 그려냄으로써 너무 문명적 이기에 취해 있는 현대인에게 일침을 가하려 한 것이다. 즉, 투르니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이란, 잃어버린 본연의 순수를 되찾아 다연과 일체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제도와 문명에 얽매여 있는 완전한 기계적인 삶도 아니요, 완전히 야생의 동물들같은 원시적 삶도 아니라는 것이다.
3 . 귀결
다니엘 디포는〈무인도에 표류한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하여 노동의 엄격한 기원과 질서, 혹은 순서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거기서 새로이 꾸려 가게 되는 삶의 과정과 방식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투르니에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기원과 과거 쪽 보다는 미래와 결말 쪽에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리하여 디포의 소설이 순전히〈회고적〉으로, 손에 닿는 수단들을 동원하여〈과거에 잃어버린 문명을 복원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투르니에의 소설은 미래를 향한 채〈창의적〉이고〈기획적〉이고자 하는 것 같다.
순전히 철학적인 화제는 다니엘 디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투르니에가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발전 단계에 있어서 두 가지 문명〈로빈슨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기독교와 방드르디로 대표되는 제3세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비인간적인 고독으로 인하여 한 인간의 존재와 삶이 마모되고 바탕에서부터 발가벗겨짐으로써 그가 지녔던 일체의 문명적 요소가 깎여 나가는 과정과 그 근원적 싹쓸이 위에서 창조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인 것이다. 이것이 작가 자신이 나타내고자하는 이 작품의 주제가 아닐까?
우선 섬이라는 공간의 설정 자체가 작품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섬은 그 자체가 외부와 절연된 고독의 공간이다. 섬은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하는 격리된 장소이므로 타로 카드의 게임을 관장하는 그것과 유사한 조합적 구조가 허용하는 즉흥적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섬에 혼자 표류한 로빈슨은 무엇보다 먼저 두 가지 사회의 부재를 확인한다. 즉 영국, 유럽, 백인, 버지니아호 등으로 대표되던 과거의 문명 사회는 등 뒤의 기억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다른 한편 아직 답사해 보지 못한 미래의 섬은 그의 앞에 남은 백지일 뿐이다. 따라서 둘 다〈상상 속의 사회〉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살지 않는 풍경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내면에서는〈비인간화의 절차〉가 시작된다. 인간은 저마다 내면에 허약하면서도 복잡한 습관들의 틀을 가지고 있다.
로빈슨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요약해볼까 한다.
우선 절해고도(絶海孤島)에 혼자 남은 로빈슨은 그 무인도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난파한 배에서 건져온 도구와 물건들, 그리고 섬에서 발견한 재료들로 배를 한 척 건조한다. 그것이〈탈출호〉이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그 큰 배를 바닷물 속에까지 진수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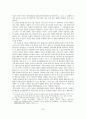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