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대적 배경
1) 권력의 독점
2) 외척 세도
3) 정치 기강의 문란
2. 삼정의 문란
1) 전정
2) 군정
3) 환곡
4) 암행 어사
3. 영향
1) 농민의 유랑
2) 농민 의식의 성장
3) 홍경래의 난
4) 진주 민란
1) 권력의 독점
2) 외척 세도
3) 정치 기강의 문란
2. 삼정의 문란
1) 전정
2) 군정
3) 환곡
4) 암행 어사
3. 영향
1) 농민의 유랑
2) 농민 의식의 성장
3) 홍경래의 난
4) 진주 민란
본문내용
않은 개간지(은결)에 징세하는 것
도결징세:횡령한 공급을 보충하고자 정액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
백지징세:도저히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땅에서 징수하는 것
2) 군정
- 균역법의 실시로 한때 군포 징수의 페단이 감소하였으나 세도 정치하에서 그 폐단이 매 우 심하였다.
(1) 균역법 실시 : 군포 부담 감소(1년에 2필→1필)
군정의 문란
황구첨정 :어린이를 장정으로 편입하여 군포를 거두는 것
백골징포 : 죽은 사람을 생존자로 하여 군포를 거두는 것
족징 : 도망자의 군포를 친척에게서 거두는 것
인징 :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서 거두는 것
강년채 : 60세가 넘는 노인의 나이를 줄여서 거두는 것
마감채 : 병역 의무자가 면제 받을 시기의 것도 미리 일시불로 받는 면역 군포
(2) 군포 징수 폐단 심화
애절양(哀絶陽) - 정약용 -
갈밭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縣門 - 현감이 근무하는 관아의 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로부터 남절양(男絶陽 -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말랐는데
삼대의 이름이 군적(軍籍)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도
범같은 문지기 버티어 있고
이정(里正 - 지금의 이장 정도되는 직위)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갔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후략>
이 시의 제목은 \'애절양(哀絶陽)\'이다. 다산 정약용이 쓴 글인데 조선후기의 세금거두는 제도인 삼정(三政) 중 군정(軍政)의 문란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이다. 죽은 시아버지에게서까지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白骨徵布), 입가에 어미젖이 누렇게 말라붙은 갓난아이도 장정으로 취급해서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의 실상이 생생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3) 환곡
-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환곡이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을 괴롭혔고, 그 폐단이 삼정 중 에서 극심하였다.
(1) 환곡의 고리대화
(2) 관리들의 불법 성행 → 환곡의 폐단 심화 → 삼정 중에서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함
환곡의 문란
늑대 :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곡식을 강제로 빌려 주는 것
분석 : 곡식에다 겨를 섞어 양을 늘려 속이는 것
반작 : 출납 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허류 : 비상 식량까지도 고리로 빌려주는 것
4) 암행 어사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 삼정의 문란 → 농민 생활의 곤란, 정부 재정 궁핍
(2) 정부의 시정 노력(성과를 거두지 못함)
① 암행어사의 파견
② 삼정 이정청의 설치
3. 영향
1) 농민의 유랑
-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로 농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
(1) 유랑 농민의 증가
① 농민 생활의 궁핍 :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착취로 농민의 몰락
② 유랑 농민 : 화전민, 임노동자
* 임노동자 : 새로운 농사기술의 개발은 농민의 계층 분화를 가져와 자기 땅이 없던 빈 농들은 농촌을 떠나 광산, 포구, 도시로 몰려가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 락 하였다.
(2) 간도와 연해주로의 이민 증가
(3) 농민 고통의 심화
① 흉년, 재해의 빈발
② 전염병의 유행
③ 농민 부담의 가중
▣ 홍수의 피해
1729년에는 함경도에서만 1,000여 명이 홍수로 사망하였으며, 1832년에는 전국을 엄습한 홍수로 인하여 7,670여 호가 유실되고 293명의 인명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1845년에는 관서지방의 홍수로 4,000여 호가 유실되고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856년에도 해서지방 에서는 5,000여 호의 인가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홍수로 수재민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들은 농촌을 떠나 유랑민이 된 경우가 많았다.
▣ 기근(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함)의 빈발
17세기 중엽 이후 약 200년 동안 비교적 규모가 큰 기근이 52회나 될 정도로 조선 후기에는 기근이 빈발하였다. 1672년의 기근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굶주린 백성이 68만 명 이상이었으며, 그 해 6월의 아사자만 1만 9천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1733년의 기근 때에는 연인원 40여 만의 기민과 1만 3천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1763년의 호남 지방의 기근에서는 48만 정도의 기민이, 1792년의 해서 지방과 관서 지방의 기근에서는 46만여 명의 기민이, 1839년(헌종)에는 전국 기민의 연인?
도결징세:횡령한 공급을 보충하고자 정액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
백지징세:도저히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땅에서 징수하는 것
2) 군정
- 균역법의 실시로 한때 군포 징수의 페단이 감소하였으나 세도 정치하에서 그 폐단이 매 우 심하였다.
(1) 균역법 실시 : 군포 부담 감소(1년에 2필→1필)
군정의 문란
황구첨정 :어린이를 장정으로 편입하여 군포를 거두는 것
백골징포 : 죽은 사람을 생존자로 하여 군포를 거두는 것
족징 : 도망자의 군포를 친척에게서 거두는 것
인징 :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서 거두는 것
강년채 : 60세가 넘는 노인의 나이를 줄여서 거두는 것
마감채 : 병역 의무자가 면제 받을 시기의 것도 미리 일시불로 받는 면역 군포
(2) 군포 징수 폐단 심화
애절양(哀絶陽) - 정약용 -
갈밭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縣門 - 현감이 근무하는 관아의 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로부터 남절양(男絶陽 -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말랐는데
삼대의 이름이 군적(軍籍)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도
범같은 문지기 버티어 있고
이정(里正 - 지금의 이장 정도되는 직위)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갔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후략>
이 시의 제목은 \'애절양(哀絶陽)\'이다. 다산 정약용이 쓴 글인데 조선후기의 세금거두는 제도인 삼정(三政) 중 군정(軍政)의 문란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이다. 죽은 시아버지에게서까지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白骨徵布), 입가에 어미젖이 누렇게 말라붙은 갓난아이도 장정으로 취급해서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의 실상이 생생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3) 환곡
-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환곡이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을 괴롭혔고, 그 폐단이 삼정 중 에서 극심하였다.
(1) 환곡의 고리대화
(2) 관리들의 불법 성행 → 환곡의 폐단 심화 → 삼정 중에서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함
환곡의 문란
늑대 :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곡식을 강제로 빌려 주는 것
분석 : 곡식에다 겨를 섞어 양을 늘려 속이는 것
반작 : 출납 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허류 : 비상 식량까지도 고리로 빌려주는 것
4) 암행 어사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 삼정의 문란 → 농민 생활의 곤란, 정부 재정 궁핍
(2) 정부의 시정 노력(성과를 거두지 못함)
① 암행어사의 파견
② 삼정 이정청의 설치
3. 영향
1) 농민의 유랑
-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로 농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
(1) 유랑 농민의 증가
① 농민 생활의 궁핍 :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착취로 농민의 몰락
② 유랑 농민 : 화전민, 임노동자
* 임노동자 : 새로운 농사기술의 개발은 농민의 계층 분화를 가져와 자기 땅이 없던 빈 농들은 농촌을 떠나 광산, 포구, 도시로 몰려가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 락 하였다.
(2) 간도와 연해주로의 이민 증가
(3) 농민 고통의 심화
① 흉년, 재해의 빈발
② 전염병의 유행
③ 농민 부담의 가중
▣ 홍수의 피해
1729년에는 함경도에서만 1,000여 명이 홍수로 사망하였으며, 1832년에는 전국을 엄습한 홍수로 인하여 7,670여 호가 유실되고 293명의 인명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1845년에는 관서지방의 홍수로 4,000여 호가 유실되고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856년에도 해서지방 에서는 5,000여 호의 인가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홍수로 수재민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들은 농촌을 떠나 유랑민이 된 경우가 많았다.
▣ 기근(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함)의 빈발
17세기 중엽 이후 약 200년 동안 비교적 규모가 큰 기근이 52회나 될 정도로 조선 후기에는 기근이 빈발하였다. 1672년의 기근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굶주린 백성이 68만 명 이상이었으며, 그 해 6월의 아사자만 1만 9천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1733년의 기근 때에는 연인원 40여 만의 기민과 1만 3천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1763년의 호남 지방의 기근에서는 48만 정도의 기민이, 1792년의 해서 지방과 관서 지방의 기근에서는 46만여 명의 기민이, 1839년(헌종)에는 전국 기민의 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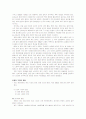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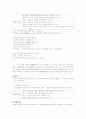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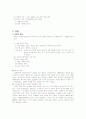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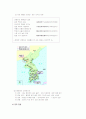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