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丁若鏞의 생애
2. ꡔ茶山論說選集ꡕ 6가지 글의 내용
1) 土地制度 改革의 방향 - 「田論」
2) 淸職의 폐지와 牧民官에 대하여 - 「職官論」
3) 守令과 鄕吏 - 「鄕吏論」
4) 다섯 가지 학문에 대하여 - 「五學論」
5) 湯임금의 정통성 - 「湯論」
6) 牧民官이란 무엇인가 - 「原牧」
3. 茶山 丁若鏞의 改革思想
1) 「五學論」으로 본 丁若鏞의 學術史的 位置
2) 「田論」으로 본 土地制度 改革思想
3) 「湯論」, 「原牧」에서 보이는 政治思想
4) 「職官論」과 「鄕吏論」
4. 정리하며
※ 참고문헌
2. ꡔ茶山論說選集ꡕ 6가지 글의 내용
1) 土地制度 改革의 방향 - 「田論」
2) 淸職의 폐지와 牧民官에 대하여 - 「職官論」
3) 守令과 鄕吏 - 「鄕吏論」
4) 다섯 가지 학문에 대하여 - 「五學論」
5) 湯임금의 정통성 - 「湯論」
6) 牧民官이란 무엇인가 - 「原牧」
3. 茶山 丁若鏞의 改革思想
1) 「五學論」으로 본 丁若鏞의 學術史的 位置
2) 「田論」으로 본 土地制度 改革思想
3) 「湯論」, 「原牧」에서 보이는 政治思想
4) 「職官論」과 「鄕吏論」
4. 정리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즉 현실 정치에의 실천을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 성리의 규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상동. 60p>
오학론 2 에서는 훈고학을 비판하는데 역시 그 긍정적 의의는 인정하였으나, 훈고학이 전수한 것이 반드시 다 본지에 맞는 것은 아니며 본지를 얻었다 해도 字句에 국한되어 道의 가르침의 본원에 거슬러 갈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문장학을 비판한 오학론 3에서는 위의 두 경우와 다르게 바로 비판하고 있다. 정약용은 문장은 지식의 축적과 절실한 내적 요구에 의해 쓰여져야 하는데, 문장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감성적 욕구를 멋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오학론 4에서는 과거학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거학은 자구를 표절하여 일시적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며 修己와 治人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시적 요행수만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유능한 인재도 전혀 실무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술수학을 비판하고 있는 오학론 5에서도 술수학이 수기치인의 학문에 방해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위에서 다룬 다섯가지 학문에 대한 비판은 모두 수기치인의 학문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에서이다. 오학론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수기치인에 방해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주공과 공자의 도란 진정으로 수기치인에 도움에 되는 학문을 의미하며 정약용이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다. 오학론은 다른 학문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자기 학문의 위치 정립 이었다.
2) 田論으로 본 土地制度 改革思想
조선 후기 피폐해져가는 농민들의 삶을 위해 여러 실학자 들이 여러 가지 토지제도 개혁방안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한 토지제도 개혁론은 田論으로 나타나는 閭田制이다. 이 안은 强豪의 土地兼倂과 지주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고 백성의 재산을 均制케 할 것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었다. 즉 정약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주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균등의 기초 위에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愼鏞廈, 茶山 丁若鏞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 丁茶山硏究의 현황, 민음사, 1982. 195p>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여전제 토지개혁론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는 井田制는 지금 실상에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반계 유형원이 주장한 均田制와 성호 이익이 주장한 限田制도 비판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비판하는 공통점이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은 여전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전제균전제한전제의 결함을 없이하면서 당시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전제 토지개혁의 원칙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이다. 이를 위해 그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기존의 정전, 균전, 한전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나온 그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개혁안이었다. 그는 이 전론의 내용에서 여전제를 시행하는 방법과 그 안에서 세를 거두는 방법,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을 다루었는데, 여전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나누고, 그 농작물은 먼저 모두 모아서 국가에 세를 주고, 그리고 그 여를 관리하는 여장의 녹봉을 주며, 나머지 곡물에서 그 농민이 농사지은 날만큼을 계산하여 분배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농민이 일한만큼 분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일한만큼 분배받게 되면 그 여의 농민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니 토지의 모든 생산력을 낼 수 있고, 그만큼 농민들도 부유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 문제는 농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주면 利를 추구하고 害를 피하려는 농민들의 합리적인 행동에 의해 일정기간 후에는 각 여의 생산성과 빈부가 균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동에 제한을 두어서 더더욱 생산성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전제 토지개혁론은 兵制와도 관련이 있는데, 기존의 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전제를 실시하면 그 여는 이미 군대로 쓰일 수 있고, 그 여 내에서도 군사와 戶布를 지불할 사람들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종래의 병제의 폐단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정약용은 여전론이 兵農을 일치시키려는 兵制改革의 구상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 한다. <상동. 212p>
마지막으로 여전제를 실시하면 전세를 10분의 1만 걷어도 결국에 나라와 농민 모두가 부유해질 것 기존의 국가 세금은 20분의 1인데, 지주가 10분의 5를 걷으므로 나라는 가난하고, 지주는 농민들을 수탈하며, 농민들도 가난하다. 그러나 소작을 없애면 국세를 10분의 1만 내도 나라와 농민 모두가 부유해 질 것이다. <상동. 209p>
이라고 이야기하고, 농민에게 기생하고 살아가는 선비들도 결국 생산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여전제를 실시하여 전세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지주층의 폐단을 없애면서 국가의 재정을 탄탄히 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화 됨으로써 나라와 농민 모두가 부유하게 되리라고 보았다. 즉 정약용은 여전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자기시대의 토지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약용의 전론의 여전제 토지개혁론은 당시의 토지문제와 사회경제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대한 구상이며 획기적이고 뛰어난 토지개혁사상 이었다. 이 사상은 본질적으로 ‘농민적 토지개혁’ <상동. 217p>
을 주장하며 그 원리를 밝힌 것인데, 이것은 당시대 농촌사회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이 사상은 정약용의 사회사상중에서 돌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에 쓴 湯論, 原牧등의 글에도 나타나 있는 민본사상과도 밀접히 관련을 가진 것이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상은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며, 우리나라 사회사상사에 획기적인 지적 유물을 남긴 사상이었다.
3) 湯論, 原牧에서 보이는 政治思想
“湯이 桀을
오학론 2 에서는 훈고학을 비판하는데 역시 그 긍정적 의의는 인정하였으나, 훈고학이 전수한 것이 반드시 다 본지에 맞는 것은 아니며 본지를 얻었다 해도 字句에 국한되어 道의 가르침의 본원에 거슬러 갈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문장학을 비판한 오학론 3에서는 위의 두 경우와 다르게 바로 비판하고 있다. 정약용은 문장은 지식의 축적과 절실한 내적 요구에 의해 쓰여져야 하는데, 문장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감성적 욕구를 멋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오학론 4에서는 과거학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거학은 자구를 표절하여 일시적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며 修己와 治人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시적 요행수만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유능한 인재도 전혀 실무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술수학을 비판하고 있는 오학론 5에서도 술수학이 수기치인의 학문에 방해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위에서 다룬 다섯가지 학문에 대한 비판은 모두 수기치인의 학문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에서이다. 오학론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수기치인에 방해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주공과 공자의 도란 진정으로 수기치인에 도움에 되는 학문을 의미하며 정약용이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다. 오학론은 다른 학문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자기 학문의 위치 정립 이었다.
2) 田論으로 본 土地制度 改革思想
조선 후기 피폐해져가는 농민들의 삶을 위해 여러 실학자 들이 여러 가지 토지제도 개혁방안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한 토지제도 개혁론은 田論으로 나타나는 閭田制이다. 이 안은 强豪의 土地兼倂과 지주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고 백성의 재산을 均制케 할 것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었다. 즉 정약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주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균등의 기초 위에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愼鏞廈, 茶山 丁若鏞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 丁茶山硏究의 현황, 민음사, 1982. 195p>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여전제 토지개혁론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는 井田制는 지금 실상에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반계 유형원이 주장한 均田制와 성호 이익이 주장한 限田制도 비판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비판하는 공통점이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은 여전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전제균전제한전제의 결함을 없이하면서 당시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전제 토지개혁의 원칙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이다. 이를 위해 그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기존의 정전, 균전, 한전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나온 그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개혁안이었다. 그는 이 전론의 내용에서 여전제를 시행하는 방법과 그 안에서 세를 거두는 방법,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을 다루었는데, 여전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나누고, 그 농작물은 먼저 모두 모아서 국가에 세를 주고, 그리고 그 여를 관리하는 여장의 녹봉을 주며, 나머지 곡물에서 그 농민이 농사지은 날만큼을 계산하여 분배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농민이 일한만큼 분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일한만큼 분배받게 되면 그 여의 농민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니 토지의 모든 생산력을 낼 수 있고, 그만큼 농민들도 부유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 문제는 농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주면 利를 추구하고 害를 피하려는 농민들의 합리적인 행동에 의해 일정기간 후에는 각 여의 생산성과 빈부가 균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동에 제한을 두어서 더더욱 생산성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전제 토지개혁론은 兵制와도 관련이 있는데, 기존의 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전제를 실시하면 그 여는 이미 군대로 쓰일 수 있고, 그 여 내에서도 군사와 戶布를 지불할 사람들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종래의 병제의 폐단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정약용은 여전론이 兵農을 일치시키려는 兵制改革의 구상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 한다. <상동. 212p>
마지막으로 여전제를 실시하면 전세를 10분의 1만 걷어도 결국에 나라와 농민 모두가 부유해질 것 기존의 국가 세금은 20분의 1인데, 지주가 10분의 5를 걷으므로 나라는 가난하고, 지주는 농민들을 수탈하며, 농민들도 가난하다. 그러나 소작을 없애면 국세를 10분의 1만 내도 나라와 농민 모두가 부유해 질 것이다. <상동. 209p>
이라고 이야기하고, 농민에게 기생하고 살아가는 선비들도 결국 생산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여전제를 실시하여 전세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지주층의 폐단을 없애면서 국가의 재정을 탄탄히 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화 됨으로써 나라와 농민 모두가 부유하게 되리라고 보았다. 즉 정약용은 여전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자기시대의 토지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약용의 전론의 여전제 토지개혁론은 당시의 토지문제와 사회경제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대한 구상이며 획기적이고 뛰어난 토지개혁사상 이었다. 이 사상은 본질적으로 ‘농민적 토지개혁’ <상동. 217p>
을 주장하며 그 원리를 밝힌 것인데, 이것은 당시대 농촌사회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이 사상은 정약용의 사회사상중에서 돌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에 쓴 湯論, 原牧등의 글에도 나타나 있는 민본사상과도 밀접히 관련을 가진 것이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상은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며, 우리나라 사회사상사에 획기적인 지적 유물을 남긴 사상이었다.
3) 湯論, 原牧에서 보이는 政治思想
“湯이 桀을
추천자료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전통음악] 정약용의 악보
[전통음악] 정약용의 악보 (방통대)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관하여
(방통대)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관하여 정약용의 악론을 읽고
정약용의 악론을 읽고 [한문학]한시론(정약용의 조선시론
[한문학]한시론(정약용의 조선시론 신라 교육사상가 원효, 설총, 최치원, 고려 교육사상가 최충과 안향, 고려 교육사상가 이색과...
신라 교육사상가 원효, 설총, 최치원, 고려 교육사상가 최충과 안향, 고려 교육사상가 이색과... 조선 성리학 교육사상(교육철학) 권근과 이황, 조선 성리학 교육사상(교육철학) 이이, 조선 ...
조선 성리학 교육사상(교육철학) 권근과 이황, 조선 성리학 교육사상(교육철학) 이이, 조선 ... 신라 원효, 설총, 최치원의 교육사상, 고려 최충과 안향의 교육사상, 고려 이색과 정몽주의 ...
신라 원효, 설총, 최치원의 교육사상, 고려 최충과 안향의 교육사상, 고려 이색과 정몽주의 ... [교육철학]조선 성리학 이황 교육사상(교육철학), 조선 성리학 이이 교육사상(교육철학), 조...
[교육철학]조선 성리학 이황 교육사상(교육철학), 조선 성리학 이이 교육사상(교육철학), 조...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사상가 권근,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사상가 이황,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사상가 권근,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사상가 이황,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정약용의 목민심서(목민관)
정약용의 목민심서(목민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정약용의 철학(심신묘합, 원욕, 성기호설, 단시설, 인심도심내지송설, 자주지권)
정약용의 철학(심신묘합, 원욕, 성기호설, 단시설, 인심도심내지송설, 자주지권) [독후감]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읽고 _ 정약용 저
[독후감]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읽고 _ 정약용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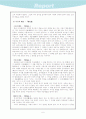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