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목차
1. 매월당 김시습의 생애
1.1 15세기 전반의 사회적 배경
1.2 생장수학기
1.3 방랑편력기(放浪遍歷期)
1.4 금오은둔기(金鰲隱遁期)
1.5 실의배회기(失意徘徊期)
1.6 김시습 일화
2. 매월당 김시습의 사상
2.1 유교사상
2.2 불교사상
2.3 도선사상
2.4 매월당의 인간성에 바탕을 둔 문학관
2.5 문학지상주의적문학관
3. 매월당 김시습의 생애에 대한 고찰
- 매월당의 방외인(方外人)적 인생
4. 금오신화(金鰲神話)
4.1 금오신화를 쓸 당시의 사회적 환경
4.2 金鰲新話에 나타난 김시습의 죽음에 대한 사상
4.3 금오신화의 문학사적 의의
4.4 금오신화에 실린 「이생규장전」(`이생이 담 안을 엿보다`라는 뜻)
4.4.1 줄거리
4.4.2 작품분석
4.4.3 이생규장전의 주제 및 감사
5. 매월당 김시습의 평가.
5.1 조윤제․주왕산의 매월당 문학의 평가
5.2 조동일의「한국소설의 이론」과「한국문학통사」가 평가한 매월당문학
5.3 남북한 문학사적 위상과 평가
5.4 소재영의 문예미학적 립장에서의 평가
5.5 박태상의 「조선조 애정소설연구」에서의 매월당 문학의 평가
5.6 (서울/연합뉴스)
6. 나오면서
-참고문헌
1.1 15세기 전반의 사회적 배경
1.2 생장수학기
1.3 방랑편력기(放浪遍歷期)
1.4 금오은둔기(金鰲隱遁期)
1.5 실의배회기(失意徘徊期)
1.6 김시습 일화
2. 매월당 김시습의 사상
2.1 유교사상
2.2 불교사상
2.3 도선사상
2.4 매월당의 인간성에 바탕을 둔 문학관
2.5 문학지상주의적문학관
3. 매월당 김시습의 생애에 대한 고찰
- 매월당의 방외인(方外人)적 인생
4. 금오신화(金鰲神話)
4.1 금오신화를 쓸 당시의 사회적 환경
4.2 金鰲新話에 나타난 김시습의 죽음에 대한 사상
4.3 금오신화의 문학사적 의의
4.4 금오신화에 실린 「이생규장전」(`이생이 담 안을 엿보다`라는 뜻)
4.4.1 줄거리
4.4.2 작품분석
4.4.3 이생규장전의 주제 및 감사
5. 매월당 김시습의 평가.
5.1 조윤제․주왕산의 매월당 문학의 평가
5.2 조동일의「한국소설의 이론」과「한국문학통사」가 평가한 매월당문학
5.3 남북한 문학사적 위상과 평가
5.4 소재영의 문예미학적 립장에서의 평가
5.5 박태상의 「조선조 애정소설연구」에서의 매월당 문학의 평가
5.6 (서울/연합뉴스)
6. 나오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처럼 매월당은 그의 문학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에게는 실제로 시가 여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는 그의 작품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戱爲
文章於道未爲尊문장은 道보다 높은 게 못 된다지만,
三百餘篇學孔門시 삼백여 편을 공자의 문하에서 배웠네.
商也起予能杜口“商이 날 일으켰다.” 는 말씀 입을 다물게
해도,
大塊假我可無言천지가 내게 (문장을) 빌려 주었으니 말이
없을소냐!
風煙揮肝膽바람과 안개 자욱해서 간담을 휘저으니,
珠玉琅琅入吐呑珠玉 소리 낭랑하게 머금었다 뱉었네.
千首輕侯應有分수없는 시(千首)지으면서 侯마저 업신여김
이 분에 맞으니,
狂歌醉黑自瀾飜미친 노래 취한 먹이 물결처럼 절로 뛰네.
<戱爲>는 말 그대로 장난으로 지어본 것이라고 하면서도 진실이 들어 있는 시다. 商은 공자의 제자 子夏를 가리킨다. 子夏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문학에 재질을 보인 사람으로 魯나라에서 시문학의 始祖라 불리 우는 사람이다.
하루는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다. “/방긋 웃는 미소, 샛별 같은 눈동자여! 얼굴이 희어 예쁘네 / 라는 시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공자가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데, 흰 바탕이 있는 뒤에 彩色하여 아름다움을 이룸을 말한다.” 자하가 말했다. “德을 세운 후에 禮가 따라야 함을 말하나이까?” 공자가 말했다. “나를 일깨우는 이는 너로구나. 비로소 함께 詩를 이야기할 만하다.”
이 말은 ‘그림에서 깨끗한 흰 바탕에 채색이 있어야만 참다운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는 공자의 말뜻을, 자하가 ‘道德의 바탕위에(도덕이 이루어진 다음에) 禮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인격이 완성 된다’는 비유로 그 의미를 이해하자 공자가 감탄한 말이다. 여기서 공자가 ‘비로소 詩를 이야기할 만하다’라고 한 것은 詩文學이란 道와 禮가 갖추어진 다음에야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공자의 문학관이자 성리학자들의 문학관이다.
그러나 시 <戱爲>에서 얘기하고 있는 매월당의 견해는 다르다. 문학의 속성도 사람의 천성이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품부 받은 것이니 道와 禮에 상관없이 표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람과 안개 자욱한 정경을 보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싯구이다. 珠玉소리처럼 낭랑하게 천수 만수 수없이 지어내면서 제후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이 시라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 효용성의 문제와 아울러 성정과 감동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당시의 도덕주의적 문학관에서 보다 자유스런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월당은 문학에 대한 견해는 문학지상주의적 입장이었다.
2.5 문학지상주의적 문학관
매월당은 무엇보다도 시를 짓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했다. 삶에 대한 기대가 적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가 당시 선비들이 교양물로 치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사실이었다.
敍悶
心與事相反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니
除詩無以娛 시없으면 즐길 일 없지.
醉鄕如瞬息 취한 기분도 순식간이고
睡味只須臾 잠자는 맛도 잠깐 사이네.
切齒爭錐賈 송곳 끝을 다투는 장사치 이가 갈리고
寒心牧馬胡 말이나 먹일 오랑캐들처럼 한심해라.
無因獻明薦 인연 없어 정결한 제사 못 올리니
淚永鳴呼 눈물 닦으며 길이 탄식하네.
매월당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심경을 읊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는 심경을, 후반부에서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말하고 있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송곳 끝을 다투는 사람들, 말이나 기르는 오랑캐들처럼 한심한 사람들뿐이다. 때문에 조정에 나가 벼슬을 할 수도 없다. 그러한 번민을 잊게 해주는 것이 ‘술’이나 ‘잠’일 만한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절실함을 읊었다. 어떻든 문학이 지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시문학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는 매월당의 글은 이외에도 많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를 몇 편 보기로 한다.
得古文眞寶
世間珠璧相爭 세상에서 株玉들이 부질없이 다투지만,
用盡終無一羸 다 쓰면 마침내 한 개도 남음이 없네.
此寶若能藏空洞 이 보배를 空洞 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滿腔渾是玉 몸 속 가득한 모두가 옥같은 소리를 내리라.
錦江
錦江春水魚 금강의 봄 물에 魚이 매끄럽게 빛나니,
閑製新詩寫數篇 한가롭게 새 시 지어 몇 편을 쓰는구나.
鉅筆一揮雷雨動 큰 붓 한번 휘두르자 雷雨가 움직이는 듯,
白雲堆裏活龍翩 흰 구름 무더기 속에 용이 살아 꿈틀대네.
<得古文眞寶>에서는 세상의 모든 보물이라는 것이 부질없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남는 것도 없다고 하고 있다. 참다운 예술작품의 영원한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는 말이다.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古文眞寶’와 같은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문학작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錦江>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멋진 詩想이다. 魚은 좋기로 이름난 全州紙를 말한다. 매끄럽게 윤기가 흐르는 全州紙를 보고 詩를 쓰고 싶은 충동에 대뜸 붓을 휘둘렀다. 붓이 흰 종이 위를 움직이니, 그 굳센 모습이 마치 천둥이 치고 뇌성벽력이 치는 듯하다. 남은 여백의 하얀 종이는 흰 구름이요, 검은 글씨는 살아 꿈틀대는 용의 모습이다.
둘째는 시인과 시에 대한 절대적 가치의 인정이다. 시인만이 뇌우를 움직이게 하고 용을 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시문학의 힘과 말 못할 오묘한 이치를 몇 자 안되는 글로 함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문학지상주의적 기개를 펼친 것이요, 매월당의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이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시를 배우거나 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學詩
客言詩可學 손님 말이, 시는 배울 수 있는 거라 하기에,
余對不能傳 내 대답이, 시는 전할 수 없는 거라 했네.
但看其妙處 다만, 그 묘한 곳만 볼 뿐이지,
莫問有聲聯 소리 있는 聯은 묻지 말아야 하네.
山靜雲收野 산 고요하면 구름은 들에서 걷히고,
江澄月上天 강물 맑으면 달이 하늘에 오르느니,
此時如得旨 이런 때 만일 뜻 얻는다 하면,
深我句中仙 나의 싯구 가운데의 神仙을 찾으리.
客言詩可學 손님 말은, 시는 배울 수 있는 거라 하네만,
詩法似寒泉 시의 법은 찬 샘과도 같은 것이네.
觸石多鳴咽 돌에 부
이처럼 매월당은 그의 문학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에게는 실제로 시가 여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는 그의 작품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戱爲
文章於道未爲尊문장은 道보다 높은 게 못 된다지만,
三百餘篇學孔門시 삼백여 편을 공자의 문하에서 배웠네.
商也起予能杜口“商이 날 일으켰다.” 는 말씀 입을 다물게
해도,
大塊假我可無言천지가 내게 (문장을) 빌려 주었으니 말이
없을소냐!
風煙揮肝膽바람과 안개 자욱해서 간담을 휘저으니,
珠玉琅琅入吐呑珠玉 소리 낭랑하게 머금었다 뱉었네.
千首輕侯應有分수없는 시(千首)지으면서 侯마저 업신여김
이 분에 맞으니,
狂歌醉黑自瀾飜미친 노래 취한 먹이 물결처럼 절로 뛰네.
<戱爲>는 말 그대로 장난으로 지어본 것이라고 하면서도 진실이 들어 있는 시다. 商은 공자의 제자 子夏를 가리킨다. 子夏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문학에 재질을 보인 사람으로 魯나라에서 시문학의 始祖라 불리 우는 사람이다.
하루는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다. “/방긋 웃는 미소, 샛별 같은 눈동자여! 얼굴이 희어 예쁘네 / 라는 시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공자가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데, 흰 바탕이 있는 뒤에 彩色하여 아름다움을 이룸을 말한다.” 자하가 말했다. “德을 세운 후에 禮가 따라야 함을 말하나이까?” 공자가 말했다. “나를 일깨우는 이는 너로구나. 비로소 함께 詩를 이야기할 만하다.”
이 말은 ‘그림에서 깨끗한 흰 바탕에 채색이 있어야만 참다운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는 공자의 말뜻을, 자하가 ‘道德의 바탕위에(도덕이 이루어진 다음에) 禮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인격이 완성 된다’는 비유로 그 의미를 이해하자 공자가 감탄한 말이다. 여기서 공자가 ‘비로소 詩를 이야기할 만하다’라고 한 것은 詩文學이란 道와 禮가 갖추어진 다음에야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공자의 문학관이자 성리학자들의 문학관이다.
그러나 시 <戱爲>에서 얘기하고 있는 매월당의 견해는 다르다. 문학의 속성도 사람의 천성이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품부 받은 것이니 道와 禮에 상관없이 표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람과 안개 자욱한 정경을 보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싯구이다. 珠玉소리처럼 낭랑하게 천수 만수 수없이 지어내면서 제후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이 시라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 효용성의 문제와 아울러 성정과 감동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당시의 도덕주의적 문학관에서 보다 자유스런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월당은 문학에 대한 견해는 문학지상주의적 입장이었다.
2.5 문학지상주의적 문학관
매월당은 무엇보다도 시를 짓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했다. 삶에 대한 기대가 적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가 당시 선비들이 교양물로 치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사실이었다.
敍悶
心與事相反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니
除詩無以娛 시없으면 즐길 일 없지.
醉鄕如瞬息 취한 기분도 순식간이고
睡味只須臾 잠자는 맛도 잠깐 사이네.
切齒爭錐賈 송곳 끝을 다투는 장사치 이가 갈리고
寒心牧馬胡 말이나 먹일 오랑캐들처럼 한심해라.
無因獻明薦 인연 없어 정결한 제사 못 올리니
淚永鳴呼 눈물 닦으며 길이 탄식하네.
매월당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심경을 읊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는 심경을, 후반부에서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말하고 있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송곳 끝을 다투는 사람들, 말이나 기르는 오랑캐들처럼 한심한 사람들뿐이다. 때문에 조정에 나가 벼슬을 할 수도 없다. 그러한 번민을 잊게 해주는 것이 ‘술’이나 ‘잠’일 만한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절실함을 읊었다. 어떻든 문학이 지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시문학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는 매월당의 글은 이외에도 많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를 몇 편 보기로 한다.
得古文眞寶
世間珠璧相爭 세상에서 株玉들이 부질없이 다투지만,
用盡終無一羸 다 쓰면 마침내 한 개도 남음이 없네.
此寶若能藏空洞 이 보배를 空洞 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滿腔渾是玉 몸 속 가득한 모두가 옥같은 소리를 내리라.
錦江
錦江春水魚 금강의 봄 물에 魚이 매끄럽게 빛나니,
閑製新詩寫數篇 한가롭게 새 시 지어 몇 편을 쓰는구나.
鉅筆一揮雷雨動 큰 붓 한번 휘두르자 雷雨가 움직이는 듯,
白雲堆裏活龍翩 흰 구름 무더기 속에 용이 살아 꿈틀대네.
<得古文眞寶>에서는 세상의 모든 보물이라는 것이 부질없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남는 것도 없다고 하고 있다. 참다운 예술작품의 영원한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는 말이다.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古文眞寶’와 같은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문학작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錦江>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멋진 詩想이다. 魚은 좋기로 이름난 全州紙를 말한다. 매끄럽게 윤기가 흐르는 全州紙를 보고 詩를 쓰고 싶은 충동에 대뜸 붓을 휘둘렀다. 붓이 흰 종이 위를 움직이니, 그 굳센 모습이 마치 천둥이 치고 뇌성벽력이 치는 듯하다. 남은 여백의 하얀 종이는 흰 구름이요, 검은 글씨는 살아 꿈틀대는 용의 모습이다.
둘째는 시인과 시에 대한 절대적 가치의 인정이다. 시인만이 뇌우를 움직이게 하고 용을 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시문학의 힘과 말 못할 오묘한 이치를 몇 자 안되는 글로 함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문학지상주의적 기개를 펼친 것이요, 매월당의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이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시를 배우거나 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學詩
客言詩可學 손님 말이, 시는 배울 수 있는 거라 하기에,
余對不能傳 내 대답이, 시는 전할 수 없는 거라 했네.
但看其妙處 다만, 그 묘한 곳만 볼 뿐이지,
莫問有聲聯 소리 있는 聯은 묻지 말아야 하네.
山靜雲收野 산 고요하면 구름은 들에서 걷히고,
江澄月上天 강물 맑으면 달이 하늘에 오르느니,
此時如得旨 이런 때 만일 뜻 얻는다 하면,
深我句中仙 나의 싯구 가운데의 神仙을 찾으리.
客言詩可學 손님 말은, 시는 배울 수 있는 거라 하네만,
詩法似寒泉 시의 법은 찬 샘과도 같은 것이네.
觸石多鳴咽 돌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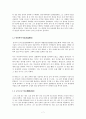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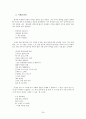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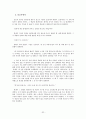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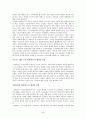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