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목차
1. 조선왕조 한문학의 정착
ㄱ. 전반적 양상
ㄴ. 왕조교체기의 문학 : 건국사업파, 절의충절파
2.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전개
ㄱ. 관인문학
ㄴ. 사림문학
ㄷ. 방외인문학
3. 훈민정음 창제와 서사시, 언해
ㄱ. 훈민정음 창제
ㄴ. 국문서사시
ㄷ. 언해
4. 조선전기 국문시가 문학
ㄱ. 악장
ㄴ. 경기체가
ㄷ. 가사
ㄹ. 시조
5. 산문영역의 확대와 소설의 출현
ㄱ. 산문영역의 확대 : 사서, 잡기, 가전체, 몽유록, 문헌설화, 골계전
ㄴ. 소설의 출현
6. 연희의 양상과 연극의 저류
ㄱ. 꼭두각시놀음
ㄴ. 탈춤
ㄷ. 나례희와 산대희 : 규식지희, 소학지희
ㄱ. 전반적 양상
ㄴ. 왕조교체기의 문학 : 건국사업파, 절의충절파
2.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전개
ㄱ. 관인문학
ㄴ. 사림문학
ㄷ. 방외인문학
3. 훈민정음 창제와 서사시, 언해
ㄱ. 훈민정음 창제
ㄴ. 국문서사시
ㄷ. 언해
4. 조선전기 국문시가 문학
ㄱ. 악장
ㄴ. 경기체가
ㄷ. 가사
ㄹ. 시조
5. 산문영역의 확대와 소설의 출현
ㄱ. 산문영역의 확대 : 사서, 잡기, 가전체, 몽유록, 문헌설화, 골계전
ㄴ. 소설의 출현
6. 연희의 양상과 연극의 저류
ㄱ. 꼭두각시놀음
ㄴ. 탈춤
ㄷ. 나례희와 산대희 : 규식지희, 소학지희
본문내용
상적 윤리를 넘어서는 도가적
삶의 태도를 보여줌.
남긴 제목이 없어 내용을 참고해 ‘미인별곡’이라 일컬음.
☆ <‘양사언’은 누구?>
☞ 양사준의 형으로, 벼슬살이를 얼마간 하다가 세상의 구속을 벗어나고자 금강산에 들어가 노닐다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서호별곡
(西湖別曲)
허 강
한강에 배를 띄우고 물결의 흐름에 따라 마포 어귀까지 내려가는
동안의 풍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풍경 묘사에 중국 고사와 한시 구절을 인용하여, 고전 속의 이름난
곳들을 두루 거쳐나간다는 이중의 풍류를 즐김.
☆ <‘허강’은 누구?>
☞ 아버지가 권신의 배척을 받고 귀양가서 죽자, 충격을 받고 벼슬을 단념하고,강호에서 노는 것을 일삼음.
6.5. 교훈가사 [도학가사]
( ; 사람이 지켜야할 윤리도덕을 서술한 노래로, 문학적 표현수사가 뛰어난 작품×, but도학자의 면모가 잘 나타남)
도 덕 가
이 황
삼강오륜의 유학이념을 강조한 대표적 교훈가사
外 작품: <퇴계가>,<금보가>,<상저가>,<효우가>
자경별곡
이 이
선조代
향풍(鄕風)을 바로 잡기 위한 교훈가.
外 작품: <낙빈가>, <낙지가>
권선지로가
조 식
6.6. 여성가사
( ; 가사는 오랫동안 사대부 남성에 의해 독점되었으나, 여성은 국문을 익히는데 대단한 열의를 가졌으며,
가사로 하소연 할 사연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대략 허초희의 것부터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인정.)
규 원 가
(閨怨歌)
난설헌
허초희
선조代
남편에게 버림받고 규방을 홀로 지키는 여자의 심정을 나타낸 作
일명 ‘원부사’(怨夫詞)라고도 함.
허균의 첩 ‘무옥’이 작가라는 說도 있음.
☆ <‘허초희’는 누구?>
☞ 허균의 누나이고, ‘난설헌’이란 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봉선화가
(鳳仙花歌)
〃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며, 봉선화를 자세히 관찰해서 묘사하여,
여성다운 꿈과 소망을 섬세하고 예리한 표현을 갖춰 묘사한 작품.
☆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끼친 영향>
☞ <규원가>의 신세타령이나, <봉선화가>같은 꽃노래는, 조선후기 ‘규방가사’가 나타날 때,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각각 ‘자탄가’류와 ‘화전가’류로 거듭 창작됨
▶ 시조 Ⅱ : (조선전기) ◀
1. 왕조창건기의 시조
(; 조선왕조가 들어섰어도 시조는, 악장경기체가같은 왕조창업 칭송 없이, 고려에 대한 회고만 거듭해,
시조의 서정적 깊이 재확인)
오백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되 인걸(人傑)은 간 듸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노라
[해석]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땅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니
자연의 모습은 예전과 같으나 빼어난 인재들은 간 곳이 없구나
아아, 태평스러웠던 고려시대가 하룻밤 꿈이었던 것만 같구나
※ 작가이해
고려 유신으로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금오산에 은거하며, 망국의 서러움을 노래하는 작품을 남겼다.
※ 작품이해
[초장] 평민 신분으로 개성 땅을 둘러봄
[중장] 자연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대조
[종장] 태평스럽던 지난 세월이 덧없음을 탄식
① 길 재, <회고가 (懷古歌)>
②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흥망(興亡)이 유수(有數)니 만월대도 수초(愁草)로다.
오백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계워 라.
[해석]
흥망이 운수가 정해졌으니, 고려 궁터 만월대도 풀숲으로 덮였도다
오백 년 고려조의 왕업도 목동의 피리 속에 잠겼으니
저녁때에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을 금하지 못 하겠도다.
※ 작가이해
이성계가 정권을 잡자 치악산에 은거. 태종의 어릴적 스승이었는데, 태종이 은둔하는 그를 불렀으나, 끝내 거절한 일화가 전한다.
※ 작품이해
자신의 심정을 객관화하여 회고의 정 노래.
초장에서는 시각, 중장에선 청각 이미지.
원천석,<흥망이…>과 정도전,<선인교…> 비교
흥망이 유수하니…
선인교 나린물이…
쓸쓸한 느낌을 주다 사라지는 ‘젓대소리’(牧笛) 사용
역사의 흐름을 느끼게 하며 흐를수록 더 커지는 ‘물소리’
고려 도읍지의 옛 터전을 둘러보고, 오백년 도읍 또는 반천년 왕업이 허망하게 되었다는 내용 다룸
③ 정도전, <선인교 나린 물이…>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에 흐르르니
반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 뿐이로다
아희야, 고국(古國) 흥망(興亡)을 무러 무엇 리요
[해석]
선인교에서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 들어오니
오백년이나 되는 고려 왕업이 무너지고 물소리만 남았구나
아희야, 이미 무너진 고려 왕조의 흥망을 따져 무엇하겠느냐?
※ 작가이해
정도전은 조선왕조를 이룩한 주역으로, 창업 칭송에 앞장섰으나, 시조를 지을 땐 원천석, 길재와 같이 회고풍의 시조를 지음.
※ 작품이해
[종장] 설의법으로, 멸망한 고려조에 대한 회상이 무상하므로, 새 왕조에 동참하자는 뜻
(* 선인교; 개성 자하동에 있는 다리 이름.)
2. 왕조교체기 후, 안정기의 정서를 표현한 시조
(; 국가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라 안의 질서를 그 시대의 이상에 맞게 다지기 위해 향리에 묻혀 한가로움을 노래하는 문신들의 작품[ex맹사성,황희]과, 국경을 확장하고 밖으로 위세를 떨치는 것을 과업으로 삼는 무장들의 시조 ‘호기가’[ex남이,김종서]도 함께 출현하기 시작함.)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졀로 난다
탁료계변(濁溪邊)에 금린어(錦鱗魚) 안주(安酒)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이하 3연 생략]
[해석]
아름다운 자연에 봄이 돌아오니 참을 수 없는 흥취가 절로 난다
시에 앉아 막걸리 마시며, 예쁘게 생긴 물고기 잡아 안주 삼도다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냄도 임금님 은덕이시도다
※ 작가이해
좌의정까지 지냈지만, 비가 새는 집에 살고, 평소 바깥 출입을 할 때 소를 타고다녀 재상인 줄 몰랐단 일화가 전할만큼 청렴결백.
※ 작품이해
각 연마다 충의사상이 짙게 베어 있는 작품.
강에서 자연을 즐기는 안분지족의 삶이 임금의 덕이라며, 자연과 임금을 동일시하는 조선시대의 절대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음
④ 맹사성,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 : 최초의 연시조
대쵸볼 불근 골에 밤은 어디 뜻드르며
벼
삶의 태도를 보여줌.
남긴 제목이 없어 내용을 참고해 ‘미인별곡’이라 일컬음.
☆ <‘양사언’은 누구?>
☞ 양사준의 형으로, 벼슬살이를 얼마간 하다가 세상의 구속을 벗어나고자 금강산에 들어가 노닐다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서호별곡
(西湖別曲)
허 강
한강에 배를 띄우고 물결의 흐름에 따라 마포 어귀까지 내려가는
동안의 풍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풍경 묘사에 중국 고사와 한시 구절을 인용하여, 고전 속의 이름난
곳들을 두루 거쳐나간다는 이중의 풍류를 즐김.
☆ <‘허강’은 누구?>
☞ 아버지가 권신의 배척을 받고 귀양가서 죽자, 충격을 받고 벼슬을 단념하고,강호에서 노는 것을 일삼음.
6.5. 교훈가사 [도학가사]
( ; 사람이 지켜야할 윤리도덕을 서술한 노래로, 문학적 표현수사가 뛰어난 작품×, but도학자의 면모가 잘 나타남)
도 덕 가
이 황
삼강오륜의 유학이념을 강조한 대표적 교훈가사
外 작품: <퇴계가>,<금보가>,<상저가>,<효우가>
자경별곡
이 이
선조代
향풍(鄕風)을 바로 잡기 위한 교훈가.
外 작품: <낙빈가>, <낙지가>
권선지로가
조 식
6.6. 여성가사
( ; 가사는 오랫동안 사대부 남성에 의해 독점되었으나, 여성은 국문을 익히는데 대단한 열의를 가졌으며,
가사로 하소연 할 사연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대략 허초희의 것부터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인정.)
규 원 가
(閨怨歌)
난설헌
허초희
선조代
남편에게 버림받고 규방을 홀로 지키는 여자의 심정을 나타낸 作
일명 ‘원부사’(怨夫詞)라고도 함.
허균의 첩 ‘무옥’이 작가라는 說도 있음.
☆ <‘허초희’는 누구?>
☞ 허균의 누나이고, ‘난설헌’이란 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봉선화가
(鳳仙花歌)
〃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며, 봉선화를 자세히 관찰해서 묘사하여,
여성다운 꿈과 소망을 섬세하고 예리한 표현을 갖춰 묘사한 작품.
☆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끼친 영향>
☞ <규원가>의 신세타령이나, <봉선화가>같은 꽃노래는, 조선후기 ‘규방가사’가 나타날 때,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각각 ‘자탄가’류와 ‘화전가’류로 거듭 창작됨
▶ 시조 Ⅱ : (조선전기) ◀
1. 왕조창건기의 시조
(; 조선왕조가 들어섰어도 시조는, 악장경기체가같은 왕조창업 칭송 없이, 고려에 대한 회고만 거듭해,
시조의 서정적 깊이 재확인)
오백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되 인걸(人傑)은 간 듸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노라
[해석]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땅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니
자연의 모습은 예전과 같으나 빼어난 인재들은 간 곳이 없구나
아아, 태평스러웠던 고려시대가 하룻밤 꿈이었던 것만 같구나
※ 작가이해
고려 유신으로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금오산에 은거하며, 망국의 서러움을 노래하는 작품을 남겼다.
※ 작품이해
[초장] 평민 신분으로 개성 땅을 둘러봄
[중장] 자연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대조
[종장] 태평스럽던 지난 세월이 덧없음을 탄식
① 길 재, <회고가 (懷古歌)>
②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흥망(興亡)이 유수(有數)니 만월대도 수초(愁草)로다.
오백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계워 라.
[해석]
흥망이 운수가 정해졌으니, 고려 궁터 만월대도 풀숲으로 덮였도다
오백 년 고려조의 왕업도 목동의 피리 속에 잠겼으니
저녁때에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을 금하지 못 하겠도다.
※ 작가이해
이성계가 정권을 잡자 치악산에 은거. 태종의 어릴적 스승이었는데, 태종이 은둔하는 그를 불렀으나, 끝내 거절한 일화가 전한다.
※ 작품이해
자신의 심정을 객관화하여 회고의 정 노래.
초장에서는 시각, 중장에선 청각 이미지.
원천석,<흥망이…>과 정도전,<선인교…> 비교
흥망이 유수하니…
선인교 나린물이…
쓸쓸한 느낌을 주다 사라지는 ‘젓대소리’(牧笛) 사용
역사의 흐름을 느끼게 하며 흐를수록 더 커지는 ‘물소리’
고려 도읍지의 옛 터전을 둘러보고, 오백년 도읍 또는 반천년 왕업이 허망하게 되었다는 내용 다룸
③ 정도전, <선인교 나린 물이…>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에 흐르르니
반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 뿐이로다
아희야, 고국(古國) 흥망(興亡)을 무러 무엇 리요
[해석]
선인교에서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 들어오니
오백년이나 되는 고려 왕업이 무너지고 물소리만 남았구나
아희야, 이미 무너진 고려 왕조의 흥망을 따져 무엇하겠느냐?
※ 작가이해
정도전은 조선왕조를 이룩한 주역으로, 창업 칭송에 앞장섰으나, 시조를 지을 땐 원천석, 길재와 같이 회고풍의 시조를 지음.
※ 작품이해
[종장] 설의법으로, 멸망한 고려조에 대한 회상이 무상하므로, 새 왕조에 동참하자는 뜻
(* 선인교; 개성 자하동에 있는 다리 이름.)
2. 왕조교체기 후, 안정기의 정서를 표현한 시조
(; 국가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라 안의 질서를 그 시대의 이상에 맞게 다지기 위해 향리에 묻혀 한가로움을 노래하는 문신들의 작품[ex맹사성,황희]과, 국경을 확장하고 밖으로 위세를 떨치는 것을 과업으로 삼는 무장들의 시조 ‘호기가’[ex남이,김종서]도 함께 출현하기 시작함.)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졀로 난다
탁료계변(濁溪邊)에 금린어(錦鱗魚) 안주(安酒)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이하 3연 생략]
[해석]
아름다운 자연에 봄이 돌아오니 참을 수 없는 흥취가 절로 난다
시에 앉아 막걸리 마시며, 예쁘게 생긴 물고기 잡아 안주 삼도다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냄도 임금님 은덕이시도다
※ 작가이해
좌의정까지 지냈지만, 비가 새는 집에 살고, 평소 바깥 출입을 할 때 소를 타고다녀 재상인 줄 몰랐단 일화가 전할만큼 청렴결백.
※ 작품이해
각 연마다 충의사상이 짙게 베어 있는 작품.
강에서 자연을 즐기는 안분지족의 삶이 임금의 덕이라며, 자연과 임금을 동일시하는 조선시대의 절대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음
④ 맹사성,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 : 최초의 연시조
대쵸볼 불근 골에 밤은 어디 뜻드르며
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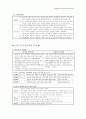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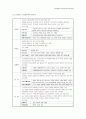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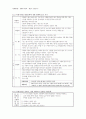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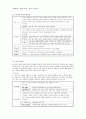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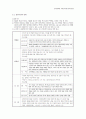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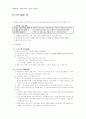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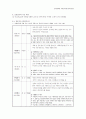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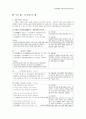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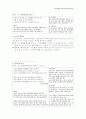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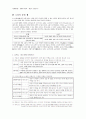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