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작품분석
Ⅲ. 결론- 김지하의 시사적 의의 와 우리들의 생각
Ⅳ. 참고문헌
Ⅱ. 본론 - 작품분석
Ⅲ. 결론- 김지하의 시사적 의의 와 우리들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람은 자기 안에 한울을 모시고 있다. 3) 사람은 마땅히 한울을 길러야 한다. 4) ‘한 그릇의 밥’은 우주의 열매요 자연의 젖이다. 5) 사람은 한울을 체현해야 한다. 6) 개벽은 창조적 진화이다. 7) 불연기연은 창조적 진화의 논리이다.- 40 -
이러한 정신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살림선언은 한살림운동의 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한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다. 2) ‘한살림’은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다. 3) ‘한살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4) ‘한살림’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활동’이다. 5) ‘한살림’은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이다. 6) ‘한살림’은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수양활동’이다. 7) ‘한살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운동‘이다.
2. 작품과 감상
① 새봄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감상 : 우선 시어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벚꽃은 화려하게 피었다 진 것이고,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삶), 인간(삶)의 조화이며 푸른 솔은 변함없이 늘 푸르름은 시대가 변해도 늘 한결같은 사람(삶)을 나타낸 말이다.
소나무와 벚나무의 특징을 대조시키면서 조화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1, 2행은 금방 피었다가 져버리는 벚꽃보다는 늘 변함없이 푸른 솔이 더 좋게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3, 4행은 푸른 솔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푸른 솔만 가득하면 세상이 삭막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때로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벚꽃도 좋다는 것이다.
결국, 노래하는 이(시적 화자)는 낙엽수로서의 벚꽃이 있어야 상록수로서 푸른 솔이 더 돋보이는 것이고, 또한 상록수가 사철 푸르러야 변화의 멋을 느끼게 해 주는 낙엽수가 더 귀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간직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② 비
새가 내린다
작은 새
하이얀 아침 접시꽃 위에
접시 위에
이빠진 칼날 위에도 작은 새
어디에선가
붙잡힌 그이는
하늘에서부턴가
스미어 오는 발자욱 소리 또 밀이삭 소리
귀기울였나 귀기울였나
묶여 간 그이는 시방
고개를 넘었나
눈물은 웬일로 한 방울
피 흐르나
꽃접시
그 위에 내리는 종이새
그 위에 죽어서 날으지 않는 종이새
죽어서도 죽어서도 훨훨훨 날으지
그이는 날으지
새가 내린다
칼날 위에
칼날처럼 내린다
눈이 붉은 작은 새
젖고
마르고
또 젖어드는 내 눈망울 속에 꽃접시
뜨락에도 붉은 꽃접시
언제부턴가 떨리며
옛날부턴가 그 위에 위에
저주처럼 내려
내려 쌓이는
하이얀
종이로 만든
비.
감상 : 리듬마저 리듬에 실어 노래이다. 김지하씨의 시집 ‘화개’(]開)를 읽다가 ‘비’라는 제목의 시를 만났다. ‘화개’에는 육체적ㆍ정신적 노쇠 이후의 삶이 감당해야 할 을씨년스러움을 잿빛 이미지에 담은 시들이 여럿 있는데, 굳이 칸막이를 하자면 ‘비’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시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을 정신의 암흑 속에서 보낸 독일 시인 횔덜린에게 시적 자아를 투사하는 ‘횔덜린’의 화자나, 독서인으로서 시력의 감퇴를 한탄하며 침침한 눈으로 살아야 할 여생을 걱정하는 ‘쉰둘’의 화자에 견주어, ‘비’의 화자는 몸에 한결 더 밀착해 있다. 말하자면 ‘비’의 화자는 ‘횔덜린’이나 ‘쉰둘’의 화자처럼 지식인이 아니라, 몸으로 한 생애를 감당하는 육체 예술가, 속된 말로 딴따라에 가깝다. “리듬은 떠나고/ 비만 내린다// 내리는 빗속에/ 춤추며 하소하나// 리듬은 떠나고/ 비만 내린다.” 화자는 리듬에 민감해야 할 예술가인 듯하다. 노래꾼일 수도 있고 춤꾼일 수도 있고 음유 시인의 후예일 수도 있다. 아니 굳이 예술 종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이면 족하다. 그런데 생애의 어느 순간, 그는 리듬을 잃어버렸다. 아마 나이 탓일 것이다. 예전의 그는 빗소리에서 리듬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거기서 아무런 감응을 겪지 못한다. 굳은 감각을 되살리려고 춤추며 하소연해보기도 하지만, 리듬은 잡히지 않는다. 그가 추는 춤은 이제 아무런 신명이 담기지 않은 춤이다.
‘화개’에 실려있는 또 다른 시 ‘빗소리’의 화자는 “빗소리 속엔/ 미래의 리듬이/ 사산된 채로 드러나// 잿빛 하늘에 흔적을 남기던/ 옛사랑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비’의 화자는 빗소리에서 사산된 리듬마저 읽지 못한다. 급기야 화자는 자신의 아우성을 주변의 생물체와 사물들에게 이입한다.
“내리는 빗속에/ 온갖 것 소리지른다// 흙도 사금파리도/ 상추잎도 소리지른다// 닫힌 몸 속에서 누군가 소리지른다.”
빗소리에서 리듬을 읽어낼 감각을 화자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흙도 사금파리도 상추잎도 함께 소리질러 보지만 화자의 몸은 굳게 닫혀 있다. 리듬으로 미만한 세계와 화자의 몸 사이에는 부도체의 벽이 놓여 있다. 그래서 “외침의 침묵”만 흐른다. 결국 화자는 다시 한번 슬프게 확인한다. “리듬은 떠나고/ 비만 내린다.”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과연 리듬을 잃어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의 독자들은 대뜸 알아차릴 수 있다. 리듬이 떠났다고 되뇌는 이 노래야말로 리듬으로 그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시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빗소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쾌한 리듬이 완강히 버티고 있다. 만약에 ‘비’의 화자가 김지하씨와 온전히 겹친다면, 리듬은 적막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듯한 이 시인을 아직 떠나지 않은 듯하다. 김지하씨는 리듬의 부재마저 리듬에 실어 노래하는 시인이다.
③ 중심의 괴로움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 밑으로 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피어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감상 : 시적 화자 즉 서술자는 꽃을 보고 있다. 1연에서 꽃을 보고 있는데 꽃이 흔들린다고 하고 있다. 제목에서의 중심이란 곧 꽃대를 말하는 것니까, 꽃대가 흔들린다는 것은 곳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3연에서
이러한 정신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살림선언은 한살림운동의 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한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다. 2) ‘한살림’은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다. 3) ‘한살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4) ‘한살림’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활동’이다. 5) ‘한살림’은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이다. 6) ‘한살림’은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수양활동’이다. 7) ‘한살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운동‘이다.
2. 작품과 감상
① 새봄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감상 : 우선 시어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벚꽃은 화려하게 피었다 진 것이고,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삶), 인간(삶)의 조화이며 푸른 솔은 변함없이 늘 푸르름은 시대가 변해도 늘 한결같은 사람(삶)을 나타낸 말이다.
소나무와 벚나무의 특징을 대조시키면서 조화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1, 2행은 금방 피었다가 져버리는 벚꽃보다는 늘 변함없이 푸른 솔이 더 좋게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3, 4행은 푸른 솔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푸른 솔만 가득하면 세상이 삭막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때로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벚꽃도 좋다는 것이다.
결국, 노래하는 이(시적 화자)는 낙엽수로서의 벚꽃이 있어야 상록수로서 푸른 솔이 더 돋보이는 것이고, 또한 상록수가 사철 푸르러야 변화의 멋을 느끼게 해 주는 낙엽수가 더 귀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간직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② 비
새가 내린다
작은 새
하이얀 아침 접시꽃 위에
접시 위에
이빠진 칼날 위에도 작은 새
어디에선가
붙잡힌 그이는
하늘에서부턴가
스미어 오는 발자욱 소리 또 밀이삭 소리
귀기울였나 귀기울였나
묶여 간 그이는 시방
고개를 넘었나
눈물은 웬일로 한 방울
피 흐르나
꽃접시
그 위에 내리는 종이새
그 위에 죽어서 날으지 않는 종이새
죽어서도 죽어서도 훨훨훨 날으지
그이는 날으지
새가 내린다
칼날 위에
칼날처럼 내린다
눈이 붉은 작은 새
젖고
마르고
또 젖어드는 내 눈망울 속에 꽃접시
뜨락에도 붉은 꽃접시
언제부턴가 떨리며
옛날부턴가 그 위에 위에
저주처럼 내려
내려 쌓이는
하이얀
종이로 만든
비.
감상 : 리듬마저 리듬에 실어 노래이다. 김지하씨의 시집 ‘화개’(]開)를 읽다가 ‘비’라는 제목의 시를 만났다. ‘화개’에는 육체적ㆍ정신적 노쇠 이후의 삶이 감당해야 할 을씨년스러움을 잿빛 이미지에 담은 시들이 여럿 있는데, 굳이 칸막이를 하자면 ‘비’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시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을 정신의 암흑 속에서 보낸 독일 시인 횔덜린에게 시적 자아를 투사하는 ‘횔덜린’의 화자나, 독서인으로서 시력의 감퇴를 한탄하며 침침한 눈으로 살아야 할 여생을 걱정하는 ‘쉰둘’의 화자에 견주어, ‘비’의 화자는 몸에 한결 더 밀착해 있다. 말하자면 ‘비’의 화자는 ‘횔덜린’이나 ‘쉰둘’의 화자처럼 지식인이 아니라, 몸으로 한 생애를 감당하는 육체 예술가, 속된 말로 딴따라에 가깝다. “리듬은 떠나고/ 비만 내린다// 내리는 빗속에/ 춤추며 하소하나// 리듬은 떠나고/ 비만 내린다.” 화자는 리듬에 민감해야 할 예술가인 듯하다. 노래꾼일 수도 있고 춤꾼일 수도 있고 음유 시인의 후예일 수도 있다. 아니 굳이 예술 종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이면 족하다. 그런데 생애의 어느 순간, 그는 리듬을 잃어버렸다. 아마 나이 탓일 것이다. 예전의 그는 빗소리에서 리듬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거기서 아무런 감응을 겪지 못한다. 굳은 감각을 되살리려고 춤추며 하소연해보기도 하지만, 리듬은 잡히지 않는다. 그가 추는 춤은 이제 아무런 신명이 담기지 않은 춤이다.
‘화개’에 실려있는 또 다른 시 ‘빗소리’의 화자는 “빗소리 속엔/ 미래의 리듬이/ 사산된 채로 드러나// 잿빛 하늘에 흔적을 남기던/ 옛사랑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비’의 화자는 빗소리에서 사산된 리듬마저 읽지 못한다. 급기야 화자는 자신의 아우성을 주변의 생물체와 사물들에게 이입한다.
“내리는 빗속에/ 온갖 것 소리지른다// 흙도 사금파리도/ 상추잎도 소리지른다// 닫힌 몸 속에서 누군가 소리지른다.”
빗소리에서 리듬을 읽어낼 감각을 화자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흙도 사금파리도 상추잎도 함께 소리질러 보지만 화자의 몸은 굳게 닫혀 있다. 리듬으로 미만한 세계와 화자의 몸 사이에는 부도체의 벽이 놓여 있다. 그래서 “외침의 침묵”만 흐른다. 결국 화자는 다시 한번 슬프게 확인한다. “리듬은 떠나고/ 비만 내린다.”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과연 리듬을 잃어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의 독자들은 대뜸 알아차릴 수 있다. 리듬이 떠났다고 되뇌는 이 노래야말로 리듬으로 그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시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빗소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쾌한 리듬이 완강히 버티고 있다. 만약에 ‘비’의 화자가 김지하씨와 온전히 겹친다면, 리듬은 적막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듯한 이 시인을 아직 떠나지 않은 듯하다. 김지하씨는 리듬의 부재마저 리듬에 실어 노래하는 시인이다.
③ 중심의 괴로움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 밑으로 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피어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감상 : 시적 화자 즉 서술자는 꽃을 보고 있다. 1연에서 꽃을 보고 있는데 꽃이 흔들린다고 하고 있다. 제목에서의 중심이란 곧 꽃대를 말하는 것니까, 꽃대가 흔들린다는 것은 곳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3연에서
추천자료
 국문학사 만해 한용운
국문학사 만해 한용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여성의 역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여성의 역할 이육사의 문학과 작품세계
이육사의 문학과 작품세계 백 석 ( 그의 삶과 시 세계 )
백 석 ( 그의 삶과 시 세계 ) [한국문학사] 김소월의 시세계 문학의 배경 및 작품세계
[한국문학사] 김소월의 시세계 문학의 배경 및 작품세계 고정희 시세계 (광주와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고정희 시세계 (광주와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신경림 시 '갈대'
신경림 시 '갈대'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삽을 씻고 [김삿갓][유랑에 대한 시][비극적비판을 다룬 시][여인 관련 시][언어적 유희]김삿갓의 생애,...
[김삿갓][유랑에 대한 시][비극적비판을 다룬 시][여인 관련 시][언어적 유희]김삿갓의 생애,... [한국현대문학A+] 1970년대 민족문학 분석 - 현기영,황석영,이문구 작가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A+] 1970년대 민족문학 분석 - 현기영,황석영,이문구 작가 중심으로 신동엽론
신동엽론 2012년 2학기 현대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시집 감상 및 비평-나무의 수사학)
2012년 2학기 현대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시집 감상 및 비평-나무의 수사학) 국문학 - 푸슈킨 [Aleksandr Sergeevich Pushkin, 1799
국문학 - 푸슈킨 [Aleksandr Sergeevich Pushkin, 1799 [현대문학사] 1960년대 문학
[현대문학사] 1960년대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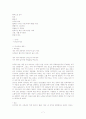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