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글 --------------- 2
2. 본론
2.1 가사의 명칭연원시초 ----- 2
2.2 가사의 장르 ------------10
2.3 가사의 형식 ------------12
2.4가사의 내용 -------------16
2.5 가사의 사적흐름 ---------20
3. 나오는 글 --------------- 23
☺참고문헌 ---------------- 24
2. 본론
2.1 가사의 명칭연원시초 ----- 2
2.2 가사의 장르 ------------10
2.3 가사의 형식 ------------12
2.4가사의 내용 -------------16
2.5 가사의 사적흐름 ---------20
3. 나오는 글 --------------- 23
☺참고문헌 ---------------- 24
본문내용
식적 특성이 하나의 장르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독자성과 특이성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가 시상전개 방식의 특이성을 가진다. 박인호, 가사문학 장르론, 다운샘, 2003
즉, 시상전개 방식이 ‘부분적 시상의 독자성, 독립된 시상의 나열, 나열된 시상의 통합’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려말 발생초기에는 포교의 목적인 교술적 장르를 지향하고, 300여년의 공백을 거쳐 조선초기에는 서정적 장르를 지향하는 듯하다가(강호자연), 17세기 이후에는 경험적 현실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일어나 다시 교술적 장르가 성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는 서사장르, 서정장르, 주제장르 등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가사가 하나의 장르를 규정지을 만한 독자성과 특이성을 가졌는가 부터 그 특이성이 장르가 가지는 형식적 기준을 만족하는가에 대해 논의 하였고 가사는 교술적(주제적) 양식의 갈래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통시적) 볼 때에 가사의 양식이 불교포교의 목적 즉, 교술적 양식로 시작되었다가, 조선에 와서 서정적 양식으로 사대부의 강호한정을 노래하고, 교술적 양식으로 백성을 훈민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서정적 양식, 서사적 양식, 교술적 양식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2.3 가사의 형식
1) 3단 구성과 결사의 형식
현전하는 가사를 보면 거의 모든 작품이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 구성은 가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서사와 본사와 결사의 공간적 성격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함으로써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서사에는 작가의 현재 상황과 본사에서 노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본사에서는 작가가 노래하려고 하는 중심적인 것들을 담고 있으며, 결사에서는 작가의 정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작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願望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전기의 강호가사를 비롯하여 기행가사, 유배가사 등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사가 지닌 중요한 형식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3단 구성의 구조와 함께 언급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결사의 형식이다, 가사에서 말하는 결사의 형식은 작품의 마지막 행을 시조의 마지막 행과 같은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대부가사에 시조 종장과 같은 結詞를 가진 것이 많다.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엇더하리 <賞春曲>
우리도 이방하찌여내야 父母供養 하리라 <相杵歌>
님이야 날인쥴모라셔도 내님조차려 하노라 <思美人曲>
각시님 달이야카니와 구잔비나 되쇼셔 <續美人曲>
그밧긔 남은일이야 삼긴대로 살렷노라 <陋港詞>
이몸은 이강산풍월에 늘글주를 모라로라 <蘆溪歌>
두어라 왕셔긔개지랄 여일망지 하노라 <續思美人曲>
이글을 仔細히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農家月令歌>
이 외에도 많은 사대부가사들이 시조 종장형식과 같은 마지막 행의 제2음보가 過音節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結詞形式을 가진 가사를 정격가사(政格歌辭)라 하고 결사형식을 가지지 않은 가사를 변격가사(變格歌辭)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가사문학 형성기의 작품들이 대개 시조와 같은 결사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문학 융성기의 유명 작가들의 가사에도 결사형식을 갖춘 것과 갖추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에서 결사형식의 유무를 가지고 정형과 변형으로 나누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초기의 가사들 중에서 <僧元歌>.<西往歌Ⅱ>.<樂道歌>.<尋牛歌>.<修道歌> 등의 불교가사와 <梅窓月歌>.<樂志歌>. <면앙정가> 등의 사대부가사는 시조의 종장과 같은 결사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於西於西 低極樂애 速耳速耳 受耳可自 <승원가>
자로성해 菩堤場에 太平歌를 블러보세 <서왕가Ⅱ>
각슈담화 조혼꼿치 쳐쳐에 피엇더라 <낙도가>
여보參禪 동모님네 이말삼을 信聽하오 <심우가>
三寶께 맞이하고 일중에 供養하올리라 <수도가>
平生에 한詩를 을푸기 죠와하노라 <매창월가>
竹長銃의 樂志論을 我亦私淑 하여셔라 <낙지가>
이몸이 이렁굼도 亦君恩이샷다 <면앙정가>
그리고 사대부가사의 발흥기라 할 수 있는 명종, 선조 대에 창작된 가사 중에도 <도덕가>, <자경별곡>, <강촌별곡>, <독락당> 등은 시조의 결사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사대부가사에 시조의 종장과 같은 결사형식이 쓰이게 된 것은 그들의 취향과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은 사고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취향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사에도 분명한 형태를 원했을 것이고 이러한 취향과 요구를 그들이 향수해 오던 시조에서 종결의 형식을 쉽게 차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34음수의 율조와 4음보의 형식
가사는 조선조 전 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변모해 왔기 때문에 音數律과 音步律도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양반사대부가 작가의 중심을 이루었던 조선 전기의 작품들을 보면 음수율에서는 34조가 중심을 이루면서 44조, 23조, 24조 등도 많았다. 조선전기의 사대부가사에 3.4조를 비롯한 2.3조,2.4조 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기 사대부 가사들이 주어나 목적어가 많이 오는, 가사 각 행의 제1음보와 제3음보에 한자 어구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는 한자어로 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체언에는 토가 생략되어도 뜻이 잘 통하므로 토가 생략되면 자연히 2나 3이라는 음수가 많아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조선전기의 가사들이 대개 가창되었기 때문에 4.4조와 같이 안정된 음수율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기의 서민가사나 내방가사의 경우에는 우리말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 등 체언에 토가 붙어야 했고, 또한 후기가사는 가창보다는 음영위주로 변하였기 때문에 율독상 안정된 음수율이 필요해서 4.4조라는, 앞뒤가 균형된 음수율로 안착됐다고 본다. 결국, 가사의 음수율은 제1음보≤제2음보, 제3음보≤제4음보라 할 수 있다.
후기의 서민가사, 내방가사로 갈수록 음수율이 파괴되면서 44조 중심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숑근(松根)을 다시쓸고
대부분의 가사가 시상전개 방식의 특이성을 가진다. 박인호, 가사문학 장르론, 다운샘, 2003
즉, 시상전개 방식이 ‘부분적 시상의 독자성, 독립된 시상의 나열, 나열된 시상의 통합’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려말 발생초기에는 포교의 목적인 교술적 장르를 지향하고, 300여년의 공백을 거쳐 조선초기에는 서정적 장르를 지향하는 듯하다가(강호자연), 17세기 이후에는 경험적 현실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일어나 다시 교술적 장르가 성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는 서사장르, 서정장르, 주제장르 등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가사가 하나의 장르를 규정지을 만한 독자성과 특이성을 가졌는가 부터 그 특이성이 장르가 가지는 형식적 기준을 만족하는가에 대해 논의 하였고 가사는 교술적(주제적) 양식의 갈래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통시적) 볼 때에 가사의 양식이 불교포교의 목적 즉, 교술적 양식로 시작되었다가, 조선에 와서 서정적 양식으로 사대부의 강호한정을 노래하고, 교술적 양식으로 백성을 훈민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서정적 양식, 서사적 양식, 교술적 양식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2.3 가사의 형식
1) 3단 구성과 결사의 형식
현전하는 가사를 보면 거의 모든 작품이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 구성은 가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서사와 본사와 결사의 공간적 성격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함으로써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서사에는 작가의 현재 상황과 본사에서 노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본사에서는 작가가 노래하려고 하는 중심적인 것들을 담고 있으며, 결사에서는 작가의 정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작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願望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전기의 강호가사를 비롯하여 기행가사, 유배가사 등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사가 지닌 중요한 형식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3단 구성의 구조와 함께 언급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결사의 형식이다, 가사에서 말하는 결사의 형식은 작품의 마지막 행을 시조의 마지막 행과 같은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대부가사에 시조 종장과 같은 結詞를 가진 것이 많다.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엇더하리 <賞春曲>
우리도 이방하찌여내야 父母供養 하리라 <相杵歌>
님이야 날인쥴모라셔도 내님조차려 하노라 <思美人曲>
각시님 달이야카니와 구잔비나 되쇼셔 <續美人曲>
그밧긔 남은일이야 삼긴대로 살렷노라 <陋港詞>
이몸은 이강산풍월에 늘글주를 모라로라 <蘆溪歌>
두어라 왕셔긔개지랄 여일망지 하노라 <續思美人曲>
이글을 仔細히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農家月令歌>
이 외에도 많은 사대부가사들이 시조 종장형식과 같은 마지막 행의 제2음보가 過音節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結詞形式을 가진 가사를 정격가사(政格歌辭)라 하고 결사형식을 가지지 않은 가사를 변격가사(變格歌辭)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가사문학 형성기의 작품들이 대개 시조와 같은 결사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문학 융성기의 유명 작가들의 가사에도 결사형식을 갖춘 것과 갖추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에서 결사형식의 유무를 가지고 정형과 변형으로 나누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초기의 가사들 중에서 <僧元歌>.<西往歌Ⅱ>.<樂道歌>.<尋牛歌>.<修道歌> 등의 불교가사와 <梅窓月歌>.<樂志歌>. <면앙정가> 등의 사대부가사는 시조의 종장과 같은 결사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於西於西 低極樂애 速耳速耳 受耳可自 <승원가>
자로성해 菩堤場에 太平歌를 블러보세 <서왕가Ⅱ>
각슈담화 조혼꼿치 쳐쳐에 피엇더라 <낙도가>
여보參禪 동모님네 이말삼을 信聽하오 <심우가>
三寶께 맞이하고 일중에 供養하올리라 <수도가>
平生에 한詩를 을푸기 죠와하노라 <매창월가>
竹長銃의 樂志論을 我亦私淑 하여셔라 <낙지가>
이몸이 이렁굼도 亦君恩이샷다 <면앙정가>
그리고 사대부가사의 발흥기라 할 수 있는 명종, 선조 대에 창작된 가사 중에도 <도덕가>, <자경별곡>, <강촌별곡>, <독락당> 등은 시조의 결사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사대부가사에 시조의 종장과 같은 결사형식이 쓰이게 된 것은 그들의 취향과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은 사고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취향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사에도 분명한 형태를 원했을 것이고 이러한 취향과 요구를 그들이 향수해 오던 시조에서 종결의 형식을 쉽게 차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34음수의 율조와 4음보의 형식
가사는 조선조 전 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변모해 왔기 때문에 音數律과 音步律도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양반사대부가 작가의 중심을 이루었던 조선 전기의 작품들을 보면 음수율에서는 34조가 중심을 이루면서 44조, 23조, 24조 등도 많았다. 조선전기의 사대부가사에 3.4조를 비롯한 2.3조,2.4조 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기 사대부 가사들이 주어나 목적어가 많이 오는, 가사 각 행의 제1음보와 제3음보에 한자 어구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는 한자어로 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체언에는 토가 생략되어도 뜻이 잘 통하므로 토가 생략되면 자연히 2나 3이라는 음수가 많아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조선전기의 가사들이 대개 가창되었기 때문에 4.4조와 같이 안정된 음수율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기의 서민가사나 내방가사의 경우에는 우리말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 등 체언에 토가 붙어야 했고, 또한 후기가사는 가창보다는 음영위주로 변하였기 때문에 율독상 안정된 음수율이 필요해서 4.4조라는, 앞뒤가 균형된 음수율로 안착됐다고 본다. 결국, 가사의 음수율은 제1음보≤제2음보, 제3음보≤제4음보라 할 수 있다.
후기의 서민가사, 내방가사로 갈수록 음수율이 파괴되면서 44조 중심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숑근(松根)을 다시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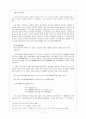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