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5세기와 지금의 음운 체계의 다른 점
2. 변천의 시기
(1) 닿소리 체계의 변천
(2) 홀소리 체계의 변천
(3) 음소 연결 방식의 변천
(4) 높이와 길이의 갈음
3. 변천의 역사
(1) 지금말의 음운 체계의 기반이 닦아짐 : 15-6세기
(2) 지금말의 음절 짜임새 : 17세기-19세기 처음
(3) 홀소리 조직의 큰 변천 (18세기 끝- 지금)
2. 변천의 시기
(1) 닿소리 체계의 변천
(2) 홀소리 체계의 변천
(3) 음소 연결 방식의 변천
(4) 높이와 길이의 갈음
3. 변천의 역사
(1) 지금말의 음운 체계의 기반이 닦아짐 : 15-6세기
(2) 지금말의 음절 짜임새 : 17세기-19세기 처음
(3) 홀소리 조직의 큰 변천 (18세기 끝- 지금)
본문내용
금말에서는 중화된다.)
(라) 말머리에서도 /ㄴ/에 /ㅣ, /가 연결될 수 있었는데, 지금말에서는 이러한 자리의 /ㄴ/는 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ㄴ/ 머리소리 규clr\'이 생겨난다.)
(마) 15세기에는 /ㅢ/ 겹홀소리가 안정되어 있어서, 그 앞에 여러 닿소리 음소(떼)가 올 수 있었는데, 지금말에서는 /ㅢ/ 겹홀소리 자체가 불안정하여, 이러한 연결은 극히 제한된다.
(바) 8 끝소리가 7 끝소리로 바뀐다.
(사) 홀소리 어울림이 거의 허물어졌다.
<운소의다름>성조(toneme)가 없어지고, 그 대신 길이(chroneme)가 생겨난다.
2. 변천의 시기
이러한 두-15세기와 지금-음운 체계의 다름은 조선조 500년 동안에 일어난 변천의 결과인데, 다음으로 이 변천의 하나하나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밝히기로 한다.
(1) 닿소리 체계의 변천
① /ㅸ, ㆅ, ㅿ/가 없어짐
이 세 음소가 없어진 때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한다.
<ㅸ> /ㅸ/는, /ㅂ/가 공깃길이 큰 앞뒤의 소리를 닮아서 변한 소리이다. 그러므로 순 우리말에서는 /ㅸ/는 말머리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닮음이 한 걸음 더 나가면 /ㅸ/의 공깃길이 한층 더 커져서, 완전히 홀소리에 가까운 공깃길을 가지게 되는데(/ㅂ/ > /ㅸ/ > /우/), 이 변화는 /ㅸ/를 포함한 모든 말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다. 이리하여 /ㅸ/는 우리말의 음소로는 완전히 없어지고 만 것이다.
/ㅸ/은 용가,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과 같은, 정음을 만들던 때의 문헌에는 쓰여 있으나, 1460년대 세조조의 불경 언해류에서는 이 글자는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떨어지거나 또는 [오, 우]로 바뀐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이 음소는 이미 1440년대에 동요하기 시작하여 서기 1450~1460년 사이에 없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ㅸ/가 없어진 때는 비교적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이 글자를 쓰고 있는 문헌과 쓰지 않는 문헌이 연대적으로 분명히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변화한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이미 갖추어져 있을 때는, 그 변화는 바로 문헌에 반영되기 쉽다. 그러나 변화한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따로 없을 때는, 그 변화의 반영은 늦게 나타나거나, 나타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ㅸ/>/우/의 변화는, /우/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바로 문헌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음운 변천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ㆅ> /ㆅ/은 [c]의 된소리인데, 이 소리는 꽤 발음하기 힘드는 것이므로 때로는 단순한 /ㅎ/소리로 내어 버리기도 하고 (도ㆅㅕ > 도로혀), 때로는 /ㅆ/로 바뀌기도 하고, ㆅㅕ- >써-), 때로는 [c‘]의 공깃길이 아주 좁혀져서 /ㅋ/로 변하기도 하였다. (ㆅㅕ- > 켜)
그런데 「ㆅ」은, 용가, 월인석보 등에서는 물론 쓰였고, 그리고 세조 때의 불경 언해류에도 나타나는데, 1481년에 나온 두시언해 이후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ㆅ/는 대체로 1460년경에 이미 동요가 심하다가, 1480년경에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ㆅ/도, 그 변한 소리를 적을 글자가 이미 있었으므로, 그 변천은 문헌에 빨리 반영되는 것이다.
<ㅿ> /ㅿ/도 /ㅸ/과 같이, /ㅅ/가 울림소리 사이에서 울림소리 된 것이므로, 순 우리말에서는 말머리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리 닮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뒤의 울림소리의 공깃길을 닮아 공깃길이 커져서 떨어지고 마는 것인데, 이 닮음은 /ㅿ/는 우리 음운 체계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만다. /ㅿ/은 16세기에 동요되기 시작하여 임진(1592) 이전에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ㅿ/도 그 없어진 말의 표기법은 쉽사리 구할 수 있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그 없어진 꼴이 문헌에 반영된 것은 빨랐으며, 글자의 보수성을 이유로, 그 없어진 시기를 15세기 끝 시기까지 가져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음소의 없어지고 바뀌는 것은, 반드시 한 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방언에 따라 다름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며, 같은 방언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낱말에 따라 그 바뀌는 시기는 어느 정도의 폭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 음소가 없어졌다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명맥을 지니고 있던 마지막 낱말에까지 그 것이 없어져야 한다. 한 음소는 몇 개의 낱말에서도 목숨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ㅿ/가 동요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겹닿소리 음소의 없어짐, 된소리의 발달
위에서 말한 여러 음소들은, 그 쓰여 있는 문헌과 그렇지 않은 것이 연대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없어진 연대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할 겹닿소리 음소, 곧 /ㅳ, ㅄ/ 따위는 그렇지 못하여서- 이를테면 「ㅅ」계는 물론이오, 「ㅂ」계도 최근세까지 그대로 쓰여 내려왔다- 그 없어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겹닿소리 음소는 거의 다 그 끝닿소리에 닮아서, 드디어 끝닿소리의 된소리로 바뀌는 것인데 -「ㅻ,ㅷ」빼고- 그 된소리 된 시기는 「ㅅ」-계와 「ㅂ」-계가 각각 달랐으리라고 보아진다.
「ㅅ」- 계는 대체로 서기 16세기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며, 「ㅂ」-계는 17세기 끝에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여 1730년경에는 그 변천은 완성되었다. 「ㅄ」-계는 16세기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된소리로 합류한 것도 있고, 「ㅂ」-계로 합류한 것도 있다. (이것은 「ㅂ」-계와 운명을 같이한다.)
이리하여 조선 초기 훈민정음을 만들던 그 때에 있어서는 , 된소리 [ㄲ, ㄸ, ㅃ, ㅉ]는 독립한 음소로서 그리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러한 변천으로 말미암아, 된소리는 우리 음운 체계 안에서, 확고부동한 독립 음소의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어 음운사 상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된소리의 발달은 약한 소리가 된소리 됨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촉진되어 내려온 것이다.
예 ) 곶>꽃, 불휘>뿌리, 가치>까치, 걱다>꺾다,
(라) 말머리에서도 /ㄴ/에 /ㅣ, /가 연결될 수 있었는데, 지금말에서는 이러한 자리의 /ㄴ/는 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ㄴ/ 머리소리 규clr\'이 생겨난다.)
(마) 15세기에는 /ㅢ/ 겹홀소리가 안정되어 있어서, 그 앞에 여러 닿소리 음소(떼)가 올 수 있었는데, 지금말에서는 /ㅢ/ 겹홀소리 자체가 불안정하여, 이러한 연결은 극히 제한된다.
(바) 8 끝소리가 7 끝소리로 바뀐다.
(사) 홀소리 어울림이 거의 허물어졌다.
<운소의다름>성조(toneme)가 없어지고, 그 대신 길이(chroneme)가 생겨난다.
2. 변천의 시기
이러한 두-15세기와 지금-음운 체계의 다름은 조선조 500년 동안에 일어난 변천의 결과인데, 다음으로 이 변천의 하나하나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밝히기로 한다.
(1) 닿소리 체계의 변천
① /ㅸ, ㆅ, ㅿ/가 없어짐
이 세 음소가 없어진 때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한다.
<ㅸ> /ㅸ/는, /ㅂ/가 공깃길이 큰 앞뒤의 소리를 닮아서 변한 소리이다. 그러므로 순 우리말에서는 /ㅸ/는 말머리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닮음이 한 걸음 더 나가면 /ㅸ/의 공깃길이 한층 더 커져서, 완전히 홀소리에 가까운 공깃길을 가지게 되는데(/ㅂ/ > /ㅸ/ > /우/), 이 변화는 /ㅸ/를 포함한 모든 말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다. 이리하여 /ㅸ/는 우리말의 음소로는 완전히 없어지고 만 것이다.
/ㅸ/은 용가,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과 같은, 정음을 만들던 때의 문헌에는 쓰여 있으나, 1460년대 세조조의 불경 언해류에서는 이 글자는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떨어지거나 또는 [오, 우]로 바뀐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이 음소는 이미 1440년대에 동요하기 시작하여 서기 1450~1460년 사이에 없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ㅸ/가 없어진 때는 비교적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이 글자를 쓰고 있는 문헌과 쓰지 않는 문헌이 연대적으로 분명히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변화한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이미 갖추어져 있을 때는, 그 변화는 바로 문헌에 반영되기 쉽다. 그러나 변화한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따로 없을 때는, 그 변화의 반영은 늦게 나타나거나, 나타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ㅸ/>/우/의 변화는, /우/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바로 문헌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음운 변천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ㆅ> /ㆅ/은 [c]의 된소리인데, 이 소리는 꽤 발음하기 힘드는 것이므로 때로는 단순한 /ㅎ/소리로 내어 버리기도 하고 (도ㆅㅕ > 도로혀), 때로는 /ㅆ/로 바뀌기도 하고, ㆅㅕ- >써-), 때로는 [c‘]의 공깃길이 아주 좁혀져서 /ㅋ/로 변하기도 하였다. (ㆅㅕ- > 켜)
그런데 「ㆅ」은, 용가, 월인석보 등에서는 물론 쓰였고, 그리고 세조 때의 불경 언해류에도 나타나는데, 1481년에 나온 두시언해 이후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ㆅ/는 대체로 1460년경에 이미 동요가 심하다가, 1480년경에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ㆅ/도, 그 변한 소리를 적을 글자가 이미 있었으므로, 그 변천은 문헌에 빨리 반영되는 것이다.
<ㅿ> /ㅿ/도 /ㅸ/과 같이, /ㅅ/가 울림소리 사이에서 울림소리 된 것이므로, 순 우리말에서는 말머리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리 닮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뒤의 울림소리의 공깃길을 닮아 공깃길이 커져서 떨어지고 마는 것인데, 이 닮음은 /ㅿ/는 우리 음운 체계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만다. /ㅿ/은 16세기에 동요되기 시작하여 임진(1592) 이전에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ㅿ/도 그 없어진 말의 표기법은 쉽사리 구할 수 있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그 없어진 꼴이 문헌에 반영된 것은 빨랐으며, 글자의 보수성을 이유로, 그 없어진 시기를 15세기 끝 시기까지 가져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음소의 없어지고 바뀌는 것은, 반드시 한 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방언에 따라 다름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며, 같은 방언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낱말에 따라 그 바뀌는 시기는 어느 정도의 폭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 음소가 없어졌다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명맥을 지니고 있던 마지막 낱말에까지 그 것이 없어져야 한다. 한 음소는 몇 개의 낱말에서도 목숨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ㅿ/가 동요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겹닿소리 음소의 없어짐, 된소리의 발달
위에서 말한 여러 음소들은, 그 쓰여 있는 문헌과 그렇지 않은 것이 연대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없어진 연대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할 겹닿소리 음소, 곧 /ㅳ, ㅄ/ 따위는 그렇지 못하여서- 이를테면 「ㅅ」계는 물론이오, 「ㅂ」계도 최근세까지 그대로 쓰여 내려왔다- 그 없어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겹닿소리 음소는 거의 다 그 끝닿소리에 닮아서, 드디어 끝닿소리의 된소리로 바뀌는 것인데 -「ㅻ,ㅷ」빼고- 그 된소리 된 시기는 「ㅅ」-계와 「ㅂ」-계가 각각 달랐으리라고 보아진다.
「ㅅ」- 계는 대체로 서기 16세기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며, 「ㅂ」-계는 17세기 끝에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여 1730년경에는 그 변천은 완성되었다. 「ㅄ」-계는 16세기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된소리로 합류한 것도 있고, 「ㅂ」-계로 합류한 것도 있다. (이것은 「ㅂ」-계와 운명을 같이한다.)
이리하여 조선 초기 훈민정음을 만들던 그 때에 있어서는 , 된소리 [ㄲ, ㄸ, ㅃ, ㅉ]는 독립한 음소로서 그리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러한 변천으로 말미암아, 된소리는 우리 음운 체계 안에서, 확고부동한 독립 음소의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어 음운사 상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된소리의 발달은 약한 소리가 된소리 됨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촉진되어 내려온 것이다.
예 ) 곶>꽃, 불휘>뿌리, 가치>까치, 걱다>꺾다,
추천자료
 [과외]중학 국어 2-1학기 기말 4단원 삶과 문학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1학기 기말 4단원 삶과 문학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1학기 기말 4단원 삶과 문학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1학기 기말 4단원 삶과 문학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3-1학기 기말 6단원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3-1학기 기말 6단원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3-1학기 기말 6단원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3-1학기 기말 6단원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2학기 중간 3단원 문학의 표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2학기 중간 3단원 문학의 표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1-2학기 기말 6단원 문학과 독자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1-2학기 기말 6단원 문학과 독자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1-2학기 기말 6단원 문학과 독자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1-2학기 기말 6단원 문학과 독자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2학기 기말 3단원 문학의 표현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2학기 기말 3단원 문학의 표현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2학기 기말 3단원 문학의 표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2-2학기 기말 3단원 문학의 표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중1-1학기 01 단원 문학의 즐거움 02
[과외]중학 국어 중1-1학기 01 단원 문학의 즐거움 02 [과외]중학 국어 중1-1학기 03 단원 문학과 의사소통 02
[과외]중학 국어 중1-1학기 03 단원 문학과 의사소통 02 [과외]중학 국어 중1-2학기 02 단원 문학의 아름다움 02
[과외]중학 국어 중1-2학기 02 단원 문학의 아름다움 02 [과외]고등 국어 문학 기출 01
[과외]고등 국어 문학 기출 01 [과외]고등 국어 문학 기출 02
[과외]고등 국어 문학 기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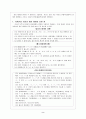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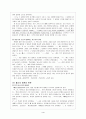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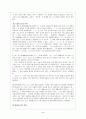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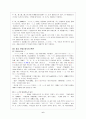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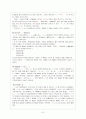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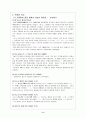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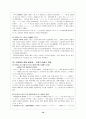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