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머리말
II.어석풀이
III.문학적 해석
3-1.역사적 배경
3-2.창작 장소와 시기
3-3.형식
3-4.명칭·전승·문학사적 의의
VI.끝맺는 말
II.어석풀이
III.문학적 해석
3-1.역사적 배경
3-2.창작 장소와 시기
3-3.형식
3-4.명칭·전승·문학사적 의의
VI.끝맺는 말
본문내용
와 문학적 해석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학적 해석에서는 역사적 배경, 창작 시기와 장소, 형식, 명칭·전승·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겠다.
II.어석풀이
(前腔) 내 님믈 그리와 우니나니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지내니
(中腔) 山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사실이 아니며 모든 것이 거짓인 줄을 아!
(附葉) 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지새는 달과 새벽 별만이 아실 것입니다.
(大葉) 넉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죽은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고 싶구나 아!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내 죄를 우기던 이, 그 누구였습니까.
(二葉)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나는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三葉) 힛마려(리)시뎌 사람들의 거짓말이었구나!
(四葉) 읏브뎌(븐뎌) 아으 슬프구나 아!
(附葉)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님께서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아! 님이시여 돌려 들으시고 아껴주소서.
<樂學軌範 권 5>
*( )안은 蓬左文庫本 악학궤범의 표기이다.
1.내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더니
(1)내>내가(박병채); 나(我)+이(주격조사). 나(我)의 주격형
나의(양주동)
(2)님믈>님을
·‘니믈’이나 ‘님을’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님믈’로 표기된 것은 철자법의 혼합상태를 나타낸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연철과 분철이 혼용되어서 사용됨)
(3)그리와>그리워하며
·그리(戀·慕)+와(겸양선어말어미 의 부사형). ‘그리다’는 畵의 訓 ‘그리다’와 동일어원의 동사인 바 ‘戀慕’의 뜻은 ‘그립다’가 되어 ㅂ불규칙용언으로 형용사화하였고 현재는 ‘-하다’와 붙어서 동사로 사용된다.
·‘’이 부사형을 취한 ‘아’는 ‘>아>와>와’의 변천을 거친다. 광해군에 나온 악학궤범 중간본에는 마땅히 ‘와’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음이 유지된 채 ‘ 와’로 나타난 것은 성종조에 나온 초간본의 모방본일 수도 있다.
(4)우니다니>울더니, 울고 있더니
·우니-울(泣)+니(行). 복합어간으로 ‘니’와의 결합형은 현재 진행의 뜻을 가진다.(예: 니, 하니, 안니, 노니)
·다니-다(과거회상선어말어미)+니(어말어미)로 ‘더니’의 고어형
2.山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1)졉동새>접동새(두견새)
(2)난>나는
·나(我;絶大格形)+ㄴ(絶大格접미사의 원형). 양주동은 ‘나(我)’의 지정형으로 본다.
(3)이슷요이다>비슷합니다
·이슷-‘비슷’의 고어형
·요이다-(爲)+오(삽입모음;雅語形)+이다(존칭서술형어미)
삽입모음 ‘오’가 삽입되어 ‘요’가 될 때 선행모음이 ‘ㅣ’모음이면 ‘ㅣ’모음동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여기 ‘’아래 ‘요’가 된 것은 ‘’모음이 원래 ‘ㅣ’ 모음의 음가에 접근하기 때문에 ‘’와 ‘오’가 연결될 때 ‘ㅣ’ 모음동화로 ‘요’가 된 것이다.
3.아니시며 거츠른신 아으양주동:非이며 僞妄인 줄을
김형규:참소자의 말이 非요 虛妄한 줄을
권영철:(서울에)안 있으면, (여기) 동래에 (와서) 있다 하더라도
서재극:내가 또는 그 누가 그리고 허황한 줄
강길운:아무것도 아닌 즉 허황하신 줄 모르고 미련스럽게 곧이 들었구나
최기호: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非)이 있는 줄
박병채:王이 취하신 擧措가 非요 妄이신 줄을, 참언자의 말이 非요 妄僞인 줄을
: 참소자들의 말이 아니며(非) 거짓인 줄을 아!
(1)아니시며>아니며
·안(不)+ ㅣ+시(존칭선어말어미이나 비존칭으로 사용), ‘아니다’에서의 ‘아니’는 부사형이고 ‘사실이 아니다’에서의 ‘아니’는 서술격조사 ‘ㅣ’와 결합된 것으로 형용사적 성질을 띤다.
(2)거츠르신>거짓인 줄을, 妄僞인 줄을
·거츨르신-거츨(僞·妄)+으(매개모음, 조음소)+시(존칭선어말어미)+ㄴ(관형사형어미)
‘시’는 위의 ‘아니시며’의 ‘시’처럼 비존칭으로 사용
‘거츨다’는 ‘僞·妄’과 ‘荒’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뜻이고 현재는 주로 ‘荒(거칠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원시추상명사)+ㄹ(연체조사). ‘줄’의 고어형. 대격 ‘’은 ‘줄을, 것을’ 등 외에 뜻이 전이되어 조건반사 등을 표시하는 어미형을 취한다.(예:간들, 들)
(3)아으-감탄사
4.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새벽달·새벽별이 알 것입니다.
(1)殘月曉星이>새벽달·새벽별
(2)아시이()다>알 것입니다
·아시-아실. 알(知)+(매개모음, 조음소)+시(존칭선어말어미)+ㄹ(관형사형어미)
·이이()다-이(‘것’을 뜻하는 명사)+이다(존칭서술형어미, 고어형은 ‘다’)
5.넉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가고 싶어라 아!
(1)넉시라도>넋이라도
·넉시-‘넋’의 주격형(양주동), 서술격형(박병채)
(2)님은>님과
(3)>한 곳에
(4)녀져라>가고 싶어라
·녀져라-녀(니;行)+져라(願望形語尾)
6.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지헌영:抵抗
양주동:우기다(현대어 뻐기다)
김형규:버그러지게 하다(이간시키다)
박병채:어기다(임금의 뜻을)어기던 사람이 나 자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신배였습니까
권영철:아집하다
: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벼기더시니>우기던 사람이
·벼기-우기(고집, 抗言)
·더시니-‘더신이’; 더(과거회상선어말어미)+시(존칭선어말어미)+ㄴ(관형사형어미)+이(‘사람’을 뜻하는 명사)
(2)뉘러시니잇()가>누구였습니까
·뉘-‘누(誰)’의 서술격형이 어간으로 굳어진 形
·러시니잇()가-‘더시니잇()가’가 원형. 더(어간말음 모음 ‘ㅣ’아래에서 ‘ㄷ>ㄹ’로 바뀌어 ‘러’가 됨)+시(존칭선어말어미)+니잇가(존칭의문형종결어미)
7.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1)過도>過失도
·도-보조사
(2)허믈도>허물도
(3)업소이다>없습니다
·업소이다-없(無)+오(삽입모음, 雅語形)+이다(존칭서술형어미)
8.힛마러(리)신뎌지헌영:아뢸 말씀이 마르(枯渴)오이다.
양주동:衆讒言이러신뎌
권영철:몰림말이 있는 것이여
김형규:슬프게 말하지 말아 주시오
박병채:말짱한 말씀이었구나
:사람들의 거짓말이었구나
(1)힛>衆讒(무리들의 참언)
·힛-(양주동) ‘물핫’의 오자로 봄. ‘群·衆’의 訓은 ‘물’이며 관형사형은 ‘
II.어석풀이
(前腔) 내 님믈 그리와 우니나니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지내니
(中腔) 山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사실이 아니며 모든 것이 거짓인 줄을 아!
(附葉) 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지새는 달과 새벽 별만이 아실 것입니다.
(大葉) 넉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죽은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고 싶구나 아!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내 죄를 우기던 이, 그 누구였습니까.
(二葉)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나는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三葉) 힛마려(리)시뎌 사람들의 거짓말이었구나!
(四葉) 읏브뎌(븐뎌) 아으 슬프구나 아!
(附葉)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님께서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아! 님이시여 돌려 들으시고 아껴주소서.
<樂學軌範 권 5>
*( )안은 蓬左文庫本 악학궤범의 표기이다.
1.내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더니
(1)내>내가(박병채); 나(我)+이(주격조사). 나(我)의 주격형
나의(양주동)
(2)님믈>님을
·‘니믈’이나 ‘님을’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님믈’로 표기된 것은 철자법의 혼합상태를 나타낸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연철과 분철이 혼용되어서 사용됨)
(3)그리와>그리워하며
·그리(戀·慕)+와(겸양선어말어미 의 부사형). ‘그리다’는 畵의 訓 ‘그리다’와 동일어원의 동사인 바 ‘戀慕’의 뜻은 ‘그립다’가 되어 ㅂ불규칙용언으로 형용사화하였고 현재는 ‘-하다’와 붙어서 동사로 사용된다.
·‘’이 부사형을 취한 ‘아’는 ‘>아>와>와’의 변천을 거친다. 광해군에 나온 악학궤범 중간본에는 마땅히 ‘와’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음이 유지된 채 ‘ 와’로 나타난 것은 성종조에 나온 초간본의 모방본일 수도 있다.
(4)우니다니>울더니, 울고 있더니
·우니-울(泣)+니(行). 복합어간으로 ‘니’와의 결합형은 현재 진행의 뜻을 가진다.(예: 니, 하니, 안니, 노니)
·다니-다(과거회상선어말어미)+니(어말어미)로 ‘더니’의 고어형
2.山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1)졉동새>접동새(두견새)
(2)난>나는
·나(我;絶大格形)+ㄴ(絶大格접미사의 원형). 양주동은 ‘나(我)’의 지정형으로 본다.
(3)이슷요이다>비슷합니다
·이슷-‘비슷’의 고어형
·요이다-(爲)+오(삽입모음;雅語形)+이다(존칭서술형어미)
삽입모음 ‘오’가 삽입되어 ‘요’가 될 때 선행모음이 ‘ㅣ’모음이면 ‘ㅣ’모음동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여기 ‘’아래 ‘요’가 된 것은 ‘’모음이 원래 ‘ㅣ’ 모음의 음가에 접근하기 때문에 ‘’와 ‘오’가 연결될 때 ‘ㅣ’ 모음동화로 ‘요’가 된 것이다.
3.아니시며 거츠른신 아으양주동:非이며 僞妄인 줄을
김형규:참소자의 말이 非요 虛妄한 줄을
권영철:(서울에)안 있으면, (여기) 동래에 (와서) 있다 하더라도
서재극:내가 또는 그 누가 그리고 허황한 줄
강길운:아무것도 아닌 즉 허황하신 줄 모르고 미련스럽게 곧이 들었구나
최기호: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非)이 있는 줄
박병채:王이 취하신 擧措가 非요 妄이신 줄을, 참언자의 말이 非요 妄僞인 줄을
: 참소자들의 말이 아니며(非) 거짓인 줄을 아!
(1)아니시며>아니며
·안(不)+ ㅣ+시(존칭선어말어미이나 비존칭으로 사용), ‘아니다’에서의 ‘아니’는 부사형이고 ‘사실이 아니다’에서의 ‘아니’는 서술격조사 ‘ㅣ’와 결합된 것으로 형용사적 성질을 띤다.
(2)거츠르신>거짓인 줄을, 妄僞인 줄을
·거츨르신-거츨(僞·妄)+으(매개모음, 조음소)+시(존칭선어말어미)+ㄴ(관형사형어미)
‘시’는 위의 ‘아니시며’의 ‘시’처럼 비존칭으로 사용
‘거츨다’는 ‘僞·妄’과 ‘荒’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뜻이고 현재는 주로 ‘荒(거칠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원시추상명사)+ㄹ(연체조사). ‘줄’의 고어형. 대격 ‘’은 ‘줄을, 것을’ 등 외에 뜻이 전이되어 조건반사 등을 표시하는 어미형을 취한다.(예:간들, 들)
(3)아으-감탄사
4.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새벽달·새벽별이 알 것입니다.
(1)殘月曉星이>새벽달·새벽별
(2)아시이()다>알 것입니다
·아시-아실. 알(知)+(매개모음, 조음소)+시(존칭선어말어미)+ㄹ(관형사형어미)
·이이()다-이(‘것’을 뜻하는 명사)+이다(존칭서술형어미, 고어형은 ‘다’)
5.넉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가고 싶어라 아!
(1)넉시라도>넋이라도
·넉시-‘넋’의 주격형(양주동), 서술격형(박병채)
(2)님은>님과
(3)>한 곳에
(4)녀져라>가고 싶어라
·녀져라-녀(니;行)+져라(願望形語尾)
6.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지헌영:抵抗
양주동:우기다(현대어 뻐기다)
김형규:버그러지게 하다(이간시키다)
박병채:어기다(임금의 뜻을)어기던 사람이 나 자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신배였습니까
권영철:아집하다
: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벼기더시니>우기던 사람이
·벼기-우기(고집, 抗言)
·더시니-‘더신이’; 더(과거회상선어말어미)+시(존칭선어말어미)+ㄴ(관형사형어미)+이(‘사람’을 뜻하는 명사)
(2)뉘러시니잇()가>누구였습니까
·뉘-‘누(誰)’의 서술격형이 어간으로 굳어진 形
·러시니잇()가-‘더시니잇()가’가 원형. 더(어간말음 모음 ‘ㅣ’아래에서 ‘ㄷ>ㄹ’로 바뀌어 ‘러’가 됨)+시(존칭선어말어미)+니잇가(존칭의문형종결어미)
7.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1)過도>過失도
·도-보조사
(2)허믈도>허물도
(3)업소이다>없습니다
·업소이다-없(無)+오(삽입모음, 雅語形)+이다(존칭서술형어미)
8.힛마러(리)신뎌지헌영:아뢸 말씀이 마르(枯渴)오이다.
양주동:衆讒言이러신뎌
권영철:몰림말이 있는 것이여
김형규:슬프게 말하지 말아 주시오
박병채:말짱한 말씀이었구나
:사람들의 거짓말이었구나
(1)힛>衆讒(무리들의 참언)
·힛-(양주동) ‘물핫’의 오자로 봄. ‘群·衆’의 訓은 ‘물’이며 관형사형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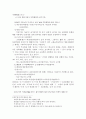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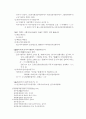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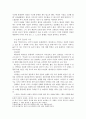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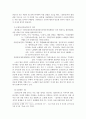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