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암의 생애
2. 18세기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
3. 연암의 사상사적 특징
4. 연암의 문학사적 특징
Ⅲ. 결론
Ⅱ. 본론
1. 연암의 생애
2. 18세기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
3. 연암의 사상사적 특징
4. 연암의 문학사적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이 가장 우세한 정치집단으로 등장하면서 노론계가 표방하던 주자절대화의 강고한 학문적 입장은 심성론이나 예론에서 주자이외의 학문적 입장을 용납하지 않고 있었다. 윤고박세당최석정 등 남인소론계의 탈주자학적 학문태도는 그것이 주자설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하여 배척당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노론학계에서는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는 100여 년간에 걸치는 일찍이 없는 심성논쟁이 벌어지고도 있었다. 1708년 주자주의 해석이 발단이 되어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은 그 이후 호서(湖西)지방의 권승하계통 학자들과 경락간(京洛間)의 김창협김창흡계 학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사회가 당도하였던 경향분기의 커다란 추세 속에서 서울과 그 주변의 경화학계의 유리된 다른 학문은 재야기반에 집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향유적(鄕儒的)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노론세력은 세도정국 아래서 산림의 행세를 노론이 독점하는 가운데 간혹 추천에 의한 관직진출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벼슬길이 막힌 재야학자에 불과하였다.
3. 연암의 사상사적 특징
1) 자연에 대한 이해
연암의 자연관은 그의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음양오행을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이나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는 「호질」과 「홍범우익서」를 들 수 있다. 연암은 「호질」에서 호랑이의 입을 빌어 음양은 한 기운의 줆어듬과 자라남이요, 오행은 서로 낳는 것이 아니며, 육기도 또한 제각기 행하는 것이지 어떤 외부의 작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연암은 음양오행론 자체를 부정하고, 당시 성리학자들이 지나치게 음양오행론을 관념화시킨 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특히 오행의 개념에 대해 상생상극하는 원소로 보지 않고, 실생활에서 이용후생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물질로 보았다. 그런데 한대(漢代)의 유학자들이 화복을 굳게 믿고 허망한 것을 즐겨하여 음양복서의 학을 꾸미고 참위의 글을 만들어 성인의 뜻과는 크게 어긋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폐단은 오행이 서로 낳는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성인이 오행을 입론한 것은 실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오행을 우주의 생성원리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연암은 탐욕에 의해 오행을 악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성인의 취지대로 오행을 선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후세의 유학자들이 실생활에 입각하여 오행을 선용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고원한 논변이나 견강부회로 흐르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박지원은 음양오행을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연현상 내지 실생활에서 이용후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물질로 보았는데, 이 점이 성리학파와 구별되는 특성이라 하겠다.
한편 연암은 하늘이 낸 물건 치고 모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대지와 일월성신들도 모두 하늘이 만들었으므로 지구가 둥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주장하는 자는 무엇이나 방정(方正)해야 된다는 대의(大義)에 입각해서 사물을 이해하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지방(地方)’이 아니라 ‘지구(地球)’라는 것이다. 또한 “자연에 존재하는 물건은 대체로 둥글며, 둥근 물건은 반드시 돈다”라고 하여 지전설(地轉說)을 주장하였다. 이어 “만약 지구가 허공에 자리잡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자전하지도 않고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다면, 즉시로 물은 썩고 흙은 당장에 모두가 썩어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고 하여 지구의 자전에 의해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생생(生生)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지원은 “하늘과 땅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끊임없이 생생하며, 해와 달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그 빛은 날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박지원의 자연에 대한 사상은 기존의 성리학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인식에 전환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2) 인간에 대한 이해
전통 성리학에서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호론은 물론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낙론에서도 ‘인간은 귀하고 동물은 천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즉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인륜’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임을 강조하여, 아침내 인륜사회의 건설을 인간의 당위적 목표로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김인규, 「북학사상연구」, 성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노론학계에서는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는 100여 년간에 걸치는 일찍이 없는 심성논쟁이 벌어지고도 있었다. 1708년 주자주의 해석이 발단이 되어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은 그 이후 호서(湖西)지방의 권승하계통 학자들과 경락간(京洛間)의 김창협김창흡계 학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사회가 당도하였던 경향분기의 커다란 추세 속에서 서울과 그 주변의 경화학계의 유리된 다른 학문은 재야기반에 집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향유적(鄕儒的)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노론세력은 세도정국 아래서 산림의 행세를 노론이 독점하는 가운데 간혹 추천에 의한 관직진출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벼슬길이 막힌 재야학자에 불과하였다.
3. 연암의 사상사적 특징
1) 자연에 대한 이해
연암의 자연관은 그의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음양오행을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이나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는 「호질」과 「홍범우익서」를 들 수 있다. 연암은 「호질」에서 호랑이의 입을 빌어 음양은 한 기운의 줆어듬과 자라남이요, 오행은 서로 낳는 것이 아니며, 육기도 또한 제각기 행하는 것이지 어떤 외부의 작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연암은 음양오행론 자체를 부정하고, 당시 성리학자들이 지나치게 음양오행론을 관념화시킨 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특히 오행의 개념에 대해 상생상극하는 원소로 보지 않고, 실생활에서 이용후생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물질로 보았다. 그런데 한대(漢代)의 유학자들이 화복을 굳게 믿고 허망한 것을 즐겨하여 음양복서의 학을 꾸미고 참위의 글을 만들어 성인의 뜻과는 크게 어긋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폐단은 오행이 서로 낳는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성인이 오행을 입론한 것은 실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오행을 우주의 생성원리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연암은 탐욕에 의해 오행을 악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성인의 취지대로 오행을 선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후세의 유학자들이 실생활에 입각하여 오행을 선용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고원한 논변이나 견강부회로 흐르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박지원은 음양오행을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연현상 내지 실생활에서 이용후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물질로 보았는데, 이 점이 성리학파와 구별되는 특성이라 하겠다.
한편 연암은 하늘이 낸 물건 치고 모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대지와 일월성신들도 모두 하늘이 만들었으므로 지구가 둥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주장하는 자는 무엇이나 방정(方正)해야 된다는 대의(大義)에 입각해서 사물을 이해하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지방(地方)’이 아니라 ‘지구(地球)’라는 것이다. 또한 “자연에 존재하는 물건은 대체로 둥글며, 둥근 물건은 반드시 돈다”라고 하여 지전설(地轉說)을 주장하였다. 이어 “만약 지구가 허공에 자리잡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자전하지도 않고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다면, 즉시로 물은 썩고 흙은 당장에 모두가 썩어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고 하여 지구의 자전에 의해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생생(生生)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지원은 “하늘과 땅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끊임없이 생생하며, 해와 달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그 빛은 날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박지원의 자연에 대한 사상은 기존의 성리학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인식에 전환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2) 인간에 대한 이해
전통 성리학에서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호론은 물론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낙론에서도 ‘인간은 귀하고 동물은 천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즉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인륜’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임을 강조하여, 아침내 인륜사회의 건설을 인간의 당위적 목표로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김인규, 「북학사상연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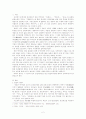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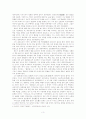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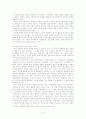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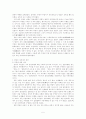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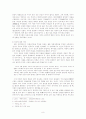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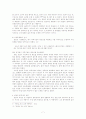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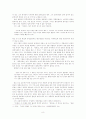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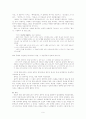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