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떡이란
2.떡의풍속
3.떡의유래와역사
1)삼국시대이전
2)삼국시대
3)조선지대
4)근대이후
4.떡의종류
5.떡 만드는 방법
6.영양과 성분
7.시식
2.떡의풍속
3.떡의유래와역사
1)삼국시대이전
2)삼국시대
3)조선지대
4)근대이후
4.떡의종류
5.떡 만드는 방법
6.영양과 성분
7.시식
본문내용
치고 푸른 것은 쑥 넣어 절편 쳐서 만들되 팥거피고물하여 소 넣어, 탕기 뚜껑 같은 것으로 떠내고\'라고 하여 오늘날과 매우 유사했음을 할 수 있다.
전병류도 차수수전병에서 더덕전병, 토란병, 산약병, 서여향병, 유병, 권전병, 송풍병 등으로 재료의 사용이 자유로워졌다. <음식디미방,1670년경>에는 \'전화법\'이라하여 두견화(진달래), 장미꽃, 출단화의 꽃을 찰가루에 섞어 지져내는 떡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지금과 거의 같다. 그리고 주악이 전병류의 하나로 새로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조악전이라 하여 \'백미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설탕물로 반죽하고 설탕가루로 속을 넣어 배가 약간 볼록하게 하여 향기로운 기름에 지져서 먹는\'것이었으나 이후 주재료가 찹쌀로 바뀌었다. 다만<규합총서, 1815년>에 \'소를 넣어 만두과처럼 가를 틀어 살 잡아 빚어\'만들라고 하였으니 현재와는 형태가 다소 달랐을 것이다. \'빈자떡\'은 기름에 지지는 떡으로 <음식디미방>에 비로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빈자떡은 \'녹두를 뉘없이 거피하여 되직하게 갈아서 번철에 기름을 부어 끓으면 조금씩 떠 놓아 거피한 팥을 꿀에 말아 소로 넣고, 또 그 위에 녹두 간 것을 덮어 빛이 유자빛 같이 되게 지져야 한다.\'고 하여 현재의 형태와는 달리 순수한 떡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
경단 및 단자류는 조선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떡의 종류이다. 경단류는<요록, 1680년경>에 \'경단병\'으로 처음 등장하여 <음식방문>, <시의전서>등 이후의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다. 경단병은 찹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삶아 익힌 뒤 꿀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청향을 바르고 그릇에 담아 다시 그 위에 꿀을 더한다고 하였다.
단자류는 <증보산림경제>에 \'향애(香艾)단자\'로 기록된 것이 최초이다. 이후 밤단자, 대추단자, 승검초단자, 유자단자, 토란단자, 건시단자, 마단자, 귤병단자, 꿀단자 등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 외에도 송편이 만들어져 추석에 즐겨 먹는 명절 음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근대 이후
19세기말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사회변동은 떡의 역사마저 바꾸어 놓았다. 간식이자 별식거리 혹은 밥 대용식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던 떡은 서양에서 들어온 빵에 의해 점차 식단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떡을 집에서 만들기보다는 떡집이나 떡방앗간 같은 전문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던 떡의 종류는 전문 업소에서 주로 생산되는 몇 가지로 축소되어 가는 형편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떡은 아직도 중요한 행사나 제사 등에는 빠지지 않고 오르는 필수적인 음식이기도 하다.이 시기에는 시루떡류의 경우 콩을 섞어 만든 콩버무리떡, 콩설기, 콩시루편, 쇠머리떡 등이 서민들이 즐겨 해먹던 떡이었다.
특히 인절미는 찰밥을 지어 쳐서 만드는 법과 찹쌀가루를 쪄 쳐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이용되어 왔으나 근대 이후에는 간편한 후자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조선요리제법,1913년>의 중보판인 <우리 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2년>에는 송기개피와 세 가지 새4의 기피떡을 한 데 붙인 셋붙이도 등장하였다. 절편을 송편 모양으로 빚어 다시 찐 재증병도 등장하였는데 지금은 사라진 매우 단명한 떡이다.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1943년>에서는 70여종의 다양한 떡이 소개되는 데 토란을 말려서 가루내어 찌거나 송편으로 만드는 토련병, 백합뿌리를 섞어 찌는 백합떡,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만든 신선부귀병, 흔떡, 북떡, 석류, 수수거멀제비 등 특이한 이름의 떡들이 소개된다.
떡이란 대개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찌거나 삶거나 지져서 익힌 음식으로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우리 민족이 떡을 먹기 시작한 것은 삼국이 설립되기 이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시대에 떡의 주재료가 되는 곡물이 생산되고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갈판과 갈돌 시루가 당시의 유물로 출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떡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떡은 관혼상제의 의식때는 물론, 철에 따른 명절, 출산에 따르는 아기의 백일이나, 돌, 또는 생일 회갑, 그 밖의 잔치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떡은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종류가 많고, 지방이나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하다
남주 북병이란 말이 있는데, 옛날에 무반은 : 서울 남산 밑에서 살고, 북촌에는 고관과 부자들이 살았다. 무반은 구차하고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탓으로 이를 달래느라 술을 빚어 마셨고 북촌의 고관이나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떡을 만드는 솜씨가 발달한 데서 나온 말이다
떡은 원래 쌀이나 찹쌀을 위주로 하는데, 그 외에도 수수나 조 밀가루 등도 많이 이용한다.
★ 떡의 종류 ★
떡은 만드는 재료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고, 지방이나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하다. 찹쌀가루에 감가루를 섞어서 경단처럼 만든 감떡, 3가지 빛깔이 나게 만든 시루떡의 일종인 삼색편, 새앙(생강)으로 만든 생앙편은 강병(薑餠)이라고도 한다. 금강산의 잣과 석이버섯을 넣은 꿀편, 함경도 두메의 귀리로 만든 절편 등은 특히 유명하다.
남주북병(南酒北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무반(武班)은 서울 남산 밑에서 살고, 북촌에는 고관과 부자들이 살았다. 무반은 구차하고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탓으로, 이를 달래느라 술을 빚어 마셨고, 북촌의 고관이나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떡을 만드는 솜씨가 발달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 외에 흔히 볼 수 있는 찹쌀떡과 호떡이 있다.
♠ 서울, 경기
▷ 배피떡, 개성주악, 개성경단, 여주산병, 각색경단, 개성조랭이, 쑥버무리, 밀범벅떡, 쑥갠떡, 색떡,
♠ 강원도
▷ 감자송편, 감자뭉생이, 옥수수설기, 각색차조인절미, 메싹떡, 수리취개피떡, 도토리송편, 호박시루떡 구름떡, 메밀총떡, 방울증편, 찰옥수수시루떡, 팥소흑임자,
♠ 충청도
▷ 곤떡, 쇠머리떡, 해장떡, 호박송편
♠ 전라도
▷ 감고지떡, 감단자,감시리떡, 꽃송편,주악, 콩대끼떡, 풋호박떡, 송피떡, 차조기떡, 보리떡 밀기울떡, 고
전병류도 차수수전병에서 더덕전병, 토란병, 산약병, 서여향병, 유병, 권전병, 송풍병 등으로 재료의 사용이 자유로워졌다. <음식디미방,1670년경>에는 \'전화법\'이라하여 두견화(진달래), 장미꽃, 출단화의 꽃을 찰가루에 섞어 지져내는 떡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지금과 거의 같다. 그리고 주악이 전병류의 하나로 새로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조악전이라 하여 \'백미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설탕물로 반죽하고 설탕가루로 속을 넣어 배가 약간 볼록하게 하여 향기로운 기름에 지져서 먹는\'것이었으나 이후 주재료가 찹쌀로 바뀌었다. 다만<규합총서, 1815년>에 \'소를 넣어 만두과처럼 가를 틀어 살 잡아 빚어\'만들라고 하였으니 현재와는 형태가 다소 달랐을 것이다. \'빈자떡\'은 기름에 지지는 떡으로 <음식디미방>에 비로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빈자떡은 \'녹두를 뉘없이 거피하여 되직하게 갈아서 번철에 기름을 부어 끓으면 조금씩 떠 놓아 거피한 팥을 꿀에 말아 소로 넣고, 또 그 위에 녹두 간 것을 덮어 빛이 유자빛 같이 되게 지져야 한다.\'고 하여 현재의 형태와는 달리 순수한 떡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
경단 및 단자류는 조선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떡의 종류이다. 경단류는<요록, 1680년경>에 \'경단병\'으로 처음 등장하여 <음식방문>, <시의전서>등 이후의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다. 경단병은 찹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삶아 익힌 뒤 꿀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청향을 바르고 그릇에 담아 다시 그 위에 꿀을 더한다고 하였다.
단자류는 <증보산림경제>에 \'향애(香艾)단자\'로 기록된 것이 최초이다. 이후 밤단자, 대추단자, 승검초단자, 유자단자, 토란단자, 건시단자, 마단자, 귤병단자, 꿀단자 등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 외에도 송편이 만들어져 추석에 즐겨 먹는 명절 음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근대 이후
19세기말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사회변동은 떡의 역사마저 바꾸어 놓았다. 간식이자 별식거리 혹은 밥 대용식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던 떡은 서양에서 들어온 빵에 의해 점차 식단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떡을 집에서 만들기보다는 떡집이나 떡방앗간 같은 전문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던 떡의 종류는 전문 업소에서 주로 생산되는 몇 가지로 축소되어 가는 형편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떡은 아직도 중요한 행사나 제사 등에는 빠지지 않고 오르는 필수적인 음식이기도 하다.이 시기에는 시루떡류의 경우 콩을 섞어 만든 콩버무리떡, 콩설기, 콩시루편, 쇠머리떡 등이 서민들이 즐겨 해먹던 떡이었다.
특히 인절미는 찰밥을 지어 쳐서 만드는 법과 찹쌀가루를 쪄 쳐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이용되어 왔으나 근대 이후에는 간편한 후자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조선요리제법,1913년>의 중보판인 <우리 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2년>에는 송기개피와 세 가지 새4의 기피떡을 한 데 붙인 셋붙이도 등장하였다. 절편을 송편 모양으로 빚어 다시 찐 재증병도 등장하였는데 지금은 사라진 매우 단명한 떡이다.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1943년>에서는 70여종의 다양한 떡이 소개되는 데 토란을 말려서 가루내어 찌거나 송편으로 만드는 토련병, 백합뿌리를 섞어 찌는 백합떡,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만든 신선부귀병, 흔떡, 북떡, 석류, 수수거멀제비 등 특이한 이름의 떡들이 소개된다.
떡이란 대개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찌거나 삶거나 지져서 익힌 음식으로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우리 민족이 떡을 먹기 시작한 것은 삼국이 설립되기 이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시대에 떡의 주재료가 되는 곡물이 생산되고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갈판과 갈돌 시루가 당시의 유물로 출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떡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떡은 관혼상제의 의식때는 물론, 철에 따른 명절, 출산에 따르는 아기의 백일이나, 돌, 또는 생일 회갑, 그 밖의 잔치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떡은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종류가 많고, 지방이나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하다
남주 북병이란 말이 있는데, 옛날에 무반은 : 서울 남산 밑에서 살고, 북촌에는 고관과 부자들이 살았다. 무반은 구차하고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탓으로 이를 달래느라 술을 빚어 마셨고 북촌의 고관이나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떡을 만드는 솜씨가 발달한 데서 나온 말이다
떡은 원래 쌀이나 찹쌀을 위주로 하는데, 그 외에도 수수나 조 밀가루 등도 많이 이용한다.
★ 떡의 종류 ★
떡은 만드는 재료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고, 지방이나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하다. 찹쌀가루에 감가루를 섞어서 경단처럼 만든 감떡, 3가지 빛깔이 나게 만든 시루떡의 일종인 삼색편, 새앙(생강)으로 만든 생앙편은 강병(薑餠)이라고도 한다. 금강산의 잣과 석이버섯을 넣은 꿀편, 함경도 두메의 귀리로 만든 절편 등은 특히 유명하다.
남주북병(南酒北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무반(武班)은 서울 남산 밑에서 살고, 북촌에는 고관과 부자들이 살았다. 무반은 구차하고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탓으로, 이를 달래느라 술을 빚어 마셨고, 북촌의 고관이나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떡을 만드는 솜씨가 발달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 외에 흔히 볼 수 있는 찹쌀떡과 호떡이 있다.
♠ 서울, 경기
▷ 배피떡, 개성주악, 개성경단, 여주산병, 각색경단, 개성조랭이, 쑥버무리, 밀범벅떡, 쑥갠떡, 색떡,
♠ 강원도
▷ 감자송편, 감자뭉생이, 옥수수설기, 각색차조인절미, 메싹떡, 수리취개피떡, 도토리송편, 호박시루떡 구름떡, 메밀총떡, 방울증편, 찰옥수수시루떡, 팥소흑임자,
♠ 충청도
▷ 곤떡, 쇠머리떡, 해장떡, 호박송편
♠ 전라도
▷ 감고지떡, 감단자,감시리떡, 꽃송편,주악, 콩대끼떡, 풋호박떡, 송피떡, 차조기떡, 보리떡 밀기울떡,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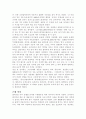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