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머리말
ꊲ 본론 1 - 김소월의 생애와 <산유화>, <접동새> 작품 분석
ꊳ 본론 2 - <산유화>, <접동새>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ꊴ 맺음말
ꊲ 본론 1 - 김소월의 생애와 <산유화>, <접동새> 작품 분석
ꊳ 본론 2 - <산유화>, <접동새>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ꊴ 맺음말
본문내용
정서가 반영된다.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화소(話素)는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만 고스란히 전하게 된다. 원형(archetype)이 반복되면서 드러나는 것은 그만큼 정서적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이 시는 바로 설화의 세계에서 보이는 원형적 한과 화자 개인의 정서가 교묘히 결합하면서, 보편적 한의 정서를 개인적 한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참고자료]배경 설화(서북 지방)와 해설
\'옛날 어느 곳에 10남매가 부모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 어미가 들어왔는데, 의붓어미는 아이들을 심하게 구박하였다. 큰누이가 과년해지자 이웃 부잣집 도령과 혼약하여 많은 예물을 받게 되었다. 이를 시기한 의붓어미가 그녀를 친모가 쓰던 장농에 가두었다가 불에 태워 죽였다. 동생들이 슬퍼하며 타고 남은 재를 헤치다 거기서 접동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갔다. 죽은 누이의 화신인 것이다. 관가에서 이를 알고 의붓어미를 잡아다 불에 태워 죽였는데, 재 속에서 까마귀가 나왔다. 접동새는 동생들이 보고 싶었지만 까마귀가 무서워 야삼경에만 와서 울었다.\'
이를 통해 표상하고자 하는 시인의 내면 의식은 모(母) 상실 의식이며, 주된 정서는 모 상실 의식에서 기인된 한(恨)이다. 동시에 이 시는 신인이 그 자신의 실제적인 삶으로서 이러한 불행을 신화화시켜 현실이 주는 부단한 역사적 압력과 그에 맞서야 할 구체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김소월의 시세계를 단순히 ‘한(恨)’으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은 큰 위험성을 갖는다. ‘한(恨)’이란 한 줄로 쉽게 요약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며, ‘한(恨)’이 생겨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다. 그런데도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 \'한\'만큼 깊게 자리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한이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한국인 모두에 공유볼 때..」처럼 애매하고도 무책임한 설명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전(聖典)처럼 여기는 참고서에서 실려 있기엔 문제가 있다.
또, [감상의 길잡이]에서 김소월의 시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한을 그려내었다고 설명해 놓고서도, [참고자료]에서는 모 상실 의식에서 기인된 한(恨)이다.으로 풀어놓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한의 내용은 엄마 없음이란 뜻인 지도 의문이든다. 이처럼 시인의 전기적 요소까지 끌어들여와 프로이드식 분석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석’이 과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을 한(恨)의 민족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분노, 풍자와 해학 그리고 삶의 가지가지 애환을 모두 젖혀 두고 어찌하여 패배주의적이고 모두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남녀간의 애상적 연모와 이별만을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정서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하늘 아래 어느 민족의 기층민이 한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 왔을까. 그들과 우리들이 다른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우리는 그것을 한(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을 뿐이며, 이 한(恨)이라는 말은 오로지 자의적일 뿐일 것이다.
우리의 민요 중에서 잘 다듬어져 있는 곡들은 슬프고 느린 곡조와 경쾌하고 빠른 곡조로 쌍을 이루고 있다. 슬프고 처연하게 농투성이의 삶을 노래하고 난 뒤에는, 다시 눈물을 거두고 빠른 가락에 얹어서 그 나마의 삶을 긍정하는 신명을 노래한다. <육자배기>를 노래하고 바로 이어서 <자즌 육자배기>를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며, 뱃사람의 삶을 서럽게 노래했다가 곧바로 이어서 만선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배따라기>와 <자즌 배따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선법과 창법이 서로 다른 각 지방의 민요에서마다 흔히 발견되는 한과 신명의 쌍이다.
따라서 <접동새>도 개인의 정서를 담은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우선 이해되어져야 한다. 처음부터 이 시에 민족적 한과 설화적 배경이라는 말을 덧붙이어 본 모습을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이제 시 전문 분석에 주목해 보자. 참고서의 시 분석 시 텍스트는 <접동새> 원전 (진달래꽃, 1925)을 그대로 사용함
도 설화와, 한의 정서, 1910~20년대 문학사를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접동
접동
: 한의 표상(접동새의 행위-시인 내면에 잠재한 상실 의식)
접동새가 한의 표상이라는 것을 바로 언급하고 있다. 접동새의 설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고개를 갸웃 할 수 밖에 없는 해설이다. 따라서 이는 시의 본질적인 해석에 에 방해가 될 뿐이다. 또, 시인 내면에 잠재된 상실의식, 아마도 모(母)없음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접동새 소리와 상실의식을 연결짓는 것은 부질없는 과잉 해석일 뿐이다.
아우래비접동
: \'아홉오래비\'의 변형, 이유 - 아홉이라는 내용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 활음조를 활용하여 의성음으로 변형시킴,
접동새라는 제재와 설화 사이의 시적 매개를 이룸
접동새의 울음을 실감나게 의성법으로 표현
아우래비에 대한 해석은 문학 참고서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 첫째, 정한모 교수가 이것을 ‘아홉 오래비’의 활음조로 본 것을 대부분 정설로 삼고 있다. 설화에서 10남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둘째, 아우래비는 마지막 연에 나오는 ‘오랩동생’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문원각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시를 이해함에 있어 이 시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연의 오랩 동생을 고려한다면, 간단히 “죽은 누이의 동생들” 정도로 설명해 주면 충분할 것 같다.
津頭江가람가에 살든누나는
津頭江압마을에
와서웁니다
: 누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柔延性이 한결 곱다
누님 대신 누나의 호칭은 훨씬 친근한 느낌을 주며, 시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시의 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누나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하여, 이별의 아픔이 더 컸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굳이 이렇게 쉬운 시의 정황을 유연성이 곱다는 식의 고답적인 어투는 고등학생의 참고서에서 쓰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하다.
옛날, 우리나라
: 민담의 소재
먼뒤의
진두강가람에 살든누나는
이붓어미
이 시는 바로 설화의 세계에서 보이는 원형적 한과 화자 개인의 정서가 교묘히 결합하면서, 보편적 한의 정서를 개인적 한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참고자료]배경 설화(서북 지방)와 해설
\'옛날 어느 곳에 10남매가 부모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 어미가 들어왔는데, 의붓어미는 아이들을 심하게 구박하였다. 큰누이가 과년해지자 이웃 부잣집 도령과 혼약하여 많은 예물을 받게 되었다. 이를 시기한 의붓어미가 그녀를 친모가 쓰던 장농에 가두었다가 불에 태워 죽였다. 동생들이 슬퍼하며 타고 남은 재를 헤치다 거기서 접동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갔다. 죽은 누이의 화신인 것이다. 관가에서 이를 알고 의붓어미를 잡아다 불에 태워 죽였는데, 재 속에서 까마귀가 나왔다. 접동새는 동생들이 보고 싶었지만 까마귀가 무서워 야삼경에만 와서 울었다.\'
이를 통해 표상하고자 하는 시인의 내면 의식은 모(母) 상실 의식이며, 주된 정서는 모 상실 의식에서 기인된 한(恨)이다. 동시에 이 시는 신인이 그 자신의 실제적인 삶으로서 이러한 불행을 신화화시켜 현실이 주는 부단한 역사적 압력과 그에 맞서야 할 구체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김소월의 시세계를 단순히 ‘한(恨)’으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은 큰 위험성을 갖는다. ‘한(恨)’이란 한 줄로 쉽게 요약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며, ‘한(恨)’이 생겨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다. 그런데도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 \'한\'만큼 깊게 자리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한이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한국인 모두에 공유볼 때..」처럼 애매하고도 무책임한 설명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전(聖典)처럼 여기는 참고서에서 실려 있기엔 문제가 있다.
또, [감상의 길잡이]에서 김소월의 시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한을 그려내었다고 설명해 놓고서도, [참고자료]에서는 모 상실 의식에서 기인된 한(恨)이다.으로 풀어놓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한의 내용은 엄마 없음이란 뜻인 지도 의문이든다. 이처럼 시인의 전기적 요소까지 끌어들여와 프로이드식 분석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석’이 과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을 한(恨)의 민족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분노, 풍자와 해학 그리고 삶의 가지가지 애환을 모두 젖혀 두고 어찌하여 패배주의적이고 모두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남녀간의 애상적 연모와 이별만을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정서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하늘 아래 어느 민족의 기층민이 한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 왔을까. 그들과 우리들이 다른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우리는 그것을 한(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을 뿐이며, 이 한(恨)이라는 말은 오로지 자의적일 뿐일 것이다.
우리의 민요 중에서 잘 다듬어져 있는 곡들은 슬프고 느린 곡조와 경쾌하고 빠른 곡조로 쌍을 이루고 있다. 슬프고 처연하게 농투성이의 삶을 노래하고 난 뒤에는, 다시 눈물을 거두고 빠른 가락에 얹어서 그 나마의 삶을 긍정하는 신명을 노래한다. <육자배기>를 노래하고 바로 이어서 <자즌 육자배기>를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며, 뱃사람의 삶을 서럽게 노래했다가 곧바로 이어서 만선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배따라기>와 <자즌 배따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선법과 창법이 서로 다른 각 지방의 민요에서마다 흔히 발견되는 한과 신명의 쌍이다.
따라서 <접동새>도 개인의 정서를 담은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우선 이해되어져야 한다. 처음부터 이 시에 민족적 한과 설화적 배경이라는 말을 덧붙이어 본 모습을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이제 시 전문 분석에 주목해 보자. 참고서의 시 분석 시 텍스트는 <접동새> 원전 (진달래꽃, 1925)을 그대로 사용함
도 설화와, 한의 정서, 1910~20년대 문학사를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접동
접동
: 한의 표상(접동새의 행위-시인 내면에 잠재한 상실 의식)
접동새가 한의 표상이라는 것을 바로 언급하고 있다. 접동새의 설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고개를 갸웃 할 수 밖에 없는 해설이다. 따라서 이는 시의 본질적인 해석에 에 방해가 될 뿐이다. 또, 시인 내면에 잠재된 상실의식, 아마도 모(母)없음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접동새 소리와 상실의식을 연결짓는 것은 부질없는 과잉 해석일 뿐이다.
아우래비접동
: \'아홉오래비\'의 변형, 이유 - 아홉이라는 내용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 활음조를 활용하여 의성음으로 변형시킴,
접동새라는 제재와 설화 사이의 시적 매개를 이룸
접동새의 울음을 실감나게 의성법으로 표현
아우래비에 대한 해석은 문학 참고서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 첫째, 정한모 교수가 이것을 ‘아홉 오래비’의 활음조로 본 것을 대부분 정설로 삼고 있다. 설화에서 10남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둘째, 아우래비는 마지막 연에 나오는 ‘오랩동생’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문원각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시를 이해함에 있어 이 시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연의 오랩 동생을 고려한다면, 간단히 “죽은 누이의 동생들” 정도로 설명해 주면 충분할 것 같다.
津頭江가람가에 살든누나는
津頭江압마을에
와서웁니다
: 누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柔延性이 한결 곱다
누님 대신 누나의 호칭은 훨씬 친근한 느낌을 주며, 시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시의 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누나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하여, 이별의 아픔이 더 컸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굳이 이렇게 쉬운 시의 정황을 유연성이 곱다는 식의 고답적인 어투는 고등학생의 참고서에서 쓰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하다.
옛날, 우리나라
: 민담의 소재
먼뒤의
진두강가람에 살든누나는
이붓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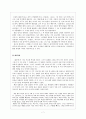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