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남선과 『소년』
2. 신체시
3. 「海에게서 少年에게」
4. 현재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해에게서 소 년에게」 실태 분석
5. 「해에게서 소년에게」교수・학습 모형
Ⅲ. 결론
Ⅱ. 본론
1. 최남선과 『소년』
2. 신체시
3. 「海에게서 少年에게」
4. 현재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해에게서 소 년에게」 실태 분석
5. 「해에게서 소년에게」교수・학습 모형
Ⅲ. 결론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의 최초 온상이었다는 점이다. 신문장 건립 운동은 『소년』지 후신인 『샛별』지에서 처음으로 씌어진 용어였다. 그러나 이미 그 운동은 『소년』지에서부터 실천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잡지는 당시의 소년들을 계몽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계몽에 중점을 두고 엮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잡지의 공적은 첫째, 근대적 새 형식을 갖춘 최초의 대표적 월간지로서 청소년의 계몽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서구 문학의 선구적 도입과 톨스토이, 바이런, 테니슨, 엘리어트 등의 작품과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표류기』, 『이솝우화』 등을 게재 소개하여 민중의 눈을 뜨게 하였고 셋째, 시조를 부흥시킨 점 등을 들 수 있다.
2. 신체시
1) 신체시
신체시란 일명 신시라고도 하는데, 고대 시가에 대해 갑오경장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시를 일컫는다. 즉, 창가의 전형적인 율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율조 속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시 형태이다. 신체시는 애국가 유형ㆍ개화 가사ㆍ창가 등과 함께 개화기시가의 한 유형을 이룬다.
신체시의 기점은 1908년 11월 『소년』창간호에 실린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로 잡는 것이 통설이다. 이어 1919년 『창조』 창간호에 실린 주요한의 「불노리」 이전의 『학지광』,『청춘』,『태서문예신보』 등의 잡지나 그 밖에 발표된 이광수ㆍ현상윤ㆍ최승구ㆍ김여제ㆍ김억ㆍ황석우 등의 초기 시들이 ‘신체시’ 또는 ‘신시’ 의 범주에 든다.
신체시는 근대정신의 소산으로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고 서구 문화를 수용하려는 근대화 운동의 표현이다. 때문에 그 이전의 전통 시가와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때 이질적인 요소라 함은 형태적인 면에서는 정형적인 율문성에서 일탈한 산문성을 뜻한다. 신체시 이전가지의 고시가ㆍ애국가 유형ㆍ창가 등이 가창을 전제로 한 율조라면, 신체시는 산문화한 자유시에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시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애국가 유형과 개화 가사가 3ㆍ4조, 4ㆍ4조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고, 창가가 각 행간의 음수율을 7ㆍ5조, 8ㆍ5조, 6ㆍ5조로 일치시키고 있는데 비해서, 초기의 신체시는 분연체로서 각 연 대응 행에서만 음수율의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신체시의 내용은 주로 개화 의식, 자주 독립과 민족정신, 신교육, 남녀평등 등의 사상을 담고 있다.
2) 신체시의 효시 논란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신체시의 효시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 작품 이전에 이미 다른 신체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경우 논거를 이룬 것 가운데 하나가 「舊作三篇」이다.「구작삼편」은 『소년』6호에 실린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 꼬리에 육당은 그것이 <정미년(1907)의 조약이 체결되기 전 석 달, 붓을 들어 우연히 생각한 대로 기록한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대신 「구작삼편」을 신체시의 효시로 손꼽고자 하는 생각은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선뜻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거기에 한 가지 난점이 뒤따른다. 우선 근대적인 인쇄술이 개발된 이후 이루어진 작품은 그것이 발표되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그것을 공식적인 경우의 작품으로 친다. 그런데 「구작삼편」은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물론 이런 경우 우리 근대문학과 시가에는 발표하지 못할 부득불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그것은 문학 활동의 상황과 발표 여건에 관계된 것인데, 우리 근대문학은 그 형성, 전개의 초두에서부터 매우 불리한 발표 여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에 의해 구축된 식민지 체제 속의 문학 작품 발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즉 일제 식민 체제에서는 반일저항적인 작품이 활자화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제작된 작품으로 정치적 사유에 의해 활자화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 발표시기가 재고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작삼편」은 그런 테두리에 들지 않는 작품이다.
1.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소.
칼이나 육혈포(六穴砲)나
그러나 무서움 없네.
철장(鐵杖)같은 형세라도
우리는 어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 것 짐을 지고
큰 길을 걸어가는 자(者)임일세.
2.
우리는 아무 것도 지닌 것 없소
비수나 화약이나
그러나 두려움 없네.
면류관의 힘이라도
우리는 어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 것 광이(廣耳) 삼아
큰 길을 다사리는 자임일세.
3.
우리는 아무 것도 든 물건 없소.
돌이나 몽둥이나
그러나 겁 아니나네.
세사(細砂) 같은 제물로도
우리는 어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 것 칼에 잡고
큰 길을 지켜보는 자임일세.
우리는 아모것도 가질 것 없오
「舊作三篇」
얼핏 보아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작품과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그 의식내용이 동일하다.「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소년을 예찬하고 그 기백을 고무시키는 데 목적으로 둔 작품인데 대해 이 작품도 그와 같다. 또한 두 작품이 다 민족적 자아를 내세울 뿐 별도로 항일저항의 생각을 담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겠다. 따라서 그 의식내용 때문에 이 작품의 발표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또한, 그 형태로 보아도 「구작삼편」이 신체시의 효시라는 주장에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 그 보기로 짐작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그 허두가 75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후렴구도 가진다. 그리하여 신체시로 생각되기보다는 그에 선행한 창가의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신체시의 효시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든 작품의 다른 예는 「막은 물」이하 몇 편의 작품을 거론한 경우도 있다. 본래 이 작품들은 1908년 2월에 발행된 『大韓學會月報』 ‘대한학회월보‘는 1908년 9월 25일에 창간하여 같은 해 11월 25일 제9호로 종간된 것으로 당시의 일본유학생들에 의하여 제작된 문화 계몽적 학회지였다. 매월 발행되었으나 6, 7호 사이에 1회의 격월이 있었다.
에 개재된 것이다. 그 발표시기로 보아서 이 작품은 명백히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 한발 앞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은 형태면에서 신체시라고 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밤이나 낮이나 됴리
의 최초 온상이었다는 점이다. 신문장 건립 운동은 『소년』지 후신인 『샛별』지에서 처음으로 씌어진 용어였다. 그러나 이미 그 운동은 『소년』지에서부터 실천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잡지는 당시의 소년들을 계몽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계몽에 중점을 두고 엮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잡지의 공적은 첫째, 근대적 새 형식을 갖춘 최초의 대표적 월간지로서 청소년의 계몽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서구 문학의 선구적 도입과 톨스토이, 바이런, 테니슨, 엘리어트 등의 작품과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표류기』, 『이솝우화』 등을 게재 소개하여 민중의 눈을 뜨게 하였고 셋째, 시조를 부흥시킨 점 등을 들 수 있다.
2. 신체시
1) 신체시
신체시란 일명 신시라고도 하는데, 고대 시가에 대해 갑오경장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시를 일컫는다. 즉, 창가의 전형적인 율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율조 속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시 형태이다. 신체시는 애국가 유형ㆍ개화 가사ㆍ창가 등과 함께 개화기시가의 한 유형을 이룬다.
신체시의 기점은 1908년 11월 『소년』창간호에 실린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로 잡는 것이 통설이다. 이어 1919년 『창조』 창간호에 실린 주요한의 「불노리」 이전의 『학지광』,『청춘』,『태서문예신보』 등의 잡지나 그 밖에 발표된 이광수ㆍ현상윤ㆍ최승구ㆍ김여제ㆍ김억ㆍ황석우 등의 초기 시들이 ‘신체시’ 또는 ‘신시’ 의 범주에 든다.
신체시는 근대정신의 소산으로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고 서구 문화를 수용하려는 근대화 운동의 표현이다. 때문에 그 이전의 전통 시가와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때 이질적인 요소라 함은 형태적인 면에서는 정형적인 율문성에서 일탈한 산문성을 뜻한다. 신체시 이전가지의 고시가ㆍ애국가 유형ㆍ창가 등이 가창을 전제로 한 율조라면, 신체시는 산문화한 자유시에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시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애국가 유형과 개화 가사가 3ㆍ4조, 4ㆍ4조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고, 창가가 각 행간의 음수율을 7ㆍ5조, 8ㆍ5조, 6ㆍ5조로 일치시키고 있는데 비해서, 초기의 신체시는 분연체로서 각 연 대응 행에서만 음수율의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신체시의 내용은 주로 개화 의식, 자주 독립과 민족정신, 신교육, 남녀평등 등의 사상을 담고 있다.
2) 신체시의 효시 논란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신체시의 효시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 작품 이전에 이미 다른 신체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경우 논거를 이룬 것 가운데 하나가 「舊作三篇」이다.「구작삼편」은 『소년』6호에 실린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 꼬리에 육당은 그것이 <정미년(1907)의 조약이 체결되기 전 석 달, 붓을 들어 우연히 생각한 대로 기록한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대신 「구작삼편」을 신체시의 효시로 손꼽고자 하는 생각은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선뜻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거기에 한 가지 난점이 뒤따른다. 우선 근대적인 인쇄술이 개발된 이후 이루어진 작품은 그것이 발표되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그것을 공식적인 경우의 작품으로 친다. 그런데 「구작삼편」은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물론 이런 경우 우리 근대문학과 시가에는 발표하지 못할 부득불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그것은 문학 활동의 상황과 발표 여건에 관계된 것인데, 우리 근대문학은 그 형성, 전개의 초두에서부터 매우 불리한 발표 여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에 의해 구축된 식민지 체제 속의 문학 작품 발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즉 일제 식민 체제에서는 반일저항적인 작품이 활자화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제작된 작품으로 정치적 사유에 의해 활자화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 발표시기가 재고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작삼편」은 그런 테두리에 들지 않는 작품이다.
1.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소.
칼이나 육혈포(六穴砲)나
그러나 무서움 없네.
철장(鐵杖)같은 형세라도
우리는 어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 것 짐을 지고
큰 길을 걸어가는 자(者)임일세.
2.
우리는 아무 것도 지닌 것 없소
비수나 화약이나
그러나 두려움 없네.
면류관의 힘이라도
우리는 어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 것 광이(廣耳) 삼아
큰 길을 다사리는 자임일세.
3.
우리는 아무 것도 든 물건 없소.
돌이나 몽둥이나
그러나 겁 아니나네.
세사(細砂) 같은 제물로도
우리는 어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 것 칼에 잡고
큰 길을 지켜보는 자임일세.
우리는 아모것도 가질 것 없오
「舊作三篇」
얼핏 보아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작품과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그 의식내용이 동일하다.「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소년을 예찬하고 그 기백을 고무시키는 데 목적으로 둔 작품인데 대해 이 작품도 그와 같다. 또한 두 작품이 다 민족적 자아를 내세울 뿐 별도로 항일저항의 생각을 담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겠다. 따라서 그 의식내용 때문에 이 작품의 발표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또한, 그 형태로 보아도 「구작삼편」이 신체시의 효시라는 주장에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 그 보기로 짐작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그 허두가 75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후렴구도 가진다. 그리하여 신체시로 생각되기보다는 그에 선행한 창가의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신체시의 효시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든 작품의 다른 예는 「막은 물」이하 몇 편의 작품을 거론한 경우도 있다. 본래 이 작품들은 1908년 2월에 발행된 『大韓學會月報』 ‘대한학회월보‘는 1908년 9월 25일에 창간하여 같은 해 11월 25일 제9호로 종간된 것으로 당시의 일본유학생들에 의하여 제작된 문화 계몽적 학회지였다. 매월 발행되었으나 6, 7호 사이에 1회의 격월이 있었다.
에 개재된 것이다. 그 발표시기로 보아서 이 작품은 명백히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 한발 앞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은 형태면에서 신체시라고 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밤이나 낮이나 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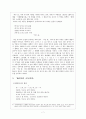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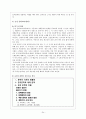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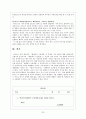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