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근대시가
1. 서론
2. 개화기의 시가
3. 1920년대의 시
4. 1930년대의 시
5. 광복 후의 시
6. 결론
1. 서론
2. 개화기의 시가
3. 1920년대의 시
4. 1930년대의 시
5. 광복 후의 시
6. 결론
본문내용
세계를 명상적이면서 허무적으로 노래했다. 대표작으로는 <방랑의 마음>을 들 수 있다. 김동명 역시 20년대초 《개벽》등에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 등을 발표하면서 데뷔했다. 초기에는 유미주의적인 경향을 추구했지만 후에 인생을 서정적으로 노래하거나 민족적 비애를 읊은 시들을 썼다. 30년대 작품들이지만 <파초><내 마음은> 등을 그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4. 1930년대의 시
우리 시사에서 30년대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킨 1931년부터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1941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의 기간도 포함시켜 좀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일제가 20년대의 소위 문화정치란 미명의 식민 통치 방식을 버리고 조선을 완전하게 일본화하기 위해서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30년대는 또한 일제가 한국을 그들이 주도한 대동아전쟁과 태평양전쟁의 후방기지 및 병참기지화해 상상을 절하는 물적, 인적 수탈을 감행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해졌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억압되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조직된 각종 어용 문학단체는 한국인의 전쟁 동원과 소위 내선일체 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악화되어 30년대말에 와서는 한국어 사용의 전면 금지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소위 창씨개명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시는 해방이 될 때까지 강요된 일제 어용시와 숨어서 쓴 일부 서정시 및 지하의 저항시들만으로 문학사이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
시대가 이처럼 파시즘의 폭력에 휩쓸리게 되자 한국의 시도 당대적 상황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차적인 것은 강화된 사상 검속과 검열제도로 인해 현실 비판적인 시 혹은 ― 민족주의 시든 프롤레타리아 시든 ― 일제에 대항하는 이념적인 시들의 창작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 운동도 만주사변 이후 전면 금지되어 같은 해에 카프 제1차 검거가 있었고 1934년에 제2차 검거, 그리고 1935년에는 카프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카프의 주동자인 박영희와 김기진, 임화 등이 사상 전향을 선언한 것은 대체로 1934년 전후의 일이다. 따라서 1930년대의 시는 일반적으로 순수문학적인 시들이 주된 경향을 이룰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시단의 변화에는 문학 자체 내의 요인도 컸다. 그것은 이 시대에 이르러 20년대의 이념시 특히 프롤레타리아 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제기되었다는 점, 일본 유학생을 통해 서구의 현대사조가 유입되고 이 새로운 세대의 시인들이 프롤레타리아 시 등이 지닌 정치주의와 이념주의에서 벗어나 순문학적 태도를 지향했다는 점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유학의 기회 증대는 20년대와 달리 서구 문학사조를 접함에 있어서 동시성을 가져다 주었다. 30년대의 한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들, 즉 정지용(鄭芝溶, 1903-?), 김기림(金起林, 1908-?), 최재서(崔載瑞, 1908-1964) 등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 그리하여 30년대 시는 대체로 정치주의나 이념주의를 떠나서 순수시, 모더니즘 시, 인간 탐구의 시, 자연 탐구의 시 등을 지향하게 된다. 우리 문학사에서 이 시기의 인간 탐구의 시를 생명파, 자연 탐구의 시를 청록파로 호칭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1920년말에 이르러서 한국의 시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해 시의 예술성을 회복하려는 시인들이 등장한 것이다. 박용철(朴龍喆, 1904-1938), 김영랑(金永郞, 1903-1950), 이하윤(異河潤, 1906-1974), 김상용(金尙鎔, 1902-1951) 등이 그들이다. 주로 《시문학(詩文學)》(1930), 《문예월간(文藝月刊)》(1931), 《문학(文學)》(1934), 《시원(詩苑)》(1935) 등 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한 이들을 한국시사에서는 순수시파라고 부른다. \'순수시파\'는 모더니즘의 시나 생명파 혹은 청록파 등과 같이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했지만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들과 구분된 다른 하나의 경향으로 묶일 수 있다.
첫째는, 순수서정을 노래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서정은 투명하고 자연발생적이었다. 그들은 어떤 특정 감정, 예컨대 한이나 비애나 허무 등의 감정에 편향성을 띠지 않는다. 그것은 모더니즘퓨의 도시적 센티멘틀리즘이나 생명파류의 본능적 몸부림의 감정이나 청록파류의 자연에 대한 향수의 감정과는 질이 다르다. 둘째는, 지적인 요소가 가능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제 면에서 볼 때 순수시파의 시는 모더니즘류의 문명 비판이나 내면 성찰, 생명파류의 생의 근원적 고뇌, 청록파류의 객관적 자연 인식과 같은 형이상학적 지평이 없다. 다만 서정이 환기해 주는 본원적 감정이 전달될 뿐이다. 셋째, 순수시는 그 표현이 여성적이다. 언어가 부드럽고 섬세하며 또 곱다. 이는 모더니즘 시의 남성적 터치나 생명파의 소위 \'직정(直情)언어\' ― 본능 그 자체의 직접 호소 ―에 비해 볼 때 한층 확연해짐다. 넷째, 순수시파는 30년대의 다른 유파의 시들과 같이 시의 언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언어의 감각성을 추구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휘 조사(措辭)에서는 문명어, 도시어를 가능한 한 배제했다. 달리 말해 참신한 감각성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 선택이나 어휘 구사는 전통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기타 비지성적 유미주의적인 태도, 주정주의 등도 지적될 수 있다.
박용철은 《시문학》《문예월간》등의 문예지를 주재하고 시론의 뒷받침을 통해 순수시파의 시 운동을 이끌어 간 시인이다. 그는 《시문학》창간호에 <떠나가는 배><비 내리는 날>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 활동을 했는데 <떠나가는 배><싸늘한 이마><밤열차에 그대를 보내고> 등은 그의 대표작들이다. 그의 시는 인생과 생활에서 부딪치는 느낌을 감상적으로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절제되지 못한 언어, 감정이 과잉
4. 1930년대의 시
우리 시사에서 30년대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킨 1931년부터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1941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의 기간도 포함시켜 좀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일제가 20년대의 소위 문화정치란 미명의 식민 통치 방식을 버리고 조선을 완전하게 일본화하기 위해서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30년대는 또한 일제가 한국을 그들이 주도한 대동아전쟁과 태평양전쟁의 후방기지 및 병참기지화해 상상을 절하는 물적, 인적 수탈을 감행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해졌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억압되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조직된 각종 어용 문학단체는 한국인의 전쟁 동원과 소위 내선일체 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악화되어 30년대말에 와서는 한국어 사용의 전면 금지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소위 창씨개명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시는 해방이 될 때까지 강요된 일제 어용시와 숨어서 쓴 일부 서정시 및 지하의 저항시들만으로 문학사이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
시대가 이처럼 파시즘의 폭력에 휩쓸리게 되자 한국의 시도 당대적 상황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차적인 것은 강화된 사상 검속과 검열제도로 인해 현실 비판적인 시 혹은 ― 민족주의 시든 프롤레타리아 시든 ― 일제에 대항하는 이념적인 시들의 창작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 운동도 만주사변 이후 전면 금지되어 같은 해에 카프 제1차 검거가 있었고 1934년에 제2차 검거, 그리고 1935년에는 카프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카프의 주동자인 박영희와 김기진, 임화 등이 사상 전향을 선언한 것은 대체로 1934년 전후의 일이다. 따라서 1930년대의 시는 일반적으로 순수문학적인 시들이 주된 경향을 이룰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시단의 변화에는 문학 자체 내의 요인도 컸다. 그것은 이 시대에 이르러 20년대의 이념시 특히 프롤레타리아 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제기되었다는 점, 일본 유학생을 통해 서구의 현대사조가 유입되고 이 새로운 세대의 시인들이 프롤레타리아 시 등이 지닌 정치주의와 이념주의에서 벗어나 순문학적 태도를 지향했다는 점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유학의 기회 증대는 20년대와 달리 서구 문학사조를 접함에 있어서 동시성을 가져다 주었다. 30년대의 한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들, 즉 정지용(鄭芝溶, 1903-?), 김기림(金起林, 1908-?), 최재서(崔載瑞, 1908-1964) 등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 그리하여 30년대 시는 대체로 정치주의나 이념주의를 떠나서 순수시, 모더니즘 시, 인간 탐구의 시, 자연 탐구의 시 등을 지향하게 된다. 우리 문학사에서 이 시기의 인간 탐구의 시를 생명파, 자연 탐구의 시를 청록파로 호칭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1920년말에 이르러서 한국의 시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해 시의 예술성을 회복하려는 시인들이 등장한 것이다. 박용철(朴龍喆, 1904-1938), 김영랑(金永郞, 1903-1950), 이하윤(異河潤, 1906-1974), 김상용(金尙鎔, 1902-1951) 등이 그들이다. 주로 《시문학(詩文學)》(1930), 《문예월간(文藝月刊)》(1931), 《문학(文學)》(1934), 《시원(詩苑)》(1935) 등 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한 이들을 한국시사에서는 순수시파라고 부른다. \'순수시파\'는 모더니즘의 시나 생명파 혹은 청록파 등과 같이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했지만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들과 구분된 다른 하나의 경향으로 묶일 수 있다.
첫째는, 순수서정을 노래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서정은 투명하고 자연발생적이었다. 그들은 어떤 특정 감정, 예컨대 한이나 비애나 허무 등의 감정에 편향성을 띠지 않는다. 그것은 모더니즘퓨의 도시적 센티멘틀리즘이나 생명파류의 본능적 몸부림의 감정이나 청록파류의 자연에 대한 향수의 감정과는 질이 다르다. 둘째는, 지적인 요소가 가능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제 면에서 볼 때 순수시파의 시는 모더니즘류의 문명 비판이나 내면 성찰, 생명파류의 생의 근원적 고뇌, 청록파류의 객관적 자연 인식과 같은 형이상학적 지평이 없다. 다만 서정이 환기해 주는 본원적 감정이 전달될 뿐이다. 셋째, 순수시는 그 표현이 여성적이다. 언어가 부드럽고 섬세하며 또 곱다. 이는 모더니즘 시의 남성적 터치나 생명파의 소위 \'직정(直情)언어\' ― 본능 그 자체의 직접 호소 ―에 비해 볼 때 한층 확연해짐다. 넷째, 순수시파는 30년대의 다른 유파의 시들과 같이 시의 언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언어의 감각성을 추구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휘 조사(措辭)에서는 문명어, 도시어를 가능한 한 배제했다. 달리 말해 참신한 감각성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 선택이나 어휘 구사는 전통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기타 비지성적 유미주의적인 태도, 주정주의 등도 지적될 수 있다.
박용철은 《시문학》《문예월간》등의 문예지를 주재하고 시론의 뒷받침을 통해 순수시파의 시 운동을 이끌어 간 시인이다. 그는 《시문학》창간호에 <떠나가는 배><비 내리는 날>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 활동을 했는데 <떠나가는 배><싸늘한 이마><밤열차에 그대를 보내고> 등은 그의 대표작들이다. 그의 시는 인생과 생활에서 부딪치는 느낌을 감상적으로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절제되지 못한 언어, 감정이 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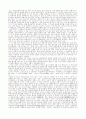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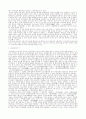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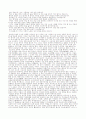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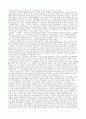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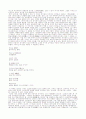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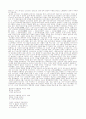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