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사별을 주제로 한 고전문학작품(작품,감상포인트)
ⅰ) 부부간의 사별
ⅱ) 자식과의 사별
ⅲ) 동기간의 사별
ⅳ) 친구와의 사별
Ⅲ. 나오면서
Ⅱ. 사별을 주제로 한 고전문학작품(작품,감상포인트)
ⅰ) 부부간의 사별
ⅱ) 자식과의 사별
ⅲ) 동기간의 사별
ⅳ) 친구와의 사별
Ⅲ. 나오면서
본문내용
사면은 검어 어둑하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 여읜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요?
감상 포인트
위 시조는 작자 미상의 작으로, 사별의 고통을 매에 쫓기는 암꿩과 풍랑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을 초장과 중장의 상황 중첩을 통해 비유적으로 심화, 확대하고 있다. 이별을 노래한 많은 시조가 한숨과 눈물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반면 이 작품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절망적인 심정을 절박하고 과장된 비유를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임과 사별한 화자의 신세를 한탄한 내용이면서 거기에 따르는 관례를 넘어서서 하층민이 겪는 고난을 우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세상살이에서의 시련을 거듭 암시하는 의미를 지녔다.
(3) <원이 아바님께> - 이응태 부인
원이 아바님께 - 병슐 뉴월 초하룻날 집에서
자내 샹해 날드려 닐오되 둘히 머리 셰도록 사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몬져 가시노 날하고 자식하며 뉘긔 걸하야
엇디하야 살라하야 다 더디고 자내 몬져 가시는고 자내 날 향해 마음을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해 마음을 엇디 가지런고 매양 자내드려 내 닐오되 한데 누어 새기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엿비 녀겨 사랑호리 남도 우리 같은가 하야 자내드러 닐렀더니
엇디 그런 일을 생각지 아녀 나를 버리고 몬져 가시난고
자내 여히고 아무려 내 살 셰 업스니 수이 자내한테 가고져 하니
날 데려가소 자내 향해 마음을 차승(此乘)니 찾즐리 업스니
아마래 션운 뜻이 가이 업스니 이 내 안밖은 어데다가 두고
자식 데리고 자내를 그려 살려뇨 하노 이따 이 내 유무(遺墨) 보시고
내 꿈에 자셰 와 니르소 내 꿈에 이 보신 말 자세 듣고져 하야 이리 써녔네
자셰 보시고 날드려 니르소 자내 내 밴 자식 나거든 보고 사뢸 일하고 그리 가시지
밴 자식 놓거든 누를 아바 하라 하시논고 아무리 한들 내 안 같을까
이런 텬디(天地)같은 한(恨)이라 하늘아래 또 이실가
자내는 한갓 그리 가 겨실 뿐이거니와 아무려 한들 내 안 같이 셜울가
그지 그지 끝이 업서 다 못 써 대강만 적네 이 유무(遺墨) 자셰 보시고
내 꿈에 자셰히 뵈고 자셰 니르소 나는 다만 자내 보려 믿고있뇌 이따 몰래 뵈쇼셔
하 그지 그지 업서 이만 적소이다
<현대역>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감상 포인트
4백12년 전 31세에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부의 정을 백지에 꼬박꼬박 적어 합장한 것이 안동에서 발굴됐다. 이부자리 속에서 맞바라보고 나는 당신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다고 말하면 당신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졌나를 말하곤 했다는 그 사부곡의 정경은 가히 환상적 이다. 당신 여의고는 아무래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직설적 감정 표현도 고정관념에서 신선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은 편지에 열네 번이나 \'자내(자네)\'라는 호칭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내 다려 내 닐오되(당신에게 내가 말하기를)\' 등 \'자내(자네)\'라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세히 보니 편지는 대부분 하소체로 되어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어느 정도 남편과 부인이 상당히 대등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ⅱ) 자식과의 사별
흔히 죽은 부모는 무덤에 묻고,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곱게 기른 자식을 가슴에 묻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정무문(至情 無文)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통곡을 삼키고 지어낸 시들을 살펴보자.
ㄱ. 남성의 亡子의 恨
(1)〈망아생일(亡兒生日)〉- 김상채(金尙彩)
지난 해 오늘은 널 데리고 놀았는데
올해 오늘엔 아득히 자취 없다.
마음 속 맺힌 아픔 언제나 끝이 날까
마당에 네 자취는 볼 때마다 눈물 난다.
去歲此辰撫爾弄 今年今日杳無形
中腸痛結何時已 垂淚每看跡在庭
감상 포인트
아들을 잃은 애달픈 슬픔을 담고 있는 위의 시는 영조 때 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상채의 시이다. 작중에서 그는, 달력을 짚어 보았는데 오늘이 마침 죽은 아들의 생일이다. 지난 해 아들을 어르며 함께 장난치던 일이 생각나는데, 고개를 흔들며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당을 보면 아들의 장난치던 모습이 떠오르고, 문밖을 나서면 동무들과 뛰놀던 모습이 눈에 밟힌다. 아들은 그렇게 훌쩍 떠나갔지만, 창암의 마음에 맺힌 아픔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이제는 이토록 안타까운 슬픔을 주고 있다.
(2) <無妹獨子는 어드러로 갓돗고> - 강복중(姜復中)
3000 春風의 봄
엊그제 임 여읜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요?
감상 포인트
위 시조는 작자 미상의 작으로, 사별의 고통을 매에 쫓기는 암꿩과 풍랑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을 초장과 중장의 상황 중첩을 통해 비유적으로 심화, 확대하고 있다. 이별을 노래한 많은 시조가 한숨과 눈물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반면 이 작품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절망적인 심정을 절박하고 과장된 비유를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임과 사별한 화자의 신세를 한탄한 내용이면서 거기에 따르는 관례를 넘어서서 하층민이 겪는 고난을 우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세상살이에서의 시련을 거듭 암시하는 의미를 지녔다.
(3) <원이 아바님께> - 이응태 부인
원이 아바님께 - 병슐 뉴월 초하룻날 집에서
자내 샹해 날드려 닐오되 둘히 머리 셰도록 사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몬져 가시노 날하고 자식하며 뉘긔 걸하야
엇디하야 살라하야 다 더디고 자내 몬져 가시는고 자내 날 향해 마음을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해 마음을 엇디 가지런고 매양 자내드려 내 닐오되 한데 누어 새기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엿비 녀겨 사랑호리 남도 우리 같은가 하야 자내드러 닐렀더니
엇디 그런 일을 생각지 아녀 나를 버리고 몬져 가시난고
자내 여히고 아무려 내 살 셰 업스니 수이 자내한테 가고져 하니
날 데려가소 자내 향해 마음을 차승(此乘)니 찾즐리 업스니
아마래 션운 뜻이 가이 업스니 이 내 안밖은 어데다가 두고
자식 데리고 자내를 그려 살려뇨 하노 이따 이 내 유무(遺墨) 보시고
내 꿈에 자셰 와 니르소 내 꿈에 이 보신 말 자세 듣고져 하야 이리 써녔네
자셰 보시고 날드려 니르소 자내 내 밴 자식 나거든 보고 사뢸 일하고 그리 가시지
밴 자식 놓거든 누를 아바 하라 하시논고 아무리 한들 내 안 같을까
이런 텬디(天地)같은 한(恨)이라 하늘아래 또 이실가
자내는 한갓 그리 가 겨실 뿐이거니와 아무려 한들 내 안 같이 셜울가
그지 그지 끝이 업서 다 못 써 대강만 적네 이 유무(遺墨) 자셰 보시고
내 꿈에 자셰히 뵈고 자셰 니르소 나는 다만 자내 보려 믿고있뇌 이따 몰래 뵈쇼셔
하 그지 그지 업서 이만 적소이다
<현대역>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감상 포인트
4백12년 전 31세에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부의 정을 백지에 꼬박꼬박 적어 합장한 것이 안동에서 발굴됐다. 이부자리 속에서 맞바라보고 나는 당신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다고 말하면 당신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졌나를 말하곤 했다는 그 사부곡의 정경은 가히 환상적 이다. 당신 여의고는 아무래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직설적 감정 표현도 고정관념에서 신선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은 편지에 열네 번이나 \'자내(자네)\'라는 호칭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내 다려 내 닐오되(당신에게 내가 말하기를)\' 등 \'자내(자네)\'라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세히 보니 편지는 대부분 하소체로 되어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어느 정도 남편과 부인이 상당히 대등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ⅱ) 자식과의 사별
흔히 죽은 부모는 무덤에 묻고,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곱게 기른 자식을 가슴에 묻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정무문(至情 無文)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통곡을 삼키고 지어낸 시들을 살펴보자.
ㄱ. 남성의 亡子의 恨
(1)〈망아생일(亡兒生日)〉- 김상채(金尙彩)
지난 해 오늘은 널 데리고 놀았는데
올해 오늘엔 아득히 자취 없다.
마음 속 맺힌 아픔 언제나 끝이 날까
마당에 네 자취는 볼 때마다 눈물 난다.
去歲此辰撫爾弄 今年今日杳無形
中腸痛結何時已 垂淚每看跡在庭
감상 포인트
아들을 잃은 애달픈 슬픔을 담고 있는 위의 시는 영조 때 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상채의 시이다. 작중에서 그는, 달력을 짚어 보았는데 오늘이 마침 죽은 아들의 생일이다. 지난 해 아들을 어르며 함께 장난치던 일이 생각나는데, 고개를 흔들며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당을 보면 아들의 장난치던 모습이 떠오르고, 문밖을 나서면 동무들과 뛰놀던 모습이 눈에 밟힌다. 아들은 그렇게 훌쩍 떠나갔지만, 창암의 마음에 맺힌 아픔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이제는 이토록 안타까운 슬픔을 주고 있다.
(2) <無妹獨子는 어드러로 갓돗고> - 강복중(姜復中)
3000 春風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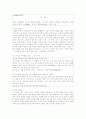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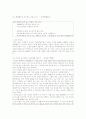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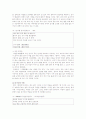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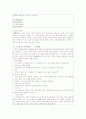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