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다.
석가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내에 있으며 국보 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동서로 있는 양탑 중 서쪽에 세워진 탑으로 일명 무영탑(無影塔) 또는 석가탑이라고도 한다. 무영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탑을 세우는 과정에 얽힌 백제 석공부부의 설화 때문인데 이 설화는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 기록되어 있다.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쪽의 다보탑에 대한 호칭으로 법화경에 보이는 석가여래(釋迦如來) 상주설법(常住說法)의 상(相) 곧 다보여래(多寶如來)와 나란히 앉기 이전의 상(相)으로 해석된다. 동서 두 탑의 대조가 묘할 뿐 아니라 그 조형(造形)이 소박 장중하여, 신라 석탑 중에서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이 탑의 건립연대는 불국사의 창건과 아울러 생각해봐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불국사 창건은 일찍이 법흥왕대(法興王代)의 일이라고 하나,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는 경덕왕(景德王) 10년(751)이므로 김대성이 대규모로 중창한 이후에 이 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탑의 형식은 2층기단 위에 탑신을 세운 신라시대 일반형석탑 양식의 완숙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석탑으로 각부의 비례가 아름다운 아주 뛰어난 탑이다. 기단부는 몇 장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상하대중석 각면에는 탱주 2주가 면석을 3분하고 있으며, 옥신과 옥개석은 각각 한돌로 되어 있다. 각층 옥신에는 두 우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옥개받침은 각층마다 5단이다. 상륜부에는 노반복발앙화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졌으나, 나중에 복원할 때 실상사탑의 상륜부를 본따 새로 만들어 올렸다. 탑 둘레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연화문을 조각한 8개의 둥근 돌이 방형으로 연결되어 탑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8방금강좌(八方金剛座)\'라고 부른다. 정역(淨域)을 나타내는 시설로 보여지며, 한편 연화대 위에 8보살을 안치하여 공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8개의 정좌라고도 한다. 해체 복원시 이 탑 2층 옥신 안에서는 금동사리외함, 유리사리병 등의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이 것은 저지(楮紙)로 되어 있으며 당나라 측천무후자가 있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로 인정받고 있다.
다보탑
과거불의 하나인 다보불(多寶佛)을 모신 탑. 다보불탑 또는 칠보탑(七寶塔)이라고도 한다. 법화경 견보탑품에 의해 탑 안에 석가, 다보불을 함께 안치하게 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영축산(靈鷲山)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땅 밑에서 다보탑이 솟아 나와 다보불이 석존의 설법을 찬양하고 다보탑 안의 자리 한쪽을 비워서 나란히 앉도록 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3층석탑으로 기단 위에 2중의 옥개를 설치하고 맨 꼭대기에는 상륜(相輪)을 장식하였으며 보통 1층 또는 2층의 탑신에 석가와 다보불이 모셔진다. 중국에서는 법화경의 신앙과 함께 석가 다보의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을 탑 안에 봉안하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주지역에 유일하게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다보탑이 석가탑과 함께 남아 있다. 일본에서는 1194년에 건립된 자가현 대진시 석산사(石山寺)의 다보탑이 가장 오래된 예로 알려져 있다.
불국사 다보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으며 국보 20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4사자석탑과 함께 우리나라 이형석탑을 대표하는 이 탑은 그 예가 전무후무한 유일한 탑이다.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석가탑과 같이 서 있는 이 탑은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나란히 앉아 석가설법을 증명하는 상(相)을 나타낸 탑이다. 탑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단부는 2층으로, 하층기단에는 4방에 보계(寶階)를 만들고 난간을 가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난간은 없고 석주만이 남아 있다. 상층기단은 네 귀퉁이에 우주를 세우고 가운데에 방형의 찰주가 놓여져 있으며, 그 위에 갑석이 얹혀 있는데,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두공이 약화된 모습의 받침돌을 끼여 놓았다. 기단부 네 귀퉁이에 4마리의 사자가 놓여져 있었으나 3마리는 식민지시기에 도난당하고 지금은 1마리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석 위에는 방형의 난간 속에 8각의 탑신부를 두었으며, 다시 8각 갑석을 얹고 8각 난간을 돌리고 있다. 그 안에 8본 죽절형(竹節形) 석주를 돌린 다음 8각 연화대석을 얹었다. 이 연화대석 위에 다시 8각 대판이 돌려져 있으며, 꽃술 8본을 돌린 탑신을 안치하고 8각 옥개석을 덮었다. 옥개석 위에 상륜부가 놓여 있는데, 8각 노반 위에 원형 복발, 8각 앙화석, 보륜 등 셋을 얹고 보개와 보주를 놓았는데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와같이 층수 없이 2층 기단위에 부도형의 8각 탑신을 올리는 것은, 선례인 7세기에 만들어진 감은사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탑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탑은 1925년 일본인들이 수리하였는데, 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아 있지 않다.
감은사지 3층탑
동서로 마주 서 있는 이 탑은 신라 신문왕 2년(682)에 세워진 석탑이다. 화강암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 중층의 이 탑은 동서 양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를 보인다. 하층기단은 지대석과 면석을 같은 돌로 각각 12매의 석재로 구성하였다. 상층기단은 면석을 12매로, 갑석은 8매로 구성하였다. 탱주는 하층기단에 3주, 상층기단에 2주를 세웠다. 초층옥신은 각 우주와 면석을 따로 세웠으며, 2층은 각면이 한 돌, 3층은 전체가 한돌로 되었다. 옥개석은 받침돌로 별석으로 각층 4매씩의 돌로 되었다. 그리고 옥개석 받침은 각층마다 5단의 층급으로 되었다. 상륜부는 양탑 모두 노반과 높이 3.3m의 철제 찰주가 남아 있다. 목조가구(木造架構)를 모방한 형적을 보이며 옥개석 받침을 층단식으로 한 수법은 전탑(塼塔)의 전단계 모습을 추정케 한다. 기단을 이중으로 하는 형식은 새로운 형식으로 이와 같은 양식은 이후로 한국 석탑의 규범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또한 1960년 석탑을 해체 보수할 때 3층 탑신에서 창건 당시 설치하였던 매우 정교하고 귀중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탑의 전체높이는 13.4m이다.
익산 미륵사지탑
부여 정림사지탑
불국사3층석탑
다보탑
감은사지3층탑
석가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내에 있으며 국보 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동서로 있는 양탑 중 서쪽에 세워진 탑으로 일명 무영탑(無影塔) 또는 석가탑이라고도 한다. 무영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탑을 세우는 과정에 얽힌 백제 석공부부의 설화 때문인데 이 설화는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 기록되어 있다.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쪽의 다보탑에 대한 호칭으로 법화경에 보이는 석가여래(釋迦如來) 상주설법(常住說法)의 상(相) 곧 다보여래(多寶如來)와 나란히 앉기 이전의 상(相)으로 해석된다. 동서 두 탑의 대조가 묘할 뿐 아니라 그 조형(造形)이 소박 장중하여, 신라 석탑 중에서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이 탑의 건립연대는 불국사의 창건과 아울러 생각해봐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불국사 창건은 일찍이 법흥왕대(法興王代)의 일이라고 하나,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는 경덕왕(景德王) 10년(751)이므로 김대성이 대규모로 중창한 이후에 이 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탑의 형식은 2층기단 위에 탑신을 세운 신라시대 일반형석탑 양식의 완숙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석탑으로 각부의 비례가 아름다운 아주 뛰어난 탑이다. 기단부는 몇 장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상하대중석 각면에는 탱주 2주가 면석을 3분하고 있으며, 옥신과 옥개석은 각각 한돌로 되어 있다. 각층 옥신에는 두 우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옥개받침은 각층마다 5단이다. 상륜부에는 노반복발앙화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졌으나, 나중에 복원할 때 실상사탑의 상륜부를 본따 새로 만들어 올렸다. 탑 둘레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연화문을 조각한 8개의 둥근 돌이 방형으로 연결되어 탑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8방금강좌(八方金剛座)\'라고 부른다. 정역(淨域)을 나타내는 시설로 보여지며, 한편 연화대 위에 8보살을 안치하여 공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8개의 정좌라고도 한다. 해체 복원시 이 탑 2층 옥신 안에서는 금동사리외함, 유리사리병 등의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이 것은 저지(楮紙)로 되어 있으며 당나라 측천무후자가 있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로 인정받고 있다.
다보탑
과거불의 하나인 다보불(多寶佛)을 모신 탑. 다보불탑 또는 칠보탑(七寶塔)이라고도 한다. 법화경 견보탑품에 의해 탑 안에 석가, 다보불을 함께 안치하게 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영축산(靈鷲山)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땅 밑에서 다보탑이 솟아 나와 다보불이 석존의 설법을 찬양하고 다보탑 안의 자리 한쪽을 비워서 나란히 앉도록 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3층석탑으로 기단 위에 2중의 옥개를 설치하고 맨 꼭대기에는 상륜(相輪)을 장식하였으며 보통 1층 또는 2층의 탑신에 석가와 다보불이 모셔진다. 중국에서는 법화경의 신앙과 함께 석가 다보의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을 탑 안에 봉안하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주지역에 유일하게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다보탑이 석가탑과 함께 남아 있다. 일본에서는 1194년에 건립된 자가현 대진시 석산사(石山寺)의 다보탑이 가장 오래된 예로 알려져 있다.
불국사 다보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으며 국보 20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4사자석탑과 함께 우리나라 이형석탑을 대표하는 이 탑은 그 예가 전무후무한 유일한 탑이다.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석가탑과 같이 서 있는 이 탑은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나란히 앉아 석가설법을 증명하는 상(相)을 나타낸 탑이다. 탑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단부는 2층으로, 하층기단에는 4방에 보계(寶階)를 만들고 난간을 가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난간은 없고 석주만이 남아 있다. 상층기단은 네 귀퉁이에 우주를 세우고 가운데에 방형의 찰주가 놓여져 있으며, 그 위에 갑석이 얹혀 있는데,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두공이 약화된 모습의 받침돌을 끼여 놓았다. 기단부 네 귀퉁이에 4마리의 사자가 놓여져 있었으나 3마리는 식민지시기에 도난당하고 지금은 1마리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석 위에는 방형의 난간 속에 8각의 탑신부를 두었으며, 다시 8각 갑석을 얹고 8각 난간을 돌리고 있다. 그 안에 8본 죽절형(竹節形) 석주를 돌린 다음 8각 연화대석을 얹었다. 이 연화대석 위에 다시 8각 대판이 돌려져 있으며, 꽃술 8본을 돌린 탑신을 안치하고 8각 옥개석을 덮었다. 옥개석 위에 상륜부가 놓여 있는데, 8각 노반 위에 원형 복발, 8각 앙화석, 보륜 등 셋을 얹고 보개와 보주를 놓았는데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와같이 층수 없이 2층 기단위에 부도형의 8각 탑신을 올리는 것은, 선례인 7세기에 만들어진 감은사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탑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탑은 1925년 일본인들이 수리하였는데, 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아 있지 않다.
감은사지 3층탑
동서로 마주 서 있는 이 탑은 신라 신문왕 2년(682)에 세워진 석탑이다. 화강암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 중층의 이 탑은 동서 양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를 보인다. 하층기단은 지대석과 면석을 같은 돌로 각각 12매의 석재로 구성하였다. 상층기단은 면석을 12매로, 갑석은 8매로 구성하였다. 탱주는 하층기단에 3주, 상층기단에 2주를 세웠다. 초층옥신은 각 우주와 면석을 따로 세웠으며, 2층은 각면이 한 돌, 3층은 전체가 한돌로 되었다. 옥개석은 받침돌로 별석으로 각층 4매씩의 돌로 되었다. 그리고 옥개석 받침은 각층마다 5단의 층급으로 되었다. 상륜부는 양탑 모두 노반과 높이 3.3m의 철제 찰주가 남아 있다. 목조가구(木造架構)를 모방한 형적을 보이며 옥개석 받침을 층단식으로 한 수법은 전탑(塼塔)의 전단계 모습을 추정케 한다. 기단을 이중으로 하는 형식은 새로운 형식으로 이와 같은 양식은 이후로 한국 석탑의 규범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또한 1960년 석탑을 해체 보수할 때 3층 탑신에서 창건 당시 설치하였던 매우 정교하고 귀중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탑의 전체높이는 13.4m이다.
익산 미륵사지탑
부여 정림사지탑
불국사3층석탑
다보탑
감은사지3층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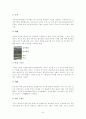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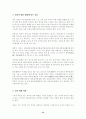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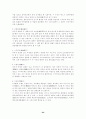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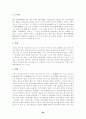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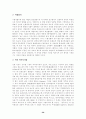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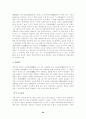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