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표시는 무겁게 눌러서 천천히 손을 들면 소리에 여운을 남기는 방법으로 퇴성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수법은 줄을 밀
어 짚지 않고 가볍게 짚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3번 무겁게 눌러 소리를 갖고 노는 방법(弄)으로 요성과 비슷하다. 또 농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조금씩 움직여 줄은 흔들리지 않으며 소리만 농하도록 한다. 搖는 괘를 짚고 밀어서 그 소리를 흔들어 내는 방법으로, 오늘날의 요성에 해당한다.
추현(推絃)의 방법은 대현은 괘상청까지 유현은 대현까지 미는데, 현재의 추성에 해당한다.
16세기 초에는 요현이 쓰이다가 16세기 말에는 요현 외에 \'弄\'과 추현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방법이 쓰였다.
*탄법(술대 쓰는 법)
15세기의 탄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악학궤범이 있으며, 현금동문류기의 한글 육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현금동문류기 한글 육보의 탄법도 악학궤범과 대부분 같다.
악학궤범의 탄법에 의하면, \'ㅅ랭\' \'ㄷ랭\' \'외술\' \'겹술\'의 설명이 있다. ㅅ랭은 여러 줄을 바깥쪽으로 타는 방법이고, ㄷ랭은 여러 줄을 안쪽으로 타는 방법이다.32) 또, 외술은 한줄을 안쪽이나 바깥으로 타는 방법이고, 겹술은 문현, 유현, 대현 세 줄을 바깥으로 타는 방법이다. 겹술은 세 줄을 타는 방법으로 설명되었지만 금합자보에는 문현과 유현 두 줄을 타는 곳에도 겹술의 부호가 있는 점으로 보아 문현과 안현을 함께 연주하는 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위 방법을 분류하면, 술대를 밖으로 향하여 연주하는 법과 안으로 향하여 연주하는 법으로 나 눌 수 있고, 또 한 줄을 타는 방법(외술)과 두(세) 줄을 타는 방법(겹술)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타특징 :
*이득윤(李得胤)
1553(명종 8)∼1630(인조 8). 조선 중기의 역학자(易學者)·악인(樂人).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극흠(克欽), 호는 서계(西溪).
고려말 문신 제현(齊賢)의 후손이다. 유학자 서기(徐起)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박지화(朴枝華)에게 역학(易學)을 배우고, 1588년(선조 21)에 진사가 되었다.
1597년 학행으로 추천되어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독서에 전념하다가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고 이어서 형조좌랑·의성현령을 지냈다.
광해군 때 혼란한 정계를 피하여 고향에 머무르면서 김장생(金長生)·정두원(鄭斗源) 등과 서한을 교환하며 역학과 음악을 토론하였다.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두어 고향에 머무르는 동안에 거문고에 관련된 명(銘)·부(賦)·기(記)·시(詩)·서(書)·악보·고금금보(古今琴譜) 등을 집대성하여 《현금동문유기 玄琴東文類記》라는 귀한 거문고악보를 후세에 남겼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선공감(繕工監)의 정(正)이 되고, 이듬해 괴산군수가 되어 이괄(李适)의 난으로 소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관기를 바로잡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과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현금동문유기》 외에 저서로 《서계집 西溪集》·《서계가장결 西溪家藏訣》이 있다.
특히, 정두원과 나눈 서한의 내용을 담은 《현금동문유기》는 《안상금보 安常琴譜》·《조성금보 趙晟琴譜》와 더불어 임진왜란 이전의 음악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양금신보>>
편찬연대 : 조선 중기(1610년)
저자 : 양덕수(梁德壽)
1610년(광해군 2) 양덕수(梁德壽) 편찬한 거문고 고악보이다.
엮은이가 임진왜란을 피하여 남원에 갔다가 임실현감인 친구 김두남을 우연히 만났다. 김두남은 양덕수에게 금도(琴道)가 단절될 것을 막기 위해 금보를 정리할 것을 권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수록악곡 : 악곡은 만대엽(慢大葉) ·북전(北殿) ·중대엽(中大葉) ·조음(調音) ·감군은(感君恩)이라는 향악곡 등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중대엽에 쓰인 4조의 악곡을 후대에 악보로 전해줌으로써 조선시대 음악사연구에 서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거문고의 전통을 후대에 전승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편집체제 : 책머리의 금아부(琴雅部)에서 중국 칠현금(七絃琴)을 소개하고 현금아부에서는 거문고의 유래를 소개했으며 거문고의 평조산형(平調散形)·우조산형(羽調散形)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또 술대 쥐는 법, 줄 고르는 법, 줄 짚는 법, 시가(時價)를 측정하는 법, 합자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책끝에 김두남의 발문이 있는데 여기에 악보가 이루어진 경위가 적혀 있다. 본문에는 모두 9곡이 실려 있는데, 중대엽의 \"오리오리쇼셔\"의 가사는 〈금합자보(琴合字譜)〉의 만대엽의 가사와 일본 다마야마 신사[玉山神社]에 전하는〈학구무의 노래〉와 같은 점에서 흥미롭다. 임진왜란 때 남원·김해 등지에서 일본으로 도공(陶工) 수십 명이 납치되어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 우리 음악이 전해진 듯하다. 다마야마 신사에는 아직도 〈신무가〉·〈신봉축사〉·〈학구무의 노래〉 등 3가지 노래가 전해오고, 그밖에 악기·기구·일상용어까지 아직도 한국말에 가깝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보법 : 민찬악보로는 드물게 목판본으로 되어있고, 기보(記譜)는 6대강(六大綱)에 5음 · 합자보 · 육보(肉譜)를 사용하였다. 가악(歌樂)을 수록하였으며, 조(調)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책 끝에는 이 악보를 엮도록 권유한 임실현감(任實縣監) 김두남(金斗南)의 발문이 있어 이 악보가 엮어지기까지의 경위를 밝혀 주고 있다.
*농현법
양금신보에 요현의 부호와 구인(鉤引)부호가 있다. 요현은 줄을 흔들어 내는 소리 즉, 오늘날의 농현에 해당하며, 구인은 처음 낸 소리를 끌어 올리는 주법이다. 17세기 초에는 2가지가 쓰이는데, 금합자보에서 무겁게 눌러서 연주하는 수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역안법으로 연주할 때 이러한 수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술대 쥐는 법
산(山) 대나무로 살이 두터운 것으로 양쪽 마디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오른손 식지와 장지 사 이에 끼우고, 식지로 구부리고 모지로 밀어 술대를 잡는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주먹을 쥔다. 술대는 힘있게 잡는다.
*탄법(술대 쓴는 법)
17세기의 탄법을 양금신보를 통하여 살펴보면 16세기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ㅅㄹ랭(皆淸法)은
어 짚지 않고 가볍게 짚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3번 무겁게 눌러 소리를 갖고 노는 방법(弄)으로 요성과 비슷하다. 또 농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조금씩 움직여 줄은 흔들리지 않으며 소리만 농하도록 한다. 搖는 괘를 짚고 밀어서 그 소리를 흔들어 내는 방법으로, 오늘날의 요성에 해당한다.
추현(推絃)의 방법은 대현은 괘상청까지 유현은 대현까지 미는데, 현재의 추성에 해당한다.
16세기 초에는 요현이 쓰이다가 16세기 말에는 요현 외에 \'弄\'과 추현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방법이 쓰였다.
*탄법(술대 쓰는 법)
15세기의 탄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악학궤범이 있으며, 현금동문류기의 한글 육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현금동문류기 한글 육보의 탄법도 악학궤범과 대부분 같다.
악학궤범의 탄법에 의하면, \'ㅅ랭\' \'ㄷ랭\' \'외술\' \'겹술\'의 설명이 있다. ㅅ랭은 여러 줄을 바깥쪽으로 타는 방법이고, ㄷ랭은 여러 줄을 안쪽으로 타는 방법이다.32) 또, 외술은 한줄을 안쪽이나 바깥으로 타는 방법이고, 겹술은 문현, 유현, 대현 세 줄을 바깥으로 타는 방법이다. 겹술은 세 줄을 타는 방법으로 설명되었지만 금합자보에는 문현과 유현 두 줄을 타는 곳에도 겹술의 부호가 있는 점으로 보아 문현과 안현을 함께 연주하는 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위 방법을 분류하면, 술대를 밖으로 향하여 연주하는 법과 안으로 향하여 연주하는 법으로 나 눌 수 있고, 또 한 줄을 타는 방법(외술)과 두(세) 줄을 타는 방법(겹술)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타특징 :
*이득윤(李得胤)
1553(명종 8)∼1630(인조 8). 조선 중기의 역학자(易學者)·악인(樂人).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극흠(克欽), 호는 서계(西溪).
고려말 문신 제현(齊賢)의 후손이다. 유학자 서기(徐起)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박지화(朴枝華)에게 역학(易學)을 배우고, 1588년(선조 21)에 진사가 되었다.
1597년 학행으로 추천되어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독서에 전념하다가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고 이어서 형조좌랑·의성현령을 지냈다.
광해군 때 혼란한 정계를 피하여 고향에 머무르면서 김장생(金長生)·정두원(鄭斗源) 등과 서한을 교환하며 역학과 음악을 토론하였다.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두어 고향에 머무르는 동안에 거문고에 관련된 명(銘)·부(賦)·기(記)·시(詩)·서(書)·악보·고금금보(古今琴譜) 등을 집대성하여 《현금동문유기 玄琴東文類記》라는 귀한 거문고악보를 후세에 남겼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선공감(繕工監)의 정(正)이 되고, 이듬해 괴산군수가 되어 이괄(李适)의 난으로 소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관기를 바로잡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과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현금동문유기》 외에 저서로 《서계집 西溪集》·《서계가장결 西溪家藏訣》이 있다.
특히, 정두원과 나눈 서한의 내용을 담은 《현금동문유기》는 《안상금보 安常琴譜》·《조성금보 趙晟琴譜》와 더불어 임진왜란 이전의 음악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양금신보>>
편찬연대 : 조선 중기(1610년)
저자 : 양덕수(梁德壽)
1610년(광해군 2) 양덕수(梁德壽) 편찬한 거문고 고악보이다.
엮은이가 임진왜란을 피하여 남원에 갔다가 임실현감인 친구 김두남을 우연히 만났다. 김두남은 양덕수에게 금도(琴道)가 단절될 것을 막기 위해 금보를 정리할 것을 권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수록악곡 : 악곡은 만대엽(慢大葉) ·북전(北殿) ·중대엽(中大葉) ·조음(調音) ·감군은(感君恩)이라는 향악곡 등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중대엽에 쓰인 4조의 악곡을 후대에 악보로 전해줌으로써 조선시대 음악사연구에 서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거문고의 전통을 후대에 전승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편집체제 : 책머리의 금아부(琴雅部)에서 중국 칠현금(七絃琴)을 소개하고 현금아부에서는 거문고의 유래를 소개했으며 거문고의 평조산형(平調散形)·우조산형(羽調散形)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또 술대 쥐는 법, 줄 고르는 법, 줄 짚는 법, 시가(時價)를 측정하는 법, 합자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책끝에 김두남의 발문이 있는데 여기에 악보가 이루어진 경위가 적혀 있다. 본문에는 모두 9곡이 실려 있는데, 중대엽의 \"오리오리쇼셔\"의 가사는 〈금합자보(琴合字譜)〉의 만대엽의 가사와 일본 다마야마 신사[玉山神社]에 전하는〈학구무의 노래〉와 같은 점에서 흥미롭다. 임진왜란 때 남원·김해 등지에서 일본으로 도공(陶工) 수십 명이 납치되어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 우리 음악이 전해진 듯하다. 다마야마 신사에는 아직도 〈신무가〉·〈신봉축사〉·〈학구무의 노래〉 등 3가지 노래가 전해오고, 그밖에 악기·기구·일상용어까지 아직도 한국말에 가깝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보법 : 민찬악보로는 드물게 목판본으로 되어있고, 기보(記譜)는 6대강(六大綱)에 5음 · 합자보 · 육보(肉譜)를 사용하였다. 가악(歌樂)을 수록하였으며, 조(調)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책 끝에는 이 악보를 엮도록 권유한 임실현감(任實縣監) 김두남(金斗南)의 발문이 있어 이 악보가 엮어지기까지의 경위를 밝혀 주고 있다.
*농현법
양금신보에 요현의 부호와 구인(鉤引)부호가 있다. 요현은 줄을 흔들어 내는 소리 즉, 오늘날의 농현에 해당하며, 구인은 처음 낸 소리를 끌어 올리는 주법이다. 17세기 초에는 2가지가 쓰이는데, 금합자보에서 무겁게 눌러서 연주하는 수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역안법으로 연주할 때 이러한 수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술대 쥐는 법
산(山) 대나무로 살이 두터운 것으로 양쪽 마디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오른손 식지와 장지 사 이에 끼우고, 식지로 구부리고 모지로 밀어 술대를 잡는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주먹을 쥔다. 술대는 힘있게 잡는다.
*탄법(술대 쓴는 법)
17세기의 탄법을 양금신보를 통하여 살펴보면 16세기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ㅅㄹ랭(皆淸法)은
추천자료
 교육방법의 변천과정(코메니우스~듀이와 길패트릭)
교육방법의 변천과정(코메니우스~듀이와 길패트릭) 품질변천과정
품질변천과정 [동서양][동양서양][자연관][미술][국가사회변천][술문화]동서양(동양서양)의 자연관과 동서...
[동서양][동양서양][자연관][미술][국가사회변천][술문화]동서양(동양서양)의 자연관과 동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요약하시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요약하시오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 교육과정변천과 역할,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 지도원칙, 초등...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 교육과정변천과 역할,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 지도원칙, 초등... 소매업태의 변천과정
소매업태의 변천과정 한국정부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하여(1공화국~4공화국:1945~1979년)
한국정부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하여(1공화국~4공화국:1945~1979년) 리더십이론의 변천과정 조사
리더십이론의 변천과정 조사 가족법의 변천과정.
가족법의 변천과정.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 및 문제점과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 및 문제점과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국제금융체제의 변천]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국제금융시장의 확...
[국제금융체제의 변천]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국제금융시장의 확... [의료사회사업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의료사회사업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이론의 발전과 변천] 행정이론 (Administrative Theory) - 행정이론의 발전(계보), 행정...
[행정이론의 발전과 변천] 행정이론 (Administrative Theory) - 행정이론의 발전(계보),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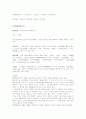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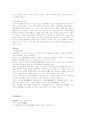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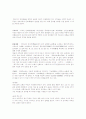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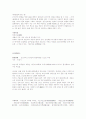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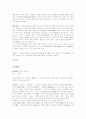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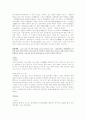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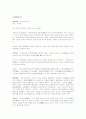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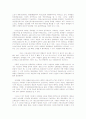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