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論
2. 本 論
1 > 日 鮮 同 祖 論
2 > 主體的 發展性을 缺如하고 있다는 韓國史觀
3 > 征 韓 論
4 > 大 東 合 邦 論
3. 結 論
2. 本 論
1 > 日 鮮 同 祖 論
2 > 主體的 發展性을 缺如하고 있다는 韓國史觀
3 > 征 韓 論
4 > 大 東 合 邦 論
3. 結 論
본문내용
치말기의 福田德三의 소위 “封建 制度 缺如論 = 藤原氏 時代論”등의 여러형태로 이른바 停滯論이 강조되게 되어 조선사회가 歷史上 停滯 落後되고 있었다는 일본인의 전통적 인식은 오늘날까지 日本學界에 계속 전파되면서 日帝의 植民地 支配를 美化하는 유력한 학설이 되었던 것이다.
脫亞論의 발상은 1885년에 福澤諭吉의 서구문화수용의 이론인 文明開化論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일본은 이미 德川幕府末期에 Perry제독이 이끄는 이양선의 來港으로 開國하면서 西歐諸國에서 강요당한 不平等條約을 이번에는 加害者의 입장에서 서구제국이 마지막까지 열지못한 한국의 鎖國을 군사적 압력으로 여는데 성공하여 江華島條約을 체결함으로서 한국에 대한 經濟的侵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미 일본은 明治初부터 서구문화의 수용방식에 있어서 海外雄飛論, 近隣諸國侵略論등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富國强兵의 수단으로 개화의 方略을 세운바 있었다. 국가 발전의 이념형과 문화가치의 기준을 멀리 서구의 그것에다 두고 미 서구화 나라는 모두 野蠻이라 규정하여 文明開化에 반대하는 나라는 무력으로 억압해도 무방하다는 帝國主義的 군사침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반서구적이고 아시아 제국 (특히 支那와 朝鮮을 지칭)중 일본만은 그 野蠻的 대오를 벗어나 서구에 끼어야 한다는 것이 福澤의 脫圈을 몽상하는 脫亞論이다. 福澤의 주장은 일본문화가 동북아의 동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외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文明化 = 西歐化라는 위험한 발전관을 전제하고 있었다.
한편 停滯後進性論은 주로 御用經濟學者들에 의해 세워진 이론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福田德三의 封建制度 缺如論을 들 수 있다. 그는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를 經濟發展 段階論에 의거하여 그 수준을 고찰할때 한국은 봉건제도가 성립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현저히 낙오되어 있어 平安朝의 藤原氏시대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平安朝時代論 또는 封建制度 缺如論은 그후 그대로 일본인의 韓國經濟史 硏究에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발상은 西洋의 역사의 經濟發展 過程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일본의 역사를 맞추어 보아 그 발전수준을 측정하려는 것으로 결국 脫亞論的 思考라고 할 수 있다. 福田은 한국의 政治.社會組織 土地所有 關係.商業機構.工業形態등을 검토한 후 한국경제의 현저한 後進性을 지적하고 그 후진성의 근원으로서 封建制度의 缺如를 지적하였다. 그의 論法은 서양 근대사회를 가져오게 한 것은 봉건제도로서 그 존부가 근대화 발전의 가능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며 일본은 서양과 같은 봉건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한데 비하여 한국은 봉건제도 성립 이전의 극히 유치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사회에의 자주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福田의 이러한 논거는 서양 近代文明을 최고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그것과이 거리를 측정하여 우열을 논하는 脫亞論的 方法을 기초로 한 것이며 그 방법에 따르면 일본의 先進性과 한국의 後進性 또는 停滯性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史 展開에 있어서 高麗朝나 朝鮮朝는 執權的 體制였기
脫亞論의 발상은 1885년에 福澤諭吉의 서구문화수용의 이론인 文明開化論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일본은 이미 德川幕府末期에 Perry제독이 이끄는 이양선의 來港으로 開國하면서 西歐諸國에서 강요당한 不平等條約을 이번에는 加害者의 입장에서 서구제국이 마지막까지 열지못한 한국의 鎖國을 군사적 압력으로 여는데 성공하여 江華島條約을 체결함으로서 한국에 대한 經濟的侵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미 일본은 明治初부터 서구문화의 수용방식에 있어서 海外雄飛論, 近隣諸國侵略論등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富國强兵의 수단으로 개화의 方略을 세운바 있었다. 국가 발전의 이념형과 문화가치의 기준을 멀리 서구의 그것에다 두고 미 서구화 나라는 모두 野蠻이라 규정하여 文明開化에 반대하는 나라는 무력으로 억압해도 무방하다는 帝國主義的 군사침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반서구적이고 아시아 제국 (특히 支那와 朝鮮을 지칭)중 일본만은 그 野蠻的 대오를 벗어나 서구에 끼어야 한다는 것이 福澤의 脫圈을 몽상하는 脫亞論이다. 福澤의 주장은 일본문화가 동북아의 동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외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文明化 = 西歐化라는 위험한 발전관을 전제하고 있었다.
한편 停滯後進性論은 주로 御用經濟學者들에 의해 세워진 이론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福田德三의 封建制度 缺如論을 들 수 있다. 그는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를 經濟發展 段階論에 의거하여 그 수준을 고찰할때 한국은 봉건제도가 성립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현저히 낙오되어 있어 平安朝의 藤原氏시대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平安朝時代論 또는 封建制度 缺如論은 그후 그대로 일본인의 韓國經濟史 硏究에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발상은 西洋의 역사의 經濟發展 過程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일본의 역사를 맞추어 보아 그 발전수준을 측정하려는 것으로 결국 脫亞論的 思考라고 할 수 있다. 福田은 한국의 政治.社會組織 土地所有 關係.商業機構.工業形態등을 검토한 후 한국경제의 현저한 後進性을 지적하고 그 후진성의 근원으로서 封建制度의 缺如를 지적하였다. 그의 論法은 서양 근대사회를 가져오게 한 것은 봉건제도로서 그 존부가 근대화 발전의 가능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며 일본은 서양과 같은 봉건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한데 비하여 한국은 봉건제도 성립 이전의 극히 유치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사회에의 자주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福田의 이러한 논거는 서양 近代文明을 최고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그것과이 거리를 측정하여 우열을 논하는 脫亞論的 方法을 기초로 한 것이며 그 방법에 따르면 일본의 先進性과 한국의 後進性 또는 停滯性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史 展開에 있어서 高麗朝나 朝鮮朝는 執權的 體制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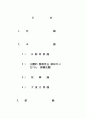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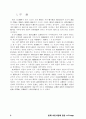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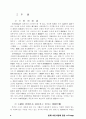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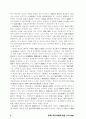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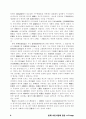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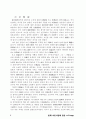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