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설시조의 애정형상
1. 관습적 수사가 유사한 사설시조
2. 관습적 수사가 다른 사설시조
3. 성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사설시조
Ⅲ. 사설시조의 애정형상과 특징
1. 인물상의 변화(남성상과 여성성)
(1). 남성상에 대한 고찰
(2). 여성상에 대한 고찰
2. 상황묘사적 특징
3. 사설시조와 성담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Ⅱ. 사설시조의 애정형상
1. 관습적 수사가 유사한 사설시조
2. 관습적 수사가 다른 사설시조
3. 성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사설시조
Ⅲ. 사설시조의 애정형상과 특징
1. 인물상의 변화(남성상과 여성성)
(1). 남성상에 대한 고찰
(2). 여성상에 대한 고찰
2. 상황묘사적 특징
3. 사설시조와 성담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평시조와는 달리 삶을 노래하며 비극적 정조를 주조로 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허무주의적 사상과 현세주의적 지향성을 갖는 한편 저항적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인물 중심으로 생활 주변의 사물들이 시적 대상이 되고 있으며 비판 정신의 풍자성과 외설적, 향락적, 저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설시조는 기존의 양반문학처럼 추상적, 관념적, 고답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생활이 중심이 된 재담, 욕설, 음담, 애욕 등을 서슴없이 대담하게 묘사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은데 특히 애정형상에 있어서 평시조와는 다른 모습을 띈다. 사설시조는 주로 기존 시가에서 쓰이던 관습적 수사가 아닌, 시어의 확대를 통해서 애정형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런 작품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기존의 시가에서 볼 수 있는 관습적 수사를 통해 애정형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있어서는 평시조의 시적관습에 기대지만 사설시조가 가지는 장형화된 형식적 특징을 잘 살려 애정형상을 나타낸다. 또한 사설시조에는 작품 속에서 성을 적극적으로 형상화 하는 작품들이 많다. 인간의 욕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런 작품들은 이전의 시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애정형상이다.
여기서는 사설시조의 애정형상을 통해 사설시조 애정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사설시조와 성담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자 한다.
Ⅱ. 사설시조의 애정형상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설시조는 그 애정형상에 따라 평시조와 관습적 수사가 유사한 사설시조, 평시조와 다른 관습적 수사를 사용한 사설시조, 그리고 평시조와는 전혀 다르게 성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사설시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설시조의 애정형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평시조와 관습적 수사방식이 유사한 사설시조를 살펴본 후, 차이를 보이는 사설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설시조의 특징을 끌어내려 한다.
1. 관습적 수사가 유사한 사설시조
여기서 관습적 수사가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어의 의미가 유사하다거나 표현방식이 유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조의 분위기와 화자의 태도가 유사하다는 의미임을 미리 밝힌다. 이를 통해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비교해본 결과, 주로 이전의 기녀시조들에서 주로 드러났던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그와의 만남과 화합을 갈구하는 상사의 감정을 다룬 평시조와 여전히 맥락을 같이하며 같은 정서로 가는 시조들을 사설시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月下에 任 生覺되 任의 消息 바히 업
四更 사경: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넷째 시간. 곧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우름 울고 瀟湘 洞庭 소상동정: 중국 호남성의 명승지인 소강(瀟江), 상강(湘江)과 동정호(洞庭湖).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외기러기
을 보고 번 길게 우난고나
언제나 그리던 任 만나 왼 밤 잘고 노라
-(六堂本 靑丘永言)-
月黃昏 월황혼: 달 뜬 저녁.
계여 간 날에 定處 업시 나간 님이
白馬 金鞭 백마금편: 흰 말과 금채찍. 풍류 남아의 호사스러운 나들이 차림.
으로 어듸 가 됴니다가
酒色에 기어 도라올 줄 니젓고
獨宿孤房여 長相思 淚如雨 장상사 누여우: 오래도록 그리는 정에 눈물이 비 오듯 함.
에 轉輾不寐 전전불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노라.
-(珍本 靑丘永言)-
첫 번째 시조는 한밤중에 달 아래서 아무 소식 없는 임을 생각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기다림의 정서를 드러낸다. 두 번째 시조는 좀 더 임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는데, 임은 해가 져서 저녁이 되자마자 정처 없이 집을 나가는 풍류남아로, 주색잡기에 빠져 집에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다. 화자는 빈방에 홀로 앉아서 그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시조들의 현재 상황은 임이 부재하며, 화자는 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기다림과 그리움의 감정만 있을 뿐이지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나 임을 찾아 나선다든지, 임에 대해 원망을 한다든지 등의 좀 더 적극적인 행동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사설시조들은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2. 관습적 수사가 다른 사설시조
어이 못 오던가, 무 일노 못 오던가
너 오 길우희 무쇠로 城을 고
城 안헤 담 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두지: 쌀 같은 곡식을 담아두는 세간.
노코 두지 안헤 櫃를 노코
櫃 안헤 너를 結縛여 노코
雙목 쌍배목: 걸쇠를 거는 구멍난 못.
외걸새 외걸새: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
에 龍거북 물쇠 용거북자물쇠: 용과 거북의 무늬를 새긴, 좋은 자물쇠.
로
수기수기 수기수기: 깊이 깊이.
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이 셜흔 이여니 날 보라 올 리 업스랴.
-(珍本 靑丘永言)-
이 시조에서도 역시 임은 부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시조와 비교하여보면 화자의 감정이 기다림과 그리움을 넘어 원망이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조에서는 아예 ‘임’이라고 지칭하는 대신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 원망이 슬프고 애절한 표현이 아닌, 해학적인 표현 안에서 녹아나는데, 특히 중장에서는 임이 오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제약을 연쇄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네가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성안에 담을 쌓고, 그 담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뒤주를 놓고, 그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네가 결박되어 있는데 쌍배목 외걸새에 용거북 자물쇠로 잠갔기 때문에 못 온 것이냐’는 표현을 통해 점점 작은 범위로 좁혀 들어가는 연쇄법과 과장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비유들은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한 달이 30일이나 되는데 날 보러 하루도 올 수 없냐는 종장의 표현에서 임에 대한 책망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시조는 애정을 노래했던 이전의 평시조에서는 보기 힘든 강한 감정의 표출이 잘 드러난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어이려뇨 어이러뇨
사설시조는 기존의 양반문학처럼 추상적, 관념적, 고답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생활이 중심이 된 재담, 욕설, 음담, 애욕 등을 서슴없이 대담하게 묘사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은데 특히 애정형상에 있어서 평시조와는 다른 모습을 띈다. 사설시조는 주로 기존 시가에서 쓰이던 관습적 수사가 아닌, 시어의 확대를 통해서 애정형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런 작품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기존의 시가에서 볼 수 있는 관습적 수사를 통해 애정형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있어서는 평시조의 시적관습에 기대지만 사설시조가 가지는 장형화된 형식적 특징을 잘 살려 애정형상을 나타낸다. 또한 사설시조에는 작품 속에서 성을 적극적으로 형상화 하는 작품들이 많다. 인간의 욕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런 작품들은 이전의 시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애정형상이다.
여기서는 사설시조의 애정형상을 통해 사설시조 애정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사설시조와 성담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자 한다.
Ⅱ. 사설시조의 애정형상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설시조는 그 애정형상에 따라 평시조와 관습적 수사가 유사한 사설시조, 평시조와 다른 관습적 수사를 사용한 사설시조, 그리고 평시조와는 전혀 다르게 성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사설시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설시조의 애정형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평시조와 관습적 수사방식이 유사한 사설시조를 살펴본 후, 차이를 보이는 사설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설시조의 특징을 끌어내려 한다.
1. 관습적 수사가 유사한 사설시조
여기서 관습적 수사가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어의 의미가 유사하다거나 표현방식이 유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조의 분위기와 화자의 태도가 유사하다는 의미임을 미리 밝힌다. 이를 통해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비교해본 결과, 주로 이전의 기녀시조들에서 주로 드러났던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그와의 만남과 화합을 갈구하는 상사의 감정을 다룬 평시조와 여전히 맥락을 같이하며 같은 정서로 가는 시조들을 사설시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月下에 任 生覺되 任의 消息 바히 업
四更 사경: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넷째 시간. 곧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우름 울고 瀟湘 洞庭 소상동정: 중국 호남성의 명승지인 소강(瀟江), 상강(湘江)과 동정호(洞庭湖).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외기러기
을 보고 번 길게 우난고나
언제나 그리던 任 만나 왼 밤 잘고 노라
-(六堂本 靑丘永言)-
月黃昏 월황혼: 달 뜬 저녁.
계여 간 날에 定處 업시 나간 님이
白馬 金鞭 백마금편: 흰 말과 금채찍. 풍류 남아의 호사스러운 나들이 차림.
으로 어듸 가 됴니다가
酒色에 기어 도라올 줄 니젓고
獨宿孤房여 長相思 淚如雨 장상사 누여우: 오래도록 그리는 정에 눈물이 비 오듯 함.
에 轉輾不寐 전전불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노라.
-(珍本 靑丘永言)-
첫 번째 시조는 한밤중에 달 아래서 아무 소식 없는 임을 생각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기다림의 정서를 드러낸다. 두 번째 시조는 좀 더 임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는데, 임은 해가 져서 저녁이 되자마자 정처 없이 집을 나가는 풍류남아로, 주색잡기에 빠져 집에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다. 화자는 빈방에 홀로 앉아서 그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시조들의 현재 상황은 임이 부재하며, 화자는 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기다림과 그리움의 감정만 있을 뿐이지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나 임을 찾아 나선다든지, 임에 대해 원망을 한다든지 등의 좀 더 적극적인 행동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사설시조들은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2. 관습적 수사가 다른 사설시조
어이 못 오던가, 무 일노 못 오던가
너 오 길우희 무쇠로 城을 고
城 안헤 담 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두지: 쌀 같은 곡식을 담아두는 세간.
노코 두지 안헤 櫃를 노코
櫃 안헤 너를 結縛여 노코
雙목 쌍배목: 걸쇠를 거는 구멍난 못.
외걸새 외걸새: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
에 龍거북 물쇠 용거북자물쇠: 용과 거북의 무늬를 새긴, 좋은 자물쇠.
로
수기수기 수기수기: 깊이 깊이.
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이 셜흔 이여니 날 보라 올 리 업스랴.
-(珍本 靑丘永言)-
이 시조에서도 역시 임은 부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시조와 비교하여보면 화자의 감정이 기다림과 그리움을 넘어 원망이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조에서는 아예 ‘임’이라고 지칭하는 대신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 원망이 슬프고 애절한 표현이 아닌, 해학적인 표현 안에서 녹아나는데, 특히 중장에서는 임이 오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제약을 연쇄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네가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성안에 담을 쌓고, 그 담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뒤주를 놓고, 그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네가 결박되어 있는데 쌍배목 외걸새에 용거북 자물쇠로 잠갔기 때문에 못 온 것이냐’는 표현을 통해 점점 작은 범위로 좁혀 들어가는 연쇄법과 과장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비유들은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한 달이 30일이나 되는데 날 보러 하루도 올 수 없냐는 종장의 표현에서 임에 대한 책망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시조는 애정을 노래했던 이전의 평시조에서는 보기 힘든 강한 감정의 표출이 잘 드러난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어이려뇨 어이러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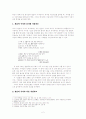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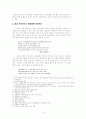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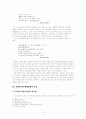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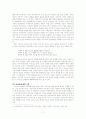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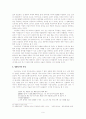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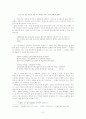












소개글